본문내용
었다. 그리고 양복과 기모노를 상황에 맞게 갖춰 입으면서도 멀티폼을 입는 모습, 서양적 요소와 일본적 요소가 공존하는 의식주 문화의 생활적인 면에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말고, 의식적인 면에서도 나타난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강박적인 연구심, 탐구심, 생활양식이나 전통적인 천황제에 따른 천황모델방식, 메이지 시대로의 복고모델방식, 가장 일반적인 서양화모델방식, 탈아론으로 볼 수 있는 국위선양방식 등이 있다. 또한 운명론적인 요소와 그때그때주의의 결합 같은 상황순응주의나 단념과 체념하는 모습, 그리고 유랑과 고독을 즐기고 싶어 하는 예술가적인 방랑지향적 성향도 있다. 그리고 이런 성향을 응용했다고 볼 수 있는 네마와시나 겉마음 속마음이 다른 혼네와 다테마에가 있다. 우리가 일본인을 이중인격 같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혼네와 다테마에의 습성을 보고 하는 말인것 같다. 처음 이 단어들을 접했을 때 ‘완전 이중인격이네.’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패전을 통해 드러난 혼네가 오래가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사회에서 다테마에가 더 우위를 차지하여 자아불확실감이 점점 깊어지고 혼네를 표출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회문제가 생기는 모습을 보니 이중인격이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속마음과 다르게 겉마음을 내세워야 하는 경우가 있다. 혼네를 표출하지 못해 답답해 하면서도, 다테마에를 내비쳐 자아를 그나마 안전하게 하려는 일본인의 모습이 조금은 안쓰럽기도 하다.
늘 우리는 우리와 같은 것에는 친밀감을 느끼고 다른 것에는 이질감을 느낀다. 친밀감은 모두에게 있는 면이라는 점에서의 안도감 같은 것이고, 이질감은 적대적이라기 보다는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신기하고 어색하고, 특이해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랜 시간동안 맞물린 역사 속에서, 바로 이웃해 있는 지리적 여건 속에서, 아시아라는 같은 문명권 속에서 우리와 일본은 같으면서도 다른 성향을 키워나갔다.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라는 의미는 어쩌면 ‘같은 성향이면서도 다른 면을 보이는 나라’라는 의미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일본적 자아》라는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혹 부정적으로 보아왔던 일본인의 특성들이 그들의 역사적, 문화적, 심리적 배경 속에서 나올 수 밖에 없었던 것이며,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일본과 감정이 안좋아서, 일본인 우리보다 잘 사는 것 같아서 곱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 일본인도 우리를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기도 한다. 그러나 21세기 앞으로도 끊임없이 같은 역사속에 살아야 하는 두 이웃나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가 아닐까 싶다. 어쩌면 그 이해를 위해 일본적 자아, 그리고 우리도 알게 모르는 한국인적 자아를 서로 알아야 하는지도 모른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이제는 그들을 이해할수 없다는 시선으로 볼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시선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자아속에서 우리의 눈이 보지 못하는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다.
늘 우리는 우리와 같은 것에는 친밀감을 느끼고 다른 것에는 이질감을 느낀다. 친밀감은 모두에게 있는 면이라는 점에서의 안도감 같은 것이고, 이질감은 적대적이라기 보다는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신기하고 어색하고, 특이해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랜 시간동안 맞물린 역사 속에서, 바로 이웃해 있는 지리적 여건 속에서, 아시아라는 같은 문명권 속에서 우리와 일본은 같으면서도 다른 성향을 키워나갔다.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라는 의미는 어쩌면 ‘같은 성향이면서도 다른 면을 보이는 나라’라는 의미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일본적 자아》라는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혹 부정적으로 보아왔던 일본인의 특성들이 그들의 역사적, 문화적, 심리적 배경 속에서 나올 수 밖에 없었던 것이며,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일본과 감정이 안좋아서, 일본인 우리보다 잘 사는 것 같아서 곱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 일본인도 우리를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기도 한다. 그러나 21세기 앞으로도 끊임없이 같은 역사속에 살아야 하는 두 이웃나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가 아닐까 싶다. 어쩌면 그 이해를 위해 일본적 자아, 그리고 우리도 알게 모르는 한국인적 자아를 서로 알아야 하는지도 모른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이제는 그들을 이해할수 없다는 시선으로 볼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시선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자아속에서 우리의 눈이 보지 못하는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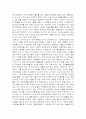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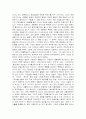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