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서 론
■ 본 론
▲ 매스미디어와 정치
• 정부에 협력적인 매스미디어
• 정치권이 매스미디어를 이용하는 경우
• 외교와 매스미디어
▲ 한국 매스미디어의 특성
• 반공주의적 경향
• 언론에 대한 국가의 통제
• 자본주의와 종속된 관계
▲ 한국 언론의 왜곡 실태
• 군사정부와 언론
• 북한관련 오보
■ 결 론
■ 본 론
▲ 매스미디어와 정치
• 정부에 협력적인 매스미디어
• 정치권이 매스미디어를 이용하는 경우
• 외교와 매스미디어
▲ 한국 매스미디어의 특성
• 반공주의적 경향
• 언론에 대한 국가의 통제
• 자본주의와 종속된 관계
▲ 한국 언론의 왜곡 실태
• 군사정부와 언론
• 북한관련 오보
■ 결 론
본문내용
났던 언론의 문제들을 전형적으로 보여준 경우였다. 추측보도가 남발되었고 정부 발표를 ‘받아쓰기’한 경우도 많았다. 나아가 정부의 햇볕정책을 흔드는 언론도 있었다.
조선일보는 사건 직후부터 선정적 단어와 무리한 추측보도로 긴장감을 조성하는 한편 사실을 확대 과장왜곡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예를 들어 26일자에는 96년 생포된 이광수씨가 작전에 투입되어 “폭발물 설치된 것 같다”고 말한 것을 사실확인도 없이 제목으로 달았다. 24, 27일자 사설을 통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햇볕을 쬐어 주어도 ...아무 소용없는 일”(24일), “[햇볕정책]이라는 틀에 너무 얽매여서...경직된 자세로 일관...처음부터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려는 노력마저 미흡했다”(27일)며 정부의 햇볕정책을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안보가 흔들리면 외국 기업인의 투자는 ...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감을 부추겼다.
동아일보는 잠수정 출현 초기 “현 시점에서는 과잉 반응도 안일한 자세도 모두 금물”이라며 다른 신문에 비해 차분하게 접근했다. 그러나 불과 이틀 뒤인 27일 사설을 통해 “정부가 아무리 햇볕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려해도 국민 여론이 용납 못하는 상황으로 빠져들지 모른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방송 3사는 정부의 햇볕정책을 직접 비판하지는 않았으나, 22일 첫 보도에서 “북한 잠수정 한 척이 또 속초 앞바다에 침투했습니다”(KBS)라며 상황파악이 채 이뤄지기도 전에 ‘침투’로 규정하는가 하면 “정부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SBS)이라고 주장하는 등 성급함을 보였다.
북한관련 언론보도는 과거 역대정권기간 동안, 기존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취한 권력자와 언론의 왜곡과 정치적인 도구로 수없이 전락했었다. 대선이나 총선 직전에는 거의 대부분 북의 행동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유권자들인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지나치리만큼 고조시켜서 자신들의 정권연장에 이용했었다. 불과 얼마전의 이른바 북풍과 총풍 사건을 봐도 알 수 있다. 이처럼, 권력자들에게는 정권유지 수단이었지만, 특정 언론사에게는 판매부수와 시청률을 높이는 좋은 기회로서, 이른바 [국가안보 상업주의]라는 말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결 론
신문과 방송 그리고 잡지와 같은 매스미디어는 그 출생단계부터 시장 논리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 구독률과 시청률에 따른 광고주의 영향으로 상업성을 제일 많이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사실 전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 환경 감시의 덕목은 우선 순위의 목표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언론이 생존과 경쟁을 위해 상업성과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며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 사회의 모순과 병폐의 깊은 환부는 부분적으로 언론이 자신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방치한 결과일지 모른다. 정의와 도덕의 편에 서자면 그 자신부터 떳떳해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해 왔던 것이다.
언론도 미디어라는 수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언어학자 노엄 촘스키의 말은 더더욱 수용자인 우리들에게 의미심장하게 들린다.
조선일보는 사건 직후부터 선정적 단어와 무리한 추측보도로 긴장감을 조성하는 한편 사실을 확대 과장왜곡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예를 들어 26일자에는 96년 생포된 이광수씨가 작전에 투입되어 “폭발물 설치된 것 같다”고 말한 것을 사실확인도 없이 제목으로 달았다. 24, 27일자 사설을 통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햇볕을 쬐어 주어도 ...아무 소용없는 일”(24일), “[햇볕정책]이라는 틀에 너무 얽매여서...경직된 자세로 일관...처음부터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려는 노력마저 미흡했다”(27일)며 정부의 햇볕정책을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안보가 흔들리면 외국 기업인의 투자는 ...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감을 부추겼다.
동아일보는 잠수정 출현 초기 “현 시점에서는 과잉 반응도 안일한 자세도 모두 금물”이라며 다른 신문에 비해 차분하게 접근했다. 그러나 불과 이틀 뒤인 27일 사설을 통해 “정부가 아무리 햇볕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려해도 국민 여론이 용납 못하는 상황으로 빠져들지 모른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방송 3사는 정부의 햇볕정책을 직접 비판하지는 않았으나, 22일 첫 보도에서 “북한 잠수정 한 척이 또 속초 앞바다에 침투했습니다”(KBS)라며 상황파악이 채 이뤄지기도 전에 ‘침투’로 규정하는가 하면 “정부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SBS)이라고 주장하는 등 성급함을 보였다.
북한관련 언론보도는 과거 역대정권기간 동안, 기존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취한 권력자와 언론의 왜곡과 정치적인 도구로 수없이 전락했었다. 대선이나 총선 직전에는 거의 대부분 북의 행동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유권자들인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지나치리만큼 고조시켜서 자신들의 정권연장에 이용했었다. 불과 얼마전의 이른바 북풍과 총풍 사건을 봐도 알 수 있다. 이처럼, 권력자들에게는 정권유지 수단이었지만, 특정 언론사에게는 판매부수와 시청률을 높이는 좋은 기회로서, 이른바 [국가안보 상업주의]라는 말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결 론
신문과 방송 그리고 잡지와 같은 매스미디어는 그 출생단계부터 시장 논리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 구독률과 시청률에 따른 광고주의 영향으로 상업성을 제일 많이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사실 전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 환경 감시의 덕목은 우선 순위의 목표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언론이 생존과 경쟁을 위해 상업성과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며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 사회의 모순과 병폐의 깊은 환부는 부분적으로 언론이 자신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방치한 결과일지 모른다. 정의와 도덕의 편에 서자면 그 자신부터 떳떳해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해 왔던 것이다.
언론도 미디어라는 수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언어학자 노엄 촘스키의 말은 더더욱 수용자인 우리들에게 의미심장하게 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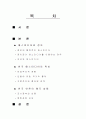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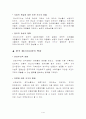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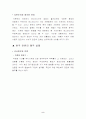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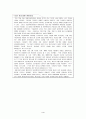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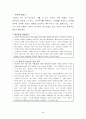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