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자선 조직협회
1) 설립배경
2) 특징
3) 목적
4) 방법
5) 효과 및 의의
2. 인보관
1) 발생배경
2) 특징
3) 방법
4) 효과 및 의의
3. 자선조직협외와 인보관 운동의 공통점
4.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의 차이점
5. 나의 생각
6. 베버리지보고서의 사회보장원칙과 가정에대한 비판
1) 설립배경
2) 특징
3) 목적
4) 방법
5) 효과 및 의의
2. 인보관
1) 발생배경
2) 특징
3) 방법
4) 효과 및 의의
3. 자선조직협외와 인보관 운동의 공통점
4.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의 차이점
5. 나의 생각
6. 베버리지보고서의 사회보장원칙과 가정에대한 비판
본문내용
port)이 도입되면서 8백만명으로 급증하였다(Alcock, 1996).
또한 1991년 공공부조 전체 수급자는 10,722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9%였고, 1996년에는 27.6%로 1995년 이후 평균 4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수급자가 되었다. 특히 2007/08년은 1991/92년의 1,668천명에서 거의 2배 가깝게 증가하여(DWP, 2005 d) 2명 가운데 1명은 공공부조수급자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공공부조는 1990년대 이후 가장 포괄적인 주된 사회보장제도로서, 사회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을 넘어, 이를 대신하였다56). 나아가 최근에는 의도적으로 자산조사급여 중심을 전환하려는 정책적 기미도 보여(지은정, 2005)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 공적연금과 자산조사급여지출의 비중변화
지난 20년 동안 영국의 GDP대비 사회보장지출의 증가는 자산조사급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기여급여와 연금은 더 축소되었다.
기초연금은 전체 급여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65/66년 53.3%의 최고치였지만, 1974/7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후, 2003/04년에 다소 증가하여 2005/06까지 37%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소득비례연금인 SERPS는 1978년에 도입되어 1979/80년 이후 조금씩 지출이 증가하고있다. 그러나 비기여연금은 총 급여지출에서 0~0.55%로 매우 낮은 비율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어, 그 역할이 미약함을 볼 수 있다. 한편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지급되는 공공부조의 비중은 1948/49년 13.4%에서 출발하여 1979/80년에 8.9%로 전체 급여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았다. 그러나 그 이후 단조상승하였고, 특히 1991/92년에 17.6%에서 1992/93년에는 35.5%로 2배 이상 급증하여 그 비중이 총 연금지출과 같아졌다. 나아가 2000/01년부터 40%를 넘어 2005/06년에는 44.4%였을 뿐 아니라, DWP는 2006/07년에는 46.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DWP, 2005 e; f).
따라서 사회보험이 성숙하면 공공부조가 사라질 것이라는 베버리지의 가정과는 달리, 자산조사급여는 총 기여연금과 동일한 비중을 지닌 주된 소득보장제도로 자리잡았고, 그 비중은 앞으로도 더 커질 전망이다.
② 남성생계부양자 모델
남성생계부양자 모델과 관련해서는 결혼한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한 성역할에 대한 비판과, 여성의 근로활동에 대한 잘못된 가정이 주로 비판받는데, 성역할에 대한 논의와 비판의 타당성은 본 연구의 노후소득보장제도와 직접 상관이 없기 때문에, 논외로 하였다. 이에 여성고용률 중심으로 살펴보면, 예전에는 기혼여성가운데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비율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으나, 그 후 계속 증가하여 현재는 여성의 절반이상이 유급노동에 종사하고 있다60)(Lewis and Piachaud, 1992; Alcock, 1996재인용). 실제 LIS와 영국 DWP의 LFS 자료를 통해 여성의 고용률을 살펴보면, 1960년 여성의 고용참가율은 32.7%(8,017천명)로 총 노동시장참가자의 1/3을 넘었고, 전체 실업률이 11.2%로 높았던 1984년에도 41.3%(13,085천명)로 증가하였다. 또한 2001년에는 45.8%(12,729천명), 2005년에는 46%(13,187천명)로 거의 여성과 남성의 고용참가율이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이는 베버리지가 사회보험을 설계하던 당시의 여성고용률 12.5%와 비교하면 약 4배가 증가한 높은 수치로서, 최근의 상황은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의 적용가능성이 절반을 다소 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남성생계 부양자 모델을 중심으로 설계한 사회보험이 적절하였던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부당한 평가이다.
③안정된 가족구조
베버리지의 사회보험에서 기혼여성은 남성이 퇴직하면, 그의 기여로 자신도 급여를 받고, 남편사망한 홀로된 여성은 남편의 기여금에 따른 사회보험을 통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이 불안정할 경우 여성의 사회적 보호는 위협받게 되고, 이들이 고용관계에 다시 편입되지 못한다면 위험은 더 커진다. 더구나 최근에는 베버리지의 가정과는 달리 이혼율과 한부모가족이 증가하였고, 가족규모는 더 작아지며 그 관계는 종종 단기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또한 결혼율도 낮아지고 결혼연령도 늦어질 뿐 아니라, 재혼 등을 통해 재구성된 가족(reconstitute family)도 증가하였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가족구조의 변화는 결혼을 통해 발생하는 권리와 보호를 복잡하게 하거나 약화시켰고, 특히 여성이 가장인 한부모 가정 등은 복지공백(welfare gap)에 빠질 위험이 높다(Gornick et al., 1997; Esping-Andersen, 1999 재인용). 따라서 기존의 비판은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적합하다. 그러나 베버리지가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안정된 가족구조가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부적절한 평가이다.
④고령화
인구구조 특히 고령화는 연금재정악화의 주요요인이기 때문에, 재무부를 중심으로 베버리지 안을 따를 경우 연간 \"\'240백만의 지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Macnicol, 1994). 그러나 베버리지도 연금이 단일 제도로서 사회보장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하였고65) 고령화에 대해 예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는 더 높게 추정하였다. 보고서(1942년)를 보면 베버리지가 예측한 노인인구 비율은 1961년과 1971년66)에 각각 17.1%와 20.8%였는데, 실제는 1960년은 11.7%, 1975년은 14%, 2001년은 15.9%였다. 이는 베버리지의 예측보다 낮은 수준으로, 베버리지가 인구고령화 문제를 과소평가했다고 판단할 수 없는 단서가 된다. 그러나 출산율이 낮아져, 노년부양비가 2000년에는 24.4%(LIS 자료로 추정함)로, 1901년 10.1%(Beveridge, 1942를 통해 계산하였음)보다 높아졌다. 이는 곧, 연금수급자 1명을 생산가능인구 2.2명(National Statistics, 2005 b)이 부양하는 것을 의미하여, 젊은 근로계층의 부담은 커졌다.
또한 1991년 공공부조 전체 수급자는 10,722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9%였고, 1996년에는 27.6%로 1995년 이후 평균 4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수급자가 되었다. 특히 2007/08년은 1991/92년의 1,668천명에서 거의 2배 가깝게 증가하여(DWP, 2005 d) 2명 가운데 1명은 공공부조수급자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공공부조는 1990년대 이후 가장 포괄적인 주된 사회보장제도로서, 사회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을 넘어, 이를 대신하였다56). 나아가 최근에는 의도적으로 자산조사급여 중심을 전환하려는 정책적 기미도 보여(지은정, 2005)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 공적연금과 자산조사급여지출의 비중변화
지난 20년 동안 영국의 GDP대비 사회보장지출의 증가는 자산조사급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기여급여와 연금은 더 축소되었다.
기초연금은 전체 급여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65/66년 53.3%의 최고치였지만, 1974/7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후, 2003/04년에 다소 증가하여 2005/06까지 37%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소득비례연금인 SERPS는 1978년에 도입되어 1979/80년 이후 조금씩 지출이 증가하고있다. 그러나 비기여연금은 총 급여지출에서 0~0.55%로 매우 낮은 비율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어, 그 역할이 미약함을 볼 수 있다. 한편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지급되는 공공부조의 비중은 1948/49년 13.4%에서 출발하여 1979/80년에 8.9%로 전체 급여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았다. 그러나 그 이후 단조상승하였고, 특히 1991/92년에 17.6%에서 1992/93년에는 35.5%로 2배 이상 급증하여 그 비중이 총 연금지출과 같아졌다. 나아가 2000/01년부터 40%를 넘어 2005/06년에는 44.4%였을 뿐 아니라, DWP는 2006/07년에는 46.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DWP, 2005 e; f).
따라서 사회보험이 성숙하면 공공부조가 사라질 것이라는 베버리지의 가정과는 달리, 자산조사급여는 총 기여연금과 동일한 비중을 지닌 주된 소득보장제도로 자리잡았고, 그 비중은 앞으로도 더 커질 전망이다.
② 남성생계부양자 모델
남성생계부양자 모델과 관련해서는 결혼한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한 성역할에 대한 비판과, 여성의 근로활동에 대한 잘못된 가정이 주로 비판받는데, 성역할에 대한 논의와 비판의 타당성은 본 연구의 노후소득보장제도와 직접 상관이 없기 때문에, 논외로 하였다. 이에 여성고용률 중심으로 살펴보면, 예전에는 기혼여성가운데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비율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으나, 그 후 계속 증가하여 현재는 여성의 절반이상이 유급노동에 종사하고 있다60)(Lewis and Piachaud, 1992; Alcock, 1996재인용). 실제 LIS와 영국 DWP의 LFS 자료를 통해 여성의 고용률을 살펴보면, 1960년 여성의 고용참가율은 32.7%(8,017천명)로 총 노동시장참가자의 1/3을 넘었고, 전체 실업률이 11.2%로 높았던 1984년에도 41.3%(13,085천명)로 증가하였다. 또한 2001년에는 45.8%(12,729천명), 2005년에는 46%(13,187천명)로 거의 여성과 남성의 고용참가율이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이는 베버리지가 사회보험을 설계하던 당시의 여성고용률 12.5%와 비교하면 약 4배가 증가한 높은 수치로서, 최근의 상황은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의 적용가능성이 절반을 다소 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남성생계 부양자 모델을 중심으로 설계한 사회보험이 적절하였던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부당한 평가이다.
③안정된 가족구조
베버리지의 사회보험에서 기혼여성은 남성이 퇴직하면, 그의 기여로 자신도 급여를 받고, 남편사망한 홀로된 여성은 남편의 기여금에 따른 사회보험을 통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이 불안정할 경우 여성의 사회적 보호는 위협받게 되고, 이들이 고용관계에 다시 편입되지 못한다면 위험은 더 커진다. 더구나 최근에는 베버리지의 가정과는 달리 이혼율과 한부모가족이 증가하였고, 가족규모는 더 작아지며 그 관계는 종종 단기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또한 결혼율도 낮아지고 결혼연령도 늦어질 뿐 아니라, 재혼 등을 통해 재구성된 가족(reconstitute family)도 증가하였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가족구조의 변화는 결혼을 통해 발생하는 권리와 보호를 복잡하게 하거나 약화시켰고, 특히 여성이 가장인 한부모 가정 등은 복지공백(welfare gap)에 빠질 위험이 높다(Gornick et al., 1997; Esping-Andersen, 1999 재인용). 따라서 기존의 비판은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적합하다. 그러나 베버리지가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안정된 가족구조가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부적절한 평가이다.
④고령화
인구구조 특히 고령화는 연금재정악화의 주요요인이기 때문에, 재무부를 중심으로 베버리지 안을 따를 경우 연간 \"\'240백만의 지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Macnicol, 1994). 그러나 베버리지도 연금이 단일 제도로서 사회보장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하였고65) 고령화에 대해 예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는 더 높게 추정하였다. 보고서(1942년)를 보면 베버리지가 예측한 노인인구 비율은 1961년과 1971년66)에 각각 17.1%와 20.8%였는데, 실제는 1960년은 11.7%, 1975년은 14%, 2001년은 15.9%였다. 이는 베버리지의 예측보다 낮은 수준으로, 베버리지가 인구고령화 문제를 과소평가했다고 판단할 수 없는 단서가 된다. 그러나 출산율이 낮아져, 노년부양비가 2000년에는 24.4%(LIS 자료로 추정함)로, 1901년 10.1%(Beveridge, 1942를 통해 계산하였음)보다 높아졌다. 이는 곧, 연금수급자 1명을 생산가능인구 2.2명(National Statistics, 2005 b)이 부양하는 것을 의미하여, 젊은 근로계층의 부담은 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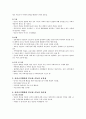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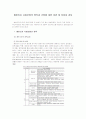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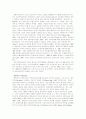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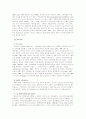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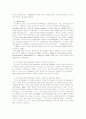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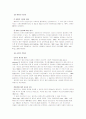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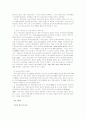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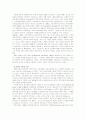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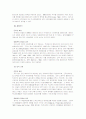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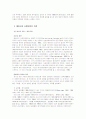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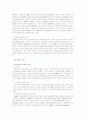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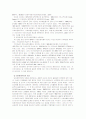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