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되었다. 고대의 대표적인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예언자들도 정신사와 종교사에서 절정에 도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집단속에서도 가장 깊은 뿌리에서 자라나오며 야훼 신앙의 근원으로 소급하는 극도로 능동적인 반작용이다.
2. 이스라엘 국가의 멸망
이스라엘이 유혈 찬탈적인 왕위 혼란은 아시리아의 봉신의 위협과 관련되어 있음을 연상시켜 열왕기서에서 표현하고 있다.
아시리아의 정복 정착은 733년에 민중의 폭동이 일어나 수많은 소수 국가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몰락될 때 까지 계속되었다. 733년과 722-21년 사이에 사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 혼합으로 인하여 독특한 이스라엘이라도 독립적인 집단으로서는 멸망한 것이 되었고 세계사의 무대에서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 이러한 국토의 위기에서 유다왕 아하즈의 굴복으로 예루살렘과 유다는 북 왕국 이스라엘 종족들이 겪었던 것과 같은 운명을 모면하게 되었으며 유다가 이스라엘을 대표하게 되었다. 중요한 사실은 종족동맹의 사상으로 받아들여짐으로써 유다 나라에서도 점차 이스라엘이라는 의식이 자각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722-586년 동안의 유다 나라
1. 아시리아 지배하의 유다
아하즈가 북 왕국 이스라엘과 다마스커스로부터 위협을 받아 자발적으로 아시리아의 봉신이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 때부터 아시리아의 국가 신을 섬기는 제단이 생겼다. 그리고 1913-711년에는 완전히 다른 정책 아시리아에 대항한 연맹을 맺어 반 시리아 정책을 추구하였으며 아시리아가 강요한 제국의 안정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705(703)-701년의 반아시리아 연합 세력을 일으켰으나 701년에 연합 세력의 폭동자체가 오래가지 못하고 분쇄 당하였음을 자세히 알려 주고 있다(열왕기하 18장 13-16절).
701년부터 유다는 다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였고 열왕기상 18장 8절에서 히스기야의 반 아시리아에 대항한 종교적인 정화 운동을 일으켰다.
2. 요시아 왕의 개혁 설화
요시아 왕은 639/38년으로부터 609년까지 8세에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였다.
요시아의 종교 개혁에 대한 보고는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하든 낮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요시아가 유다 나라의 국경선을 넘어서 종교 개혁을 하였다는 사실은 보고문에 나오는 지명들을 통하여 잘 밝혀주고 있다. 요시아의 사업은 2-30년 이내에 실현되어 이스라엘과 유다를 연합하여 국가 재건에 있었다. 일찍이 이스라엘 국가에 속했던 도성들이 유다 나라에 병합되었다는 사실은 요시아의 국가가 예루사렘-유다를 중심으로 북 왕국의 독립성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하지 않았을 것이다.
3. 유다 왕국의 종말
유다가 다른 작은 나라들과 같이 일찍이 아시리아와 에집트에 대하여 조공을 바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서의 증인에 의하면 22장 13,19절에서 여호아킴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그가 외국에 대하여는 무력한 봉신이었으나 자기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폭군이었다고 한다.
562년에 여호아킴이 바빌론으로 잡혀가고 다윗 왕조의 마지막 왕이 된 시드기야의 통치로 예레미야서 34장, 37-38장에서 그가 악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매우 허약한 군주라는 사실과 느브갓네살 통치19년인, 시드기야 왕 11년 넷째 달(7-8월) 9일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으며(586), 이로써 시드기야는 눈을 뽑힌 다음 바빌론으로 잡혀갔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지배 계층은 바빌론으로 사로 잡혀가고 마치 북쪽의 형제 국가 이스라엘이 1세기 반 만 전에 당하였던 것처럼 유다 나라도 망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자신이 국가적인 멸망이라는 것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정신적인 의미에서 계속 살아남을 수가 있었으며 그런 생존과 생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힘을 준 바탕은 예언자들의 선포였다.
바빌론 통치시대(586-538년)
1. 고향에 남아 있던 자들의 상황
597년의 사건과 587-86년의 사건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결과적으로 여기저기서 지역에 관련 없이 갈라져서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스라엘 역사는 다소간에 여기저기서 독립적으로 이루어 졌고 이와 동시에 상당히 많은 디아스포라가 바빌론에서 살았고 또 일부는 이집트에서 살았다.
바빌론 나라는 유다의 내부적 상황에도 간섭하였고 그래서 새로운 토지 개혁을 착수하여 토지 소유를 다시 분할하여 준 것이다. 농업 사회의 상황에서는 완전 시민권과 완전 법적 권리가 토지 소유가 결부되어 왔었기 때문에 법적인 개혁과 사회적인 개혁을 종교적인 문제에도 간섭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토지를 다시 소유하여 잃었던 계층을 다시금 회복하려는 희망은 그 시대의 단순한 정신적인 자세가 아니었다. 예레미야는 재앙 속에서도 구원을 선포하고 민족이 망하는 심판 속에서도 은혜를 선포하였고 이 선포는 결국 바빌론이나 고향 땅이나 어떤 포로 생활에서도 굴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배제하지 않는 심판으로 이해하고 극복하게 하였다.
2. 바빌론 유다인들(디아스포라)
바빌론으로 사로 잡혀간 유다인 들에게도 제한된 집단으로 함께 생활하는 것이 허락되었다.
유랑 생활의 사정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 에제키엘서는 그발 강과 텔아비브 장소에 대하여 잘 나타내 주고 유랑민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이라는 하지만 사실상 본질적인 의미에서 결국 포로가 아니었다. 에제키엘 자신이 597년에 바빌론으로 잡혀간 자들 중의 하나였다.
그는 포로시대의 유랑 생활이 결코 포로생활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생활은 정신적인 위기와 종교적인 위기를 초래하였다. 예배가 없이는 종교가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바빌론의 통치기간은 겨우 수십 년에 그치고 말았다. 고레스가 바빌론을 점령하면서 그는 아시리아와 바빌론의 멍에 밑에서 수난 당하던 기나긴 비극의 시대를 끝내고 ″구원과 생명을 가지고 온 자″가 되었다.
고레스는 또 다른 세력 교체를 수반하고 뒷받침하는 추방과 처형대신 다양한 고대의 제사 의식들을 그대로 회복시키고 바빌론과 수메르와 수메르 지역의 신들과 제사 의식의 도구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냈으며 정복자로서 바빌론과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의 땅, 곧 시리아의 팔레스틴의 대왕이 되었다.
2. 이스라엘 국가의 멸망
이스라엘이 유혈 찬탈적인 왕위 혼란은 아시리아의 봉신의 위협과 관련되어 있음을 연상시켜 열왕기서에서 표현하고 있다.
아시리아의 정복 정착은 733년에 민중의 폭동이 일어나 수많은 소수 국가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몰락될 때 까지 계속되었다. 733년과 722-21년 사이에 사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 혼합으로 인하여 독특한 이스라엘이라도 독립적인 집단으로서는 멸망한 것이 되었고 세계사의 무대에서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 이러한 국토의 위기에서 유다왕 아하즈의 굴복으로 예루살렘과 유다는 북 왕국 이스라엘 종족들이 겪었던 것과 같은 운명을 모면하게 되었으며 유다가 이스라엘을 대표하게 되었다. 중요한 사실은 종족동맹의 사상으로 받아들여짐으로써 유다 나라에서도 점차 이스라엘이라는 의식이 자각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722-586년 동안의 유다 나라
1. 아시리아 지배하의 유다
아하즈가 북 왕국 이스라엘과 다마스커스로부터 위협을 받아 자발적으로 아시리아의 봉신이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 때부터 아시리아의 국가 신을 섬기는 제단이 생겼다. 그리고 1913-711년에는 완전히 다른 정책 아시리아에 대항한 연맹을 맺어 반 시리아 정책을 추구하였으며 아시리아가 강요한 제국의 안정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705(703)-701년의 반아시리아 연합 세력을 일으켰으나 701년에 연합 세력의 폭동자체가 오래가지 못하고 분쇄 당하였음을 자세히 알려 주고 있다(열왕기하 18장 13-16절).
701년부터 유다는 다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였고 열왕기상 18장 8절에서 히스기야의 반 아시리아에 대항한 종교적인 정화 운동을 일으켰다.
2. 요시아 왕의 개혁 설화
요시아 왕은 639/38년으로부터 609년까지 8세에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였다.
요시아의 종교 개혁에 대한 보고는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하든 낮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요시아가 유다 나라의 국경선을 넘어서 종교 개혁을 하였다는 사실은 보고문에 나오는 지명들을 통하여 잘 밝혀주고 있다. 요시아의 사업은 2-30년 이내에 실현되어 이스라엘과 유다를 연합하여 국가 재건에 있었다. 일찍이 이스라엘 국가에 속했던 도성들이 유다 나라에 병합되었다는 사실은 요시아의 국가가 예루사렘-유다를 중심으로 북 왕국의 독립성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하지 않았을 것이다.
3. 유다 왕국의 종말
유다가 다른 작은 나라들과 같이 일찍이 아시리아와 에집트에 대하여 조공을 바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서의 증인에 의하면 22장 13,19절에서 여호아킴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그가 외국에 대하여는 무력한 봉신이었으나 자기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폭군이었다고 한다.
562년에 여호아킴이 바빌론으로 잡혀가고 다윗 왕조의 마지막 왕이 된 시드기야의 통치로 예레미야서 34장, 37-38장에서 그가 악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매우 허약한 군주라는 사실과 느브갓네살 통치19년인, 시드기야 왕 11년 넷째 달(7-8월) 9일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으며(586), 이로써 시드기야는 눈을 뽑힌 다음 바빌론으로 잡혀갔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지배 계층은 바빌론으로 사로 잡혀가고 마치 북쪽의 형제 국가 이스라엘이 1세기 반 만 전에 당하였던 것처럼 유다 나라도 망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자신이 국가적인 멸망이라는 것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정신적인 의미에서 계속 살아남을 수가 있었으며 그런 생존과 생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힘을 준 바탕은 예언자들의 선포였다.
바빌론 통치시대(586-538년)
1. 고향에 남아 있던 자들의 상황
597년의 사건과 587-86년의 사건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결과적으로 여기저기서 지역에 관련 없이 갈라져서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스라엘 역사는 다소간에 여기저기서 독립적으로 이루어 졌고 이와 동시에 상당히 많은 디아스포라가 바빌론에서 살았고 또 일부는 이집트에서 살았다.
바빌론 나라는 유다의 내부적 상황에도 간섭하였고 그래서 새로운 토지 개혁을 착수하여 토지 소유를 다시 분할하여 준 것이다. 농업 사회의 상황에서는 완전 시민권과 완전 법적 권리가 토지 소유가 결부되어 왔었기 때문에 법적인 개혁과 사회적인 개혁을 종교적인 문제에도 간섭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토지를 다시 소유하여 잃었던 계층을 다시금 회복하려는 희망은 그 시대의 단순한 정신적인 자세가 아니었다. 예레미야는 재앙 속에서도 구원을 선포하고 민족이 망하는 심판 속에서도 은혜를 선포하였고 이 선포는 결국 바빌론이나 고향 땅이나 어떤 포로 생활에서도 굴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배제하지 않는 심판으로 이해하고 극복하게 하였다.
2. 바빌론 유다인들(디아스포라)
바빌론으로 사로 잡혀간 유다인 들에게도 제한된 집단으로 함께 생활하는 것이 허락되었다.
유랑 생활의 사정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 에제키엘서는 그발 강과 텔아비브 장소에 대하여 잘 나타내 주고 유랑민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이라는 하지만 사실상 본질적인 의미에서 결국 포로가 아니었다. 에제키엘 자신이 597년에 바빌론으로 잡혀간 자들 중의 하나였다.
그는 포로시대의 유랑 생활이 결코 포로생활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생활은 정신적인 위기와 종교적인 위기를 초래하였다. 예배가 없이는 종교가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바빌론의 통치기간은 겨우 수십 년에 그치고 말았다. 고레스가 바빌론을 점령하면서 그는 아시리아와 바빌론의 멍에 밑에서 수난 당하던 기나긴 비극의 시대를 끝내고 ″구원과 생명을 가지고 온 자″가 되었다.
고레스는 또 다른 세력 교체를 수반하고 뒷받침하는 추방과 처형대신 다양한 고대의 제사 의식들을 그대로 회복시키고 바빌론과 수메르와 수메르 지역의 신들과 제사 의식의 도구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냈으며 정복자로서 바빌론과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의 땅, 곧 시리아의 팔레스틴의 대왕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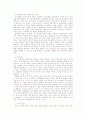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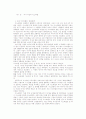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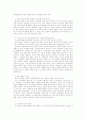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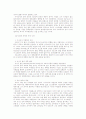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