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아졌으나 2004년 55.3 수준을 기록하는 데 그치고 있다.
임금 10분위 배율 높아져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임금구조의 전체적 분포와 그 추이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임금구조상의 분포와 그 변화 추이는 외환위기 이후, 특히 2000년대 들어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양극화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유용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본 분석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조사대상 임금근로자의 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비율, 즉 10분위 배율과 함께 전체 조사대상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중간값(median)의 절반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상대적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과 그 추이를 구했다.
먼저 10분위 배율의 경우 지난 1998년 7.46, 즉 상위 10% 근로자의 임금이 하위 10% 근로자 임금의 7.46배를 기록했으나, 2004년에는 8.28배로 높아진 상태이다.
한편 중위근로자의 절반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상대적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특히 2000년대 초반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동 비중은 1998년 9.6% 수준에서 2004년에는 12.5%로 높아 졌다. 여기에다 저임금의 기준을 중위근로자 임금의 50%~70% 수준을 받는 차상위 임금근로자로 확장할 경우 상대적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2004년 28.2%로 높아진다. 외환위기 이후 26~28% 수준을 유지하던 이 비율은 내수경기가 호전되었던 2001년 일시적으로 21.3% 수준으로 하락했으나 이후 전반적인 경기부진과 더불어 다시 증가 추세로 반전된 것으로 판단된다.
취약근로 계층에 교육훈련 투자 필요
이상에서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임금구조상의 변화 추이와 그 배경 등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고령화, 경제의 지식정보화 및 서비스화, 노동의 유연화, 그리고 글로벌 경쟁의 심화 등과 같은 거대 트렌드가 우리나라의 임금구조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별 근로자 집단의 부가가치 창출능력의 차이에 따른 임금 격차는 향후에도 더욱 심화될 것이다.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거나 부가가치 창출 구조의 혁신의 가능성이 낮은 저부가가치업종 종사자나, 지식정보화 트렌드에의 적응능력이 떨어지는 중고령자, 저학력자 등의 상대적 임금 수준은 시간 이 흐를수록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특정집단을 중심으로 한 임금격차의 확대가 사회전반의 양극화를 가속시키는 중요 동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고령자와 저학력자, 그리고 저부가가치 제조업이나 전통서비스업 종사자 등 취약 근로계층의 직업능력,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다양하고전문적인교육및훈련기회가요구된다. 공공부문의 관련 예산 확대와 전문인력 확보 등 정책적 투자확대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개개인이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스스로의 경제적, 또는 직업적 가치를 반복적으로 높여나갈 수 있는 평생 교육훈련 체계가 공공부문에서 탄탄하게 구축될 때 우리 사회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 안정망을 갖게 될 것이다.
임금 10분위 배율 높아져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임금구조의 전체적 분포와 그 추이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임금구조상의 분포와 그 변화 추이는 외환위기 이후, 특히 2000년대 들어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양극화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유용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본 분석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조사대상 임금근로자의 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비율, 즉 10분위 배율과 함께 전체 조사대상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중간값(median)의 절반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상대적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과 그 추이를 구했다.
먼저 10분위 배율의 경우 지난 1998년 7.46, 즉 상위 10% 근로자의 임금이 하위 10% 근로자 임금의 7.46배를 기록했으나, 2004년에는 8.28배로 높아진 상태이다.
한편 중위근로자의 절반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상대적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특히 2000년대 초반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동 비중은 1998년 9.6% 수준에서 2004년에는 12.5%로 높아 졌다. 여기에다 저임금의 기준을 중위근로자 임금의 50%~70% 수준을 받는 차상위 임금근로자로 확장할 경우 상대적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2004년 28.2%로 높아진다. 외환위기 이후 26~28% 수준을 유지하던 이 비율은 내수경기가 호전되었던 2001년 일시적으로 21.3% 수준으로 하락했으나 이후 전반적인 경기부진과 더불어 다시 증가 추세로 반전된 것으로 판단된다.
취약근로 계층에 교육훈련 투자 필요
이상에서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임금구조상의 변화 추이와 그 배경 등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고령화, 경제의 지식정보화 및 서비스화, 노동의 유연화, 그리고 글로벌 경쟁의 심화 등과 같은 거대 트렌드가 우리나라의 임금구조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별 근로자 집단의 부가가치 창출능력의 차이에 따른 임금 격차는 향후에도 더욱 심화될 것이다.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거나 부가가치 창출 구조의 혁신의 가능성이 낮은 저부가가치업종 종사자나, 지식정보화 트렌드에의 적응능력이 떨어지는 중고령자, 저학력자 등의 상대적 임금 수준은 시간 이 흐를수록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특정집단을 중심으로 한 임금격차의 확대가 사회전반의 양극화를 가속시키는 중요 동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고령자와 저학력자, 그리고 저부가가치 제조업이나 전통서비스업 종사자 등 취약 근로계층의 직업능력,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다양하고전문적인교육및훈련기회가요구된다. 공공부문의 관련 예산 확대와 전문인력 확보 등 정책적 투자확대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개개인이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스스로의 경제적, 또는 직업적 가치를 반복적으로 높여나갈 수 있는 평생 교육훈련 체계가 공공부문에서 탄탄하게 구축될 때 우리 사회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 안정망을 갖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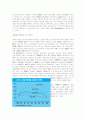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