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수(大首)
본문내용
착용한 관 대수.
대수는 도대체 언제부터 사용한 것일까?
그 용어에 대해서 전설이 분분한 것을 책례도감의궤의 표기를 발견함으로써
궁중용어로 사용되어 온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수라는 표기가 발견되는 것으로 현재까지 전해오는 책례도감의궤 중 가장 오랜 것은 효종이 왕세자로 책봉될 때 의궤이다. 물론 그 전에도 책례도감의궤는 기록으로 전해져왔을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전해오는 것은 광해군 때부터이다. 그 이유는 가례도감의궤가 임진란 이후부터 전해지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전의 것은 전쟁 때 망실되고 만 것이라고 판단해도 무방할 것이다.
대수의 사용은 임진왜란이라는 미증유의 대참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국고가 바닥이 났는데 궁중 혼례에 호사스러운 용품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사정이 이러했기 때문에 조선왕조실록과 책례도감의궤, 그리고 가례도감의궤를 서로 엮어 가면서 대조해보면 대수가 언제부터 왜 사용되었는지 알 수 있다.
먼저 살펴볼 자료는 선조3년 8월 11일자 실록의 기록이다.
상이 조강에 자정전에서 \'맹자\'를 강하였다. 영사 윤방이 아뢰기를
\"반정한 뒤에 상께서 검약을 숭상하였으나 사치의 풍조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가례의 경비가 호대하나 아래에서 감히 마음대로 그 등록을 줄일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른바 등록이란 당초 어디에 근거하여 만든 것인가?\"
하자 윤방이 아뢰기를
\"대략 임인년 대비의 가례를 모방한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적관의 제도는 중국 조정에 배워서 만들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중국 조정에서 착용하던 관이다. 대비의 대례 때에도 경비가 많이 든다 하여 그만 두었으니 지금 꼭 만들 것이 없다.\"
하였다. 동지사 서성이 아뢰기를
\"수식의 제도는 예로부터 주옥으로 만들었습니다. 대개 예복은 지나치게 사치스러워도 안 되지만 또한 만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그럴 듯하나 현재의 경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도승지 정온이 아뢰기를
\"백성은 곤궁하고 재용은 고갈되었으니 적관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대례에 무슨 흠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이 기록은 인조의 세자인 소현세자가 갑작스럽게 죽자 아우인 봉림대군을 세자로 책봉할 때 그에 준비해야 하는 세자빈의 관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인조와 신하들의 대화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임인년 대례란 선조의 계비인 인목왕후의 가례를 말한다. 말하자면 이 기록 이전에 칠적관이 필요한 때는 인목왕후의 가례 때였다. 그런데 인목왕후의 대례는 임진왜란 직후여서 칠적관을 만들 줄 아는 장인들이 행방불명이 되고 국고도 바닥이 나 칠적관을 사용하긴 했으나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실이 말해주는 것은 중국에서 칠적관을 들여올 때 많은 비용을 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게 들여온 재료로 조립해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인조 때의 위 기록에서는 인목왕후 때에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굳이 많은 경비를 들여 제작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이 보인다. 그렇다면 봉림대군을 세자로 책봉하는 대례 때 세자빈은 칠적관을 사용하지 않은 것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그리고 이를 해소시켜 주는 기사가 인조 23년 7월 6일자, 다음의 기사에 보인다.
책례도감이 아뢰기를
\"빈궁 책례 때에 이미 적의가 있고 보면 의당 적관도 있어야 할 터인데 우리나라 장인들은 적관의 제도를 알지 못합니다. 등록을 상고해 보건대 선조조 임인년 가례 때에 도감이 아뢰기를 칠적관의 제도만 장인들이 아는 자가 없을 뿐 아니라 각종의 물품을 반드시 중국에서 사와야 하고 끝내 본국에서는 제조하기가 어려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 선조께서
\"관은 제조하기가 어렵다.\"
는 전교를 내렸습니다. 또
\"계해년 이후로는 비록 가례를 치르더라도 모두 적관을 사용하지 않고 체발로 수식을 만들어 예식을 치렀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계해년 이후의 관례에 따라서 하라.\"
하였다.
이 기록에 나오는 계해년이란 인조가 등극한 해를 말한다. 즉 기사의 내용에서 인조 등극 이후에 칠적관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만든 관, 대수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봉립대군이 세자로 책봉될 때의 의례 때부터 칠적관은 사라지고 조선식의 대수를 제작해 조선조 말까지 사용한 것이다.
초기에 사용한 것은 주취로 만든 것이 아니라 다리와 비녀, 그리고 공작깃털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가례도감의궤는 전해주고 있다.
대수는 도대체 언제부터 사용한 것일까?
그 용어에 대해서 전설이 분분한 것을 책례도감의궤의 표기를 발견함으로써
궁중용어로 사용되어 온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수라는 표기가 발견되는 것으로 현재까지 전해오는 책례도감의궤 중 가장 오랜 것은 효종이 왕세자로 책봉될 때 의궤이다. 물론 그 전에도 책례도감의궤는 기록으로 전해져왔을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전해오는 것은 광해군 때부터이다. 그 이유는 가례도감의궤가 임진란 이후부터 전해지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전의 것은 전쟁 때 망실되고 만 것이라고 판단해도 무방할 것이다.
대수의 사용은 임진왜란이라는 미증유의 대참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국고가 바닥이 났는데 궁중 혼례에 호사스러운 용품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사정이 이러했기 때문에 조선왕조실록과 책례도감의궤, 그리고 가례도감의궤를 서로 엮어 가면서 대조해보면 대수가 언제부터 왜 사용되었는지 알 수 있다.
먼저 살펴볼 자료는 선조3년 8월 11일자 실록의 기록이다.
상이 조강에 자정전에서 \'맹자\'를 강하였다. 영사 윤방이 아뢰기를
\"반정한 뒤에 상께서 검약을 숭상하였으나 사치의 풍조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가례의 경비가 호대하나 아래에서 감히 마음대로 그 등록을 줄일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른바 등록이란 당초 어디에 근거하여 만든 것인가?\"
하자 윤방이 아뢰기를
\"대략 임인년 대비의 가례를 모방한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적관의 제도는 중국 조정에 배워서 만들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중국 조정에서 착용하던 관이다. 대비의 대례 때에도 경비가 많이 든다 하여 그만 두었으니 지금 꼭 만들 것이 없다.\"
하였다. 동지사 서성이 아뢰기를
\"수식의 제도는 예로부터 주옥으로 만들었습니다. 대개 예복은 지나치게 사치스러워도 안 되지만 또한 만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그럴 듯하나 현재의 경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도승지 정온이 아뢰기를
\"백성은 곤궁하고 재용은 고갈되었으니 적관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대례에 무슨 흠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이 기록은 인조의 세자인 소현세자가 갑작스럽게 죽자 아우인 봉림대군을 세자로 책봉할 때 그에 준비해야 하는 세자빈의 관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인조와 신하들의 대화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임인년 대례란 선조의 계비인 인목왕후의 가례를 말한다. 말하자면 이 기록 이전에 칠적관이 필요한 때는 인목왕후의 가례 때였다. 그런데 인목왕후의 대례는 임진왜란 직후여서 칠적관을 만들 줄 아는 장인들이 행방불명이 되고 국고도 바닥이 나 칠적관을 사용하긴 했으나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실이 말해주는 것은 중국에서 칠적관을 들여올 때 많은 비용을 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게 들여온 재료로 조립해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인조 때의 위 기록에서는 인목왕후 때에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굳이 많은 경비를 들여 제작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이 보인다. 그렇다면 봉림대군을 세자로 책봉하는 대례 때 세자빈은 칠적관을 사용하지 않은 것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그리고 이를 해소시켜 주는 기사가 인조 23년 7월 6일자, 다음의 기사에 보인다.
책례도감이 아뢰기를
\"빈궁 책례 때에 이미 적의가 있고 보면 의당 적관도 있어야 할 터인데 우리나라 장인들은 적관의 제도를 알지 못합니다. 등록을 상고해 보건대 선조조 임인년 가례 때에 도감이 아뢰기를 칠적관의 제도만 장인들이 아는 자가 없을 뿐 아니라 각종의 물품을 반드시 중국에서 사와야 하고 끝내 본국에서는 제조하기가 어려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 선조께서
\"관은 제조하기가 어렵다.\"
는 전교를 내렸습니다. 또
\"계해년 이후로는 비록 가례를 치르더라도 모두 적관을 사용하지 않고 체발로 수식을 만들어 예식을 치렀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계해년 이후의 관례에 따라서 하라.\"
하였다.
이 기록에 나오는 계해년이란 인조가 등극한 해를 말한다. 즉 기사의 내용에서 인조 등극 이후에 칠적관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만든 관, 대수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봉립대군이 세자로 책봉될 때의 의례 때부터 칠적관은 사라지고 조선식의 대수를 제작해 조선조 말까지 사용한 것이다.
초기에 사용한 것은 주취로 만든 것이 아니라 다리와 비녀, 그리고 공작깃털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가례도감의궤는 전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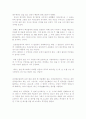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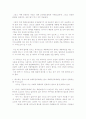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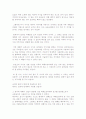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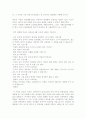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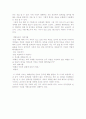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