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박두진 시인의 시세계
2. 박두진의 시에 대하여
3. 박두진 시학의 특징
4. 시사적 의의
5. 청록파시인 박남수
6. 박남수 시인의 시세계
7. 박남수 시의 유형 별 고찰
8. 박남수의 시관
참고문헌
2. 박두진의 시에 대하여
3. 박두진 시학의 특징
4. 시사적 의의
5. 청록파시인 박남수
6. 박남수 시인의 시세계
7. 박남수 시의 유형 별 고찰
8. 박남수의 시관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에 대한 지적 억제보다 심정적인 표출을 더 들어내는 쪽으로 변모하고 있다’ .김광림은 시집별 특성들을 지적하면서 특히 <<사슴의 관>>에 와서 감정적 절제가 해체되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셋째로 도미 이후에 간행된 시집들에 대한 연구로 이건청 김명수 등과 현대시학에서 기획한 추모특집 등을 들 수 있다.
8. 박남수의 시관
박남수는 시의 예술성에 대해 투철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시가 진술이 아니며 다듬겨진 표현 형태를 이룰 수 있을 때, 비로소 예술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을 설파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박남수는 외래적인 것에 맹목적 추종해온 외래 사조의 문학 흐름에 대하여 강한 주체적 시관을 피력하고 있다. 또한 “현대시의 성격”에서는 ‘사상의 감각화’를 주장하고 있다. 문덕수는 박남수의 초기 시론을 (1). 시는 예술성과 사상성을 동시에 가져야 하지만 모든 예술은 사상성을 포섭한 예술이어야 한다 이런 주장은 T.S. 엘리어트의 시론과 발레리의 과실은 미미만이 아니라 사상을 지녀야 한다는 이론에 연결되어 있다. (2).자연발생적인 시가 아니라 의식적 방법의 시를 써야 한다. (3).시는 언어의 예술이다. 이런 견해는 이미지스트로서의 박남수의 이런 시적 견해는 1958년에 간행된 시집 <갈매기 소묘>>에서 적극적으로 추구되기 시작하여 박남수의 시 전체를 지배한다.
김광림은 박남수의 제3시집 <<신의 쓰레기>> 해설에서 박남수의 시를 3기로 나누어 분석해 보이고 있다. 즉, ‘이미지의 안정 맹아기’로 정의된 첫 시집 <<초롱불>>의 세계는 ‘자연’뿐이 아니라 ‘사회적인데도 관심을 가지면서 리리칼한 서경에다 절박감정을 메타포’하던 시기로 ‘모색 실험기’인 시집 <,갈매기 소묘>의 세계는 ‘이미지에 대한 극심한 배려와 언어감각을 새로 트레이닝하던 시기로 보았다. 그리고, 정리 비약기인 시집 <<신의 쓰레기>.는 ’종전까지 깔끔하게 간직해온 자연성을 간혹 파괴시켜보기도 하고 하면서 존재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기로 설명하고 있다.
김춘수의 글 분석비평적 관점에서 시집 <<신의 쓰레기>>를 분석하면서 박남수 시의 순수함과 투명한 이미지가 T.E.흄에게 닿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박남수의 시 <微熱>의 끄머리 5행 <메주뜨는 냄새 매캐한/坪 가웃 어둔 밤에는// 시방 마을 어린 것들이/ 뾰루지의 붉은 꽃을 쓰고/구실이 한창 倡獗하고 있다>를 분석하면서 “의식적으로 논리를 뒤틀어 놓기도 하고, 또는 단절의 도랑을 파기도 하면서 감각과 이미지를 즐기고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연결방법이 과격하여 機智를 보이고 있는 것은 “古月에게서는 물론 芝溶에게서도 극히 희미하게 밖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모더니스트로서, 특히 주지적 이미지스트로서의 박남수의 면목은 이처럼 등단 초기로부터의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런 시관은 그의 시집 <<갈매기 소묘>>, <<신의 쓰레기>>를 거쳐 1970년의 <<새의 암장>>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추구되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조남익, 현대시해설세운문화사, 1977
8. 박남수의 시관
박남수는 시의 예술성에 대해 투철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시가 진술이 아니며 다듬겨진 표현 형태를 이룰 수 있을 때, 비로소 예술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을 설파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박남수는 외래적인 것에 맹목적 추종해온 외래 사조의 문학 흐름에 대하여 강한 주체적 시관을 피력하고 있다. 또한 “현대시의 성격”에서는 ‘사상의 감각화’를 주장하고 있다. 문덕수는 박남수의 초기 시론을 (1). 시는 예술성과 사상성을 동시에 가져야 하지만 모든 예술은 사상성을 포섭한 예술이어야 한다 이런 주장은 T.S. 엘리어트의 시론과 발레리의 과실은 미미만이 아니라 사상을 지녀야 한다는 이론에 연결되어 있다. (2).자연발생적인 시가 아니라 의식적 방법의 시를 써야 한다. (3).시는 언어의 예술이다. 이런 견해는 이미지스트로서의 박남수의 이런 시적 견해는 1958년에 간행된 시집 <갈매기 소묘>>에서 적극적으로 추구되기 시작하여 박남수의 시 전체를 지배한다.
김광림은 박남수의 제3시집 <<신의 쓰레기>> 해설에서 박남수의 시를 3기로 나누어 분석해 보이고 있다. 즉, ‘이미지의 안정 맹아기’로 정의된 첫 시집 <<초롱불>>의 세계는 ‘자연’뿐이 아니라 ‘사회적인데도 관심을 가지면서 리리칼한 서경에다 절박감정을 메타포’하던 시기로 ‘모색 실험기’인 시집 <,갈매기 소묘>의 세계는 ‘이미지에 대한 극심한 배려와 언어감각을 새로 트레이닝하던 시기로 보았다. 그리고, 정리 비약기인 시집 <<신의 쓰레기>.는 ’종전까지 깔끔하게 간직해온 자연성을 간혹 파괴시켜보기도 하고 하면서 존재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기로 설명하고 있다.
김춘수의 글 분석비평적 관점에서 시집 <<신의 쓰레기>>를 분석하면서 박남수 시의 순수함과 투명한 이미지가 T.E.흄에게 닿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박남수의 시 <微熱>의 끄머리 5행 <메주뜨는 냄새 매캐한/坪 가웃 어둔 밤에는// 시방 마을 어린 것들이/ 뾰루지의 붉은 꽃을 쓰고/구실이 한창 倡獗하고 있다>를 분석하면서 “의식적으로 논리를 뒤틀어 놓기도 하고, 또는 단절의 도랑을 파기도 하면서 감각과 이미지를 즐기고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연결방법이 과격하여 機智를 보이고 있는 것은 “古月에게서는 물론 芝溶에게서도 극히 희미하게 밖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모더니스트로서, 특히 주지적 이미지스트로서의 박남수의 면목은 이처럼 등단 초기로부터의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런 시관은 그의 시집 <<갈매기 소묘>>, <<신의 쓰레기>>를 거쳐 1970년의 <<새의 암장>>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추구되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조남익, 현대시해설세운문화사, 1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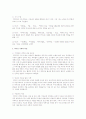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