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민속과 민속학
Ⅱ. 인간의례
Ⅱ. 인간의례
본문내용
을 만들어 각 매듭마다 끼어둔다.
대렴- 시신이 들어있는 관의 빈곳을 종이나 망자가 생시에 입던 면옷으로 채우고(보공), 상제들이 곡을 한다음 시신을 홑이불로 덮는다. 이후 관 뚜껑을 덮고 머리 없는 못을 친 다음 백지나 천으로 싸서 묶는다.
영좌에 모시기- 입관이 끝나면 병풍을 치고 명정을 우측에 걸고 혼백을 영좌에 보신다. 혼백상자는 명주 수건으로 덮어놓고 전을 올릴 때만 열어둔다.
성복- 상주 및 상제는 자기 처지에 맞는 상복을 입는다. 상복을 입는 이를 유복친, 유복자, 오복지친이라고 하며 그 범위는 같은 고조의 후손인 8촌까지다. 성복하고 제수를 진설하고 성복제를 지낸다.
조문객 맞기- 이후 상주는 정식으로 조문객을 맞이한다. 조문객이 호상소에 들러 서명을 한 후 빈소로 들어오면, 상주와 상제가 일어나 곡을 한다. 조문객은 영전에 나가 읍을 한 뒤 꿇어 앉아 향을 피우고 잔에 술을 쳐서 올린 다음 두 번 절한다. 그리고 상주와 상제를 향해 절을 한 뒤에 꿇어 앉아 간략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
③치장: 본래적 의미는 장지를 선정하고 광중을 만드는 일.
장지 선정 및 발인일시 택하기- 장지는 상주와 지관이 의논하여 결정한다.
발인- 시신을 얹은 상여가 집을 떠남. 관을 상여에 얹고 그 앞에서 발인제를 지낸다.
노제- 장지로 가는 도중 적당한 장소에서 병풍을 치고 노제를 지낸다.
조문객 받기- 상여가 장지에 도착하면 관은 광 가까이 놓고 그 위에 명정을 덮는다. 장지 근처에 병풍을 치고 그 앞에 혼백을 모시고 제물을 진설한 다음 상주와 상객은 조문객을 받는다.
산신제- 산역을 하기 전 장지 외쪽에서 산신제를 지낸다.
하관- 보토 취토를 거쳐 평토제를 지내고 상주 및 상제들은 귀가한다.
④흉제: 시신을 매장하고 집에 돌아와 지내는 반혼제부터 탈상까지의 제사를 흉제라고 한다.
초우제- 장일에 집에 돌아와 제사를 지낸다.
졸곡제- 장례 후 석 달 안에 지내며 졸곡제를 지낸 이후로는 조석의 상식 때만 곡을 한다.
부제- 망자의 신주를 사당에 모시며 지내는 제사로, 이것은 사당이 있는 사대부가문에서만 행한다.
소상- 초상 1주기가 되는 기일.
대상- 초상 2주기가 되는 기일.
탈상- 대상을 지낸 상주는 상복을 벗고 빈소를 철거한다.
담제- 사당에 신주를 모시는 집안에서 대상 후 정일이나 해일에 지낸다.
길제- 담제를 지낸 다음 달의 정일이나 해일을 택하여 지낸다.
6. 제례: 학술적 용어로 조상숭배.
①기제: 기일(자기를 기준으로 고조까지의 주송알 포함한 친속의 사망한 날)에 지내는 제사. 기제의 대상은 4대(고조)까지이고 참사의 범위는 제주의 8촌까지이다. 기제 때 모시는 신위는 해당 조상 일위로 한정하거나 합사한다.
제사상 차리기- 신위가 놓인 곳을 북쪽으로 하여 오른쪽은 동쪽, 왼쪽은 서쪽으로 둔다.
기제의 절차- 강신, 참신, 진찬, 초헌, 독축, 아헌, 종헌, 개반삽시, 합문, 개문, 헌다(철시복반), 사신, 신위봉환, 철상(음복)의 순으로 진행된다. 기제사의 절차는 가문이나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강신, 참신, 초헌, 아헌, 종헌과 사신의 절차는 변함이 없다.
②차례(절사, 다사): 명절과 조상의 생신 때 간단히 지내는 제사. 차례를 모시는 대상은 4대조까지로, 아침에 부계혈족끼리 모여 종가에서부터 순서대로 지낸다. 사당에서 지내나 사당이 없는 경우에는 마루에 신위를 봉안하고 지낸다. 차례의 절차는 기제사와 다를 바 없으나 헌작은 단헌이며 축문이 없고, 함문 및 개문의 절차도 없다. 반드시 하나이상의 별찬을 올리는 것이 특징이다.(설에는 떡국, 추석에는 송편)
③묘사(시향, 세사, 시사, 묘제): 음력 10월에 5대조 이상의 묘소에 가서 지내는 제사.
대렴- 시신이 들어있는 관의 빈곳을 종이나 망자가 생시에 입던 면옷으로 채우고(보공), 상제들이 곡을 한다음 시신을 홑이불로 덮는다. 이후 관 뚜껑을 덮고 머리 없는 못을 친 다음 백지나 천으로 싸서 묶는다.
영좌에 모시기- 입관이 끝나면 병풍을 치고 명정을 우측에 걸고 혼백을 영좌에 보신다. 혼백상자는 명주 수건으로 덮어놓고 전을 올릴 때만 열어둔다.
성복- 상주 및 상제는 자기 처지에 맞는 상복을 입는다. 상복을 입는 이를 유복친, 유복자, 오복지친이라고 하며 그 범위는 같은 고조의 후손인 8촌까지다. 성복하고 제수를 진설하고 성복제를 지낸다.
조문객 맞기- 이후 상주는 정식으로 조문객을 맞이한다. 조문객이 호상소에 들러 서명을 한 후 빈소로 들어오면, 상주와 상제가 일어나 곡을 한다. 조문객은 영전에 나가 읍을 한 뒤 꿇어 앉아 향을 피우고 잔에 술을 쳐서 올린 다음 두 번 절한다. 그리고 상주와 상제를 향해 절을 한 뒤에 꿇어 앉아 간략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
③치장: 본래적 의미는 장지를 선정하고 광중을 만드는 일.
장지 선정 및 발인일시 택하기- 장지는 상주와 지관이 의논하여 결정한다.
발인- 시신을 얹은 상여가 집을 떠남. 관을 상여에 얹고 그 앞에서 발인제를 지낸다.
노제- 장지로 가는 도중 적당한 장소에서 병풍을 치고 노제를 지낸다.
조문객 받기- 상여가 장지에 도착하면 관은 광 가까이 놓고 그 위에 명정을 덮는다. 장지 근처에 병풍을 치고 그 앞에 혼백을 모시고 제물을 진설한 다음 상주와 상객은 조문객을 받는다.
산신제- 산역을 하기 전 장지 외쪽에서 산신제를 지낸다.
하관- 보토 취토를 거쳐 평토제를 지내고 상주 및 상제들은 귀가한다.
④흉제: 시신을 매장하고 집에 돌아와 지내는 반혼제부터 탈상까지의 제사를 흉제라고 한다.
초우제- 장일에 집에 돌아와 제사를 지낸다.
졸곡제- 장례 후 석 달 안에 지내며 졸곡제를 지낸 이후로는 조석의 상식 때만 곡을 한다.
부제- 망자의 신주를 사당에 모시며 지내는 제사로, 이것은 사당이 있는 사대부가문에서만 행한다.
소상- 초상 1주기가 되는 기일.
대상- 초상 2주기가 되는 기일.
탈상- 대상을 지낸 상주는 상복을 벗고 빈소를 철거한다.
담제- 사당에 신주를 모시는 집안에서 대상 후 정일이나 해일에 지낸다.
길제- 담제를 지낸 다음 달의 정일이나 해일을 택하여 지낸다.
6. 제례: 학술적 용어로 조상숭배.
①기제: 기일(자기를 기준으로 고조까지의 주송알 포함한 친속의 사망한 날)에 지내는 제사. 기제의 대상은 4대(고조)까지이고 참사의 범위는 제주의 8촌까지이다. 기제 때 모시는 신위는 해당 조상 일위로 한정하거나 합사한다.
제사상 차리기- 신위가 놓인 곳을 북쪽으로 하여 오른쪽은 동쪽, 왼쪽은 서쪽으로 둔다.
기제의 절차- 강신, 참신, 진찬, 초헌, 독축, 아헌, 종헌, 개반삽시, 합문, 개문, 헌다(철시복반), 사신, 신위봉환, 철상(음복)의 순으로 진행된다. 기제사의 절차는 가문이나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강신, 참신, 초헌, 아헌, 종헌과 사신의 절차는 변함이 없다.
②차례(절사, 다사): 명절과 조상의 생신 때 간단히 지내는 제사. 차례를 모시는 대상은 4대조까지로, 아침에 부계혈족끼리 모여 종가에서부터 순서대로 지낸다. 사당에서 지내나 사당이 없는 경우에는 마루에 신위를 봉안하고 지낸다. 차례의 절차는 기제사와 다를 바 없으나 헌작은 단헌이며 축문이 없고, 함문 및 개문의 절차도 없다. 반드시 하나이상의 별찬을 올리는 것이 특징이다.(설에는 떡국, 추석에는 송편)
③묘사(시향, 세사, 시사, 묘제): 음력 10월에 5대조 이상의 묘소에 가서 지내는 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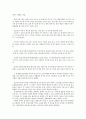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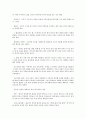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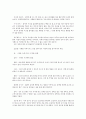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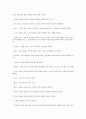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