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감상록 요약
Ⅰ. 서론 ……………………………………………………………1
Ⅱ. 본론 ……………………………………………………………1
1. 부농의 개념과 연구대상 …………………………………1
2. 부농성장의 원인……………………………………………2
(1) 기술의 발전……………………………………………2
(2) 사회적 원인………………………………………………3
3. 부농성장에 따른 사회적 영향………………………………7
(1) 농촌사회의 변화…………………………………………7
(2) 지주제의 변동……………………………………………8
Ⅲ. 결론 ……………………………………………………………9
참고문헌 ……………………………………………………………11
표 목 차
【표1】직물매매지역수 ……………………………………………6
【표2】곡물매매지역수 ……………………………………………7
Ⅰ. 서론 ……………………………………………………………1
Ⅱ. 본론 ……………………………………………………………1
1. 부농의 개념과 연구대상 …………………………………1
2. 부농성장의 원인……………………………………………2
(1) 기술의 발전……………………………………………2
(2) 사회적 원인………………………………………………3
3. 부농성장에 따른 사회적 영향………………………………7
(1) 농촌사회의 변화…………………………………………7
(2) 지주제의 변동……………………………………………8
Ⅲ. 결론 ……………………………………………………………9
참고문헌 ……………………………………………………………11
표 목 차
【표1】직물매매지역수 ……………………………………………6
【표2】곡물매매지역수 ……………………………………………7
본문내용
變動
토지소유의 집중화 현상과 농지경영의 집중화 현상을 계기로 하여 農村社會에서 농민층 분화 현상이 일어났다. 게다가 상품화폐경제의 발전 및 手工業과 鑛業의 발달 등도 농민층 분화현상을 촉진시켰다. 농민층 분화현상은 소농층을 중심으로 하던 농촌사회의 계급구성을 변화시켰다. 농민층은 이제 富農, 中農, 小農, 貧農, 賃勞動者層으로 분화하면서 소유와 경영의 분화가 두드러졌다. 빈농층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소토지로써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었으며, 따라서 농촌사회에서 자신의 勞動力을 販賣하여 생계를 유지하기도 하였다. 몰락한 무전농민층은 다수가 농촌에 머물며 賃勞動者가 되었지만, 일부는 도시나 포구로 나가 잡역노동자가 되거나 혹은 수공업, 광업촌에 들어가 노동자가 되었다. 그들은 점차 자유로운 임노동자가 되어갔다. 이러한 분화현상은 兩班層 內部에서도 일어났다. 양반층도 권력에 참여하거나 토지를 집적하여 부를 축적한 계층이 있는가 하면, 일부는 관직에 올라가지 못하거나 부를 모으지 못하여 몰락양반으로 전락해간 계층이 생겼다. 양반층도 大地主, 中小地主, 自作農, 小作農 등으로 分化한 것이다.
(2) 지주제의 변동
이 시기 사회 전반의 변동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變動으로 지주제의 변동을 들 수 있다. 지주제의 변동은 農地 開墾이나 農法 改良 어느 쪽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농지 개간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봉건지배층과 그 가구들은 개간사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募民開墾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民人을 모집하여 開墾하고, 그 노동에 대한 대가로 小作權을 給與하는 방식이었다. 개간지를 매개로 하여 개간지의 소유자와 개간공사에 참여한 농업 노동자 사이에는 지주 전호관계가 수립되고 있었으며, 또 그러한 관계를 전제로 하여 개간은 진행되어 갔다. 이러한 地主 佃戶관계는 종래 賦役勞動의 동원이나 壓良爲賤하는 방법을 구사할 수 없게 된 사회적 사정에서 성립된 것으로서, 조선 전기에 있어서의 노비제적 성격, 지주 전호간의 신분계급적인 지배 예속관계가 직접적으로 표출 작용하던 종전의 지주제와는 일정한 거리를 갖는 것이었고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 시기의 지주 전호제는 經濟的 關係가 한층 强化되고, 전호에 대한 身分的 降下는 필요 없게 되었다.
農法 改良을 계기로 하여서도 지주제에는 변동이 오고 있었다. 농법의 개량은 生産力의 增加와 農業 勞動力의 節約을 수반하는 것이었으므로, 자작농이나 소작농민 등 생산자 농민층들 중에서는 농법의 전환이나 이를 기반으로 가능한 小作地의 擴大를 통해 수확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이 시기에 발달하고 있던 상품화폐경제와의 관련에서 시장을 대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농업경영 즉 상업적 농업을 추진하여 나갔다. 이 새로운 농업경영의 담당자들은 이른바 經營型 富農層으로 그 기본층은 地主農地의 借耕을 통해 성립하는 층이었으므로, 지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地代의 減下를 도모하지 않을 수 없었고, 따라서 그들과 대항관계에 서 있으면서, 동시에 임금노동에 의한 농업경영을 행하고 있음에서는 빈농이나 無田農民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의 활동이 성행함에 따라 소작지에서의 소작농민의 배제가 필연적으로 야기되었다.
농업경영상의 이러한 변동에는 토지의 상품화, 봉건 지주권의 약화, 그리고 농민층의 분화가 수반되고 있었고, 또한 그 변동이 광범하게 전개됨에 따라 이런 현상은 더욱 촉진되어 갔다. 특히 농민층의 分化는 지주층의 토지 겸병이 왕성하여져 감에 따라서도 야기되는 것이어서 그 분화는 안팎에서 연유하고 있었다. 농민층의 분화는 18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면서 더욱 격화되었고 양반층 내부에서도 크게 일어나고 있었다. 다수의 양반층은 토지 소유에서 탈락하여 小作佃戶, 나가서는 無田農民賃勞動層으로까지 전락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일반 농민층 가운데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나 상인층들은 토지집적을 통해 지주층으로 상승하는 자들도 있게 되었다. 이들은 경제적 수단과 목표 아래 지주로 상승한 요컨대 非身分的 地主로서의 庶民地主들로서 종래의 신분적인 봉건지주층들과는 거리가 있는 지주층이었다. 庶民地主의 등장은 經營型 富農의 성장과 함께 地主佃戶制에 있어서 身分的 隸屬性의 弱化를 한층 촉진시키고 經濟的 關係에 의거한 地主制를 더욱 發展시켜 나갔다.
Ⅲ. 결론
현 시점의 농민들의 問題點은 朝鮮後期 그들의 問題點과 매우 흡사하다. 閉鎖經濟였던 조선후기에 農業技術의 不足으로 인한 農業生産力의 미약함은 開放經濟인 現在 品種改良 등으로 그 절대적인 한계를 넘어선 듯 보이지만 다른 국가와의 경쟁시 상대적인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선후기의 富農들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하여 왔는지를 살펴보면서 현 시대에 놓여진 問題에 대한 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1960년대 산업화의 지속으로 농촌의 급격한 노동인력이 빠져나가고 高嶺化가 지속됨에 따라 農村은 심각한 위기에 놓인다. 1차 산업의 농업에서 3차 산업의 정보화시대로 흘러간다는 A.Toffler가 말한‘제3의 물결’은 마치 한곳에 모아놓았던 물을 한꺼번에 방류하듯이 우리를 정신없이 이곳에 내던졌다. 이에 대한 희생양은 농민들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최근 여러 곳에서 生存鬪爭을 위한 열매의 소식이 전해진다. 농업은 벼농사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다양한 商品作物의 재배로 오히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젊은 농가들을 볼 수 있다. 조선후기 농민들이 담배, 인삼, 고추, 면화 등의 다양한 상품작물의 재배로 도시 양반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등 사회적으로는 厚生을 향상시키고 개인적으로는 富의 蓄積을 누리는 것과 매우 흡사한 형태를 보인다. 하지만 資本主義 萌芽라고 불리던 조선후기는 여전히 그 미완성된 모습을 보기도 한다. 제도가 시장경제의 성숙을 포용하지 못함에 따라 시장경제 곳곳에서 잘못된 부의 이동이 이루어져 오히려 농민 계층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졌던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고 현 시대에서 되풀이 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우리의 농산물도 또한 세계시장에서 우수성을 알리는 것은 물론이고 과학기술과 농민들의 경험적 기술을 접목시키는 시도는 새로운 산업의 가지를 뻗칠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토지소유의 집중화 현상과 농지경영의 집중화 현상을 계기로 하여 農村社會에서 농민층 분화 현상이 일어났다. 게다가 상품화폐경제의 발전 및 手工業과 鑛業의 발달 등도 농민층 분화현상을 촉진시켰다. 농민층 분화현상은 소농층을 중심으로 하던 농촌사회의 계급구성을 변화시켰다. 농민층은 이제 富農, 中農, 小農, 貧農, 賃勞動者層으로 분화하면서 소유와 경영의 분화가 두드러졌다. 빈농층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소토지로써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었으며, 따라서 농촌사회에서 자신의 勞動力을 販賣하여 생계를 유지하기도 하였다. 몰락한 무전농민층은 다수가 농촌에 머물며 賃勞動者가 되었지만, 일부는 도시나 포구로 나가 잡역노동자가 되거나 혹은 수공업, 광업촌에 들어가 노동자가 되었다. 그들은 점차 자유로운 임노동자가 되어갔다. 이러한 분화현상은 兩班層 內部에서도 일어났다. 양반층도 권력에 참여하거나 토지를 집적하여 부를 축적한 계층이 있는가 하면, 일부는 관직에 올라가지 못하거나 부를 모으지 못하여 몰락양반으로 전락해간 계층이 생겼다. 양반층도 大地主, 中小地主, 自作農, 小作農 등으로 分化한 것이다.
(2) 지주제의 변동
이 시기 사회 전반의 변동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變動으로 지주제의 변동을 들 수 있다. 지주제의 변동은 農地 開墾이나 農法 改良 어느 쪽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농지 개간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봉건지배층과 그 가구들은 개간사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募民開墾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民人을 모집하여 開墾하고, 그 노동에 대한 대가로 小作權을 給與하는 방식이었다. 개간지를 매개로 하여 개간지의 소유자와 개간공사에 참여한 농업 노동자 사이에는 지주 전호관계가 수립되고 있었으며, 또 그러한 관계를 전제로 하여 개간은 진행되어 갔다. 이러한 地主 佃戶관계는 종래 賦役勞動의 동원이나 壓良爲賤하는 방법을 구사할 수 없게 된 사회적 사정에서 성립된 것으로서, 조선 전기에 있어서의 노비제적 성격, 지주 전호간의 신분계급적인 지배 예속관계가 직접적으로 표출 작용하던 종전의 지주제와는 일정한 거리를 갖는 것이었고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 시기의 지주 전호제는 經濟的 關係가 한층 强化되고, 전호에 대한 身分的 降下는 필요 없게 되었다.
農法 改良을 계기로 하여서도 지주제에는 변동이 오고 있었다. 농법의 개량은 生産力의 增加와 農業 勞動力의 節約을 수반하는 것이었으므로, 자작농이나 소작농민 등 생산자 농민층들 중에서는 농법의 전환이나 이를 기반으로 가능한 小作地의 擴大를 통해 수확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이 시기에 발달하고 있던 상품화폐경제와의 관련에서 시장을 대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농업경영 즉 상업적 농업을 추진하여 나갔다. 이 새로운 농업경영의 담당자들은 이른바 經營型 富農層으로 그 기본층은 地主農地의 借耕을 통해 성립하는 층이었으므로, 지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地代의 減下를 도모하지 않을 수 없었고, 따라서 그들과 대항관계에 서 있으면서, 동시에 임금노동에 의한 농업경영을 행하고 있음에서는 빈농이나 無田農民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의 활동이 성행함에 따라 소작지에서의 소작농민의 배제가 필연적으로 야기되었다.
농업경영상의 이러한 변동에는 토지의 상품화, 봉건 지주권의 약화, 그리고 농민층의 분화가 수반되고 있었고, 또한 그 변동이 광범하게 전개됨에 따라 이런 현상은 더욱 촉진되어 갔다. 특히 농민층의 分化는 지주층의 토지 겸병이 왕성하여져 감에 따라서도 야기되는 것이어서 그 분화는 안팎에서 연유하고 있었다. 농민층의 분화는 18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면서 더욱 격화되었고 양반층 내부에서도 크게 일어나고 있었다. 다수의 양반층은 토지 소유에서 탈락하여 小作佃戶, 나가서는 無田農民賃勞動層으로까지 전락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일반 농민층 가운데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나 상인층들은 토지집적을 통해 지주층으로 상승하는 자들도 있게 되었다. 이들은 경제적 수단과 목표 아래 지주로 상승한 요컨대 非身分的 地主로서의 庶民地主들로서 종래의 신분적인 봉건지주층들과는 거리가 있는 지주층이었다. 庶民地主의 등장은 經營型 富農의 성장과 함께 地主佃戶制에 있어서 身分的 隸屬性의 弱化를 한층 촉진시키고 經濟的 關係에 의거한 地主制를 더욱 發展시켜 나갔다.
Ⅲ. 결론
현 시점의 농민들의 問題點은 朝鮮後期 그들의 問題點과 매우 흡사하다. 閉鎖經濟였던 조선후기에 農業技術의 不足으로 인한 農業生産力의 미약함은 開放經濟인 現在 品種改良 등으로 그 절대적인 한계를 넘어선 듯 보이지만 다른 국가와의 경쟁시 상대적인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선후기의 富農들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하여 왔는지를 살펴보면서 현 시대에 놓여진 問題에 대한 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1960년대 산업화의 지속으로 농촌의 급격한 노동인력이 빠져나가고 高嶺化가 지속됨에 따라 農村은 심각한 위기에 놓인다. 1차 산업의 농업에서 3차 산업의 정보화시대로 흘러간다는 A.Toffler가 말한‘제3의 물결’은 마치 한곳에 모아놓았던 물을 한꺼번에 방류하듯이 우리를 정신없이 이곳에 내던졌다. 이에 대한 희생양은 농민들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최근 여러 곳에서 生存鬪爭을 위한 열매의 소식이 전해진다. 농업은 벼농사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다양한 商品作物의 재배로 오히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젊은 농가들을 볼 수 있다. 조선후기 농민들이 담배, 인삼, 고추, 면화 등의 다양한 상품작물의 재배로 도시 양반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등 사회적으로는 厚生을 향상시키고 개인적으로는 富의 蓄積을 누리는 것과 매우 흡사한 형태를 보인다. 하지만 資本主義 萌芽라고 불리던 조선후기는 여전히 그 미완성된 모습을 보기도 한다. 제도가 시장경제의 성숙을 포용하지 못함에 따라 시장경제 곳곳에서 잘못된 부의 이동이 이루어져 오히려 농민 계층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졌던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고 현 시대에서 되풀이 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우리의 농산물도 또한 세계시장에서 우수성을 알리는 것은 물론이고 과학기술과 농민들의 경험적 기술을 접목시키는 시도는 새로운 산업의 가지를 뻗칠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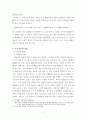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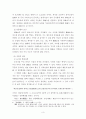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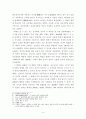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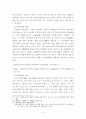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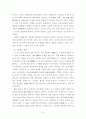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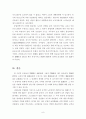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