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작품분석
(1). 사모곡의 보편적 의미
(2). 형식적 특징 및 서정적 자아
2. 사모곡을 선택한 이유
3. 사모곡이 현재 자신에게 갖는 영향 및 의미
4. 사모곡과 나의 서사와의 공통점 및 차이점
5. 사모곡의 변형
Ⅲ. 결론
Ⅱ. 본론
1. 작품분석
(1). 사모곡의 보편적 의미
(2). 형식적 특징 및 서정적 자아
2. 사모곡을 선택한 이유
3. 사모곡이 현재 자신에게 갖는 영향 및 의미
4. 사모곡과 나의 서사와의 공통점 및 차이점
5. 사모곡의 변형
Ⅲ. 결론
본문내용
아빠와 나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서사가 긍정적으로 회복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부모님이 주시는 사랑에는 경중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고, 사랑이라는 관념을 보여지는 것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오류를 범하는지 알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사모곡을 아래와 같이 재창조 해보았다.
낫이 날이 있듯이 호미도 날이 있지 않습니까/ 낫처럼 잘 들지 않다하여 누가 호미에게 날이 없다 하겠습니까/ 어찌 부모님의 사랑을 겉만 보고 아버지의 사랑을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은 한곳에서 나와 한곳으로 흘러감을 마음속에 풀고 살아가렵니다
Ⅲ. 결론
- 사모곡을 읽으면서 내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사모곡의 자아에 내 모습을 투영해서 작품을 감상하다 보니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사모곡은 나에게 위로·치유의 문학이자 반성의 문학으로 다가왔다. 위로·치유의 관점에서 사모곡은, 나의 숨겨뒀던 서사를 겉으로 드러내고 비로소 바로 볼 수 있게 도와주었다.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나의 서사를 밖으로 드러냄으로써 감정의 정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다.
이와 달리 반성의 관점에서 사모곡은 아빠와 나의 관계에서 소극적이었던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였다. 어린 시절의 기억처럼 아빠의 사랑을 매번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처음부터 시작도 하지 않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이 아빠와 나의 관계를 차단시키고 있음을 깨달았다. 나에 대한 아빠의 사랑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며, 오히려 아빠는 더 크게 표현해주려고 노력 하셨지만, 난 그걸 부담스럽게 느끼고 떨치려 하였다. 아빠와 내 사이가 이렇게 된 건 다 아빠 때문이라며 탓하고 원망했지만, 정작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겁먹고 있었던 건 내 자신이었다. 사모곡은 이러한 나의 모순적인 태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감사한 작품이다.
사모곡을 읽기 전에는, 내가 가진 서사가 부끄러운 서사인지 알았다. 그래서 더 밖으로 드러내려 하지도 않았고, 드러날까 두려워 아빠와 부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려 했었다. 그러나 사모곡을 읽으면서,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서사를 제 3자의 시각에서 바로 볼 수 잇게 되었다. 객관적으로 바라본 내 유년시절 서사는 그리 부끄러운 것도 감출 것 도 아니었다. 그리고 나의 서사에서 상처를 준 사람도 상처를 받은 사람도 없었다는 걸 깨달았다. 난 늘 내가 상처를 받았고 아빠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누구는 가해자가 되고 누구는 피해자가 되는 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전환하게 되니 오히려 못난 딸로 몇 년간 지내왔던 내 모습이 아빠에게 죄송스럽게 느껴져 괜스레 먼저 말을 걸어보았다. 이처럼 사모곡은 나에게 치유의 문학이 된 것이다. 사모곡을 읽기 전과 읽은 후의 내 서사는 분명 건강해졌으며, 아빠와 내가 더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참고문헌
최철, 고려국어가요의 해석,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6
김명준, 고려속요 집성, 다운샘, 2002
낫이 날이 있듯이 호미도 날이 있지 않습니까/ 낫처럼 잘 들지 않다하여 누가 호미에게 날이 없다 하겠습니까/ 어찌 부모님의 사랑을 겉만 보고 아버지의 사랑을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은 한곳에서 나와 한곳으로 흘러감을 마음속에 풀고 살아가렵니다
Ⅲ. 결론
- 사모곡을 읽으면서 내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사모곡의 자아에 내 모습을 투영해서 작품을 감상하다 보니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사모곡은 나에게 위로·치유의 문학이자 반성의 문학으로 다가왔다. 위로·치유의 관점에서 사모곡은, 나의 숨겨뒀던 서사를 겉으로 드러내고 비로소 바로 볼 수 있게 도와주었다.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나의 서사를 밖으로 드러냄으로써 감정의 정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다.
이와 달리 반성의 관점에서 사모곡은 아빠와 나의 관계에서 소극적이었던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였다. 어린 시절의 기억처럼 아빠의 사랑을 매번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처음부터 시작도 하지 않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이 아빠와 나의 관계를 차단시키고 있음을 깨달았다. 나에 대한 아빠의 사랑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며, 오히려 아빠는 더 크게 표현해주려고 노력 하셨지만, 난 그걸 부담스럽게 느끼고 떨치려 하였다. 아빠와 내 사이가 이렇게 된 건 다 아빠 때문이라며 탓하고 원망했지만, 정작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겁먹고 있었던 건 내 자신이었다. 사모곡은 이러한 나의 모순적인 태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감사한 작품이다.
사모곡을 읽기 전에는, 내가 가진 서사가 부끄러운 서사인지 알았다. 그래서 더 밖으로 드러내려 하지도 않았고, 드러날까 두려워 아빠와 부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려 했었다. 그러나 사모곡을 읽으면서,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서사를 제 3자의 시각에서 바로 볼 수 잇게 되었다. 객관적으로 바라본 내 유년시절 서사는 그리 부끄러운 것도 감출 것 도 아니었다. 그리고 나의 서사에서 상처를 준 사람도 상처를 받은 사람도 없었다는 걸 깨달았다. 난 늘 내가 상처를 받았고 아빠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누구는 가해자가 되고 누구는 피해자가 되는 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전환하게 되니 오히려 못난 딸로 몇 년간 지내왔던 내 모습이 아빠에게 죄송스럽게 느껴져 괜스레 먼저 말을 걸어보았다. 이처럼 사모곡은 나에게 치유의 문학이 된 것이다. 사모곡을 읽기 전과 읽은 후의 내 서사는 분명 건강해졌으며, 아빠와 내가 더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참고문헌
최철, 고려국어가요의 해석,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6
김명준, 고려속요 집성, 다운샘,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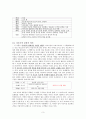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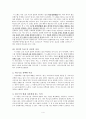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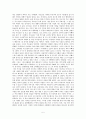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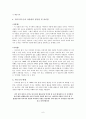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