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없음.
본문내용
계 - 고통의 돌러 가치의 합계’이다.
ex) 유명한 정치적 요인 암살 사건
고통의 양 (100만명10돌러 = 1000만돌러)
암살자&몇몇 광적인 사람들의 쾌락의 양 (5100해돈 = 500해돈)
암살자의 행위에 대한 유용성 = 500해돈 - 1000만돌러
= -999만 9500돌러
여기서, 다음 두 가지의 공리주의 형식화는 잘못일 것이다.
유용성4(U4) : 한 행위가 옳을 필요충분조건은 유용성이 0보다 클 경우다. ex) 화석의 예
유용성5(U5) : 한 행위가 옳을 필요충분조건은 유용성이 매우 높을 경우다. ex)뱀이무는 예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유용성6(U6)로 나타낼 수 있다.
유용성6(U6) : 한 행위가 옳을 필요충분조건은 그 행위의 유용성이 그 행위자가 대신에 행할 수 있는 다른 행위의 유용성보다 높은 경우다.
U6는 우리의 최종적인 형식화에 가장 근접한다. 그러나 정확히 옳은 것은 아니다.
ex) 어떤 사람이 깨지지 않는 사탕을 가지고 있다.
행위
유용성
문수에게 사탕을 주는 경우
+5
동수에게 사탕을 주는 경우
+5
아무에게도 사탕을 주지 않는 경우
0
이러한 종류의 것은 우리 원리의 사소한 변경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옳은 행위가 다른 대안이 갖는 것보다 높은 유용성을 갖도록 요구할 수 없다. 단지 다른 대안이 우리가 행한 것보다 더 높은 유용성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이 밀 이론의 최종적인 형식화다.
유용성7(U7) : 한 행위가 옳을 필요충분조건은 그 행위가 갖는 것보다 더 높은 유용성을 갖는, 행위자가 대신 할 수 있는 다른 행위가 없는 경우다.
원리 U7은 행위 공리주의의 형식화다. 이것이 일이 옹호하고자 했던 원리라고 많은 철학자들은 생각하지만 밀이 U7과 같이 생각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U7은 결과론자들의 도덕 이론이다. 이것은 그들의 대안에 의해 산출되는 결과나 그들의 결과에 행위의 규범적인 상태를 완전히 의존하게 한다.
U7은 쾌락주의적인 원리다. 이것은 대안에 의해 산출된 쾌락이나 고통과 비교해서 그것이 유발하는 쾌락이나 고통이 얼마나 많은가에 행위의 규범적인 상태를 의존하게 한다.
5. 결점 있는 형식화들
U8: 한 행위가 옳을 필요 충분 조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산출하는 경우다. → 옳은 행위란 다른 대안을 행위 했을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야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음
●행위 공리주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최대 다수)’이 쾌락을 즐기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10명×10해돈 = 100명×1해돈 = +100의 유용성
∴ 쾌락을 폭넓게 분배하는 것은 그 행위의 가치를 증진시키지 않음
● U8의 난점 : 두 개의 독립적인 변수를 극대화하도록 요구함
a1 : 2명×50해돈 = +100의 유용성
a2 : 20명×4해돈 = + 80의 유용성
→ U7에 따르면, a1이 도덕적으로 옳다 (U7은 유용성이 극대화되는 것만을 요구하기 때문)
U8에 따르면, 둘 중 어느 것도 옳지 않다. a1은 a2보다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a2는 a1보다 더 높은 유용성을 산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U9 : 한 행위가 옳을 필요 충분 조건은 그 행위가 (행위자가 대신에 행할 수 있는) 다른 행위에 의한 것보다 많은 쾌락을 유발하고 적은 고통을 유발하는 경우다.
a1
100해돈
99돌러
+ 1유용성
a2
90해돈
10돌러
+80유용성
a3
10해돈
9돌러
+ 1유용성
U7에 따르면 a2가 가장 높은 유용성을 갖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옳다.
U9에 따르면
① 많은 쾌락을 유발하는 것 = a1
② 적은 고통을 유발하는 것 = a3
③ a2는 가장 많은 쾌락을 유발하지도 가장 적은 고통을 유발하지도 못함
∴ 옳은 경우는 없다
● U9의 난점 : 최소의 고통과 최대의 쾌락이라는 독립된 두 개의 변수에 대한 극대화를 요구한다는 것
※ U7에서 행위에 의해 산출된 고통이나 쾌락을 누가 느끼느냐는 중요치 않다. 행위자에게 쾌락을 유발하는 행위가 옳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행위에 의해서 산출되는 유용성의 총량에 의해 결정된 행위가 옳은 것이다.
※ 토론거리
1. 행위공리주의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사회에서 실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가?
2. 행위공리주의 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자살, 안락사, 낙태, 정당방위는 옳은가?
3. 행위 공리주의의 기본원리를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이라고 할 수 있는가?
4. 부족한 의료자원의 할당
방법 ① 선착순
② 임의로
③ 살아날 가능성이 높은 사람부터
ex) 유명한 정치적 요인 암살 사건
고통의 양 (100만명10돌러 = 1000만돌러)
암살자&몇몇 광적인 사람들의 쾌락의 양 (5100해돈 = 500해돈)
암살자의 행위에 대한 유용성 = 500해돈 - 1000만돌러
= -999만 9500돌러
여기서, 다음 두 가지의 공리주의 형식화는 잘못일 것이다.
유용성4(U4) : 한 행위가 옳을 필요충분조건은 유용성이 0보다 클 경우다. ex) 화석의 예
유용성5(U5) : 한 행위가 옳을 필요충분조건은 유용성이 매우 높을 경우다. ex)뱀이무는 예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유용성6(U6)로 나타낼 수 있다.
유용성6(U6) : 한 행위가 옳을 필요충분조건은 그 행위의 유용성이 그 행위자가 대신에 행할 수 있는 다른 행위의 유용성보다 높은 경우다.
U6는 우리의 최종적인 형식화에 가장 근접한다. 그러나 정확히 옳은 것은 아니다.
ex) 어떤 사람이 깨지지 않는 사탕을 가지고 있다.
행위
유용성
문수에게 사탕을 주는 경우
+5
동수에게 사탕을 주는 경우
+5
아무에게도 사탕을 주지 않는 경우
0
이러한 종류의 것은 우리 원리의 사소한 변경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옳은 행위가 다른 대안이 갖는 것보다 높은 유용성을 갖도록 요구할 수 없다. 단지 다른 대안이 우리가 행한 것보다 더 높은 유용성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이 밀 이론의 최종적인 형식화다.
유용성7(U7) : 한 행위가 옳을 필요충분조건은 그 행위가 갖는 것보다 더 높은 유용성을 갖는, 행위자가 대신 할 수 있는 다른 행위가 없는 경우다.
원리 U7은 행위 공리주의의 형식화다. 이것이 일이 옹호하고자 했던 원리라고 많은 철학자들은 생각하지만 밀이 U7과 같이 생각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U7은 결과론자들의 도덕 이론이다. 이것은 그들의 대안에 의해 산출되는 결과나 그들의 결과에 행위의 규범적인 상태를 완전히 의존하게 한다.
U7은 쾌락주의적인 원리다. 이것은 대안에 의해 산출된 쾌락이나 고통과 비교해서 그것이 유발하는 쾌락이나 고통이 얼마나 많은가에 행위의 규범적인 상태를 의존하게 한다.
5. 결점 있는 형식화들
U8: 한 행위가 옳을 필요 충분 조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산출하는 경우다. → 옳은 행위란 다른 대안을 행위 했을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야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음
●행위 공리주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최대 다수)’이 쾌락을 즐기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10명×10해돈 = 100명×1해돈 = +100의 유용성
∴ 쾌락을 폭넓게 분배하는 것은 그 행위의 가치를 증진시키지 않음
● U8의 난점 : 두 개의 독립적인 변수를 극대화하도록 요구함
a1 : 2명×50해돈 = +100의 유용성
a2 : 20명×4해돈 = + 80의 유용성
→ U7에 따르면, a1이 도덕적으로 옳다 (U7은 유용성이 극대화되는 것만을 요구하기 때문)
U8에 따르면, 둘 중 어느 것도 옳지 않다. a1은 a2보다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a2는 a1보다 더 높은 유용성을 산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U9 : 한 행위가 옳을 필요 충분 조건은 그 행위가 (행위자가 대신에 행할 수 있는) 다른 행위에 의한 것보다 많은 쾌락을 유발하고 적은 고통을 유발하는 경우다.
a1
100해돈
99돌러
+ 1유용성
a2
90해돈
10돌러
+80유용성
a3
10해돈
9돌러
+ 1유용성
U7에 따르면 a2가 가장 높은 유용성을 갖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옳다.
U9에 따르면
① 많은 쾌락을 유발하는 것 = a1
② 적은 고통을 유발하는 것 = a3
③ a2는 가장 많은 쾌락을 유발하지도 가장 적은 고통을 유발하지도 못함
∴ 옳은 경우는 없다
● U9의 난점 : 최소의 고통과 최대의 쾌락이라는 독립된 두 개의 변수에 대한 극대화를 요구한다는 것
※ U7에서 행위에 의해 산출된 고통이나 쾌락을 누가 느끼느냐는 중요치 않다. 행위자에게 쾌락을 유발하는 행위가 옳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행위에 의해서 산출되는 유용성의 총량에 의해 결정된 행위가 옳은 것이다.
※ 토론거리
1. 행위공리주의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사회에서 실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가?
2. 행위공리주의 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자살, 안락사, 낙태, 정당방위는 옳은가?
3. 행위 공리주의의 기본원리를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이라고 할 수 있는가?
4. 부족한 의료자원의 할당
방법 ① 선착순
② 임의로
③ 살아날 가능성이 높은 사람부터
키워드
추천자료
 공리주의 밀 벰담 롤즈 윤리 하사니 결과주의 질적 공리주의
공리주의 밀 벰담 롤즈 윤리 하사니 결과주의 질적 공리주의 공리주의 벤담 예에링 개인적 공리주의 사회적 공리주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유용성의 원칙 ...
공리주의 벤담 예에링 개인적 공리주의 사회적 공리주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유용성의 원칙 ... 조직행동에 있어서의 피그말리온 효과와 기대이론의 적용과 그 중요성
조직행동에 있어서의 피그말리온 효과와 기대이론의 적용과 그 중요성 칸트의 의무론 & 공리주의
칸트의 의무론 & 공리주의 공학윤리 - 공리주의
공학윤리 - 공리주의 공리주의 비교
공리주의 비교 공리주의, 칸트의 사상, 홉스의 사회계약사상, 덕의 윤리
공리주의, 칸트의 사상, 홉스의 사회계약사상, 덕의 윤리 [사회복지] 공리주의가 사회복지에 끼친 영향
[사회복지] 공리주의가 사회복지에 끼친 영향 공리주의가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공리주의가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공리주의 공리주의 특징 공리주의 현실 적용의 장단점
공리주의 공리주의 특징 공리주의 현실 적용의 장단점 공리주의 행위 공리주의 규칙 공리주의 보편화 공리주의
공리주의 행위 공리주의 규칙 공리주의 보편화 공리주의 (공리주의 관점에서)테러리스트의 가족을 고문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
(공리주의 관점에서)테러리스트의 가족을 고문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 [인간행동에 관한 주요 이론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정리하고 본인 또는 주변인의 경험을 적용...
[인간행동에 관한 주요 이론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정리하고 본인 또는 주변인의 경험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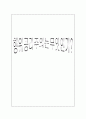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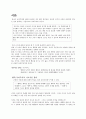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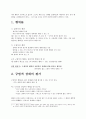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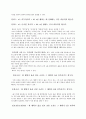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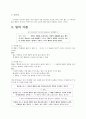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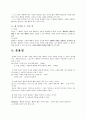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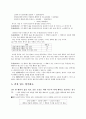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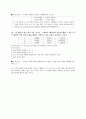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