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몽고침입(대몽항쟁, 몽골항쟁)의 의의
Ⅲ. 몽고침입(대몽항쟁, 몽골항쟁)의 과정
Ⅳ. 몽고침입(대몽항쟁, 몽골항쟁)의 몽고군 전력
Ⅴ. 몽고침입(대몽항쟁, 몽골항쟁)의 민란(民亂)
Ⅵ. 몽고침입(대몽항쟁, 몽골항쟁)의 강화(講和)
1. 대몽강화의 성립
1) 강화론의 대두
2) 강화 성립의 배경
2. 장기간 항전의 원동력은
3. 강화론의 계급적 성격
Ⅶ. 결론
참고문헌
Ⅱ. 몽고침입(대몽항쟁, 몽골항쟁)의 의의
Ⅲ. 몽고침입(대몽항쟁, 몽골항쟁)의 과정
Ⅳ. 몽고침입(대몽항쟁, 몽골항쟁)의 몽고군 전력
Ⅴ. 몽고침입(대몽항쟁, 몽골항쟁)의 민란(民亂)
Ⅵ. 몽고침입(대몽항쟁, 몽골항쟁)의 강화(講和)
1. 대몽강화의 성립
1) 강화론의 대두
2) 강화 성립의 배경
2. 장기간 항전의 원동력은
3. 강화론의 계급적 성격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종은
“만물이 발육 생장할 때가 되면 새끼 치고 알 낳는 짐승을 죽이지 말라는 것은 예기에 명시되어 있는 법전이며 옛날 어진 임금들의 좋은 정책이었다. 그런데 지금 각 도 수령은 법령을 잘 준수하는 자가 드물다. 혹은 반찬감을 바침으로써 상부의 상을 받기 위하여 혹은 사신을 후히 대접함으로써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사냥을 무시로 하고 혹은 농민들이 화전을 개간하다가 생물을 연소시키는 일도 있다. 이는 때를 맞추어 생물을 기르는 도리에 어그러지고 천지의 화기를 손상하는 것으로 되니 이런 행위를 일체 금지할 것이며 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벌에 처할 것이다.”
라고 하여 번식기에 동물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였고, 원종은
“나는 인자한 마음을 새와 짐승들에게까지 미칠 것을 바라는 바이다. 지금은 한창 봄철이라 사냥을 한다면 새와 짐승들이 알을 낳지 못하고 새끼를 치지 못 하게 될 것이니 이것은 생명 있는 것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이 뜻을 알고 상납하는 음식물 중에 육류를 넣지 말게 하라”
고 하여 살생을 금지할 뿐 아니라 솔선수범하여 육식을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라의 통치자가 동물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고 앞장서서 육식을 절제하니 자연 고기를 얻을 목적으로 가축을 기르는 것도 등한시 하였을 것은 자명한 일이고, 육류의 공급은 몹시 적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일부 상류층에서나 육식을 즐겼음이 高麗圖經의 곳곳에서 발견된다.
“고려에는 양과 돼지가 있지만 왕공이나 귀인이 아니면 먹지 못하였고, 가난한 백성은 해산물을 많이 먹는다.”
“고려의 봉록이 지극히 박해서 다만 생쌀과 채소를 줄 뿐이며 또 상시에 고기를 먹는 일이 드물어서, 중국 사신이 올 때는 바로 대서의 계절이라 음식이 썩어 냄새가 지독한데, 먹다 남은 것을 주면 아무렇지 않게 먹어 버리고 반드시 그 나머지를 집으로 가져간다.”
그러나 왕의 한 끼 식사가 쌀 세 말, 꿩 아홉 마리에 달하였던 고대의 육식문화나 수렵을 즐겼던 고구려의 기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이것은 김극기의 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래도 추위를 겁내지 않고 매와 개를 데리고 사냥 나가네
여우와 토끼를 쫓아 달릴 때, 짧은 옷에는 흐르는 피 묻었네
집에 돌아오자 온 이웃이 기뻐하고, 모여 앉아 실컷 먹네
날고기 먹는 것 무엇이 이상하랴”
즉 고려에서는 정책적으로 육류의 식용을 억제하였지만 고래로부터 내려오던 유목민의 전통은 서민들의 생활 저변에 깔려 있으면서 다시 부흥될 계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몽고의 지배는 이러한 전통을 되살리는 촉매제가 된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동전, 삼별초의 대몽항쟁과 제주도, 해양문화재단 :생각의나무, 2001
- 윤용혁, 고려의 대몽항쟁, \'단계적으로 발전해 간 항쟁역량\', 내일을 여는 역사, 2003
- 윤용혁, 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 일지사, 2000
- 윤용혁, 고려대몽항쟁사 연구, 고려대학교, 1988
- 이원복, 무인 정권과 대몽 항쟁, 계몽사, 2005
- 역사교육교재연구원, 대몽 항쟁과 원의 간섭, 한얼교육, 2008
“만물이 발육 생장할 때가 되면 새끼 치고 알 낳는 짐승을 죽이지 말라는 것은 예기에 명시되어 있는 법전이며 옛날 어진 임금들의 좋은 정책이었다. 그런데 지금 각 도 수령은 법령을 잘 준수하는 자가 드물다. 혹은 반찬감을 바침으로써 상부의 상을 받기 위하여 혹은 사신을 후히 대접함으로써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사냥을 무시로 하고 혹은 농민들이 화전을 개간하다가 생물을 연소시키는 일도 있다. 이는 때를 맞추어 생물을 기르는 도리에 어그러지고 천지의 화기를 손상하는 것으로 되니 이런 행위를 일체 금지할 것이며 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벌에 처할 것이다.”
라고 하여 번식기에 동물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였고, 원종은
“나는 인자한 마음을 새와 짐승들에게까지 미칠 것을 바라는 바이다. 지금은 한창 봄철이라 사냥을 한다면 새와 짐승들이 알을 낳지 못하고 새끼를 치지 못 하게 될 것이니 이것은 생명 있는 것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이 뜻을 알고 상납하는 음식물 중에 육류를 넣지 말게 하라”
고 하여 살생을 금지할 뿐 아니라 솔선수범하여 육식을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라의 통치자가 동물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고 앞장서서 육식을 절제하니 자연 고기를 얻을 목적으로 가축을 기르는 것도 등한시 하였을 것은 자명한 일이고, 육류의 공급은 몹시 적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일부 상류층에서나 육식을 즐겼음이 高麗圖經의 곳곳에서 발견된다.
“고려에는 양과 돼지가 있지만 왕공이나 귀인이 아니면 먹지 못하였고, 가난한 백성은 해산물을 많이 먹는다.”
“고려의 봉록이 지극히 박해서 다만 생쌀과 채소를 줄 뿐이며 또 상시에 고기를 먹는 일이 드물어서, 중국 사신이 올 때는 바로 대서의 계절이라 음식이 썩어 냄새가 지독한데, 먹다 남은 것을 주면 아무렇지 않게 먹어 버리고 반드시 그 나머지를 집으로 가져간다.”
그러나 왕의 한 끼 식사가 쌀 세 말, 꿩 아홉 마리에 달하였던 고대의 육식문화나 수렵을 즐겼던 고구려의 기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이것은 김극기의 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래도 추위를 겁내지 않고 매와 개를 데리고 사냥 나가네
여우와 토끼를 쫓아 달릴 때, 짧은 옷에는 흐르는 피 묻었네
집에 돌아오자 온 이웃이 기뻐하고, 모여 앉아 실컷 먹네
날고기 먹는 것 무엇이 이상하랴”
즉 고려에서는 정책적으로 육류의 식용을 억제하였지만 고래로부터 내려오던 유목민의 전통은 서민들의 생활 저변에 깔려 있으면서 다시 부흥될 계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몽고의 지배는 이러한 전통을 되살리는 촉매제가 된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동전, 삼별초의 대몽항쟁과 제주도, 해양문화재단 :생각의나무, 2001
- 윤용혁, 고려의 대몽항쟁, \'단계적으로 발전해 간 항쟁역량\', 내일을 여는 역사, 2003
- 윤용혁, 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 일지사, 2000
- 윤용혁, 고려대몽항쟁사 연구, 고려대학교, 1988
- 이원복, 무인 정권과 대몽 항쟁, 계몽사, 2005
- 역사교육교재연구원, 대몽 항쟁과 원의 간섭, 한얼교육,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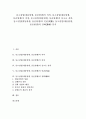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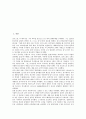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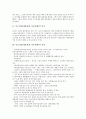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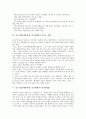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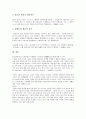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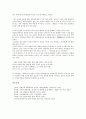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