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김수영, “시인다운 시인”을 꿈꾸다.
Ⅱ. 머리 속에 고뇌의 집을 지은 시인, 김수영
Ⅲ. ‘온몸’으로 고뇌한 시인, 김수영
[참고 문헌]
Ⅱ. 머리 속에 고뇌의 집을 지은 시인, 김수영
Ⅲ. ‘온몸’으로 고뇌한 시인, 김수영
[참고 문헌]
본문내용
)를
잠이 와
잠이 와
잠이 와 죽겠는데
왜
지금 쓰려나
이 순간에 쓰려나
죄수들의 말이
배고픈 것보다도
잠 못 자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해서
그래 그러나
배고픈 사람이
하도 많아 그러나
시 같은 것
시 같은 것
안 쓰려고 그러나
더구나
<4.19> 시 같은 것
안 쓰려고 그러나
껌벅껌벅
두 눈을
감아가면서
아주
금방 곯아떨어질 것
같은데
밥보다도
더 소중한
잠이 안 오네
달콤한
달콤한
잠이 안 오네
보스토크가
돌아와 그러나
세계정부 이상(理想)
따분해 그러나
이 나라
백성들이
너무 지쳐 그러나
별안간
빚 갚을 것
생각나 그러나
여편네가
짜증 낼까
무서워 그러나
동생들과
어머니가
걱정이 돼 그러나
참았던 오줌 마려
그래 그러나
시 같은 것
시 같은 것
써보려고 그러나
<4.19> 시 같은 것
써보려고 그러나
<1961. 4. 14>
4.19를 겪으면서 많은 지식인들은 문학의 자유, 정치의 자유를 비롯한 모든 분야의 자유를 성취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에 열광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한 자유가 완전하게 회복된 것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식인들은 또 다른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었다. 수영의 4.19체험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함께 이해해볼 수 있을 것이다.
시인은 4.19를 체험하면서 모더니스트로서의 시보다 참여시로서의 시, 즉 자유의 참뜻을 깨닫고, 정치적 폭력에 맞서 시민의 자유를 옹호하는 시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는 많은 지식인들 가운데에서도 사회와 역사와 개인이 서로 분리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시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시인으로서 충분한 사회적 인식은 하고 있었으나, 결코 시인의 혁명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늘 좌절하고 고뇌할 수 밖에 없었다.
시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이 시에서 그를 잠 못 들게 하는 것은 바로 현실이다. 이제 1년이 다 되어가는 4.19를 생각하며 그는 아직도 어지러운 현실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하필이면 잠이 와 죽겠는데 그는 시를 써야만 하는 것이다. 현실이, 지식인으로서의 의식이 그를 불편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밥보다도 소중한 잠이 오지 않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시를 쓰려고 앉은 그에게는 거창한 4.19의 어떤 내용을 알리기보다는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작은 부분들을 솔직히 적어간다. 역사 속에서 희생되어가는 우리 백성들, 더 작게는 여편네와 동생들과 어머니가 속한 가족, 더 작게는 자신의 생리현상을 통해서 말이다. 이것들은 모두 4.19시 같은 것을 써보기 위한 핑계거리이자, 그를 가장 일차적으로 고뇌하게 만드는 것들이다. 수영은 바로 이런 시인이다. 예민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솔직하고, 거창하지 않게, 일상 속에서 느끼는 고뇌를 시로서 끄적거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시인인 것이다.
Ⅲ. ‘온몸’으로 고뇌한 시인, 김수영
“20여년의 시작생활을 경험했지만, 나는 아직도 시를 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
김수영 시인은 그가 쓴 산문 <시여, 침을 뱉어라>에서 시를 쓴다는 것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덧붙여 시를 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면, 시를 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그의 말에 많은 독자들은 참 어리둥절해할 것이다. 20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 동안 시인으로 살았고, 그토록 많은 시를 남겼으면서도 시를 쓴다는 것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괴기한 시인’, 그가 바로 김수영이다.
그는 시를 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고 했지만, 시는 온몸으로 밀고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시는 머리로도 심장으로도 쓸 수 없다. 오직 온몸으로 시를 써야 하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온몸 시학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 오로지 온몸을 다 던져서 시를 쓰는 것, 마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온 몸으로 세상에 부딪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의 시는 하나의 문학적 작품이 아니라 김수영의 삶 그 자체였기에, 그만큼 소중하고 고뇌해야만 할 대상이었던 것이다. 이로써 김수영의 시는 곧 그의 삶, 더 나아가 사회와 하나가 된다.
그의 온몸시학은 결국 ‘수영 정신’과도 연결된다. 김수영 시인이 그의 시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그의 정신은 결국 ‘현실에 대한 부단한 인식과 몸싸움’이라고 볼 수 있다. 끊임없이 사회에 다가가 알고, 깨닫고, 온몸으로 부딪힌다. 그의 시는 그러한 ‘수영정신’으로 무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영 정신’에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다. 그것은 바로 시인 자신이 ‘온몸으로 부딪히면서도 사회의 혁명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한 자기 인식과 고뇌이다. 그러한 고뇌와 번민, 갈등은 ‘수영정신’의 깊은 바닥에 깔려 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좌절과 고뇌를 숨기거나 미화시키려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의 솔직한 모습이 드러나 있는 것이다. 또한 그는 좌절에서 멈춰서지 않았다. 고뇌의 밑바탕 위에서 다시 새롭게 ‘현실에 대한 온몸으로의 저항’을 시도한다. 그러한 시도는 좌절되고 무너져도 계속된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수영정신’이 빛을 찾아가는 것이다.
‘시인의 헛소리가 헛소리가 아니게 될 때, 참말이 될 때의 경이’를 꿈꾸던 시인 김수영. 우리는 그의 정신과 시를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다. 시와 삶과 사회를 온몸으로 끌어안으려던 그의 정신은 그저 나태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수영’이라는 이름 두 글자를 되새기게 한다.
[참고 문헌]
① 김수영(2003), 『김수영 전집 1』(서울: 민음사)
② 이은정(1999), 『현대시학의 두 구도-김춘수와 김수영』(서울: 소명출판)
③ 김윤배(2003), 『온 몸의 시학, 김수영』(서울: 국학 자료원)
④ 김수영(1974), 『거대한 뿌리』(서울: 민음사)
⑤ 김상환(2000), 『풍자와 해탈 혹은 사랑과 죽음 』(서울: 민음사)
⑥ 최하림(1993), 『한국현대시인연구 9, 김수영』(서울: 문학세계사)
⑦ 최성침(2000), 『물의 모험-김수영의 시』(서울: 아세아문화사)
⑧ 김혜순(1995), 『김수영, 세계의 개진과 자유의 이행』(서울 : 건국대학교출판부)
잠이 와
잠이 와
잠이 와 죽겠는데
왜
지금 쓰려나
이 순간에 쓰려나
죄수들의 말이
배고픈 것보다도
잠 못 자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해서
그래 그러나
배고픈 사람이
하도 많아 그러나
시 같은 것
시 같은 것
안 쓰려고 그러나
더구나
<4.19> 시 같은 것
안 쓰려고 그러나
껌벅껌벅
두 눈을
감아가면서
아주
금방 곯아떨어질 것
같은데
밥보다도
더 소중한
잠이 안 오네
달콤한
달콤한
잠이 안 오네
보스토크가
돌아와 그러나
세계정부 이상(理想)
따분해 그러나
이 나라
백성들이
너무 지쳐 그러나
별안간
빚 갚을 것
생각나 그러나
여편네가
짜증 낼까
무서워 그러나
동생들과
어머니가
걱정이 돼 그러나
참았던 오줌 마려
그래 그러나
시 같은 것
시 같은 것
써보려고 그러나
<4.19> 시 같은 것
써보려고 그러나
<1961. 4. 14>
4.19를 겪으면서 많은 지식인들은 문학의 자유, 정치의 자유를 비롯한 모든 분야의 자유를 성취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에 열광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한 자유가 완전하게 회복된 것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식인들은 또 다른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었다. 수영의 4.19체험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함께 이해해볼 수 있을 것이다.
시인은 4.19를 체험하면서 모더니스트로서의 시보다 참여시로서의 시, 즉 자유의 참뜻을 깨닫고, 정치적 폭력에 맞서 시민의 자유를 옹호하는 시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는 많은 지식인들 가운데에서도 사회와 역사와 개인이 서로 분리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시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시인으로서 충분한 사회적 인식은 하고 있었으나, 결코 시인의 혁명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늘 좌절하고 고뇌할 수 밖에 없었다.
시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이 시에서 그를 잠 못 들게 하는 것은 바로 현실이다. 이제 1년이 다 되어가는 4.19를 생각하며 그는 아직도 어지러운 현실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하필이면 잠이 와 죽겠는데 그는 시를 써야만 하는 것이다. 현실이, 지식인으로서의 의식이 그를 불편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밥보다도 소중한 잠이 오지 않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시를 쓰려고 앉은 그에게는 거창한 4.19의 어떤 내용을 알리기보다는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작은 부분들을 솔직히 적어간다. 역사 속에서 희생되어가는 우리 백성들, 더 작게는 여편네와 동생들과 어머니가 속한 가족, 더 작게는 자신의 생리현상을 통해서 말이다. 이것들은 모두 4.19시 같은 것을 써보기 위한 핑계거리이자, 그를 가장 일차적으로 고뇌하게 만드는 것들이다. 수영은 바로 이런 시인이다. 예민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솔직하고, 거창하지 않게, 일상 속에서 느끼는 고뇌를 시로서 끄적거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시인인 것이다.
Ⅲ. ‘온몸’으로 고뇌한 시인, 김수영
“20여년의 시작생활을 경험했지만, 나는 아직도 시를 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
김수영 시인은 그가 쓴 산문 <시여, 침을 뱉어라>에서 시를 쓴다는 것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덧붙여 시를 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면, 시를 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그의 말에 많은 독자들은 참 어리둥절해할 것이다. 20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 동안 시인으로 살았고, 그토록 많은 시를 남겼으면서도 시를 쓴다는 것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괴기한 시인’, 그가 바로 김수영이다.
그는 시를 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고 했지만, 시는 온몸으로 밀고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시는 머리로도 심장으로도 쓸 수 없다. 오직 온몸으로 시를 써야 하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온몸 시학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 오로지 온몸을 다 던져서 시를 쓰는 것, 마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온 몸으로 세상에 부딪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의 시는 하나의 문학적 작품이 아니라 김수영의 삶 그 자체였기에, 그만큼 소중하고 고뇌해야만 할 대상이었던 것이다. 이로써 김수영의 시는 곧 그의 삶, 더 나아가 사회와 하나가 된다.
그의 온몸시학은 결국 ‘수영 정신’과도 연결된다. 김수영 시인이 그의 시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그의 정신은 결국 ‘현실에 대한 부단한 인식과 몸싸움’이라고 볼 수 있다. 끊임없이 사회에 다가가 알고, 깨닫고, 온몸으로 부딪힌다. 그의 시는 그러한 ‘수영정신’으로 무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영 정신’에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다. 그것은 바로 시인 자신이 ‘온몸으로 부딪히면서도 사회의 혁명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한 자기 인식과 고뇌이다. 그러한 고뇌와 번민, 갈등은 ‘수영정신’의 깊은 바닥에 깔려 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좌절과 고뇌를 숨기거나 미화시키려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의 솔직한 모습이 드러나 있는 것이다. 또한 그는 좌절에서 멈춰서지 않았다. 고뇌의 밑바탕 위에서 다시 새롭게 ‘현실에 대한 온몸으로의 저항’을 시도한다. 그러한 시도는 좌절되고 무너져도 계속된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수영정신’이 빛을 찾아가는 것이다.
‘시인의 헛소리가 헛소리가 아니게 될 때, 참말이 될 때의 경이’를 꿈꾸던 시인 김수영. 우리는 그의 정신과 시를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다. 시와 삶과 사회를 온몸으로 끌어안으려던 그의 정신은 그저 나태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수영’이라는 이름 두 글자를 되새기게 한다.
[참고 문헌]
① 김수영(2003), 『김수영 전집 1』(서울: 민음사)
② 이은정(1999), 『현대시학의 두 구도-김춘수와 김수영』(서울: 소명출판)
③ 김윤배(2003), 『온 몸의 시학, 김수영』(서울: 국학 자료원)
④ 김수영(1974), 『거대한 뿌리』(서울: 민음사)
⑤ 김상환(2000), 『풍자와 해탈 혹은 사랑과 죽음 』(서울: 민음사)
⑥ 최하림(1993), 『한국현대시인연구 9, 김수영』(서울: 문학세계사)
⑦ 최성침(2000), 『물의 모험-김수영의 시』(서울: 아세아문화사)
⑧ 김혜순(1995), 『김수영, 세계의 개진과 자유의 이행』(서울 : 건국대학교출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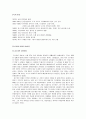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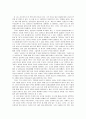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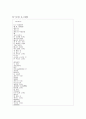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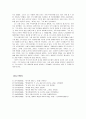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