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dward Burnett Tylor>
업적
<타일러 이론에 대한 비판>
<현상에 대한 작용여부>
<토론의 장>
업적
<타일러 이론에 대한 비판>
<현상에 대한 작용여부>
<토론의 장>
본문내용
니고 계신다. 본인은 그정도까지는 아니므로 확신한다)
그렇다면 모듈도 고정된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반응이라는 결정론적인 관점이 아니라 발현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의문을 품어본다. 즉, 선사문화의 인류와 현생 인류의 유전적 특질, 그에 따르는 모듈이 같다고 할지라도, 그 모듈의 작동방식 중 어떤 것이 더 잘 발현되는가는 하나의 체계로 일반화할 수 없다. 때문에 현생 원시종족의 연구를 통해 선사문화를 직접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은 무리가 있다.
<토론의 장>
타일러는 <원시문화>에서 문화를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라 하였다. 과학은 왜 빠졌을까? 과학은 인간이 자연을 알고 인식하는 과정의 산물이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획득한 능력의 일부이다. ‘과학’과 ‘문화’는 융합이 아니라, 과학은 문화의 일부이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과학은 스키마를 통한 지식의 산출(?)에 불과한 단순한 지식에 지나지 않는 유물론의 그것도 같지 않을까? 위의 비판내용도 그와 맥락을 같이 한다. 과학을 뺏기 때문에 유전자의 발현 형태나 가짓수를 부정하는 것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모듈도 고정된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반응이라는 결정론적인 관점이 아니라 발현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의문을 품어본다. 즉, 선사문화의 인류와 현생 인류의 유전적 특질, 그에 따르는 모듈이 같다고 할지라도, 그 모듈의 작동방식 중 어떤 것이 더 잘 발현되는가는 하나의 체계로 일반화할 수 없다. 때문에 현생 원시종족의 연구를 통해 선사문화를 직접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은 무리가 있다.
<토론의 장>
타일러는 <원시문화>에서 문화를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라 하였다. 과학은 왜 빠졌을까? 과학은 인간이 자연을 알고 인식하는 과정의 산물이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획득한 능력의 일부이다. ‘과학’과 ‘문화’는 융합이 아니라, 과학은 문화의 일부이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과학은 스키마를 통한 지식의 산출(?)에 불과한 단순한 지식에 지나지 않는 유물론의 그것도 같지 않을까? 위의 비판내용도 그와 맥락을 같이 한다. 과학을 뺏기 때문에 유전자의 발현 형태나 가짓수를 부정하는 것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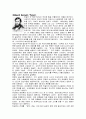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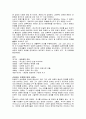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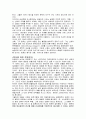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