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카프카의 삶
2. <소송>의 줄거리
3. <법 앞에서>로 살펴보는 법과 개인의 관계
4. 논의
5. 개인적 감상
6. 맺음말
참고 문헌
2. <소송>의 줄거리
3. <법 앞에서>로 살펴보는 법과 개인의 관계
4. 논의
5. 개인적 감상
6. 맺음말
참고 문헌
본문내용
에서 많은 호응을 얻었었다. 하지만 1980년대와 90년대를 끌려가듯 살아온 한 남성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영화는 이창동 감독이 스스로에게 보내는 자기위안이자 자기 세대를 위한 비가, 무질서한 시대의 부정에 무기력했던 아버지 세대, 즉 감독 세대의 자기변명인 동시에 그런 고난의 세월을 살아온 동년배들을 위한 자기연민의 비가로 그친다는 한계점 또한 내포하고 있었다. 이효인, <영화로 읽는 한국 사회문화사> (개마고원, 2003)
하지만 <효자동 이발사>의 경우 이발사가 솔선수범해왔던 권력에 대한 복종이 자신의 아들을 불구로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면서 궤도를 달리한다. 아무리 일으켜보려고 해도 자식이 두발로 일어서지 못하고 다시 주저 앉아버리고 말자 이발사는 경무대 앞거리로 뛰쳐나가 울부짖는데, 아마도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로 울부짖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들뢰즈가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경무대에 대한 이발사의 욕망이 곧 권력이고 그렇게 따지자면 이발사의 자식은 이발사의 욕망에 의해 불구가 된 것이니까 말이다. 이런 상황을 통해 감독은 소심했던 이발사가 권력에 저항하는 모습까지를 이끌어낸다. 사실 자살로 끝나는 영호의 삶으로 시작해 여전히 암담한 시기임에도 개인적인 순수함에 기대어 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의 <박하사탕>보다는 자신의 삶이 권력에 의해 심한 굴곡을 겪어 나가면서 결국에 자신의 소시민적인 이데올로기를 버리고 나중에는 저항하는 모습 -머리가 자라면 다시 오겠다는 대사- 까지 보이는 <효자동 이발사>가 본래의 주제인 개인과 권력의 관계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의도를 더 잘 살리고 있는 듯이 보인다.
카프카의 <소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요제프 K의 죄는 절대적인 권력을 믿고서 소송에 스스로 끝없이 휘말리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즉, 요제프 K의 죄는 부당한 권력에 복종했다는 것이 되고 박홍규, 위의 책 408p
그로 인해 치욕만을 남기는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된 것이다. 지금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권력의 모습을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바꾸겠다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다. 지금 선 자리가, 어떤 특정한 힘 아래 있는 권력의 배치지만, 동시에 행동과 동작을 그리는 선을 변형시키는 ‘조그마한’ 변형으로도 충분히 하나의 출구가 만들어지는 바로 그곳인 것이다. 고미숙 외. 위의 책 333p
6. 맺음말
카프카가 친구에게 쓴 편지문구로 카프카의 <소송>을 읽은 느낌을 대신하며 글을 마친다.
빈틈없이 거듭거듭 높이 치솟아서 망원경으로조차 꼭대기를 보기 어려울 만큼 드높은 그런 생애를 조망할 때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양심이 큰 상처를 입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럼으로써 양심은 온갖 상처에 대해 보다 민감해지기 때문이다. 나는 오로지 꽉 물거나 쿡쿡 찌르는 책만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읽는 책이 단 한 주먹으로 정수리를 갈겨 우리를 각성시키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책을 읽겠는가? 자네 말대로 책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도록? 맙소사. 책을 읽어 행복할 수 있다면 책이 없어도 마찬가지로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책이라면 아쉬운 대로 우리 자신이 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책이란 우리를 몹시 고통스럽게 해주는 불행처럼,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의 죽음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을 떠나 인적 없는 숲 속으로 추방당한 것처럼, 자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책이다. 한 권의 책은 우리들 내면의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이어야만 한다. (바겐바하, <카프카>, 51~52쪽 재인용) 박홍규, 위의 책 230p
참고 문헌
프란츠 카프카, <심판>(1925). [박환덕 역 (범우사, 1998년)]
박환덕, <카프카 문학 연구> (범우사, 1994)
염무웅, <혼돈의 시대에 구상하는 문학의 논리> (창작과비평사, 1995)
박홍규, <카프카, 권력과 싸우다> (미토, 2003)
고미숙 외, <들뢰즈와 문학-기계> (소명, 2002)
김태환, <푸른 장미를 찾아서: 혼돈의 미학> (문학과지성사, 2001)
들뢰즈, 가타리 / 이진경 역, <카프카> (동문선, 2001)
김태환, “발신자를 찾아서-「법 앞에서」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 <카프카 연구 제9집> (한국 카프카 학회, 2001)
박은주, “<소송>에 나타난 권력과 법정세계”, <카프카 연구 제6집> (한국 카프카 학회, 1998)
http://kafka.german.or.kr
하지만 <효자동 이발사>의 경우 이발사가 솔선수범해왔던 권력에 대한 복종이 자신의 아들을 불구로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면서 궤도를 달리한다. 아무리 일으켜보려고 해도 자식이 두발로 일어서지 못하고 다시 주저 앉아버리고 말자 이발사는 경무대 앞거리로 뛰쳐나가 울부짖는데, 아마도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로 울부짖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들뢰즈가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경무대에 대한 이발사의 욕망이 곧 권력이고 그렇게 따지자면 이발사의 자식은 이발사의 욕망에 의해 불구가 된 것이니까 말이다. 이런 상황을 통해 감독은 소심했던 이발사가 권력에 저항하는 모습까지를 이끌어낸다. 사실 자살로 끝나는 영호의 삶으로 시작해 여전히 암담한 시기임에도 개인적인 순수함에 기대어 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의 <박하사탕>보다는 자신의 삶이 권력에 의해 심한 굴곡을 겪어 나가면서 결국에 자신의 소시민적인 이데올로기를 버리고 나중에는 저항하는 모습 -머리가 자라면 다시 오겠다는 대사- 까지 보이는 <효자동 이발사>가 본래의 주제인 개인과 권력의 관계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의도를 더 잘 살리고 있는 듯이 보인다.
카프카의 <소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요제프 K의 죄는 절대적인 권력을 믿고서 소송에 스스로 끝없이 휘말리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즉, 요제프 K의 죄는 부당한 권력에 복종했다는 것이 되고 박홍규, 위의 책 408p
그로 인해 치욕만을 남기는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된 것이다. 지금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권력의 모습을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바꾸겠다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다. 지금 선 자리가, 어떤 특정한 힘 아래 있는 권력의 배치지만, 동시에 행동과 동작을 그리는 선을 변형시키는 ‘조그마한’ 변형으로도 충분히 하나의 출구가 만들어지는 바로 그곳인 것이다. 고미숙 외. 위의 책 333p
6. 맺음말
카프카가 친구에게 쓴 편지문구로 카프카의 <소송>을 읽은 느낌을 대신하며 글을 마친다.
빈틈없이 거듭거듭 높이 치솟아서 망원경으로조차 꼭대기를 보기 어려울 만큼 드높은 그런 생애를 조망할 때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양심이 큰 상처를 입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럼으로써 양심은 온갖 상처에 대해 보다 민감해지기 때문이다. 나는 오로지 꽉 물거나 쿡쿡 찌르는 책만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읽는 책이 단 한 주먹으로 정수리를 갈겨 우리를 각성시키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책을 읽겠는가? 자네 말대로 책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도록? 맙소사. 책을 읽어 행복할 수 있다면 책이 없어도 마찬가지로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책이라면 아쉬운 대로 우리 자신이 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책이란 우리를 몹시 고통스럽게 해주는 불행처럼,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의 죽음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을 떠나 인적 없는 숲 속으로 추방당한 것처럼, 자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책이다. 한 권의 책은 우리들 내면의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이어야만 한다. (바겐바하, <카프카>, 51~52쪽 재인용) 박홍규, 위의 책 230p
참고 문헌
프란츠 카프카, <심판>(1925). [박환덕 역 (범우사, 1998년)]
박환덕, <카프카 문학 연구> (범우사, 1994)
염무웅, <혼돈의 시대에 구상하는 문학의 논리> (창작과비평사, 1995)
박홍규, <카프카, 권력과 싸우다> (미토, 2003)
고미숙 외, <들뢰즈와 문학-기계> (소명, 2002)
김태환, <푸른 장미를 찾아서: 혼돈의 미학> (문학과지성사, 2001)
들뢰즈, 가타리 / 이진경 역, <카프카> (동문선, 2001)
김태환, “발신자를 찾아서-「법 앞에서」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 <카프카 연구 제9집> (한국 카프카 학회, 2001)
박은주, “<소송>에 나타난 권력과 법정세계”, <카프카 연구 제6집> (한국 카프카 학회, 1998)
http://kafka.german.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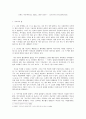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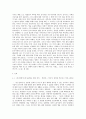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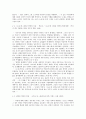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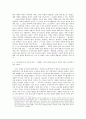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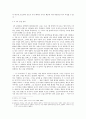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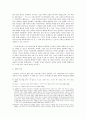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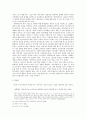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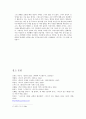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