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은 ‘선영이를’의 진목적어를 한정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가목적어가 됨을 알 수 있다. 즉, 일종의 수식 기능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본다면, 국어에 있어서 피동문은 기본적으로 피동사들-<되다, 받다, 당하다 등>-에 의해서 성립이 되거나, 피동 접미사인 <-이-, -히-, -리-, -기->에 의해서 파생적으로 성립이 되거나, <-어 지다>, <-게 되다>등이 이용되어 통사적으로 성립이 된다. 그리고 피동문에 있어서 그 문장이 피동성을 나타나게 해주는 피동사들은 자동사의 역할을 하여 주므로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앞서 확인해 보았듯이 국어의 피동문에는 목적어를 수반하는 피동문이 존재한다. 이른바 목적격 피동 구문인 것이다. 이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연구들 해왔지만 그 연구들이 통일성을 나타내고 있지는 못하다. 우선 문제시되는 것이 목적어를 지니고 있는 피동문이 진짜 피동문이냐 하는 것인데, 이는 피동 구문의 성립 조건을 살펴보아 그 진위를 확인해 보았고, 목적어를 지니고 있는 피동문에서 ‘을/를’이 붙어 있는 단어가 목적어이며, 격조사의 기능만 하느냐에도 답을 해 보았다. 물론 목적격 조사 ‘을/를’이 붙어 있는 것이 목적어의 기능만 하지 않고 피동문에서는 제약이나, 한정성 등을 나타낸다고 보았다면, 목적격 피동 구문이라는 말도 성립될 수 없지만 특별히 다른 말로 표현하기가 애매하여 목적격 피동 구문이라는 명칭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격 피동구문은 아무 상황에서나 표현되는 것이 아니다. 문장에 있어서 문법적인 주어와 피동형의 제약을 받는 목적어 사이에 있어서의 분리성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목적격 피동 구문이 성립한다. 또한 문법적인 주어에서 그 주어의 특징이 유정하냐 무정하냐도 큰 역할을 한다. 목적어가 있는 피동문의 대당능동문에서의 2중 목적어 중 진목적어와 가목적어가 있으며, 이 가목적어는 진목적어를 제약하거나 한정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목적격 피동구문에서 유정명사가 문법적인 주어가 되고 이 주어는 목적어(피동과의 대당능동문에 있어서는 가목적어)어와 한정이나 제약의 관계를 나타내고 이것은 주어와 목적어의 불가분리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국어에서 목적어를 수반하는 피동문은 특이한 구조이지만, 여러 상황과 적합하다면 그 문장은 문법적으로 큰 문제없이 성립되는 하나의 구문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
참고 문헌
권재일, 한국어 통사론, 民音社, 1992
김기혁, 국어문법 연구, 박이정 출판사, 1995
남기심, 현대 국어 통사론, 태학사, 2001
류구상, 한국어의 목적어, 月印, 2001
서정수, 국어 문법, 뿌리 깊은 나무, 1994
서정수, 현대 국어 문법론, 한양대학교 출판부, 1996
이익섭, 임홍빈, 국어문법론, 學硏社, 1988
이주행, 한국어 문법의 이해, 月印, 2000
임홍빈, 국어 문법의 심층 3, 태학사, 1998
우인혜, 우리말 피동 연구, 한국문화사, 1997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본다면, 국어에 있어서 피동문은 기본적으로 피동사들-<되다, 받다, 당하다 등>-에 의해서 성립이 되거나, 피동 접미사인 <-이-, -히-, -리-, -기->에 의해서 파생적으로 성립이 되거나, <-어 지다>, <-게 되다>등이 이용되어 통사적으로 성립이 된다. 그리고 피동문에 있어서 그 문장이 피동성을 나타나게 해주는 피동사들은 자동사의 역할을 하여 주므로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앞서 확인해 보았듯이 국어의 피동문에는 목적어를 수반하는 피동문이 존재한다. 이른바 목적격 피동 구문인 것이다. 이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연구들 해왔지만 그 연구들이 통일성을 나타내고 있지는 못하다. 우선 문제시되는 것이 목적어를 지니고 있는 피동문이 진짜 피동문이냐 하는 것인데, 이는 피동 구문의 성립 조건을 살펴보아 그 진위를 확인해 보았고, 목적어를 지니고 있는 피동문에서 ‘을/를’이 붙어 있는 단어가 목적어이며, 격조사의 기능만 하느냐에도 답을 해 보았다. 물론 목적격 조사 ‘을/를’이 붙어 있는 것이 목적어의 기능만 하지 않고 피동문에서는 제약이나, 한정성 등을 나타낸다고 보았다면, 목적격 피동 구문이라는 말도 성립될 수 없지만 특별히 다른 말로 표현하기가 애매하여 목적격 피동 구문이라는 명칭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격 피동구문은 아무 상황에서나 표현되는 것이 아니다. 문장에 있어서 문법적인 주어와 피동형의 제약을 받는 목적어 사이에 있어서의 분리성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목적격 피동 구문이 성립한다. 또한 문법적인 주어에서 그 주어의 특징이 유정하냐 무정하냐도 큰 역할을 한다. 목적어가 있는 피동문의 대당능동문에서의 2중 목적어 중 진목적어와 가목적어가 있으며, 이 가목적어는 진목적어를 제약하거나 한정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목적격 피동구문에서 유정명사가 문법적인 주어가 되고 이 주어는 목적어(피동과의 대당능동문에 있어서는 가목적어)어와 한정이나 제약의 관계를 나타내고 이것은 주어와 목적어의 불가분리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국어에서 목적어를 수반하는 피동문은 특이한 구조이지만, 여러 상황과 적합하다면 그 문장은 문법적으로 큰 문제없이 성립되는 하나의 구문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
참고 문헌
권재일, 한국어 통사론, 民音社, 1992
김기혁, 국어문법 연구, 박이정 출판사, 1995
남기심, 현대 국어 통사론, 태학사, 2001
류구상, 한국어의 목적어, 月印, 2001
서정수, 국어 문법, 뿌리 깊은 나무, 1994
서정수, 현대 국어 문법론, 한양대학교 출판부, 1996
이익섭, 임홍빈, 국어문법론, 學硏社, 1988
이주행, 한국어 문법의 이해, 月印, 2000
임홍빈, 국어 문법의 심층 3, 태학사, 1998
우인혜, 우리말 피동 연구, 한국문화사,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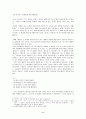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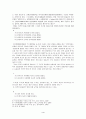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