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와 평면 일원화되는 색채의 물질감이 사라지는 우리의 선험적인 조형의식으로 환원되며, 따라서 모노크롬 회화의 표면작업은 서구의 평면작업과 접점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 같은 서구적 구조 개념인 평면성과 한국적 정서인 흰색이 접합된 한국 모노크롬 회화는 단순한 서양식 그림이기 이전에, 단색 표현의 전형을 이루어내고 고도의 정신세계를 암시하여 백색 양식에까지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 모노크롬 회화는 동양의 유서 깊은 의식체계 위에서 가능할 수 있었다. 서구인에게는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측면들, 즉 바탕, 형상의 관계를 굳이 구분 짓지 않아도 되었던 것은 주체로서의 형상을 없애고, 그것을 세계로서의 바탕에 귀속시키거나 모든 색을 포함할 수 있는 단색 중심의 색깔을 선호했던 것이다.
이러한 단색에 대한 선호가 1970년대 한국 모노크롬 회화의 중요한 특징이 되었고, 한국 모노크롬이 한 시대의 조형이념을 뛰어넘어 보편적 정서체계를 이루었음이 오늘날 인정받고 있다.
Ⅲ. 결론
모노크롬(monochrome)은 한마디로 정신성으로 물들여진 일종의 세계로서, 한국 모노크롬은 우리의 자연관과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며, 모노크롬 속에 담겨진 자연은 어떤 객관적인 대상세계가 아니라, 인간의 정신과 함께 생성하는 보다 원천적인 의미의 자연이다.
즉, 모노크롬 회화는 그와 같은 자연관에 상응하는 예술형태로, 작가의 인격과 사상이 기교에 구애됨이 없이 자연관을 대상으로 표현된 정신성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모노크롬 회화에서의 자연에 순응하는 무위(無爲)자연사상은 한국적인 정체성을 지닌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대표적 미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주의의 개념에 따라 한국인들은 청색과 흰색에 강한 선호를 보인다.
이런 전통적인 자연관이 작용한 결과로 동양화의 공간 감각이 단색화 화면에 드러났으며, 이것은 우리의 보편적 정서체계인 범자연주의적인 전통에의 회귀가 거의 집단 무의식적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한국 모노크롬 회화가 현대회화의 대세를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교묘히 전통 정신과 접목된 모델을 창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1970년대 모노크롬 회화는 단절의 역사를 겪어온 한국 현대미술에서 그 단절의 극복을 보여주는 것이며, 고유한 미적 유형을 한국 현대미술에 정착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1970년대 모노크롬 회화는 모더니즘(modernism) 회화에 동양 정신과 한국적 가치를 부여하여 국제적 효력과 한국적 정체성을 동시에 보유한 이상적인 한국적 현대미술로 부각되었다.
참고문헌
김미숙. 추상충동과 점·선의 조형성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오광수. 한국 현대미술 비평사. 미진사. 1998.
이우환. 회화에 있어서 추상성의 문제. 월간미술. 1996.
이일. 현대미술에서의 환원과 확산. 열화당. 1991.
한국현대미술사연구회. 한국 현대미술 197080. 학연문화사. 2005.
황재선. 한국 모노크롬회화에 관한 연구: 한국의 미를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2 0 0 6
이 같은 서구적 구조 개념인 평면성과 한국적 정서인 흰색이 접합된 한국 모노크롬 회화는 단순한 서양식 그림이기 이전에, 단색 표현의 전형을 이루어내고 고도의 정신세계를 암시하여 백색 양식에까지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 모노크롬 회화는 동양의 유서 깊은 의식체계 위에서 가능할 수 있었다. 서구인에게는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측면들, 즉 바탕, 형상의 관계를 굳이 구분 짓지 않아도 되었던 것은 주체로서의 형상을 없애고, 그것을 세계로서의 바탕에 귀속시키거나 모든 색을 포함할 수 있는 단색 중심의 색깔을 선호했던 것이다.
이러한 단색에 대한 선호가 1970년대 한국 모노크롬 회화의 중요한 특징이 되었고, 한국 모노크롬이 한 시대의 조형이념을 뛰어넘어 보편적 정서체계를 이루었음이 오늘날 인정받고 있다.
Ⅲ. 결론
모노크롬(monochrome)은 한마디로 정신성으로 물들여진 일종의 세계로서, 한국 모노크롬은 우리의 자연관과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며, 모노크롬 속에 담겨진 자연은 어떤 객관적인 대상세계가 아니라, 인간의 정신과 함께 생성하는 보다 원천적인 의미의 자연이다.
즉, 모노크롬 회화는 그와 같은 자연관에 상응하는 예술형태로, 작가의 인격과 사상이 기교에 구애됨이 없이 자연관을 대상으로 표현된 정신성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모노크롬 회화에서의 자연에 순응하는 무위(無爲)자연사상은 한국적인 정체성을 지닌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대표적 미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주의의 개념에 따라 한국인들은 청색과 흰색에 강한 선호를 보인다.
이런 전통적인 자연관이 작용한 결과로 동양화의 공간 감각이 단색화 화면에 드러났으며, 이것은 우리의 보편적 정서체계인 범자연주의적인 전통에의 회귀가 거의 집단 무의식적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한국 모노크롬 회화가 현대회화의 대세를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교묘히 전통 정신과 접목된 모델을 창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1970년대 모노크롬 회화는 단절의 역사를 겪어온 한국 현대미술에서 그 단절의 극복을 보여주는 것이며, 고유한 미적 유형을 한국 현대미술에 정착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1970년대 모노크롬 회화는 모더니즘(modernism) 회화에 동양 정신과 한국적 가치를 부여하여 국제적 효력과 한국적 정체성을 동시에 보유한 이상적인 한국적 현대미술로 부각되었다.
참고문헌
김미숙. 추상충동과 점·선의 조형성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오광수. 한국 현대미술 비평사. 미진사. 1998.
이우환. 회화에 있어서 추상성의 문제. 월간미술. 1996.
이일. 현대미술에서의 환원과 확산. 열화당. 1991.
한국현대미술사연구회. 한국 현대미술 197080. 학연문화사. 2005.
황재선. 한국 모노크롬회화에 관한 연구: 한국의 미를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2 0 0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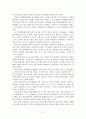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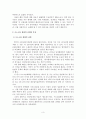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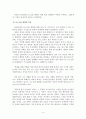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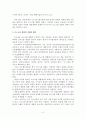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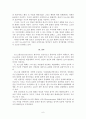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