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없음
본문내용
2. 5. 관용어 및 속담
이 장에서는 작품에 쓰인 관용어와 속담을 모아 정리했다. 여기서는 한자성어도 넓게 보아 관용어에 포함시켰다.
우물 공사
‘우물 공사’는 “공동 우물 같은 곳에서 물을 긷거나 빨래 따위를 하면서 잡담을 즐기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여자들은 다시 우물공사격으로 게걸거리며, 길바닥에 깔 자갈만 판다.” <옥심이, 41>
침 먹은 지네
할 말이 있어도 못하고 있거나 겁이 나서 기를 펴지 못하고 꼼짝 못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옥심이는 여전히 침 먹은 지네처럼 말문이 열리지 않았다.” <옥심이, 50>
뿔 빠진 쇠상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뿔 뺀 쇠 상이라”라는 속담이 있다. 이 말은 “뿔을 빼 버린 소의 모양이라는 뜻으로, 지위는 있어도 세력을 잃은 처지”를 이르는 말이다.
“그것을 본 천수는 그 팔팔하던 기가 금식에 탁 꺾이고 그만 뿔 빠진 쇠상이 되어서, 원망스러운 듯이 아버지를 잠깐 쳐다볼 뿐, 다시는 두 말도 못하고 그곳을 물러나갔다.” <옥심이, 64>
이 상황은 ‘안십장’을 따라 집을 나갔던 ‘옥심이’가 아들 ‘수복이’ 때문에 돌아오자, ‘천수’가 ‘옥심이’를 구타하던 장면이다. 이때 시아버지가 집으로 와서 ‘천수’에게 ‘소록도’에 가는 것이 그렇게 무서우냐고 소리친다. 이 말을 들은 ‘천수’의 모습을 서술자가 묘사한 것이다. 따라서 ‘뿔 빠진 쇠 상’이라는 표현이 맞다. ‘남편’이라는 지위는 있지만 세력이 없기 때문이다.
삼순구식(三旬九食)
‘삼순구식’은 몹시 가난하여 “삼십 일 동안 아홉 끼니밖에 먹지 못한다는 뜻”이다.
“도리어 삼순구식의 잔인한 운명이 그들을 향하여 아가리를 벌렸을 뿐이다.” <옥심이, 61>
2. 6. 그 밖의 말들
이 장에서는 사전에 등재되지 않는 단어나 관용어, 속담 등을 정리하고 나름대로 뜻풀이를 해 보았다.
검노르다
“그러나 빛깔은 무섭게도 검노르게 시들어졌다.” <옥심이, 53>
아마도 ‘검다’와 ‘노르다’의 비통적 합성어인 것 같은데, 사전에는 없는 말이다.
귀천없다
봄은 고양이처럼 옥심의 귀천없는 마음속에도 기어들었다. <옥심이, 40>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단어 중에는 ‘귀천없다’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없다.
등달아
“시어머니도 기가 펄펄하게 등달아 야단이다.”<옥심이, 59>
아마도 이 부분은 “실속도 모르고 남이 하는 대로 좇아서 하다”라는 ‘덩달아’의 오자(誤字) 또는 오식(誤植)으로 보인다.
맨털털이
“옥심이도 잘 알 듯이 난 원래 배운 데 없는 만무방이고, 이놈의 팔뚝밖에는 아무 것도 가진 것 없는 맨털털이지만, 남을 속이거나 해치는 허릅숭이는 아니요.” <옥심이, 50>
‘맨털털이’ 또는 ‘맨털털’은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말이다. 다만, 사전에는 “털털이”는 “성격이나 하는 짓 따위가 까다롭지 아니하고 소탈한 사람”, 또는 “몹시 낡고 헐어서 털털거리는 소리를 내는 수레, 자동차 따위를 이르는 말”로 풀이해 놓고 있다. 하지만 이 문맥에서는 이 두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이라는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것을 보아도 ‘털털이’와 관련이 없다. 한편, 관형사 ‘맨’은 “더 할 수 없을 정도나 경지에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고, 부사 ‘맨’은 “다른 것은 섞이지 아니하고 온통”이라는 뜻이다. 또한 ‘맨-’은 ‘다른 것이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기도 하다. 문맥을 고려할 때는 관형사 ‘맨’의 의미이다. 따라서 ‘가장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정도의 의미이다.
봄사리
“황토물 든 옥양목 봄사리의 잔등이 땀기름에 흠뻑 젖고…….” <옥심이, 40>
<표준국어대사전>과 <새우리말큰사전>에는 ‘봄사리’라는 말은 없고, 대신 ‘봄살이’가 등재되어 있다. ‘봄살이’는 “봄철에 먹고 입고 지낼 양식이나 옷가지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이 소설의 시간적 배경이 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마도 ‘봄살이’의 오자(誤字)나 오식(誤植)인 것 같다.
친정곳
‘친정곳’이라는 말도 사전에 등재되지 않았다. 다만 ‘친정’과 ‘곳’이 결합한 말로 보면 ‘친정이 있는 곳’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안십장이란 사람은 친정곳 사람으로서 일찌기 사방공사 품팔이를 다니너니 그만 그 길로 나가서 한산인부가 되어 고향을 등진 발록구니다.” <옥심이, 43>
등짐장수 밥 짓듯
“벌건 대낮에도 사립문을 꼭 닫아 두고서 등짐장수 밥 짓듯 시커먼 뚝배기에 쓴 너삼 뿌리를 달이고 있던 천수는 아내가 그렇게 한낮에 찾아온 것을 의외로 알고, 또 덜 좋아하였다.” <옥심이, 53>
사전에 없는 말이다. ‘등짐장수’는 “물건을 등에 지고 다니며 파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물건을 팔러다니는 사람이 밥을 지을 때는 아마도 대충 짓거나 그 모양이 어색할 것이다. 그래서 대충하거나 어설픈 모양을 뜻하는 표현이라고 추측된다.
자개 속의 게
“나도 어느덧 오년이란 긴 세월을 자개 속의 게 같이 살아오며” <옥심이, 55>
‘자개 속의 게’라는 관용적 표현은 사전에 없다. 사전에는 ‘자개’라는 말이 있는데, ‘자개’는 “금조개 껍데기를 썰어 낸 조각”이다. ‘자개’는 빛깔이 아름다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잘게 썰어 가구를 장식하는 데 쓴다. 따라서 껍데기 속의 ‘게’ 같이 숨어서 살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옥심이’의 남편 ‘천수’가 문둥병에 걸려 병을 고치기 위해 마을에서 떨어진 움막에 살고 있을 때의 이야기이므로 이런 의미가 맞을 것이다.
만고태평
“애면글면 억판을 허덕거리면서도 겉으로는 여전히 만고태평이다.” <옥심이, 61>
‘만고태평’이라는 말은 사전에 등재되지 않았다. ‘만사태평(萬事太平, “모든 일이 잘되어서 탈이 없고 평안함”, “성질이 너그럽거나 어리석어 모든 일에 걱정이 없음”)’ 등이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후욕패설
“시어머니는 이를 아드득아드득 갈아 부치면서, 물 퍼붓듯이 후욕패설을 해 던졌다.” <옥심이, 62>
‘후욕패설’도 사전에 없는 말이다. 그런데 ‘후욕(辱)’은 “꾸짖어서 욕함”이라는 뜻이고, ‘패설’은 “사리에 어긋나게 말함. 또는 그런 말”을 가리킨다. 따라서 ‘사리에 어긋나는 말로 꾸짖어서 욕함’ 정도의 의미로 추측된다.
이 장에서는 작품에 쓰인 관용어와 속담을 모아 정리했다. 여기서는 한자성어도 넓게 보아 관용어에 포함시켰다.
우물 공사
‘우물 공사’는 “공동 우물 같은 곳에서 물을 긷거나 빨래 따위를 하면서 잡담을 즐기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여자들은 다시 우물공사격으로 게걸거리며, 길바닥에 깔 자갈만 판다.” <옥심이, 41>
침 먹은 지네
할 말이 있어도 못하고 있거나 겁이 나서 기를 펴지 못하고 꼼짝 못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옥심이는 여전히 침 먹은 지네처럼 말문이 열리지 않았다.” <옥심이, 50>
뿔 빠진 쇠상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뿔 뺀 쇠 상이라”라는 속담이 있다. 이 말은 “뿔을 빼 버린 소의 모양이라는 뜻으로, 지위는 있어도 세력을 잃은 처지”를 이르는 말이다.
“그것을 본 천수는 그 팔팔하던 기가 금식에 탁 꺾이고 그만 뿔 빠진 쇠상이 되어서, 원망스러운 듯이 아버지를 잠깐 쳐다볼 뿐, 다시는 두 말도 못하고 그곳을 물러나갔다.” <옥심이, 64>
이 상황은 ‘안십장’을 따라 집을 나갔던 ‘옥심이’가 아들 ‘수복이’ 때문에 돌아오자, ‘천수’가 ‘옥심이’를 구타하던 장면이다. 이때 시아버지가 집으로 와서 ‘천수’에게 ‘소록도’에 가는 것이 그렇게 무서우냐고 소리친다. 이 말을 들은 ‘천수’의 모습을 서술자가 묘사한 것이다. 따라서 ‘뿔 빠진 쇠 상’이라는 표현이 맞다. ‘남편’이라는 지위는 있지만 세력이 없기 때문이다.
삼순구식(三旬九食)
‘삼순구식’은 몹시 가난하여 “삼십 일 동안 아홉 끼니밖에 먹지 못한다는 뜻”이다.
“도리어 삼순구식의 잔인한 운명이 그들을 향하여 아가리를 벌렸을 뿐이다.” <옥심이, 61>
2. 6. 그 밖의 말들
이 장에서는 사전에 등재되지 않는 단어나 관용어, 속담 등을 정리하고 나름대로 뜻풀이를 해 보았다.
검노르다
“그러나 빛깔은 무섭게도 검노르게 시들어졌다.” <옥심이, 53>
아마도 ‘검다’와 ‘노르다’의 비통적 합성어인 것 같은데, 사전에는 없는 말이다.
귀천없다
봄은 고양이처럼 옥심의 귀천없는 마음속에도 기어들었다. <옥심이, 40>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단어 중에는 ‘귀천없다’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없다.
등달아
“시어머니도 기가 펄펄하게 등달아 야단이다.”<옥심이, 59>
아마도 이 부분은 “실속도 모르고 남이 하는 대로 좇아서 하다”라는 ‘덩달아’의 오자(誤字) 또는 오식(誤植)으로 보인다.
맨털털이
“옥심이도 잘 알 듯이 난 원래 배운 데 없는 만무방이고, 이놈의 팔뚝밖에는 아무 것도 가진 것 없는 맨털털이지만, 남을 속이거나 해치는 허릅숭이는 아니요.” <옥심이, 50>
‘맨털털이’ 또는 ‘맨털털’은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말이다. 다만, 사전에는 “털털이”는 “성격이나 하는 짓 따위가 까다롭지 아니하고 소탈한 사람”, 또는 “몹시 낡고 헐어서 털털거리는 소리를 내는 수레, 자동차 따위를 이르는 말”로 풀이해 놓고 있다. 하지만 이 문맥에서는 이 두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이라는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것을 보아도 ‘털털이’와 관련이 없다. 한편, 관형사 ‘맨’은 “더 할 수 없을 정도나 경지에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고, 부사 ‘맨’은 “다른 것은 섞이지 아니하고 온통”이라는 뜻이다. 또한 ‘맨-’은 ‘다른 것이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기도 하다. 문맥을 고려할 때는 관형사 ‘맨’의 의미이다. 따라서 ‘가장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정도의 의미이다.
봄사리
“황토물 든 옥양목 봄사리의 잔등이 땀기름에 흠뻑 젖고…….” <옥심이, 40>
<표준국어대사전>과 <새우리말큰사전>에는 ‘봄사리’라는 말은 없고, 대신 ‘봄살이’가 등재되어 있다. ‘봄살이’는 “봄철에 먹고 입고 지낼 양식이나 옷가지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이 소설의 시간적 배경이 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마도 ‘봄살이’의 오자(誤字)나 오식(誤植)인 것 같다.
친정곳
‘친정곳’이라는 말도 사전에 등재되지 않았다. 다만 ‘친정’과 ‘곳’이 결합한 말로 보면 ‘친정이 있는 곳’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안십장이란 사람은 친정곳 사람으로서 일찌기 사방공사 품팔이를 다니너니 그만 그 길로 나가서 한산인부가 되어 고향을 등진 발록구니다.” <옥심이, 43>
등짐장수 밥 짓듯
“벌건 대낮에도 사립문을 꼭 닫아 두고서 등짐장수 밥 짓듯 시커먼 뚝배기에 쓴 너삼 뿌리를 달이고 있던 천수는 아내가 그렇게 한낮에 찾아온 것을 의외로 알고, 또 덜 좋아하였다.” <옥심이, 53>
사전에 없는 말이다. ‘등짐장수’는 “물건을 등에 지고 다니며 파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물건을 팔러다니는 사람이 밥을 지을 때는 아마도 대충 짓거나 그 모양이 어색할 것이다. 그래서 대충하거나 어설픈 모양을 뜻하는 표현이라고 추측된다.
자개 속의 게
“나도 어느덧 오년이란 긴 세월을 자개 속의 게 같이 살아오며” <옥심이, 55>
‘자개 속의 게’라는 관용적 표현은 사전에 없다. 사전에는 ‘자개’라는 말이 있는데, ‘자개’는 “금조개 껍데기를 썰어 낸 조각”이다. ‘자개’는 빛깔이 아름다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잘게 썰어 가구를 장식하는 데 쓴다. 따라서 껍데기 속의 ‘게’ 같이 숨어서 살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옥심이’의 남편 ‘천수’가 문둥병에 걸려 병을 고치기 위해 마을에서 떨어진 움막에 살고 있을 때의 이야기이므로 이런 의미가 맞을 것이다.
만고태평
“애면글면 억판을 허덕거리면서도 겉으로는 여전히 만고태평이다.” <옥심이, 61>
‘만고태평’이라는 말은 사전에 등재되지 않았다. ‘만사태평(萬事太平, “모든 일이 잘되어서 탈이 없고 평안함”, “성질이 너그럽거나 어리석어 모든 일에 걱정이 없음”)’ 등이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후욕패설
“시어머니는 이를 아드득아드득 갈아 부치면서, 물 퍼붓듯이 후욕패설을 해 던졌다.” <옥심이, 62>
‘후욕패설’도 사전에 없는 말이다. 그런데 ‘후욕(辱)’은 “꾸짖어서 욕함”이라는 뜻이고, ‘패설’은 “사리에 어긋나게 말함. 또는 그런 말”을 가리킨다. 따라서 ‘사리에 어긋나는 말로 꾸짖어서 욕함’ 정도의 의미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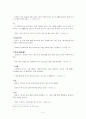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