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정체성의 사회학으로
2. 주체화와 동일시
3. 정체성과 권력
4. 근대적 정체성의 모델
5. 자본주의와 근대적 정체성
6. 횡단의 정치와 유목적 정체성
2. 주체화와 동일시
3. 정체성과 권력
4. 근대적 정체성의 모델
5. 자본주의와 근대적 정체성
6. 횡단의 정치와 유목적 정체성
본문내용
를.
맑스는 이미 정체성을 둘러싼 적대와 투쟁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것은 개념을 달리해 표현하자면, 분명히 자본의 시선과 자본의 욕망에 따른 노동자의 생산을, 집합화된 노동자 계급의 코뮨적인 욕망과 시선으로, 또는 노동자 자신의 ‘이해’에 의한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비록 그는 이를 ‘계급의식’의 개념으로, 그리하여 ‘의식화’와 ‘대자화’의 개념으로 포착할 수밖에 없었지만, 노동자가 ‘노동자 계급’으로 변환되는 것을 사유하려고 했다. 그것은 자본으로서 생산되는(이런 점에서 이는 ‘허위’의식으로 간주되었다) 노동자의 정체성을 변환시키는 문제고, 기존의 정체성에 대한 투쟁과 전복의 문제다. 혁명은 그런 정체성의 변환없이는 불가능하다.
정체성의 변환, 그것은 한편으로는 항상-이미 주어지는 다수화하는 규범이나 자본의 욕망에서 벗어나고 그것을 변환시키는 것이며, 또 다른 한편으론 그것을 실어나르는 시선의 권력을 빗겨나는 것이다. 횡단(橫斷)의 정치와 유목적 정체성은, 또 지각불가능하게-되기(devenir-imperceptible)는 이러한 변환을 사유하고 실천하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다.
가타리가 사용하는 횡단성(transversalite)이란 개념은 이미 구획되어 있는 틀을 뛰어넘는 모든 것을 지칭한다. 이는 자유로운 흐름을 가로막는 수직적 장애와 수평적 장애 모두를 넘어서 소통과 생성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첫째, 그것은 여러 요소들 사이에 흐름을 가로막는, 권력이 장착한 벽을 트거나 새로운 창을 만드는 것이다. 계와 과, 부 등등으로 분할하는 벽; 신경학과 심리학, 정신분석학, 사회학 등등으로 분할하는 벽; 육체노동자와 사무노동자, 금속노동자와 섬유노동자, 용접공과 도장공 등등으로 분할하는 벽을 넘어서는 횡단적 접속. 둘째, 그것은 여러 요소 사이에 존재하는 위계를 돌파하고 뛰어넘는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그것은 의사와 환자, 간호사와 환자 사이에 만들어진 위계를 부수는 것이다.
횡단의 정치는, 흐름을 정해진 지대 안에 고정하는 정체성의 벽을 넘어서 새로운 지대로 생산적 힘과 활동, 사유가 흘러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상하좌우로 그어진 정체성의 경계선을 가로지르고 넘나드는 것이며, 그 경계선 자체를 가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체성을 정의하는 규범과 규칙의 획일적인 선을 변이시키거나 복수화하는 것이고, 경계들을 가변화하거나 교착 내지 중첩시키는 것이다. 이로써 정체성에 영토화(territorialisation)된 사고와 행동을 탈영토화한다.
따라서 정체성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횡단의 정치는 그 횡단성 계수에 따라 정체성 자체의 고정성을 가변화시킨다. 이는 새로운 정체성이 생성되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가변화되기에 고정시키지 않는 유목적 정체성을 형성한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고정된 자리에 대한 머무는 동일성이 아니란 점에서, 반대로 변이를 통해 끊임없이 유동화되는 새로운 장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이미 정체성/동일성이 아니라 끊임없는 생성/되기(devenir)다. 여기서 정체성의 권력, 정체성의 정치는 ‘생성의 정치’로 대체된다.
횡단의 정치와 유목적 정체성은 단지 기존의 고정하는 권력에 대한 속임수가 아니라, 다시 말해 기존의 ‘오인’을 대신하는 또 다른 오인이 아니라 차라리 그로부터 얼굴을 돌리는 것(detournement)이고, ‘배신’(trahison)이다. 그것은 단순히 주어진 자리들을 옮겨 다니는 것이나 주어진 자리들의 상이한 조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들을 구획하는 경계선의 변환이요, 겹침과 뒤섞임이며, 그것을 통해 기존의 경계조차 중의화(重意化)하는 변이다.
그것은 구획된 선을 넘는 흐름 간의 접속에 의해, 그리고 그것의 미시적 전염에 의해 이루어진다. 또한 말벌의 오르키데-되기(devenir-orchidee)와 오르키데의 말벌-되기가 그렇듯이, 다른 것이 ‘되기’는 일정한 블록과 집단을 전제한다. 예를 들어 노동자의 자주-관리는 자본(정확히는 생산수단)과 노동이라는 블록을 전제하며, 생산단위와 연관된 특정한 형태의 집단을 통해 이루어지며, 여기서 노동자의 자기-관리를 통한 자본의 ‘노동’-되기와 노동자의 ‘자본’-되기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여기서 노동과 자본이라는 말은 이전의 그것과 경계를 달리한다.왜냐하면 이제 노동은 더 이상 상품을 통해, 양화된 가치를 통해 정의되지 않기 때문이고, 자본은 더 이상 가치화와 착취를 통해 정의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중첩과 뒤섞임이 그 의미를 중의화하고 변환시킨 것이다. 따라서 예전의 관념으로는 그것은 인지불가능한 것(l\'imperceptible)이 된다. 인지불가능하게-되기. 자신의 시선이 대신하던 감시의 시선, 자본의 시선은 여기서 무력화된다. 왜냐하면 그 시선이 그것을 따라 작용하던 기준선들이 중첩되고 뒤섞였으며 중의화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더 이상 초점이 맞지 않게 되어 버렸고, 감시하고 추적할 대상을 놓쳐 버린 것이다. 자신의 시선조차 그것을 추적할 수 없다. 이를 새로이 감시하기 위해선 시선은 새로운 초점을 찾아야 하고 새로운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 혹은 기존의 선들로 그 새로운 대상을 다시 분절하여 기존의 격자 안에 다시 위치지우려 할 것이다. 그러나 횡단과 유목이 멈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다시 초점을 잃을 것이다. 그리고 또...
근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체성은 한편으로는 자본의 시선, 자본의 권력을 대신하는 노동자 자신의 권력과 정치를 통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횡단의 정치와 유목적 정체성을 통해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의 지배를 대체하는, 동시에 자본에 의해 부여된 정체성을 넘어서는 새로운 집합적 주체성의 생산, 그것은 생산수단과의 직접적 결합 위에서, 혹은 그러한 조건이 부재한 상태에서 그것을 지향하는 생산자들 자신의 집합적 접속을 통한 새로운 노동자-되기를 뜻할 것이다. 동시에 그것은 정체성의 변이가 만드는 멈추지 않는 무한의 프랙탈한 선들이 그리는 코뮨적인 일관성의 구도(plan de consistance)요 내재성의 장(champs de immanence)이다. 그것을 맑스는 ‘자유로운 개인들의 자발적 연합’이라고 부른 바 있다.
맑스는 이미 정체성을 둘러싼 적대와 투쟁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것은 개념을 달리해 표현하자면, 분명히 자본의 시선과 자본의 욕망에 따른 노동자의 생산을, 집합화된 노동자 계급의 코뮨적인 욕망과 시선으로, 또는 노동자 자신의 ‘이해’에 의한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비록 그는 이를 ‘계급의식’의 개념으로, 그리하여 ‘의식화’와 ‘대자화’의 개념으로 포착할 수밖에 없었지만, 노동자가 ‘노동자 계급’으로 변환되는 것을 사유하려고 했다. 그것은 자본으로서 생산되는(이런 점에서 이는 ‘허위’의식으로 간주되었다) 노동자의 정체성을 변환시키는 문제고, 기존의 정체성에 대한 투쟁과 전복의 문제다. 혁명은 그런 정체성의 변환없이는 불가능하다.
정체성의 변환, 그것은 한편으로는 항상-이미 주어지는 다수화하는 규범이나 자본의 욕망에서 벗어나고 그것을 변환시키는 것이며, 또 다른 한편으론 그것을 실어나르는 시선의 권력을 빗겨나는 것이다. 횡단(橫斷)의 정치와 유목적 정체성은, 또 지각불가능하게-되기(devenir-imperceptible)는 이러한 변환을 사유하고 실천하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다.
가타리가 사용하는 횡단성(transversalite)이란 개념은 이미 구획되어 있는 틀을 뛰어넘는 모든 것을 지칭한다. 이는 자유로운 흐름을 가로막는 수직적 장애와 수평적 장애 모두를 넘어서 소통과 생성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첫째, 그것은 여러 요소들 사이에 흐름을 가로막는, 권력이 장착한 벽을 트거나 새로운 창을 만드는 것이다. 계와 과, 부 등등으로 분할하는 벽; 신경학과 심리학, 정신분석학, 사회학 등등으로 분할하는 벽; 육체노동자와 사무노동자, 금속노동자와 섬유노동자, 용접공과 도장공 등등으로 분할하는 벽을 넘어서는 횡단적 접속. 둘째, 그것은 여러 요소 사이에 존재하는 위계를 돌파하고 뛰어넘는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그것은 의사와 환자, 간호사와 환자 사이에 만들어진 위계를 부수는 것이다.
횡단의 정치는, 흐름을 정해진 지대 안에 고정하는 정체성의 벽을 넘어서 새로운 지대로 생산적 힘과 활동, 사유가 흘러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상하좌우로 그어진 정체성의 경계선을 가로지르고 넘나드는 것이며, 그 경계선 자체를 가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체성을 정의하는 규범과 규칙의 획일적인 선을 변이시키거나 복수화하는 것이고, 경계들을 가변화하거나 교착 내지 중첩시키는 것이다. 이로써 정체성에 영토화(territorialisation)된 사고와 행동을 탈영토화한다.
따라서 정체성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횡단의 정치는 그 횡단성 계수에 따라 정체성 자체의 고정성을 가변화시킨다. 이는 새로운 정체성이 생성되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가변화되기에 고정시키지 않는 유목적 정체성을 형성한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고정된 자리에 대한 머무는 동일성이 아니란 점에서, 반대로 변이를 통해 끊임없이 유동화되는 새로운 장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이미 정체성/동일성이 아니라 끊임없는 생성/되기(devenir)다. 여기서 정체성의 권력, 정체성의 정치는 ‘생성의 정치’로 대체된다.
횡단의 정치와 유목적 정체성은 단지 기존의 고정하는 권력에 대한 속임수가 아니라, 다시 말해 기존의 ‘오인’을 대신하는 또 다른 오인이 아니라 차라리 그로부터 얼굴을 돌리는 것(detournement)이고, ‘배신’(trahison)이다. 그것은 단순히 주어진 자리들을 옮겨 다니는 것이나 주어진 자리들의 상이한 조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들을 구획하는 경계선의 변환이요, 겹침과 뒤섞임이며, 그것을 통해 기존의 경계조차 중의화(重意化)하는 변이다.
그것은 구획된 선을 넘는 흐름 간의 접속에 의해, 그리고 그것의 미시적 전염에 의해 이루어진다. 또한 말벌의 오르키데-되기(devenir-orchidee)와 오르키데의 말벌-되기가 그렇듯이, 다른 것이 ‘되기’는 일정한 블록과 집단을 전제한다. 예를 들어 노동자의 자주-관리는 자본(정확히는 생산수단)과 노동이라는 블록을 전제하며, 생산단위와 연관된 특정한 형태의 집단을 통해 이루어지며, 여기서 노동자의 자기-관리를 통한 자본의 ‘노동’-되기와 노동자의 ‘자본’-되기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여기서 노동과 자본이라는 말은 이전의 그것과 경계를 달리한다.왜냐하면 이제 노동은 더 이상 상품을 통해, 양화된 가치를 통해 정의되지 않기 때문이고, 자본은 더 이상 가치화와 착취를 통해 정의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중첩과 뒤섞임이 그 의미를 중의화하고 변환시킨 것이다. 따라서 예전의 관념으로는 그것은 인지불가능한 것(l\'imperceptible)이 된다. 인지불가능하게-되기. 자신의 시선이 대신하던 감시의 시선, 자본의 시선은 여기서 무력화된다. 왜냐하면 그 시선이 그것을 따라 작용하던 기준선들이 중첩되고 뒤섞였으며 중의화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더 이상 초점이 맞지 않게 되어 버렸고, 감시하고 추적할 대상을 놓쳐 버린 것이다. 자신의 시선조차 그것을 추적할 수 없다. 이를 새로이 감시하기 위해선 시선은 새로운 초점을 찾아야 하고 새로운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 혹은 기존의 선들로 그 새로운 대상을 다시 분절하여 기존의 격자 안에 다시 위치지우려 할 것이다. 그러나 횡단과 유목이 멈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다시 초점을 잃을 것이다. 그리고 또...
근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체성은 한편으로는 자본의 시선, 자본의 권력을 대신하는 노동자 자신의 권력과 정치를 통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횡단의 정치와 유목적 정체성을 통해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의 지배를 대체하는, 동시에 자본에 의해 부여된 정체성을 넘어서는 새로운 집합적 주체성의 생산, 그것은 생산수단과의 직접적 결합 위에서, 혹은 그러한 조건이 부재한 상태에서 그것을 지향하는 생산자들 자신의 집합적 접속을 통한 새로운 노동자-되기를 뜻할 것이다. 동시에 그것은 정체성의 변이가 만드는 멈추지 않는 무한의 프랙탈한 선들이 그리는 코뮨적인 일관성의 구도(plan de consistance)요 내재성의 장(champs de immanence)이다. 그것을 맑스는 ‘자유로운 개인들의 자발적 연합’이라고 부른 바 있다.
추천자료
 [문화 사회학] 팬덤문화- 국내 대중가수팬들을 중심으로-
[문화 사회학] 팬덤문화- 국내 대중가수팬들을 중심으로- [교육학]신교육사회학
[교육학]신교육사회학 일상 생활의 사회학- 게오르그 짐멜의 ‘여성문화와 남성문화’를 통해
일상 생활의 사회학- 게오르그 짐멜의 ‘여성문화와 남성문화’를 통해 마약범죄의 폐해사례와 사회학적 이론 고찰
마약범죄의 폐해사례와 사회학적 이론 고찰 전통적 지식관과 교육내용관 신 교육사회학
전통적 지식관과 교육내용관 신 교육사회학 스포츠 사회학의 정의 및 특징과 개념, 연구이론, 이론과연구 대상, 연구방법, 사회학과의 관...
스포츠 사회학의 정의 및 특징과 개념, 연구이론, 이론과연구 대상, 연구방법, 사회학과의 관... 스포츠 사회학의 연구와 이론의 중요성
스포츠 사회학의 연구와 이론의 중요성 여가생활 (사회학적 이론에 입각한 여가생활의 의미, 계층·계급 간 차이에 따른 여가생활, 현황)
여가생활 (사회학적 이론에 입각한 여가생활의 의미, 계층·계급 간 차이에 따른 여가생활, 현황) 현대 사회학 이론(구조기능주의, 갈등론, 교환이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중 자신이 볼 때 가...
현대 사회학 이론(구조기능주의, 갈등론, 교환이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중 자신이 볼 때 가... 스포츠와 사회계층 - 스포츠사회학 (사회계층, 스포츠 참여와 사회계층의 관계, 스포츠 사회...
스포츠와 사회계층 - 스포츠사회학 (사회계층, 스포츠 참여와 사회계층의 관계, 스포츠 사회... 03. 스포츠 사회학 {사회이론 및 과정과 스포츠, 사회제도와 스포츠, 사회문제와 스포츠} [임...
03. 스포츠 사회학 {사회이론 및 과정과 스포츠, 사회제도와 스포츠, 사회문제와 스포츠} [임... 독후감 - 예술사회학 ( 순수예술에서 대중예술까지 )
독후감 - 예술사회학 ( 순수예술에서 대중예술까지 ) 근대사회의 등장과 사회학의 발전의 상관 관계
근대사회의 등장과 사회학의 발전의 상관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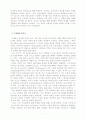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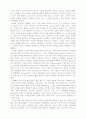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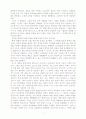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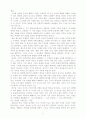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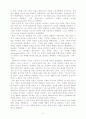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