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문학 속에서의 신화
2. 이청준 <신화를 삼킨 섬>의 줄거리
3. <신화를 삼킨 섬>의 신화적 요소
4. 윤흥길 <장마>의 줄거리
5. <장마>의 신화적 요소
6. 결론
2. 이청준 <신화를 삼킨 섬>의 줄거리
3. <신화를 삼킨 섬>의 신화적 요소
4. 윤흥길 <장마>의 줄거리
5. <장마>의 신화적 요소
6. 결론
본문내용
상상과 이성을 살맛나게 버무린다. 그리고 신화의 상상력은 무의식의 이미지와 의식적 논리의 언어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메워준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무당 신앙을 통해 제주도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는 내용은 문학이 아니고서야 실현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샤머니즘이 겹합된 상징물은 구렁이를 달래는 모습도 우리에겐 낯설지가 않다. 그만큼 우리 삶에서 신화는 이미 개개인의 상상력과 손을 잡고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다. 인문학자 도정일은 “모순을 공존케 하는 상상력, 그게 바로 신화”라고 규정하였다. 그는 언뜻 모순되어 보이는 이성과 상상력이 공존할 수 있는 ‘두터운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고 말한다. 우리 모두는 이미 신화를 받아들였다. 이제는 받아들인 신화의 상상력을 어떻게 발휘하느냐가 중요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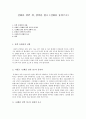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