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서론: 훈민정음에 관한 몇 가지 논란에 관하여
본론
1, 훈민정음 창제의 과정
2, 창제 원리
3, 한글 창제, 의외의 보조자들
4, 세종이 창제 발표를 꺼린 까닭
5, 평가
결론
참고문헌
서론: 훈민정음에 관한 몇 가지 논란에 관하여
본론
1, 훈민정음 창제의 과정
2, 창제 원리
3, 한글 창제, 의외의 보조자들
4, 세종이 창제 발표를 꺼린 까닭
5, 평가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희안(姜希顔·1417~1456), 이개(李塏·1417~1475), 이현로(李賢老·? ~1453) 등 여덟 사람이 임금의 명령을 받아 공동으로 자세한 해설 곧 글자 만들기, 초성과 중성 및 종성의 풀이, 모아쓰기, 실제의 본보기를 설명하고 꼬리말을 붙였다.
이 밖에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들기 위해 특별히 무슨 책을 읽으며 연구나 조사를 했는지는 전혀 밝혀져 있지 않다. 신숙주와 성삼문이 중국의 요동으로 중국인 학자 황찬(黃瓚)을 몇 차례 찾아가 음운학을 배워 왔다는 사실은 1445년의 일인 만큼 1443년에 완성된 훈민정음 창제와는 무관하다.
당대의 한자음을 표준화하기 위해 1448년에 펴낸 ‘동국정운(東國正韻)’과 세종이 떠난 지 5년이 되는 1455년에 펴낸 ‘ 홍무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을 짓는 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얻으려고 찾아간 것이다. 세종은 아들 문종(文宗)도 거들게 했고 딸 정의(貞懿) 공주도 관여하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세종대왕이 반포한 훈민정음의 서문.
세종은 임금이 된 지 4년이 되는 1422년에 활자의 글씨를 개량하도록 직접 나서서 지휘했다. 물론 한자의 글씨를 다루었겠으나 글자에 대한 세종의 관심이 각별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다. 훈민정음을 반포하고 나서 바로 신숙주 등을 시켜 ‘동국정운’을 짓게 한 사실로 보아 한자음을 바로잡는 일도 세종의 큰 관심사였음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한자나 중국어의 운학을 세종 스스로 깊이 연구한 것이 훈민정음을 만드는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세종은 앞서 음률에 정통한 것처럼 한자 운학을 통해서 음운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당대 한국어의 음운체계를 연구할 수 있는 굉장한 언어학자가 되어 있었다.
세종이 새 글자를 반대하는 신하에게 “너희가 언어학을 얼마나 아느냐?”고 한 것은 결코 허장성세가 아니었다. 이들의 상소문 가운데 몽골, 서하, 여진, 일본, 서번(티베트) 등이 한자와 다른 글자를 쓴다는 언급이 있는 점으로 보아 이웃한 나라나 민족의 여러 언어와 문자에 대한 지식도 참고가 되었을 것이다.
▲ 훈민정음의 글자 뜻과 사용법을 풀이한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의 언어학적인 기초가 되었음직한 한자의 음운은 이분법을 쓰는 데 반해 훈민정음은 삼분법을 쓴다. 수천 또는 수만 개의 한자음을 성모와 운모로 가르는 것이 이분법이다. 보기를 들면 한자사전에서 ‘東’의 소릿값을 ‘都籠切’로 표시하는데, 이것은 ‘都’의 성모 곧 초성(ㄷ)과 ‘籠’의 운모 곧 중성과 종성을 합한 소리()의 두 토막으로 나눈다는 뜻이다.
그리고 새 문자에 대해 자세히 해석을 가하여 여러 사람들을 가르치라는 왕명에 따라 저술한 이 책의 서문에 당시 참여했던 집현전 학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곧 예조판서로서 주관자라 할 수 있는 정인지를 비롯하여 집현전 응교 최항, 부교리 박팽년, 신숙주, 수찬 성삼문, 돈녕부 주부 강희안, 행집현전 부수찬 이개, 이선로 등 8인이다. 신숙주는 이 중의 한 인물인데 훈민정음과 관련하여 유독 이분만을 들추는 점에 대하여 의아하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후술할 내용에서 위정인지의 말대로 세종대왕(1419~1450 재위)은 하늘이 내신 성인으로서 베푸신 정치 업적이 모든 왕보다 뛰어나셨지만2) 어문 정책의 성과에만 한정한다면 한글의 창제와 훈정(1446)의 간행, 당시의 조선 한자음을 중국 운서에 준거하여 규범 음으로 개신한 동국정운(1448: 이하 동운으로 약칭함)의 간행, 중국어 학습을 위해 한글로써 중국의 표준 자음을 표기[諺譯]할 목적으로 편찬에 착수한 홍무정운역훈과 사성통고의 간행 인근 여러 민족어의 학습을 위한 4학(한몽여진왜학)의 장려 등을 들 수 있다. 이 네 가지 사업은 서로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글 창제의 동기와 목적이 우선 어리석은
백성들의 문자 생활을 쉽게 해 주려는 데 있었음을 인정하더라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특히 2), 3)을 해결하기 위해 표음 문자의 필요성이 절실하였던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그리하여 한글은 순수한 우리말 표기, 개정할 조선 한자음의 완전한 표기, 외국 어음의 정확한 표기 등을 동시에 충족시켜 주어야 할 문자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 점은 한글의 창제와 더불어 위 사업들이 동시에 진행되었던 사실에서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한글 또는 조선 글은 1443년 조선 제 4대 임금 세종이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는 이름으로 창제하여 1446년에 반포한 문자로, 한국어를 표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후 한문을 고수하는 사대부들에게는 경시되기도 하였으나, 조선 왕실과 일부 양반층과 서민층을 중심으로 이어지다가 1894년 갑오개혁에서 한국의 공식적인 나라 글자가 되었고, 1910년대에 이르러 한글학자인 주시경이 \'한글\'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갈래는 표음 문자 가운데 음소 문자에 속한다. 한국에서는 한글전용법이 시행되고 있다.
한글’이라는 이름은 주시경(周時經)이 지은 것으로 ‘크다’, ‘바르다’, ‘하나’를 뜻하는 고유어 ‘한’에서 비롯되었다. 그 뜻은 큰 글 가운데 오직 하나뿐인 좋은 글, 온 겨레가 한결같이 써온 글, 글 가운데 바른 글(똑바른 가운데를 한가운데라 하듯이), 모난 데 없이 둥근 글(입 크기에 알맞게 찬 것을 한 입이라 하듯이)이란 여러 뜻을 한데 모은 것이라 하기도 한다.
한글 창제 당시에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훈민정음’이라 하였고, 줄여서 ‘정음(正音)’이라는 이름이었다. 조선 시대에는 지식층으로부터 경시되며, 본래의 이름으로 쓰지 않고 막연히 ‘언문(諺文)’, ‘언서(諺書)’, ‘반절(反切)’로 불리거나, 혹은 ‘암글(여성들이 배우는 글)’, ‘아햇글(어린이들이 배우는 글)’이라고 낮추어 불렀다고 알려져 있다. (단, 암글, 아햇글이라는 표현은 그 출처가 불분명하다.) 1894년 갑오개혁 이후 ‘국서(國書)’, ‘국문(國文)’이라고 불렀고 혹은 ‘조선글’로 부르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한국의 글이라는 보통 이름일 뿐이며, 고유명사로 한글이라는 이름이 널리 쓰이기 전에는 ‘가갸’, ‘정음’ 등으로 불렀다.
처음 한글이라는 이름이 사용된 것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없다. 다만 1913년 3월 23일 주시경이 ‘배달말글
이 밖에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들기 위해 특별히 무슨 책을 읽으며 연구나 조사를 했는지는 전혀 밝혀져 있지 않다. 신숙주와 성삼문이 중국의 요동으로 중국인 학자 황찬(黃瓚)을 몇 차례 찾아가 음운학을 배워 왔다는 사실은 1445년의 일인 만큼 1443년에 완성된 훈민정음 창제와는 무관하다.
당대의 한자음을 표준화하기 위해 1448년에 펴낸 ‘동국정운(東國正韻)’과 세종이 떠난 지 5년이 되는 1455년에 펴낸 ‘ 홍무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을 짓는 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얻으려고 찾아간 것이다. 세종은 아들 문종(文宗)도 거들게 했고 딸 정의(貞懿) 공주도 관여하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세종대왕이 반포한 훈민정음의 서문.
세종은 임금이 된 지 4년이 되는 1422년에 활자의 글씨를 개량하도록 직접 나서서 지휘했다. 물론 한자의 글씨를 다루었겠으나 글자에 대한 세종의 관심이 각별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다. 훈민정음을 반포하고 나서 바로 신숙주 등을 시켜 ‘동국정운’을 짓게 한 사실로 보아 한자음을 바로잡는 일도 세종의 큰 관심사였음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한자나 중국어의 운학을 세종 스스로 깊이 연구한 것이 훈민정음을 만드는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세종은 앞서 음률에 정통한 것처럼 한자 운학을 통해서 음운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당대 한국어의 음운체계를 연구할 수 있는 굉장한 언어학자가 되어 있었다.
세종이 새 글자를 반대하는 신하에게 “너희가 언어학을 얼마나 아느냐?”고 한 것은 결코 허장성세가 아니었다. 이들의 상소문 가운데 몽골, 서하, 여진, 일본, 서번(티베트) 등이 한자와 다른 글자를 쓴다는 언급이 있는 점으로 보아 이웃한 나라나 민족의 여러 언어와 문자에 대한 지식도 참고가 되었을 것이다.
▲ 훈민정음의 글자 뜻과 사용법을 풀이한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의 언어학적인 기초가 되었음직한 한자의 음운은 이분법을 쓰는 데 반해 훈민정음은 삼분법을 쓴다. 수천 또는 수만 개의 한자음을 성모와 운모로 가르는 것이 이분법이다. 보기를 들면 한자사전에서 ‘東’의 소릿값을 ‘都籠切’로 표시하는데, 이것은 ‘都’의 성모 곧 초성(ㄷ)과 ‘籠’의 운모 곧 중성과 종성을 합한 소리()의 두 토막으로 나눈다는 뜻이다.
그리고 새 문자에 대해 자세히 해석을 가하여 여러 사람들을 가르치라는 왕명에 따라 저술한 이 책의 서문에 당시 참여했던 집현전 학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곧 예조판서로서 주관자라 할 수 있는 정인지를 비롯하여 집현전 응교 최항, 부교리 박팽년, 신숙주, 수찬 성삼문, 돈녕부 주부 강희안, 행집현전 부수찬 이개, 이선로 등 8인이다. 신숙주는 이 중의 한 인물인데 훈민정음과 관련하여 유독 이분만을 들추는 점에 대하여 의아하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후술할 내용에서 위정인지의 말대로 세종대왕(1419~1450 재위)은 하늘이 내신 성인으로서 베푸신 정치 업적이 모든 왕보다 뛰어나셨지만2) 어문 정책의 성과에만 한정한다면 한글의 창제와 훈정(1446)의 간행, 당시의 조선 한자음을 중국 운서에 준거하여 규범 음으로 개신한 동국정운(1448: 이하 동운으로 약칭함)의 간행, 중국어 학습을 위해 한글로써 중국의 표준 자음을 표기[諺譯]할 목적으로 편찬에 착수한 홍무정운역훈과 사성통고의 간행 인근 여러 민족어의 학습을 위한 4학(한몽여진왜학)의 장려 등을 들 수 있다. 이 네 가지 사업은 서로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글 창제의 동기와 목적이 우선 어리석은
백성들의 문자 생활을 쉽게 해 주려는 데 있었음을 인정하더라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특히 2), 3)을 해결하기 위해 표음 문자의 필요성이 절실하였던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그리하여 한글은 순수한 우리말 표기, 개정할 조선 한자음의 완전한 표기, 외국 어음의 정확한 표기 등을 동시에 충족시켜 주어야 할 문자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 점은 한글의 창제와 더불어 위 사업들이 동시에 진행되었던 사실에서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한글 또는 조선 글은 1443년 조선 제 4대 임금 세종이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는 이름으로 창제하여 1446년에 반포한 문자로, 한국어를 표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후 한문을 고수하는 사대부들에게는 경시되기도 하였으나, 조선 왕실과 일부 양반층과 서민층을 중심으로 이어지다가 1894년 갑오개혁에서 한국의 공식적인 나라 글자가 되었고, 1910년대에 이르러 한글학자인 주시경이 \'한글\'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갈래는 표음 문자 가운데 음소 문자에 속한다. 한국에서는 한글전용법이 시행되고 있다.
한글’이라는 이름은 주시경(周時經)이 지은 것으로 ‘크다’, ‘바르다’, ‘하나’를 뜻하는 고유어 ‘한’에서 비롯되었다. 그 뜻은 큰 글 가운데 오직 하나뿐인 좋은 글, 온 겨레가 한결같이 써온 글, 글 가운데 바른 글(똑바른 가운데를 한가운데라 하듯이), 모난 데 없이 둥근 글(입 크기에 알맞게 찬 것을 한 입이라 하듯이)이란 여러 뜻을 한데 모은 것이라 하기도 한다.
한글 창제 당시에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훈민정음’이라 하였고, 줄여서 ‘정음(正音)’이라는 이름이었다. 조선 시대에는 지식층으로부터 경시되며, 본래의 이름으로 쓰지 않고 막연히 ‘언문(諺文)’, ‘언서(諺書)’, ‘반절(反切)’로 불리거나, 혹은 ‘암글(여성들이 배우는 글)’, ‘아햇글(어린이들이 배우는 글)’이라고 낮추어 불렀다고 알려져 있다. (단, 암글, 아햇글이라는 표현은 그 출처가 불분명하다.) 1894년 갑오개혁 이후 ‘국서(國書)’, ‘국문(國文)’이라고 불렀고 혹은 ‘조선글’로 부르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한국의 글이라는 보통 이름일 뿐이며, 고유명사로 한글이라는 이름이 널리 쓰이기 전에는 ‘가갸’, ‘정음’ 등으로 불렀다.
처음 한글이라는 이름이 사용된 것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없다. 다만 1913년 3월 23일 주시경이 ‘배달말글
추천자료
 [언어의 이해 D형] 소쉬르 언어연구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시오.
[언어의 이해 D형] 소쉬르 언어연구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시오. [국어국문학과] [언어의 이해 E형] 인간 의사소통의 특징을 간략하게 서술하시오.
[국어국문학과] [언어의 이해 E형] 인간 의사소통의 특징을 간략하게 서술하시오. [국어국문학과] [언어의 이해 A형] 인간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시오.
[국어국문학과] [언어의 이해 A형] 인간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시오. [언어의 이해 E형] 문자의 유형과 특성을 설명하시오.
[언어의 이해 E형] 문자의 유형과 특성을 설명하시오. [언어의 이해 A형] 인간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시오.
[언어의 이해 A형] 인간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시오. 언어의 이해 A형:외적 언어학 또는 인접과학과 언어학의 관계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시오
언어의 이해 A형:외적 언어학 또는 인접과학과 언어학의 관계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시오 언어의 이해 - D형 인간언어의 음성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언어의 이해 - D형 인간언어의 음성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언어의 이해 D형] 언어기호의 특성을 설명하시오.
[언어의 이해 D형] 언어기호의 특성을 설명하시오. [언어의 이해 C형] 언어학이 어떤 학문인지를 설명!!!!
[언어의 이해 C형] 언어학이 어떤 학문인지를 설명!!!! [국어국문학과] [언어의 이해 A형] 인간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국어국문학과] [언어의 이해 A형] 인간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언어의 이해 A형] 인간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언어의 이해 A형] 인간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언어의 이해 B형] 내적 언어학의 분야를 제시하고 각 분야에서 무엇을 어떻게 연구하는지를 ...
[언어의 이해 B형] 내적 언어학의 분야를 제시하고 각 분야에서 무엇을 어떻게 연구하는지를 ... [언어의 이해 C형] 외적 언어학의 분야를 제시하고, 각 분야에서 무엇을 어떻게 연구하는지를...
[언어의 이해 C형] 외적 언어학의 분야를 제시하고, 각 분야에서 무엇을 어떻게 연구하는지를... 언어의 이해 D형 언어기호의 특성을 설명하시오
언어의 이해 D형 언어기호의 특성을 설명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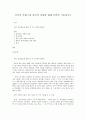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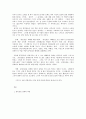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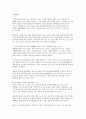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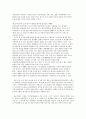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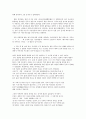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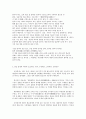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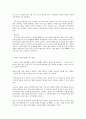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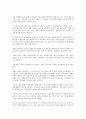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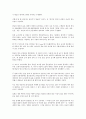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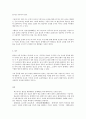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