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마종기 시인 소개
2. 시집『안보이는 사랑의 나라』
3. 작품 분석
⑴「성년의 비밀」
⑵「나비의 꿈」
⑶「증례·6」
4. 참고문헌
2. 시집『안보이는 사랑의 나라』
3. 작품 분석
⑴「성년의 비밀」
⑵「나비의 꿈」
⑶「증례·6」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되기 전까지는 내 같잖은 의사의 눈에서 연민의 작은 꽃 한 번 몽우리지지 않았지.
가슴뼈 속에 대못 같은 바늘을 꽂아 비로소 오래 살지 못하는 병을 진단한 뒤에 나는 네 병실을 겉돌고, 열기오른 뺨으로 네가 손짓할 때 나는 또 다시 망연한 나그네가 되었지. 그리고 어느 날 엉뚱한 내 팔에 안겨 숨질 때, 나는 드디어 귀엽게 살아 있는 너를 보았다. 아, 이제 아프게 몽우리졌다. 내 아픔이 물소리되어 낮에도 밤에도 속삭이는구나.
미워하지 마라 아가야. 이 땅의 한 곳에서 죽고 나면 그만이라는 패기 있는 철학자의 연구를 미워하지 마라. 너는 그이들보다 착하다. 나이 들어 자랄수록 건망증은 늘고, 보이는 것만 보는 눈은 어두워진다. 그이들은 비웃지만 아가야, 너는 죽어서 내게 다시 증명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헤어지지 않는다.
이 시는 사람의 목숨을 관장하는 의사의 삶을 산 시인을 고려하면 이해가 잘 되는 작품이다. 의사로서 환자를 진료하는 중 죽음을 마주쳤을 때 느꼈던 심정, 그 때 느낀 허무함과 죽음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 듯하다. 의학 공부와 의사 체험의 길에 오르면서 얼마나 많은 죽음과 고독들을 마주쳤을까. 의사로서 죽어가는 환자들을 옆에서 지켜보며 허무함에 사로잡히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절망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 체험을 생명에 대한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마지막 연에서는 삶과 죽음에 대해 논하는 철학자들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가까이에서 생과 사를 넘나드는 환경을 지켜보며 그 안에서 느끼는 감정보단 그저 책상에 앉아 펜을 잡고 인생을 논하는 자들의 패기(?)를 아니꼽게 바라보는 듯하다. 그 어떤 말로 너를 증명케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다.
마종기 시인은 위의 시에 인용문을 덧붙였다.
“끝 연에서 이 시는 세상을 다 알고 경험한 척하며 철학자 연연하는 주위 사람들에 대한 불만을 보이고 있다. 도서관에 앉아 책만 들척이며 세상의 진리를 다 알고 있는 듯한 표정으로 글을 쓰고, 세상의 만사를 자기식대로 난도질하는 지식인들이 나는 우습기까지 했다. …. 행동이 없이 관념의 추상 언어로만 지껄이는 문학을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체험을 통한 현장의 은유야말로 살아 있는 시를 만드는 새로운 질료라고 생각했다. 그것만이 진정성을 갖춘 문학이라고 믿었다. …. 골방에만 박혀서 하루하루의 질박한 삶을 외면하는 의식의 조작이 아니고, 땀과 눈물과 피로 만들어내는 것만이 진정한 시의 길이라고 믿었다.”
이 시의 제목 ‘증례’는 ‘어떤 사실의 유무나 진위를 증명하는 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생과 사의 치열함과 의사라는 노동자로서의 고단한 삶 속에서 진정한 예술로서의 문학을 정의내리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4. 참고문헌
손문수, 마종기시연구 - 콤프렉스와 이미지 분석에 의한 존재의지의 탐색을 중심으로, 한성어문학 1권, 한성 대학교 한성어문학회, 1982, 163~178쪽.
정효구, 마종기 시에 나타난 이민자 의식, 인문학지 19권, 충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0, 35~68쪽.
가슴뼈 속에 대못 같은 바늘을 꽂아 비로소 오래 살지 못하는 병을 진단한 뒤에 나는 네 병실을 겉돌고, 열기오른 뺨으로 네가 손짓할 때 나는 또 다시 망연한 나그네가 되었지. 그리고 어느 날 엉뚱한 내 팔에 안겨 숨질 때, 나는 드디어 귀엽게 살아 있는 너를 보았다. 아, 이제 아프게 몽우리졌다. 내 아픔이 물소리되어 낮에도 밤에도 속삭이는구나.
미워하지 마라 아가야. 이 땅의 한 곳에서 죽고 나면 그만이라는 패기 있는 철학자의 연구를 미워하지 마라. 너는 그이들보다 착하다. 나이 들어 자랄수록 건망증은 늘고, 보이는 것만 보는 눈은 어두워진다. 그이들은 비웃지만 아가야, 너는 죽어서 내게 다시 증명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헤어지지 않는다.
이 시는 사람의 목숨을 관장하는 의사의 삶을 산 시인을 고려하면 이해가 잘 되는 작품이다. 의사로서 환자를 진료하는 중 죽음을 마주쳤을 때 느꼈던 심정, 그 때 느낀 허무함과 죽음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 듯하다. 의학 공부와 의사 체험의 길에 오르면서 얼마나 많은 죽음과 고독들을 마주쳤을까. 의사로서 죽어가는 환자들을 옆에서 지켜보며 허무함에 사로잡히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절망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 체험을 생명에 대한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마지막 연에서는 삶과 죽음에 대해 논하는 철학자들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가까이에서 생과 사를 넘나드는 환경을 지켜보며 그 안에서 느끼는 감정보단 그저 책상에 앉아 펜을 잡고 인생을 논하는 자들의 패기(?)를 아니꼽게 바라보는 듯하다. 그 어떤 말로 너를 증명케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다.
마종기 시인은 위의 시에 인용문을 덧붙였다.
“끝 연에서 이 시는 세상을 다 알고 경험한 척하며 철학자 연연하는 주위 사람들에 대한 불만을 보이고 있다. 도서관에 앉아 책만 들척이며 세상의 진리를 다 알고 있는 듯한 표정으로 글을 쓰고, 세상의 만사를 자기식대로 난도질하는 지식인들이 나는 우습기까지 했다. …. 행동이 없이 관념의 추상 언어로만 지껄이는 문학을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체험을 통한 현장의 은유야말로 살아 있는 시를 만드는 새로운 질료라고 생각했다. 그것만이 진정성을 갖춘 문학이라고 믿었다. …. 골방에만 박혀서 하루하루의 질박한 삶을 외면하는 의식의 조작이 아니고, 땀과 눈물과 피로 만들어내는 것만이 진정한 시의 길이라고 믿었다.”
이 시의 제목 ‘증례’는 ‘어떤 사실의 유무나 진위를 증명하는 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생과 사의 치열함과 의사라는 노동자로서의 고단한 삶 속에서 진정한 예술로서의 문학을 정의내리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4. 참고문헌
손문수, 마종기시연구 - 콤프렉스와 이미지 분석에 의한 존재의지의 탐색을 중심으로, 한성어문학 1권, 한성 대학교 한성어문학회, 1982, 163~178쪽.
정효구, 마종기 시에 나타난 이민자 의식, 인문학지 19권, 충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0, 35~6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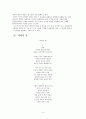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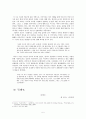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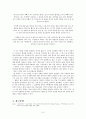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