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숭정제의 즉위
2. 숭정제의 치적
3. 체면을 목숨이나 나라보다 중시했던 망국지군
4. 명나라의 비참한 최후
-참고문헌
2. 숭정제의 치적
3. 체면을 목숨이나 나라보다 중시했던 망국지군
4. 명나라의 비참한 최후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청에 망명하게 된다.
4. 명나라의 비참한 최후
중국역사상, 황제가 목을 매어 자살한 것은 아마도 명나라때의 숭정제 주유검 한사람뿐일 것이다. 이 황제가 죽기 전의 비감하고 처참한 역사는 만감을 교차하게 한다.
1644년 이자성의 농민반란군이 황성 북경을 압박했다. 277년전에도 농민반란군인 주원장이 세웠던 명나라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한 것이다. 3월 준순 북경은 더 이상 지키지 못할 것처럼 보였다. 3월 18일의 이날, 만조의 문무백관은 모두 어찌 할 바를 몰랐고, 숭정황제의 곁에는 몇몇 태감(환관)들만이 오가고 있었다.
이날 밤, 반란군의 공성소리는 이미 황궁까지 전해졌고, 숭정제가 불러도 어느 왕공대신도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는 친히 어전전의 종을 울려 문무백관을 조회에 불렀다. 그러나 텅 빈 황궁안에 단 한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다. 곧 내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에 숭정제는 대명왕조는 끝났음을 느끼고, 후사를 처리해야 했다. 그래서, 자기의 황후비빈태자공주들을 모았다. 세 아들들은 변장시켜 피신하게 하고, 적군의 손이 욕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빈과 공주를 자신의 손으로 죽였다. 이후 그는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자기의 피로 최후의 유조를 써내려갔다.
“짐은 덕이 부족하여 하늘의 허물을 입어, 역적이 경사를 핍박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모두 여러 신하들이 짐을 잘못 이끈 탓이다. 심은 죽어서도 지하에서 조종을 뵐 면목이 없다. 스스로 황관을 벗고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덮어, 도적이 짐의 시신을 마음대로 갈기갈기 찢어도 좋으니, 백성들은 한 사람도 상하게 하지 말라”
이 글을 써서 가슴에 넣고는 궁을 나서서 매산(지금의 경산)에 올라다. 그를 따라 산에 오른 것은 태감 왕승은 하나였다. 두 사람은 같이 목을 매어 자결했다.
숭정황제의 죽음과 더불어, 277년의 대명왕조는 와해되었다.
숭정황제는 17년간 재위에 있었는데 비교적 열심히 정사를 하는 편이었다. 태감을 총애한 것을 빼면, 그는 이전의 황제들보다 아주 나은 편이었다. 그리고 그는 죽기 전에 여전히 백성의 안위를 걱정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아집과 독단으로 현명한 신하들을 믿지 못한 채 환관 등 소위 家臣만을 신임하였다. 그렇지만 숭정제가 명망에 끼친 여러 가지 영향이 있지만 이것이 한 국가의 멸망의 전부가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관료들의 당쟁 등 정치적 측면, 이갑제도의 이완과 붕괴 등 제도적 층면, 토지제도의 문란 등 경제적 측면, 만주족의 흥기 등 대외적 측면과 가뭄, 홍수, 질병 등 자연환경 측면, 그리고 시간적으로 누적된 기타 폐습 등도 명망에 크게 작용하였다. 대명왕조의 지금까지 쌓여온 모순과 부패는 이미 그의 힘으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참고문헌 : 신채식, 동양사개론, 삼영사, 2006.
오금성 외, <<명말 청초 사회의 조명>>, 한울, 1990.
김택중, 담천의 숭정제평가, 명청사학회, 1999.
참고사이트 : http://cafe.naver.com/sagasagasaga
http://mingqinghistory.or.kr/
4. 명나라의 비참한 최후
중국역사상, 황제가 목을 매어 자살한 것은 아마도 명나라때의 숭정제 주유검 한사람뿐일 것이다. 이 황제가 죽기 전의 비감하고 처참한 역사는 만감을 교차하게 한다.
1644년 이자성의 농민반란군이 황성 북경을 압박했다. 277년전에도 농민반란군인 주원장이 세웠던 명나라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한 것이다. 3월 준순 북경은 더 이상 지키지 못할 것처럼 보였다. 3월 18일의 이날, 만조의 문무백관은 모두 어찌 할 바를 몰랐고, 숭정황제의 곁에는 몇몇 태감(환관)들만이 오가고 있었다.
이날 밤, 반란군의 공성소리는 이미 황궁까지 전해졌고, 숭정제가 불러도 어느 왕공대신도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는 친히 어전전의 종을 울려 문무백관을 조회에 불렀다. 그러나 텅 빈 황궁안에 단 한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다. 곧 내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에 숭정제는 대명왕조는 끝났음을 느끼고, 후사를 처리해야 했다. 그래서, 자기의 황후비빈태자공주들을 모았다. 세 아들들은 변장시켜 피신하게 하고, 적군의 손이 욕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빈과 공주를 자신의 손으로 죽였다. 이후 그는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자기의 피로 최후의 유조를 써내려갔다.
“짐은 덕이 부족하여 하늘의 허물을 입어, 역적이 경사를 핍박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모두 여러 신하들이 짐을 잘못 이끈 탓이다. 심은 죽어서도 지하에서 조종을 뵐 면목이 없다. 스스로 황관을 벗고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덮어, 도적이 짐의 시신을 마음대로 갈기갈기 찢어도 좋으니, 백성들은 한 사람도 상하게 하지 말라”
이 글을 써서 가슴에 넣고는 궁을 나서서 매산(지금의 경산)에 올라다. 그를 따라 산에 오른 것은 태감 왕승은 하나였다. 두 사람은 같이 목을 매어 자결했다.
숭정황제의 죽음과 더불어, 277년의 대명왕조는 와해되었다.
숭정황제는 17년간 재위에 있었는데 비교적 열심히 정사를 하는 편이었다. 태감을 총애한 것을 빼면, 그는 이전의 황제들보다 아주 나은 편이었다. 그리고 그는 죽기 전에 여전히 백성의 안위를 걱정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아집과 독단으로 현명한 신하들을 믿지 못한 채 환관 등 소위 家臣만을 신임하였다. 그렇지만 숭정제가 명망에 끼친 여러 가지 영향이 있지만 이것이 한 국가의 멸망의 전부가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관료들의 당쟁 등 정치적 측면, 이갑제도의 이완과 붕괴 등 제도적 층면, 토지제도의 문란 등 경제적 측면, 만주족의 흥기 등 대외적 측면과 가뭄, 홍수, 질병 등 자연환경 측면, 그리고 시간적으로 누적된 기타 폐습 등도 명망에 크게 작용하였다. 대명왕조의 지금까지 쌓여온 모순과 부패는 이미 그의 힘으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참고문헌 : 신채식, 동양사개론, 삼영사, 2006.
오금성 외, <<명말 청초 사회의 조명>>, 한울, 1990.
김택중, 담천의 숭정제평가, 명청사학회, 1999.
참고사이트 : http://cafe.naver.com/sagasagasaga
http://mingqinghistory.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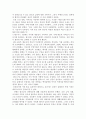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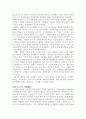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