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 론 (일본 속의 백제 문화가 지닌 의미)
2. 백제와 왜의 교섭사, 인간과 문물의 전래
2-1. 농경문화의 전래
2-2 백제문화의 첫 번째 물줄기
2-3. 백제 문화의 두 번째 물줄기
2-4 백제 문화의 세 번째 물줄기
2-5. 백제 문화의 마지막 세례
3, 일본에 끼친 백제문화
3-1. 농업기술
3-2. 사상과 학문
3-3. 건축
3-4. 공예
3-5. 조각
3-6. 회화
3-7. 기악
3-8. 의학
3-9. 조선술
3-10, 광산 기술
4. 결론
5. 참고문헌
2. 백제와 왜의 교섭사, 인간과 문물의 전래
2-1. 농경문화의 전래
2-2 백제문화의 첫 번째 물줄기
2-3. 백제 문화의 두 번째 물줄기
2-4 백제 문화의 세 번째 물줄기
2-5. 백제 문화의 마지막 세례
3, 일본에 끼친 백제문화
3-1. 농업기술
3-2. 사상과 학문
3-3. 건축
3-4. 공예
3-5. 조각
3-6. 회화
3-7. 기악
3-8. 의학
3-9. 조선술
3-10, 광산 기술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미륵사지에는 석탑이 남아 있는데 그 세 귀퉁이에는 사악한 것을 물리친다는 의미로 배치한 원숭이 모양의 석상이 있다. 이것은 일본 나라 현의 아스카 촌에 소재한 긴메이 천황릉 곁의 기비노히메미코히노구마 묘 안에 잇는 원석과 계통적으로 연결되므로 그 종형이었음을 알려준다.
3-6. 회화
463년에 왜의 요청으로 왜에 건너간 인사라아(因斯羅我)는 일본회화의 시조로서 자리매김을 했고 그 후손들까지 화가로서 이름을 날릴 정로로 그 역할이 컸다. 성왕의 후손인 진귀도 왜에서 화가로 활약하였는데, 그 후손인 혜존과 제14등급인 오산하의 관위를 받은 음도도 화사로서 일본 회화발전에 큰 공을 세웠다. 588년에 왜로 건너온 백가(百加)는 그림뿐 아니라 서예로도 이름을 날렸고, 그와 같이 온 양고도 아스카지의 벽화를 그렸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597년에는 위덕왕의 아들인 아좌태자가 건너가서 높이 1m, 너비 53.6m의 종이에 유명한 쇼토쿠태자의 모습을 그렸다고 전해진다.
하쿠호우시대인 7세기 후반에 축조된 가미요토지지의 금당 북편에서 채색 불교벽화편이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는데, 신장의 상반신과 보살의 머리 부분 등이 주목된다. 이 벽화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부여의 서복사지와 전라북도 익산의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벽화와 유사하므로, 백제에서 건너온 화공이나 기술의 영향을 받은 그림으로 간주된다.
9세기 후반에는 백제상량(百濟常良)이라는 화가와 10세기 말경에는 백제왕위효(百濟王爲孝)라는 백제계 화가가가 활약하였다.
3-7. 기악
467년에 백제에서 귀신(貴信)이라는 인물이 왜로 망명하였다. 이와레에 거주하는 금 연주가인 사카데야 가다마로 등은 그의 후손이라고 하므로 현악기의 전래를 알게 된다. 백제는 554년에 삼근 기마차 진노 진타 등 4명의 악인을 왜에 파견하였다. 이들은 8~11번째 관등을 지닌 인물들이었고, 또 교대한 것이므로 백제에서는 이전부터 왜에 음악을 전수시켜주었던 것이다. 일본 고대의 기본 법전인 《다이호우 령》에 의하면 이들은 횡적 공후 막목 무 등의 악사로 밝혀졌다. 왜에서 공후를 ‘백제금’이라고 일컬었음을 백제로부터 악기가 전파되었음을 알려준다. 백제는 왜에 불교를 전래해주었으므로, 사원 조영을 비롯한 각족 불교의식의 음악연주에 동원된 악기들 또한 불구와 더불이 백제에서 건너온 것임을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백제는 이미 오기라 하여 투호 위기 저포 악삭 롱주지희가 있었고, 오악으로는 서운산 무등산 방등산 정읍 지이산이 있어 악(樂)과 기(伎)에 있어 상당한 수준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남중국에서 수학을 한 백제의 미마지(味摩之) 일본서기 권 22 스이코왕 20년 5월 5일 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백제사람 미마지가 귀화하였는데, 이 사람은 ‘중국의 오(吳)나라에서 배워서 기악과 춤을 출 줄 안다.’고 하니 사꾸라이에 살게 하고 소년을 모아서 춤을 가르치게 하였다. 이때에 진야수제자와 신한제문 두 사람이 배워서 그 춤을 전수받았다고 한다. / 임동권, 『일본에 살이 있는 백제문화』, 주류성, 2004, pp36~37.
가 612년에 왜로 건너가 사쿠라이에 거주하면서 소년들을 모아 기악무를 전수시켰다. 진야수제자와 신한제문 두 사람이 가면을 사용한 무언의 무용극인 기악무를 배워서 전했는데, 대시수와 벽전수의 선조가 그들이라고 한다. 그리고 미마지가 백제에서 가지고 온 기악면이 전하고 있는데, 특히 옻칠한 가면은 백제 공예의 높은 수준을 알려준다. 미마지가 보급한 백제의 기악과 가면은 왜에 보급되어 궁중이나 불교행사뿐 아니라 민속놀이에도 많이 이용되었다고 한다. 684년 왜 조정의 경축연장에서 이른바 삼한악이라고 총칭되는 삼국의 음악 가운데 구다라 악이 연주되었다.
3-8. 의학
백제의 의학은 일본나니와 약사의 비조로 알려진 덕래(德來)를 통해서 왜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덕래는 본래 고구려인이었는데, 백제의 귀화하였다가 개로왕대에 왜로 파견되었다. 553년 6월에는 왜에서 사신을 백제로 파견하여 여러 종류의 양재를 부탁하였다고 한다.
3-9. 조선술
백제가 중국 남부지역뿐만 아니라 제주도와 일본열도, 나아가 동남아시아지역에 이르는 광역무역을 진행하였음은 조선술의 발달을 생각하게 한다.
3-10, 광산 기술
《고사기》에 의하면 근초고왕 때 탁소(卓素)라는 이름의 야철공이 왜에 파견되었다. 제철뿐 아니라 전반적인 광산기술은 백제 멸망 후 백제 유민들에 의해 개발되어갔다.
4. 결론
지금까지 삼국시대에 많은 백제인들이 일본에 건너가 그들의 문화 발전에 영향을 주었음을 문헌과 유적으로써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삼국사기』등 우리나라의 사서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이 축소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종종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백제에 비해 고구려의 경우는 비교적 풍부하게 자료가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것을 토대로 일본열도 안의 유적이나 유물 가운데 일방적으로 고구려와 연관을 짓기도 했다. 그러나 이중 상당수는 백제의 것일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데, 역사서에 의하면 백제와 고구려는 의복을 비롯한 풍속 일체가 거의 동일하였다고 씌여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당시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기술과 문화를 누리고 있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과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현재이라고 생각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과거의 자랑스러운 전통들을 이어왔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얼마나 발전시켜 세계 속에 그 위상을 수립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상징할 문화적 상품, 문화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과거의 영광에 도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욱 개발,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다. 문화는 전승된다. 우리는 또 아름다운 문화를 후세에 물려줄 책임을 지니고 있다. 이것이 바로 역사가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하며 발표를 마치고자 한다.
5. 참고문헌
박경희, 『연표와 사진으로 보는 일본사』, 일빛, 1998
박현숙, 『백제이야기- 잊혀진 우리의 역사』, 대한교과서, 1999
이도학, 『새로 쓰는 백제사』, 푸른역사, 1997
임동권, 『일본에 살아 있는 백제문화』, 주류성, 2004
3-6. 회화
463년에 왜의 요청으로 왜에 건너간 인사라아(因斯羅我)는 일본회화의 시조로서 자리매김을 했고 그 후손들까지 화가로서 이름을 날릴 정로로 그 역할이 컸다. 성왕의 후손인 진귀도 왜에서 화가로 활약하였는데, 그 후손인 혜존과 제14등급인 오산하의 관위를 받은 음도도 화사로서 일본 회화발전에 큰 공을 세웠다. 588년에 왜로 건너온 백가(百加)는 그림뿐 아니라 서예로도 이름을 날렸고, 그와 같이 온 양고도 아스카지의 벽화를 그렸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597년에는 위덕왕의 아들인 아좌태자가 건너가서 높이 1m, 너비 53.6m의 종이에 유명한 쇼토쿠태자의 모습을 그렸다고 전해진다.
하쿠호우시대인 7세기 후반에 축조된 가미요토지지의 금당 북편에서 채색 불교벽화편이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는데, 신장의 상반신과 보살의 머리 부분 등이 주목된다. 이 벽화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부여의 서복사지와 전라북도 익산의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벽화와 유사하므로, 백제에서 건너온 화공이나 기술의 영향을 받은 그림으로 간주된다.
9세기 후반에는 백제상량(百濟常良)이라는 화가와 10세기 말경에는 백제왕위효(百濟王爲孝)라는 백제계 화가가가 활약하였다.
3-7. 기악
467년에 백제에서 귀신(貴信)이라는 인물이 왜로 망명하였다. 이와레에 거주하는 금 연주가인 사카데야 가다마로 등은 그의 후손이라고 하므로 현악기의 전래를 알게 된다. 백제는 554년에 삼근 기마차 진노 진타 등 4명의 악인을 왜에 파견하였다. 이들은 8~11번째 관등을 지닌 인물들이었고, 또 교대한 것이므로 백제에서는 이전부터 왜에 음악을 전수시켜주었던 것이다. 일본 고대의 기본 법전인 《다이호우 령》에 의하면 이들은 횡적 공후 막목 무 등의 악사로 밝혀졌다. 왜에서 공후를 ‘백제금’이라고 일컬었음을 백제로부터 악기가 전파되었음을 알려준다. 백제는 왜에 불교를 전래해주었으므로, 사원 조영을 비롯한 각족 불교의식의 음악연주에 동원된 악기들 또한 불구와 더불이 백제에서 건너온 것임을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백제는 이미 오기라 하여 투호 위기 저포 악삭 롱주지희가 있었고, 오악으로는 서운산 무등산 방등산 정읍 지이산이 있어 악(樂)과 기(伎)에 있어 상당한 수준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남중국에서 수학을 한 백제의 미마지(味摩之) 일본서기 권 22 스이코왕 20년 5월 5일 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백제사람 미마지가 귀화하였는데, 이 사람은 ‘중국의 오(吳)나라에서 배워서 기악과 춤을 출 줄 안다.’고 하니 사꾸라이에 살게 하고 소년을 모아서 춤을 가르치게 하였다. 이때에 진야수제자와 신한제문 두 사람이 배워서 그 춤을 전수받았다고 한다. / 임동권, 『일본에 살이 있는 백제문화』, 주류성, 2004, pp36~37.
가 612년에 왜로 건너가 사쿠라이에 거주하면서 소년들을 모아 기악무를 전수시켰다. 진야수제자와 신한제문 두 사람이 가면을 사용한 무언의 무용극인 기악무를 배워서 전했는데, 대시수와 벽전수의 선조가 그들이라고 한다. 그리고 미마지가 백제에서 가지고 온 기악면이 전하고 있는데, 특히 옻칠한 가면은 백제 공예의 높은 수준을 알려준다. 미마지가 보급한 백제의 기악과 가면은 왜에 보급되어 궁중이나 불교행사뿐 아니라 민속놀이에도 많이 이용되었다고 한다. 684년 왜 조정의 경축연장에서 이른바 삼한악이라고 총칭되는 삼국의 음악 가운데 구다라 악이 연주되었다.
3-8. 의학
백제의 의학은 일본나니와 약사의 비조로 알려진 덕래(德來)를 통해서 왜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덕래는 본래 고구려인이었는데, 백제의 귀화하였다가 개로왕대에 왜로 파견되었다. 553년 6월에는 왜에서 사신을 백제로 파견하여 여러 종류의 양재를 부탁하였다고 한다.
3-9. 조선술
백제가 중국 남부지역뿐만 아니라 제주도와 일본열도, 나아가 동남아시아지역에 이르는 광역무역을 진행하였음은 조선술의 발달을 생각하게 한다.
3-10, 광산 기술
《고사기》에 의하면 근초고왕 때 탁소(卓素)라는 이름의 야철공이 왜에 파견되었다. 제철뿐 아니라 전반적인 광산기술은 백제 멸망 후 백제 유민들에 의해 개발되어갔다.
4. 결론
지금까지 삼국시대에 많은 백제인들이 일본에 건너가 그들의 문화 발전에 영향을 주었음을 문헌과 유적으로써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삼국사기』등 우리나라의 사서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이 축소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종종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백제에 비해 고구려의 경우는 비교적 풍부하게 자료가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것을 토대로 일본열도 안의 유적이나 유물 가운데 일방적으로 고구려와 연관을 짓기도 했다. 그러나 이중 상당수는 백제의 것일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데, 역사서에 의하면 백제와 고구려는 의복을 비롯한 풍속 일체가 거의 동일하였다고 씌여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당시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기술과 문화를 누리고 있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과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현재이라고 생각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과거의 자랑스러운 전통들을 이어왔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얼마나 발전시켜 세계 속에 그 위상을 수립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상징할 문화적 상품, 문화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과거의 영광에 도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욱 개발,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다. 문화는 전승된다. 우리는 또 아름다운 문화를 후세에 물려줄 책임을 지니고 있다. 이것이 바로 역사가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하며 발표를 마치고자 한다.
5. 참고문헌
박경희, 『연표와 사진으로 보는 일본사』, 일빛, 1998
박현숙, 『백제이야기- 잊혀진 우리의 역사』, 대한교과서, 1999
이도학, 『새로 쓰는 백제사』, 푸른역사, 1997
임동권, 『일본에 살아 있는 백제문화』, 주류성, 2004
추천자료
 21세기와 일본문화 -와쓰지 데쓰로(和 哲郞)의 일본문화론을 중심으로-
21세기와 일본문화 -와쓰지 데쓰로(和 哲郞)의 일본문화론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일본어를 통한 일본문화의 이해
[인문과학] 일본어를 통한 일본문화의 이해 (일본문화개론) 일본영화의 특징, 발전과 영향
(일본문화개론) 일본영화의 특징, 발전과 영향 일본문화의 특징, 일본의 전통예술
일본문화의 특징, 일본의 전통예술 [일본어][일본문화]일본어와 일본문화의 이해(일본어 기초어휘, 일본어 시점, 일본어의 종조...
[일본어][일본문화]일본어와 일본문화의 이해(일본어 기초어휘, 일본어 시점, 일본어의 종조... [일본문화]일본의 식사예절
[일본문화]일본의 식사예절 게이샤를 주제로한 일본문화와 우리나라문화와의 차이점 - 화려하지만 슬픈 이름 ‘게이샤’와 ...
게이샤를 주제로한 일본문화와 우리나라문화와의 차이점 - 화려하지만 슬픈 이름 ‘게이샤’와 ... 일본전통문화의 이해 - 일본전통문화의 큰 흐름은 和이다
일본전통문화의 이해 - 일본전통문화의 큰 흐름은 和이다 [일본의문화와예술]일본의 미술-우끼요에를 중심으로
[일본의문화와예술]일본의 미술-우끼요에를 중심으로 [일본민속놀이][일본][민속놀이][일본민속놀이 분류][일본민속놀이와 설날][연날리기][일본전...
[일본민속놀이][일본][민속놀이][일본민속놀이 분류][일본민속놀이와 설날][연날리기][일본전... 애니메이션 ≪이누야샤 (犬夜叉/Inuyasha)≫가 미치는 일본문화 인지효과에 대한 사례 분석
애니메이션 ≪이누야샤 (犬夜叉/Inuyasha)≫가 미치는 일본문화 인지효과에 대한 사례 분석 [일본문화] 일본의 주거문화 (일본 주택의 특징, 주거형태, 주거예절, 가옥의 구조 등)
[일본문화] 일본의 주거문화 (일본 주택의 특징, 주거형태, 주거예절, 가옥의 구조 등) [일본문화의 이해 과제] 일본의 화과자(わがし)와 한국의 한과
[일본문화의 이해 과제] 일본의 화과자(わがし)와 한국의 한과 [일본문화 연구] 일본문화 (일본의 음식,의복,주거문화,집단주의문화,전통놀이문화,게이샤,예...
[일본문화 연구] 일본문화 (일본의 음식,의복,주거문화,집단주의문화,전통놀이문화,게이샤,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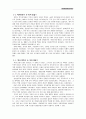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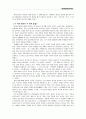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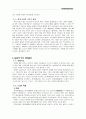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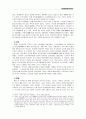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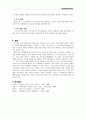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