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낙 발달해서 자신들의 사랑하는 에고를 위해 바칠 것들이 넘쳐흐르잖아요. 나라의 일을 걱정 하느라 잠시 잊어버린 에고를, 음악이나 미술 등등 말로는 다 읊지도 못할 만큼 많은 취미 생활들로 에고를 만족시키고 그를 다시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말은 우리 모두가 혁명가가 되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준씨가 말한대로 각자의 정치의식을 확고히 가지고, 작게나마 그 목소리를 내자는 것. 사실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 큰 함성을 이루고, 작은 변화가 모여서 역사가 바뀌는 거겠죠. 그래요,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유토피아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지난날의 역사를 통해 확신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 그곳을 향해 있다는 것. 거기에 희망을 걸고 움직이는 거예요. 조금은 방향이 틀릴지는 몰라도, 그것은 미미할 테니까요.
##은 걸어가고 있었다. 잠시 멈췄다. 몸을 돌려 주위를 보다가 다시 방향을 틀었다. 오던 반대방향으로 잰걸음을 걸었다. 지금까지 왔던 걸음이 잘못된 방향이란 걸 화들짝 알았다는 듯이. 그러다가는 다시 걸음이 느려졌다. 사실 ##은 생각 중이었다. 가만히 있지 못해서 움직이는 것이었다. 광장 저쪽에서는 사람들의 함성이 들려오고 있었다. 등록금 인상 저지를 위한 비상총회. 이천 명이 모이면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천 몇 백 여명이 어쩌고 하던 때가 몇 시간 전이었으니까, 지금은 조금은 늘었을 게다. 그래도 대충 눈치로 보기엔 좀 부족한 것 같았다. 이렇게 빙빙 도는 걸음으로 갈팡질팡 한지도 꽤 된 것 같았다. 순간 자기를 누가 보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되었다. 가야할 이유는 충분했다. 우선 ## 스스로가 이런 식으로의 등록금 인상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매 학기 매 년 학교에 누구누구가 죽일 놈들 살릴 놈들 하면서도 억울해하면서도 낼 것 다 내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한심해 보인 건 오래 전부터의 일이었다. 항상 그랬다. 개인은 언제나 자신의 일이 급했고, 옳다고 생각하는 건 그렇게 생각하고 말면 그만이었다. 무슨 얘기라도 해보고 싶을 때면 다 그런 거 아니냐고 이상한 사람이라는 식으로 쳐다보는 시선이 두려웠다. 저기 저 광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자신의 시간이 축날 것에 대한 두려움인지 막연한 시선에 대한 두려움인지 모호했다.
저 함성을 다 신뢰하는 것은 물론 아니었다. 그곳은 하나의 목적으로 규합된 모임이 아니라 차라리 시장에 가까운 모습이다. 어떻게든 물건을 팔아보려는 눈을 하고는 열심히 침 튀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쪽이 이익이 될지 계산하는 사람도 있고, 특별히 고민 안하고 쉽게 결정해버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저 구경 나와서 소리 높여 떠드는 자기 소리를 듣는 것에 쾌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저 곳이 그런 곳이었다. 또 학생회는 사람만 많이 모이면 그 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죽 늘어놓는 경향이 있는 듯 했다. 모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요즘 대학사회를 대하는 그들의 마음도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모임의 성격을 흐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그런 자리로 나가는 것은 ## 스스로의 개인을 포기한다는 것이 되고, 전부는 아닐지라도 일부분이라도 그렇게 되는 것은 확실하다. 촛불시위를 말하던 독고준이 생각난다. 준은 조직을 믿지 않는다고 했지. 준은 확실히 아는 게 많았다. 단순한 지식의 양을 떠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보곤 했던 것이다. 그 시각이 항상 비관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지만. 너무 많이 알면 역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건가. 하하. 하지만 그건 아닐 텐데. 모든 걸 아는 사람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승복할 수 없는 논리였다. 아니 그러기 싫었다. 무언가를 하고 그 행동이 옳지 못한 무언가를 바꿀 수 있으며, 거기에 개인 개인이 중요한 힘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은 발견했다. 세상은 참여한 만큼 바뀐다는 것은 역시 순진한 믿음일까. 개인이 조직에 일부가 되는 순간 개인은 없어진다. 그것은 맞는 말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난 그것을 알고 있다. 저기에 들어가는 순간 ##이라는 한 개성은 빛을 잃게 될 것임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알면서도 저기에 합류한다면? 그건 나의 선택이다. 그저 자조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개성을 희생하면서도 조직이 무언가를 이루는 데 나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 조직에 편성된다면? 모르고 합류될 때에는 개성이 죽는다는 것이 맞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까지 내가 인식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한다면. 그건 나의 선택이 아닌가. 게다가 그 곳에 있어도 나의 인격은 남아있다. 조금씩 변할지언정 결국 그건 나의 인격 아닌가. 개성을 희생하는 선택을 내린 것도 나의 인격이다. 그래, 진정 중요한 건 어떤 행동을 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일지 모른다. 자유. 자발적인 선택. 조직이 날 자유하게 하지 못할지라도, 난 자유롭게 조직을 선택한다. 거기서 오는 개성의 희생도 내 몫이다. 그 희생은 내 것이다. 그래, 난 진정 자유하고 싶다. ##은 광장으로 걸음을 내딛었다.
후기
회색인의 독고준을 우리 시대에 살게 한다는 시도는 발상은 나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독고준의 깊이를 감당하지 못해 쉽지 않았음을 고백해야 할 것 같다. 우리는 독고준과 대화하고 싶었다. 소설이 쓰여진 60년대에서 독고준이라는 인물만을 추출해서 우리 시대에 대입시켰다. 그것을 탈색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독고준이 경탄하던 카프카적인 방법일 수도 있겠다. 우리는 독고준과 문학을, 정치의식에 대한 문제를,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다. 우리는 독고준을 어렴풋이 만났고, 질문을 던졌다. 독고준은 촛불시위 같은 것에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최인훈의 「회색인」을 토대로 독고준이 우리 곁에 있었다면 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대답들을 구성해보았다. 우리는 안다. 그가 정말 우리 곁에 있었다면 그의 소설이나 그의 생각을 그렇게 쉽게 내비쳐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의 질문에 싫은 기색도 없이 성실하게 대화에 임해준 독고준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제 당신도 행복하기를.
##은 걸어가고 있었다. 잠시 멈췄다. 몸을 돌려 주위를 보다가 다시 방향을 틀었다. 오던 반대방향으로 잰걸음을 걸었다. 지금까지 왔던 걸음이 잘못된 방향이란 걸 화들짝 알았다는 듯이. 그러다가는 다시 걸음이 느려졌다. 사실 ##은 생각 중이었다. 가만히 있지 못해서 움직이는 것이었다. 광장 저쪽에서는 사람들의 함성이 들려오고 있었다. 등록금 인상 저지를 위한 비상총회. 이천 명이 모이면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천 몇 백 여명이 어쩌고 하던 때가 몇 시간 전이었으니까, 지금은 조금은 늘었을 게다. 그래도 대충 눈치로 보기엔 좀 부족한 것 같았다. 이렇게 빙빙 도는 걸음으로 갈팡질팡 한지도 꽤 된 것 같았다. 순간 자기를 누가 보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되었다. 가야할 이유는 충분했다. 우선 ## 스스로가 이런 식으로의 등록금 인상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매 학기 매 년 학교에 누구누구가 죽일 놈들 살릴 놈들 하면서도 억울해하면서도 낼 것 다 내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한심해 보인 건 오래 전부터의 일이었다. 항상 그랬다. 개인은 언제나 자신의 일이 급했고, 옳다고 생각하는 건 그렇게 생각하고 말면 그만이었다. 무슨 얘기라도 해보고 싶을 때면 다 그런 거 아니냐고 이상한 사람이라는 식으로 쳐다보는 시선이 두려웠다. 저기 저 광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자신의 시간이 축날 것에 대한 두려움인지 막연한 시선에 대한 두려움인지 모호했다.
저 함성을 다 신뢰하는 것은 물론 아니었다. 그곳은 하나의 목적으로 규합된 모임이 아니라 차라리 시장에 가까운 모습이다. 어떻게든 물건을 팔아보려는 눈을 하고는 열심히 침 튀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쪽이 이익이 될지 계산하는 사람도 있고, 특별히 고민 안하고 쉽게 결정해버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저 구경 나와서 소리 높여 떠드는 자기 소리를 듣는 것에 쾌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저 곳이 그런 곳이었다. 또 학생회는 사람만 많이 모이면 그 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죽 늘어놓는 경향이 있는 듯 했다. 모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요즘 대학사회를 대하는 그들의 마음도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모임의 성격을 흐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그런 자리로 나가는 것은 ## 스스로의 개인을 포기한다는 것이 되고, 전부는 아닐지라도 일부분이라도 그렇게 되는 것은 확실하다. 촛불시위를 말하던 독고준이 생각난다. 준은 조직을 믿지 않는다고 했지. 준은 확실히 아는 게 많았다. 단순한 지식의 양을 떠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보곤 했던 것이다. 그 시각이 항상 비관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지만. 너무 많이 알면 역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건가. 하하. 하지만 그건 아닐 텐데. 모든 걸 아는 사람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승복할 수 없는 논리였다. 아니 그러기 싫었다. 무언가를 하고 그 행동이 옳지 못한 무언가를 바꿀 수 있으며, 거기에 개인 개인이 중요한 힘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은 발견했다. 세상은 참여한 만큼 바뀐다는 것은 역시 순진한 믿음일까. 개인이 조직에 일부가 되는 순간 개인은 없어진다. 그것은 맞는 말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난 그것을 알고 있다. 저기에 들어가는 순간 ##이라는 한 개성은 빛을 잃게 될 것임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알면서도 저기에 합류한다면? 그건 나의 선택이다. 그저 자조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개성을 희생하면서도 조직이 무언가를 이루는 데 나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 조직에 편성된다면? 모르고 합류될 때에는 개성이 죽는다는 것이 맞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까지 내가 인식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한다면. 그건 나의 선택이 아닌가. 게다가 그 곳에 있어도 나의 인격은 남아있다. 조금씩 변할지언정 결국 그건 나의 인격 아닌가. 개성을 희생하는 선택을 내린 것도 나의 인격이다. 그래, 진정 중요한 건 어떤 행동을 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일지 모른다. 자유. 자발적인 선택. 조직이 날 자유하게 하지 못할지라도, 난 자유롭게 조직을 선택한다. 거기서 오는 개성의 희생도 내 몫이다. 그 희생은 내 것이다. 그래, 난 진정 자유하고 싶다. ##은 광장으로 걸음을 내딛었다.
후기
회색인의 독고준을 우리 시대에 살게 한다는 시도는 발상은 나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독고준의 깊이를 감당하지 못해 쉽지 않았음을 고백해야 할 것 같다. 우리는 독고준과 대화하고 싶었다. 소설이 쓰여진 60년대에서 독고준이라는 인물만을 추출해서 우리 시대에 대입시켰다. 그것을 탈색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독고준이 경탄하던 카프카적인 방법일 수도 있겠다. 우리는 독고준과 문학을, 정치의식에 대한 문제를,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다. 우리는 독고준을 어렴풋이 만났고, 질문을 던졌다. 독고준은 촛불시위 같은 것에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최인훈의 「회색인」을 토대로 독고준이 우리 곁에 있었다면 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대답들을 구성해보았다. 우리는 안다. 그가 정말 우리 곁에 있었다면 그의 소설이나 그의 생각을 그렇게 쉽게 내비쳐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의 질문에 싫은 기색도 없이 성실하게 대화에 임해준 독고준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제 당신도 행복하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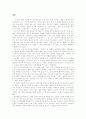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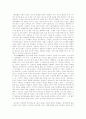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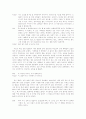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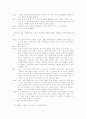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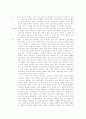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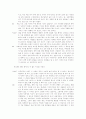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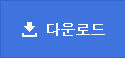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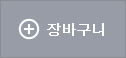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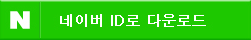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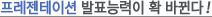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