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Ⅰ. 서론 ······························· 1
Ⅱ. 본론 ······························· 1
1. 최치원의 생애 ······················ 2
2. 주제를 통한 작품 분석 ············ 3
1) ‘외로움’ ···························· 3
2) ‘소외 의식’과 ‘자긍심’ ············ 5
3) ‘세속적 삶에 대한 미련과 회의’ · 8
Ⅲ. 결론 ······························ 10
Ⅳ. 참고문헌 ························· 12
Ⅰ. 서론 ······························· 1
Ⅱ. 본론 ······························· 1
1. 최치원의 생애 ······················ 2
2. 주제를 통한 작품 분석 ············ 3
1) ‘외로움’ ···························· 3
2) ‘소외 의식’과 ‘자긍심’ ············ 5
3) ‘세속적 삶에 대한 미련과 회의’ · 8
Ⅲ. 결론 ······························ 10
Ⅳ. 참고문헌 ························· 12
본문내용
國 皆遭亂世 屯蹇連 動輒得咎 自傷不偶 無復仕進意\" -치원은 서쪽에서 당나라[大唐]를 섬기다가 동쪽의 고국에 돌아온 후부터 계속하여 혼란한 세상을 만나 발이 묶이고 걸핏하면 허물을 뒤집어쓰니 때를 만나지 못한 것을 스스로 가슴 아파하여 다시 관직에 나갈 뜻이 없었다.
이후 최치원은 자신의 불우한 신세를 슬퍼하고, 벼슬할 생각을 버리고 방랑의 길에 들었으며, 이러한 난세 속에서 이미 신라 사회는 새로운 역사의 창조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지방의 신흥 호족들에 의해 새 국가 건설의 움직임이 싹트고 있었다. 신라말 반신라적 성향의 6두품 중 ‘1대 3최(一代三崔)’라 불렸던 최승우(崔承祐)는 후백제의 견훤(甄萱)에게, 그리고 최언위(崔彦)는 고려 왕건(王建)에게로 가버렸다. 최치원의 경우 이우성 선생은 『삼국사기』의 기록 앞의 책 “初我太祖作興 致遠知非常人 必受命開國 因致書問 有鷄林黃葉 鵠嶺靑松之句” -전에 우리 태조가 일어날 때 치원은 (태조가) 비상한 사람으로 반드시 천명을 받아 나라를 열 것을 알고서 편지를 보내 문안드렸는데, 그 글 중에 ‘계림은 누런 잎이고 곡령(鵠嶺)은 푸른 소나무라.’는 구절이 있었다.
에 따라 일찍 왕건에게 큰 기대를 걸면서 ‘계림황엽(鷄林黃葉) 곡령청송(鵠嶺靑松)’ 이라는 시를 지어 낡은 신라를 경주 계림의 누른 잎(가을 나뭇잎)에 비기고 새로운 고려를 개성 곡령(鵠嶺)의 푸른 솔에 견주었으나, 결국에는 가족과 함께 가야산(伽倻山)에 은둔하여 여생을 마쳤다고 적고 있다. 이우성, 「南北國時代와 崔致遠」, 『한국의 역사상』, 창작과 비평사, 1982, 158-159쪽
반면, 최영성은 이와 같이 최치원이 왕건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기록은 아마도 사실과 다르게 전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세상을 등진 孤雲이 또다시 정치에 간여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진정으로 고려에 의탁할 마음이 있었음에도 앞서 언급한 최언위나 최승우처럼 신라를 버리지 않은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치원이 왕건의 건국을 은밀히 도와 후일 그에게 내사령(內史令)을 추증(追贈)하고 문창후(文昌候)라는 시호를 추증했다 함도 고려에서 합리화시킨 것으로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며, 이는 그만큼 최치원이 우리나라의 유학(儒學)과 한문학의 선구자적 위치에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 최영성 편, 『註解四山碑銘』, 아세아문화사, 1987, 3쪽
그와 고려 건국과의 관련성이 어찌되었든 그가 말년에 산중에 은거하였으며, 언제 어디서 세상을 떠났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2. 주제를 통한 작품 분석
1) ‘외로움’
그가 당에서 유학할 당시에 쓰여진 시들을 보면 비록 그가 당에서 과거에 급제하고서도 외국인이라는 처지 때문에 크게 인정받지 못한 좌절감과 타국에서의 외로움과 고향 신라에 대한 향수를 엿볼 수 있다.
陳情上太尉 이하 한시들의 원전은 『崔文昌侯全集』,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 1972를 기본으로 하고, 국역은 이강옥, 「남북국시대 지식인의 고뇌와 문학 - 「고운 최치원」, 『한국 고전문학 작가론』, 소명출판, 1998을 따르기로 한다.
상태위에게 진정합니다
海內誰憐海外人 해내의 누가 해외 사람을 가엾게 여기리
問津何處是通津 묻노라. 어느 나루가 건널만한 나루인가
本求食祿非求利 애초에 먹을거리나 구하고, 이익을 구하지 않았으며
只爲榮親不爲身 어버이를 영화롭게 하고, 내 몸 위하려고 하지 않았다
客路離愁江上雨 나그네 길 이별의 시름은 강 위의 빗소리요
故苑歸夢日邊春 고향에 돌아가는 꿈에 봄이 아득히 멀구나
濟川幸遇恩波廣 냇물 건너다 요행히 은혜로운 물결 듬뿍 만나서
願濯凡纓十載塵 속된 갓끈의 십 년 먼지를 다 씻어버렸으면
海內는 당나라이고, 海外는 외국이다. 최치원은 자기가 외국인임을 절감하면서 깊은 고민에 사로잡혔다. 먹고사는 것이나 구하고, 어버이를 영화롭게 하려 했다는 변명으로 그 고민이 해소되지 않는 것이다.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고 하면서도 머뭇거리기만 하고, 모든 망설임을 한꺼번에 해소하는 길이라도 있는가 꿈꾸어보기도 했으나, 어떤 해결책도 나서지 않는 상태가 되풀이 되었다. 그런가 하면, 뒤에서 살펴볼 「촉규화(蜀葵花)」라는 시에서는 “스스로 부끄러워하노니 태어난 門地가 천하여서 사람들이 버리고 마는 것을 한탄할 만하구나” 라고 접시꽃에 자기 처지를 비하기도 했다.
郵亭夜雨 우정에서 비 내리는 밤
旅館窮秋雨 늦가을 비 내리는 날 여관에 들어
寒窓靜夜燈 차가운 창가에 고요히 등불 밝히고
自憐愁裏坐 수심에 싸여 앉았으니 가련키만 하구나
眞箇定中僧 내 진실로 선정에 든 중이로구나
위 시에서는 이국에서 체험한 좌절감은 떠나온 고향에 대한 끊임없는 그리움으로 변한다. 이 경우 시적 세계는 이원화된다. 시적 자아가 발 딛고 있는 세계는 하나같이 각박하고 냉혹하다. 시적 자아가 그리워하는 세계 즉 고향은 시적 자아가 현재 당면한 고뇌를 감싸주고 어루만져 주기에 충분한 이상적 공간으로 형상화된다. ‘가을 비 내리는 날의 여관’, ‘창가에 가물거리는 등불’등은 냉담한 세계를 암시하면서 시적 자아가 현재 여기가 아닌 다른 어떤 곳을 지향하게 하는 적절한 분위기를 마련한다. 그러나 현재의 여건 상 그것이 구체적이고 분명한 것이 될 수 없기에 ‘선정에 든 중[定中作]’이란 자조(自嘲)에 가까운 표현으로 그 안타까움을 달래고자 했다. 나아가 “나그네길 이별의 수심은 강가의 비로 내리고 / 고향으로 돌아가는 꿈은 하늘 끝 봄날 아지랑이로 피어오르네[客路離愁江上雨 故苑歸夢日邊春]”(「陳情上太尉」)와 같은 시구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만이 문제되어, 고향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만사가 뜻대로 될 것임을 암시한다.
途中作 길을 가다 지었다
東飄西轉路岐塵 갈림길 먼지 덮어쓰며 동서로 헤매느라
獨策幾苦辛 홀로 여읜 말 몰고 다니니 얼마나 쓰라리냐
不是不知歸去好 돌아가는 것이 좋은 줄 모르는 것 아니지만
只緣歸去又家貧 돌아가 보았자 내 집은 여전히 가난하리니
열 두 살의 어린나이로 수만리 타국에 유랑했던 그에게 있어서 외로움과 향수는 절실하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정서라 지극수 있다. 위의 시에서 심신의 안정을 얻지 못하고 객고(客苦)에 시달리는 나그네의 고달
이후 최치원은 자신의 불우한 신세를 슬퍼하고, 벼슬할 생각을 버리고 방랑의 길에 들었으며, 이러한 난세 속에서 이미 신라 사회는 새로운 역사의 창조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지방의 신흥 호족들에 의해 새 국가 건설의 움직임이 싹트고 있었다. 신라말 반신라적 성향의 6두품 중 ‘1대 3최(一代三崔)’라 불렸던 최승우(崔承祐)는 후백제의 견훤(甄萱)에게, 그리고 최언위(崔彦)는 고려 왕건(王建)에게로 가버렸다. 최치원의 경우 이우성 선생은 『삼국사기』의 기록 앞의 책 “初我太祖作興 致遠知非常人 必受命開國 因致書問 有鷄林黃葉 鵠嶺靑松之句” -전에 우리 태조가 일어날 때 치원은 (태조가) 비상한 사람으로 반드시 천명을 받아 나라를 열 것을 알고서 편지를 보내 문안드렸는데, 그 글 중에 ‘계림은 누런 잎이고 곡령(鵠嶺)은 푸른 소나무라.’는 구절이 있었다.
에 따라 일찍 왕건에게 큰 기대를 걸면서 ‘계림황엽(鷄林黃葉) 곡령청송(鵠嶺靑松)’ 이라는 시를 지어 낡은 신라를 경주 계림의 누른 잎(가을 나뭇잎)에 비기고 새로운 고려를 개성 곡령(鵠嶺)의 푸른 솔에 견주었으나, 결국에는 가족과 함께 가야산(伽倻山)에 은둔하여 여생을 마쳤다고 적고 있다. 이우성, 「南北國時代와 崔致遠」, 『한국의 역사상』, 창작과 비평사, 1982, 158-159쪽
반면, 최영성은 이와 같이 최치원이 왕건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기록은 아마도 사실과 다르게 전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세상을 등진 孤雲이 또다시 정치에 간여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진정으로 고려에 의탁할 마음이 있었음에도 앞서 언급한 최언위나 최승우처럼 신라를 버리지 않은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치원이 왕건의 건국을 은밀히 도와 후일 그에게 내사령(內史令)을 추증(追贈)하고 문창후(文昌候)라는 시호를 추증했다 함도 고려에서 합리화시킨 것으로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며, 이는 그만큼 최치원이 우리나라의 유학(儒學)과 한문학의 선구자적 위치에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 최영성 편, 『註解四山碑銘』, 아세아문화사, 1987, 3쪽
그와 고려 건국과의 관련성이 어찌되었든 그가 말년에 산중에 은거하였으며, 언제 어디서 세상을 떠났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2. 주제를 통한 작품 분석
1) ‘외로움’
그가 당에서 유학할 당시에 쓰여진 시들을 보면 비록 그가 당에서 과거에 급제하고서도 외국인이라는 처지 때문에 크게 인정받지 못한 좌절감과 타국에서의 외로움과 고향 신라에 대한 향수를 엿볼 수 있다.
陳情上太尉 이하 한시들의 원전은 『崔文昌侯全集』,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 1972를 기본으로 하고, 국역은 이강옥, 「남북국시대 지식인의 고뇌와 문학 - 「고운 최치원」, 『한국 고전문학 작가론』, 소명출판, 1998을 따르기로 한다.
상태위에게 진정합니다
海內誰憐海外人 해내의 누가 해외 사람을 가엾게 여기리
問津何處是通津 묻노라. 어느 나루가 건널만한 나루인가
本求食祿非求利 애초에 먹을거리나 구하고, 이익을 구하지 않았으며
只爲榮親不爲身 어버이를 영화롭게 하고, 내 몸 위하려고 하지 않았다
客路離愁江上雨 나그네 길 이별의 시름은 강 위의 빗소리요
故苑歸夢日邊春 고향에 돌아가는 꿈에 봄이 아득히 멀구나
濟川幸遇恩波廣 냇물 건너다 요행히 은혜로운 물결 듬뿍 만나서
願濯凡纓十載塵 속된 갓끈의 십 년 먼지를 다 씻어버렸으면
海內는 당나라이고, 海外는 외국이다. 최치원은 자기가 외국인임을 절감하면서 깊은 고민에 사로잡혔다. 먹고사는 것이나 구하고, 어버이를 영화롭게 하려 했다는 변명으로 그 고민이 해소되지 않는 것이다.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고 하면서도 머뭇거리기만 하고, 모든 망설임을 한꺼번에 해소하는 길이라도 있는가 꿈꾸어보기도 했으나, 어떤 해결책도 나서지 않는 상태가 되풀이 되었다. 그런가 하면, 뒤에서 살펴볼 「촉규화(蜀葵花)」라는 시에서는 “스스로 부끄러워하노니 태어난 門地가 천하여서 사람들이 버리고 마는 것을 한탄할 만하구나” 라고 접시꽃에 자기 처지를 비하기도 했다.
郵亭夜雨 우정에서 비 내리는 밤
旅館窮秋雨 늦가을 비 내리는 날 여관에 들어
寒窓靜夜燈 차가운 창가에 고요히 등불 밝히고
自憐愁裏坐 수심에 싸여 앉았으니 가련키만 하구나
眞箇定中僧 내 진실로 선정에 든 중이로구나
위 시에서는 이국에서 체험한 좌절감은 떠나온 고향에 대한 끊임없는 그리움으로 변한다. 이 경우 시적 세계는 이원화된다. 시적 자아가 발 딛고 있는 세계는 하나같이 각박하고 냉혹하다. 시적 자아가 그리워하는 세계 즉 고향은 시적 자아가 현재 당면한 고뇌를 감싸주고 어루만져 주기에 충분한 이상적 공간으로 형상화된다. ‘가을 비 내리는 날의 여관’, ‘창가에 가물거리는 등불’등은 냉담한 세계를 암시하면서 시적 자아가 현재 여기가 아닌 다른 어떤 곳을 지향하게 하는 적절한 분위기를 마련한다. 그러나 현재의 여건 상 그것이 구체적이고 분명한 것이 될 수 없기에 ‘선정에 든 중[定中作]’이란 자조(自嘲)에 가까운 표현으로 그 안타까움을 달래고자 했다. 나아가 “나그네길 이별의 수심은 강가의 비로 내리고 / 고향으로 돌아가는 꿈은 하늘 끝 봄날 아지랑이로 피어오르네[客路離愁江上雨 故苑歸夢日邊春]”(「陳情上太尉」)와 같은 시구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만이 문제되어, 고향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만사가 뜻대로 될 것임을 암시한다.
途中作 길을 가다 지었다
東飄西轉路岐塵 갈림길 먼지 덮어쓰며 동서로 헤매느라
獨策幾苦辛 홀로 여읜 말 몰고 다니니 얼마나 쓰라리냐
不是不知歸去好 돌아가는 것이 좋은 줄 모르는 것 아니지만
只緣歸去又家貧 돌아가 보았자 내 집은 여전히 가난하리니
열 두 살의 어린나이로 수만리 타국에 유랑했던 그에게 있어서 외로움과 향수는 절실하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정서라 지극수 있다. 위의 시에서 심신의 안정을 얻지 못하고 객고(客苦)에 시달리는 나그네의 고달
추천자료
 (한국현대소설작가론) 김영하론
(한국현대소설작가론) 김영하론 이기영과 그의 작품세계에 대해서
이기영과 그의 작품세계에 대해서 [한국구비문학론]한국의 신화 분석
[한국구비문학론]한국의 신화 분석 한국현대작가론 - 전상국론
한국현대작가론 - 전상국론 [건축가 프랭크로이드라이트]건축가 프랭크로이드라이트의 생애, 건축가 프랭크로이드라이트...
[건축가 프랭크로이드라이트]건축가 프랭크로이드라이트의 생애, 건축가 프랭크로이드라이트... [문예문][시][소설][수필][희곡][구조주의문예론][형식주의문예론][작품내제적문예론]문예문(...
[문예문][시][소설][수필][희곡][구조주의문예론][형식주의문예론][작품내제적문예론]문예문(... [님웨일즈아리랑, 아리랑]님웨일즈의 아리랑 서평, 김산의 생애, 작품 내용 분석, 요약
[님웨일즈아리랑, 아리랑]님웨일즈의 아리랑 서평, 김산의 생애, 작품 내용 분석, 요약 [판소리][판소리 유파][판소리 작품][조][판소리론교육][판소리 영상화]판소리의 개념, 판소...
[판소리][판소리 유파][판소리 작품][조][판소리론교육][판소리 영상화]판소리의 개념, 판소... 아래의 국내외 아동문학상을 참고하여 국내 아동문학상 수상자 1명과 외국 아동문학상 수상자...
아래의 국내외 아동문학상을 참고하여 국내 아동문학상 수상자 1명과 외국 아동문학상 수상자... 기형도(奇亨度)의 『엄마 걱정』 - 시인 기형도와 그의 작품 세계, 「엄마걱정」작품분석
기형도(奇亨度)의 『엄마 걱정』 - 시인 기형도와 그의 작품 세계, 「엄마걱정」작품분석 (교육사 공통) 우리나라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대표적 교육사상가 중 1명을 선정, ...
(교육사 공통) 우리나라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대표적 교육사상가 중 1명을 선정, ... 정신건강론의 성립과정 - 정신건강론의 발전과정, 한국(우리나라) 정신건강론의 역사
정신건강론의 성립과정 - 정신건강론의 발전과정, 한국(우리나라) 정신건강론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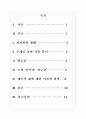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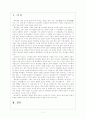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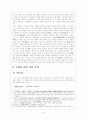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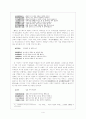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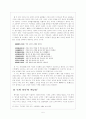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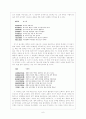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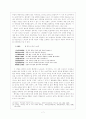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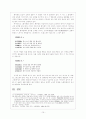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