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1970년대 문학
2-1. 시대 개관
2-2. 문학사 개관
2-3. 1970년대 소설 : 황석영 「삼포 가는 길」 , 조세희 「클라인 씨의 병」.
(1)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
1) 작가 소개
2) 줄거리 요약
3) 소설의 특성 (인용문 제시)
4) 소설「삼포 가는 길」의 의의
(2) 조세희의 「클라인 씨의 병」
1) 작가 소개
2) 줄거리 요약
3) 소설의 특성 (인용문 제시)
4) 소설「클라인 씨의 병」의 의의
2-4. 1970년대 소설의 의의
3. 결론
2. 1970년대 문학
2-1. 시대 개관
2-2. 문학사 개관
2-3. 1970년대 소설 : 황석영 「삼포 가는 길」 , 조세희 「클라인 씨의 병」.
(1)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
1) 작가 소개
2) 줄거리 요약
3) 소설의 특성 (인용문 제시)
4) 소설「삼포 가는 길」의 의의
(2) 조세희의 「클라인 씨의 병」
1) 작가 소개
2) 줄거리 요약
3) 소설의 특성 (인용문 제시)
4) 소설「클라인 씨의 병」의 의의
2-4. 1970년대 소설의 의의
3. 결론
본문내용
작 소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1960년대 이래 ‘순수문학과 참여문학의 도식적 대립항’을 뛰어넘고 있으며 사실주의 소설이 주류를 이류고 있던 당대의 한국 문단에 기존의 사실주의 소설과 차별화된 미적 경험을 제시하여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문학적 성과와 아울러 뛰어난 효용가치와 고도의 예술적 가치를 모두 겸비하여 흥행에도 성공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문학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2-4. 1970년대 소설의 의의
1970년대의 한국 소설은 질·양 양면에서 괄목할 만한 결실을 이룩하였다. 내용면에서 그것이 남긴 성과는 농촌의 궁핍화에 대한 검토에서부터 6.25의 비극이 끼친 상흔의 극복에 이르기까지 실로 광범한 영역을 커버하는 것이었으며, 형식상으로도 단편 중심의 협소한 소설 공간을 깨뜨리고 본격적인 로망에로 지향해 가는 움직임을 뚜렷하게 나타냈던 것이다. 이 같은 소설 문학의 급성장은 이 기간 동안 숱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꺾일 줄을 모르고 줄기차게 이루어져 온 시민 의식의 전반적 성장과 호흡을 같이하는 것이었으며 동시에 한국 근대 문학의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가기 위한 고무적 출발이 되기도 하였다.
작가에 따라 다소의 편차를 드러내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말해서 1970년대의 소설은 삶의 공동 주체로서 \'민중\'이 지닌 가치와 힘에 대하여 깊은 신뢰를 보여 주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 시대의 소설이 대개의 경우 단순한 \'문제의 발견\'으로 그치지 않고 \'극복을 위한 싸움\'의 차원으로까지 밀고 올라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이 부근에 놓여 있었다. 민중의 개념을 사회의식의 기둥으로 삼게 된 결과로서 많은 작가들은 고립된 개인으로서의 무력감과 패배 의식을 극복하여 공동체 의식의 기초 위에 굳건히 몸을 세울 수 있었으며 역사와 민족을 보는 시각도 새롭게 심화시킬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식민지 시대 문학의 유산이 이 시대에 와서 비로소 청산될 단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을 낳게 한다. 누구나 알다시피 한국의 근대 문학을 크게 특징지어온 작가들의 도피주의와 허무주의는 대개의 지식인이 사회의 움직임과 유기적인 관련을 맺지 못하고 무력한 방관자로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식민지 시대의 상황에서 유래된 것이었으며 그 양상은 1950 년대를 거쳐 1960년대에 이르도록 별다른 변모를 부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에 이르러 보편화된 민중 중심의 시각은 작가들이 역사 형성의 드라마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넓은가를 뚜렷이 보여 주었고 그와 더불어 \"우리는 결코 외로운 구경꾼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 민중과 더불어 싸우는 주체적 참여자로 나서야 한다.\"라는 사명 의식을 뜨겁게 고취시켰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비로소 1970년대의 소설은 근대 문학 사상 처음으로 허무주의를 넘어선 창조의 공간을 풍요롭게 개척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이상의 발표를 간단하게 정리해보자. 1970년의 시대상은 상당한 산업화로 인해 민중의식이 고조되고 잇는 시기였다. 그와 맞물려 민중 문학이 표면화 되었다. 문학사는 시대적 민족주의적 경향이 강한 민족문학이 자리 잡게 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두 개의 작품 중 하나,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은 산업화로 인한 우리나라의 어두운 면을 그림으로써 민중의 연대의식으로 연결했다는 의의가 있는 작품이다. 두 번째, 조세희의 클라인 씨의 병은 사실주의의 획일성을 피하려는 실험정신이 강하게 드러나 있는 작품으로 문학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970년대 소설의 의의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허무주의를 넘어선 창조의 공간을 개척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 있다.
2-4. 1970년대 소설의 의의
1970년대의 한국 소설은 질·양 양면에서 괄목할 만한 결실을 이룩하였다. 내용면에서 그것이 남긴 성과는 농촌의 궁핍화에 대한 검토에서부터 6.25의 비극이 끼친 상흔의 극복에 이르기까지 실로 광범한 영역을 커버하는 것이었으며, 형식상으로도 단편 중심의 협소한 소설 공간을 깨뜨리고 본격적인 로망에로 지향해 가는 움직임을 뚜렷하게 나타냈던 것이다. 이 같은 소설 문학의 급성장은 이 기간 동안 숱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꺾일 줄을 모르고 줄기차게 이루어져 온 시민 의식의 전반적 성장과 호흡을 같이하는 것이었으며 동시에 한국 근대 문학의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가기 위한 고무적 출발이 되기도 하였다.
작가에 따라 다소의 편차를 드러내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말해서 1970년대의 소설은 삶의 공동 주체로서 \'민중\'이 지닌 가치와 힘에 대하여 깊은 신뢰를 보여 주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 시대의 소설이 대개의 경우 단순한 \'문제의 발견\'으로 그치지 않고 \'극복을 위한 싸움\'의 차원으로까지 밀고 올라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이 부근에 놓여 있었다. 민중의 개념을 사회의식의 기둥으로 삼게 된 결과로서 많은 작가들은 고립된 개인으로서의 무력감과 패배 의식을 극복하여 공동체 의식의 기초 위에 굳건히 몸을 세울 수 있었으며 역사와 민족을 보는 시각도 새롭게 심화시킬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식민지 시대 문학의 유산이 이 시대에 와서 비로소 청산될 단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을 낳게 한다. 누구나 알다시피 한국의 근대 문학을 크게 특징지어온 작가들의 도피주의와 허무주의는 대개의 지식인이 사회의 움직임과 유기적인 관련을 맺지 못하고 무력한 방관자로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식민지 시대의 상황에서 유래된 것이었으며 그 양상은 1950 년대를 거쳐 1960년대에 이르도록 별다른 변모를 부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에 이르러 보편화된 민중 중심의 시각은 작가들이 역사 형성의 드라마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넓은가를 뚜렷이 보여 주었고 그와 더불어 \"우리는 결코 외로운 구경꾼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 민중과 더불어 싸우는 주체적 참여자로 나서야 한다.\"라는 사명 의식을 뜨겁게 고취시켰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비로소 1970년대의 소설은 근대 문학 사상 처음으로 허무주의를 넘어선 창조의 공간을 풍요롭게 개척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이상의 발표를 간단하게 정리해보자. 1970년의 시대상은 상당한 산업화로 인해 민중의식이 고조되고 잇는 시기였다. 그와 맞물려 민중 문학이 표면화 되었다. 문학사는 시대적 민족주의적 경향이 강한 민족문학이 자리 잡게 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두 개의 작품 중 하나,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은 산업화로 인한 우리나라의 어두운 면을 그림으로써 민중의 연대의식으로 연결했다는 의의가 있는 작품이다. 두 번째, 조세희의 클라인 씨의 병은 사실주의의 획일성을 피하려는 실험정신이 강하게 드러나 있는 작품으로 문학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970년대 소설의 의의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허무주의를 넘어선 창조의 공간을 개척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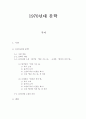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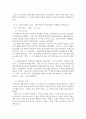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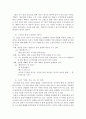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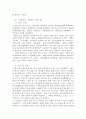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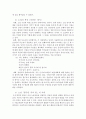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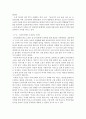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