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노계가집』의 간행과 판본
3. 고사본 『노계집』의 형성
4. 『노계선생문집』의 간행과 책판
5. 결론
2. 『노계가집』의 간행과 판본
3. 고사본 『노계집』의 형성
4. 『노계선생문집』의 간행과 책판
5. 결론
본문내용
계가집』의 간행 경위는 『노계선생문집』에 수록된 <莎堤曲>의 跋文을 통해 주로 설명되어 왔다.
사제곡은 어찌하여 지었을까? 옛 辛亥年 봄에 曾祖考 漢陰 相公이 퇴로하여 노계 박인로와 더불어 술회한 曲이다. 세대가 이미 멀어 이 곡이 전하지 않아 후세에 泯沒될까 마음속으로 걱정한 바가 오래였다. 不肖 孫 允文이 이 해 庚午年 봄에 영천 군수가 되어 갔으니 공은 곧 이 지방 사람이라. 그 곡이 지금까지 전하고 그 손자도 또한 생존하고 있었다. 公務가 끝난 뒤 달밤은 저녁에 그의 孫子 進善으로 하여금 노래부르게 하였더니 然히 이 후생이 龍津의 산수간에서 그 어른을 모신 듯하여 슬픈 회포가 더욱 북받히고 느꺼운 눈물이 절로 떨어지는도다. 陋巷詞와 단가 4장으로 더불어 각판에 부쳐 이를 널리 전하고자 한다. 때는 이 해 3월 3일이다. 「莎堤曲跋文」
김문기, 「松江 蘆溪 孤山의 歌集 板本 및 冊版 硏究」, 『국어교육연구』 21, 국어교육학회, 1989. p.21 에서 재인용.
이윤문은 “세대가 이미 멀어져서 이 노래가 전하지 못하고 후에 없어져 버릴까 두려워서 걱정”하던 중 영천 군수로 제수되어 <사제곡>이 당시까지 전해지고 있음을 알고 <사제곡>에 한음과 관련이 있는 작품들과 함께 판각하여 『노계가집』을 간행하였다.
이후 2000년대 경오본 『노계가집』이 발굴되어 이러한 전후의 사정을 더욱 분명하게 밝혀내게 되었다. 경오본 『노계가집』의 발문 역시 위 제시한 발문과 내용상 크게 다르지 않은데 『노계선생문집』에서 “陋巷詞와 단가 4장으로 더불어”로 서술된 부분이 “陋巷, 相思, 勸酒 3曲과 短歌 4章으로 더불어” 幷與陋巷相思勸酒三曲及短歌四章
김석배, 「<陋巷詞>의 文獻學的 考察」, 『문학과 언어』 제28집, 문학과언어학회, 2006, p.75 재인용.
로 표현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 즉, 1690년 『노계가집』이 편찬될 당시 책의 구성은 <사제곡>, <누항사>, <상사곡>, <권주가>의 가사 4작품과 소위 ‘早紅歌’로 일컫는 시조 4수가 수록되었던 것이다.
이후 2차 간행이 이루어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노계가집』의 2차 간행에 대한 추정의 주요 근거는 『청구영언』에 수록된 “幷與長歌三曲及短歌四章”이라는 발문의 내용 이 발문은 본래 <사제곡>의 발문이지만, 『청구영언』에서는 <早紅歌> 다음에 실려 있는데 경오본 『노계가집』에서 이 발문이 단가 4장 뒤에 위치하고 있어 김천택이 <조홍시가>의 발문으로 잘못 파악하고 이를 실은 듯 하다.
과 『노계선생문집』의 발문이 다르다는 점인데, 경오본 『노계가집』에 기록된 발문이 『청구영언』에 기록된 내용과 해당 부분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서 실제로 2차 간행이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물론 『노계선생문집』과 古寫本『노계집』 소재 歌辭의 次第가 『노계가집』과는 달라 『노계가집』이 2차 간행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는 『노계선생문집』을 편찬하며 의도적으로 변형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노계가집』의 2차간행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는 없다.
현재 발굴된 庚午本 『노계가집』은 앞서 말한 바대로 1690년 3월 경북 영천에서 간행한 14장 28면의 목판본으로 책의 크기는 31×21.7cm, 五針眼訂法의 線裝本이다. 표지는 菱花紋樣의 주황색 표지로 되어 있고, 표지의 왼쪽 상단부에 “永陽歷贈”, 오른쪽 하단부에는 “六宜堂”이 기록되어 있어며, 앞표지와 뒷표지 안쪽 면에 康熙 23년(숙종 10, 1684) 12월에 영천군수가 발행한 문건 여러 장이 배접되어 있다. 또한 四周單邊, 有界, 半葉匡廓 24.2×17.4cm, 半葉 10행, 1행 20자, 楷書體, 上下內向有紋黑魚尾, 版心題, 張次가 있다.
경오본 『노계가집』의 체제 김석배, 「庚午本 蘆溪歌集 硏究」, 『어문학』 91, 한국어문학회, 2006, pp.221-222 참조.
를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莎堤曲>
제1장 전면 1행 : 莎堤曲 萬曆辛亥春 漢陰大鑒命作此曲 莎堤勝地名 在龍津江 東距五里
許 大鑒江亭所在處也
제1장 전면 2행 : 어리고 拙 몸애 榮寵이 已極니 鞠躬盡悴야
제4장 전면 6행 : 髮애 아 줄 모도록 뫼셔 늘그리라
② <陋巷詞>
제4장 전면 7행 : 陋巷詞 漢陰大鑒命作
제4장 전면 8행 : 어리고 迂闊 이내 우희 던이 업다 吉凶禍福을
제7장 후면 6행 : 로 살련노라 (이하 4행 여백)
③ <相思曲>
제8장 전면 1행 : 相思曲 尙州令鑒命作
제8장 전면 2행 : 천지간 어 일이 대되 셜운게오 아마도 셜울
제11장 후면 8행 : 덜
사제곡은 어찌하여 지었을까? 옛 辛亥年 봄에 曾祖考 漢陰 相公이 퇴로하여 노계 박인로와 더불어 술회한 曲이다. 세대가 이미 멀어 이 곡이 전하지 않아 후세에 泯沒될까 마음속으로 걱정한 바가 오래였다. 不肖 孫 允文이 이 해 庚午年 봄에 영천 군수가 되어 갔으니 공은 곧 이 지방 사람이라. 그 곡이 지금까지 전하고 그 손자도 또한 생존하고 있었다. 公務가 끝난 뒤 달밤은 저녁에 그의 孫子 進善으로 하여금 노래부르게 하였더니 然히 이 후생이 龍津의 산수간에서 그 어른을 모신 듯하여 슬픈 회포가 더욱 북받히고 느꺼운 눈물이 절로 떨어지는도다. 陋巷詞와 단가 4장으로 더불어 각판에 부쳐 이를 널리 전하고자 한다. 때는 이 해 3월 3일이다. 「莎堤曲跋文」
김문기, 「松江 蘆溪 孤山의 歌集 板本 및 冊版 硏究」, 『국어교육연구』 21, 국어교육학회, 1989. p.21 에서 재인용.
이윤문은 “세대가 이미 멀어져서 이 노래가 전하지 못하고 후에 없어져 버릴까 두려워서 걱정”하던 중 영천 군수로 제수되어 <사제곡>이 당시까지 전해지고 있음을 알고 <사제곡>에 한음과 관련이 있는 작품들과 함께 판각하여 『노계가집』을 간행하였다.
이후 2000년대 경오본 『노계가집』이 발굴되어 이러한 전후의 사정을 더욱 분명하게 밝혀내게 되었다. 경오본 『노계가집』의 발문 역시 위 제시한 발문과 내용상 크게 다르지 않은데 『노계선생문집』에서 “陋巷詞와 단가 4장으로 더불어”로 서술된 부분이 “陋巷, 相思, 勸酒 3曲과 短歌 4章으로 더불어” 幷與陋巷相思勸酒三曲及短歌四章
김석배, 「<陋巷詞>의 文獻學的 考察」, 『문학과 언어』 제28집, 문학과언어학회, 2006, p.75 재인용.
로 표현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 즉, 1690년 『노계가집』이 편찬될 당시 책의 구성은 <사제곡>, <누항사>, <상사곡>, <권주가>의 가사 4작품과 소위 ‘早紅歌’로 일컫는 시조 4수가 수록되었던 것이다.
이후 2차 간행이 이루어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노계가집』의 2차 간행에 대한 추정의 주요 근거는 『청구영언』에 수록된 “幷與長歌三曲及短歌四章”이라는 발문의 내용 이 발문은 본래 <사제곡>의 발문이지만, 『청구영언』에서는 <早紅歌> 다음에 실려 있는데 경오본 『노계가집』에서 이 발문이 단가 4장 뒤에 위치하고 있어 김천택이 <조홍시가>의 발문으로 잘못 파악하고 이를 실은 듯 하다.
과 『노계선생문집』의 발문이 다르다는 점인데, 경오본 『노계가집』에 기록된 발문이 『청구영언』에 기록된 내용과 해당 부분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서 실제로 2차 간행이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물론 『노계선생문집』과 古寫本『노계집』 소재 歌辭의 次第가 『노계가집』과는 달라 『노계가집』이 2차 간행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는 『노계선생문집』을 편찬하며 의도적으로 변형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노계가집』의 2차간행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는 없다.
현재 발굴된 庚午本 『노계가집』은 앞서 말한 바대로 1690년 3월 경북 영천에서 간행한 14장 28면의 목판본으로 책의 크기는 31×21.7cm, 五針眼訂法의 線裝本이다. 표지는 菱花紋樣의 주황색 표지로 되어 있고, 표지의 왼쪽 상단부에 “永陽歷贈”, 오른쪽 하단부에는 “六宜堂”이 기록되어 있어며, 앞표지와 뒷표지 안쪽 면에 康熙 23년(숙종 10, 1684) 12월에 영천군수가 발행한 문건 여러 장이 배접되어 있다. 또한 四周單邊, 有界, 半葉匡廓 24.2×17.4cm, 半葉 10행, 1행 20자, 楷書體, 上下內向有紋黑魚尾, 版心題, 張次가 있다.
경오본 『노계가집』의 체제 김석배, 「庚午本 蘆溪歌集 硏究」, 『어문학』 91, 한국어문학회, 2006, pp.221-222 참조.
를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莎堤曲>
제1장 전면 1행 : 莎堤曲 萬曆辛亥春 漢陰大鑒命作此曲 莎堤勝地名 在龍津江 東距五里
許 大鑒江亭所在處也
제1장 전면 2행 : 어리고 拙 몸애 榮寵이 已極니 鞠躬盡悴야
제4장 전면 6행 : 髮애 아 줄 모도록 뫼셔 늘그리라
② <陋巷詞>
제4장 전면 7행 : 陋巷詞 漢陰大鑒命作
제4장 전면 8행 : 어리고 迂闊 이내 우희 던이 업다 吉凶禍福을
제7장 후면 6행 : 로 살련노라 (이하 4행 여백)
③ <相思曲>
제8장 전면 1행 : 相思曲 尙州令鑒命作
제8장 전면 2행 : 천지간 어 일이 대되 셜운게오 아마도 셜울
제11장 후면 8행 : 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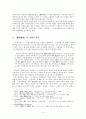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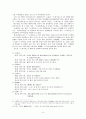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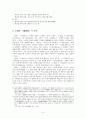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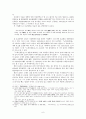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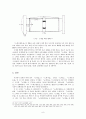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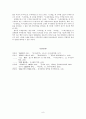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