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신교 수용 시기 지식인의 고민
2. 성산명경(聖山明鏡)에 나타난 탁사의 종교관
3. 만종일련(萬宗一連)에 나타난 탁사의 종교관
4. 만종일련에 나타난 최병헌의 천인관(天人觀)
5. 유학자 최병헌의 기독교 우월 사상
6. 첨언(添言)
2. 성산명경(聖山明鏡)에 나타난 탁사의 종교관
3. 만종일련(萬宗一連)에 나타난 탁사의 종교관
4. 만종일련에 나타난 최병헌의 천인관(天人觀)
5. 유학자 최병헌의 기독교 우월 사상
6. 첨언(添言)
본문내용
공경의 대상인 상제의 ‘은전과 약속, 천국과 영생의 이치’의 유무로 설명하였다. 여기서 언급하는 것들은 기독교의 인류 구원을 향한 일직선적 역사관에 근거한 것들이다. 물론 유가에는 그러한 역사관이 없다. 또한 유가에는 상제를 경외함은 있었을지라도, 죽음 이후의 운명에 대한 깊은 논의는 없다. 그리고 유가에 상제의 은전과 약속이 없지는 않지만, 기독교에서 설명하는 역사성을 띈 은전과 약속은 아니다. 또한 최병헌은 인류구원을 향한 일직선적 역사관의 핵심적인 요소를 ‘예수의 대속을 통한 구원의 리(理)’로 꼽았다. 상제가 인간의 모습을 띄고 이 땅에 출현하여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거쳐 인류의 죄를 구원해 주었다는 것은, 상제를 공경하는 인(人)의 감동이 더 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 두려움과 공경은 존경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 존경의 대상이 열등한 인을 위해 희생한다는 것이니 더 큰 감동의 요소 아니겠는가.
최병헌이 기독교가 유교보다 우월하다는 결정적인 근거로 제시한 것이 이처럼 유가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기독교의 상제의 구원을 향한 계획과 그것을 실현하는 역사성에 있다. 다시말해 기독교는 ‘궁극적 인간 구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형이상학적 이론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유가가 ‘인간구원’의 방식으로 제시한 것이 주로 격물치지(格物致知)를 통한 수양과 실천궁행(實踐躬行)이라는 매우 현실중심의 통로이고, 그런 통로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성인(聖人) 또는 대인(大人)이라는 목표점을 주었다. 기독교는 그 추구하는 목표가 천국에서 상제와 함께 동거하는 것이니, 이러한 구원의 결과물도 유가에 비해 그 차원이 다르다고 하겠다. 보다 정밀하고 명쾌한 형이상학적 설명방식, 인간의 구원과 종교의 역사성 등에 대한 정합적인 설명 등에서, 기독교는 유교보다 분명히 더 많은 종교성을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종교성의 유무를 통해 최병헌은 기독교의 우월성을 주장한 것이다.
6. 첨언(添言)
유교와 기독교는 최병헌이 생각하는 종교성의 측면에서 동일한 선상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둘은 상호간에 배타적 선택을 강요받는 경쟁적인 사상들이 애초에 아니다. 더 나아가자면 이 둘의 믿음은 큰 틀에서 양립 가능하다. 두 사상이 모두 언급하고 있는 상제에 대해 기독교는 좀 더 심화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배치되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며, 그렇기에 기독교인 최병헌은 유학의 지식을 저술과 연구에 활용하였다. 하지만 당시는 조선인들이 전통사상을 대표하는 유교와 신종교인 개신교 사이의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다. 두 종교의 양립 가능성과 배타적 선택의 시대적 요청이 최병헌으로 하여금 ‘성산명경’과 ‘만종일련’이라는 종교서를 저술하게끔 했는지도 모른다.
참고문헌
최익제 박사학위 논문, 한말 일제강점기 탁사 최병헌의 생애와 사상, 한국교원대학교, 2008
최병헌, 성산명경, 東洋書院, 1911
최병헌 저, 박혜선 역, ‘만종일련’, 성광문화사, 1985
심광섭, 탁사 최병헌의 유교적 기독교 신학, 신학사상 통권 122호 82p-109p, 2003
최병헌이 기독교가 유교보다 우월하다는 결정적인 근거로 제시한 것이 이처럼 유가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기독교의 상제의 구원을 향한 계획과 그것을 실현하는 역사성에 있다. 다시말해 기독교는 ‘궁극적 인간 구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형이상학적 이론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유가가 ‘인간구원’의 방식으로 제시한 것이 주로 격물치지(格物致知)를 통한 수양과 실천궁행(實踐躬行)이라는 매우 현실중심의 통로이고, 그런 통로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성인(聖人) 또는 대인(大人)이라는 목표점을 주었다. 기독교는 그 추구하는 목표가 천국에서 상제와 함께 동거하는 것이니, 이러한 구원의 결과물도 유가에 비해 그 차원이 다르다고 하겠다. 보다 정밀하고 명쾌한 형이상학적 설명방식, 인간의 구원과 종교의 역사성 등에 대한 정합적인 설명 등에서, 기독교는 유교보다 분명히 더 많은 종교성을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종교성의 유무를 통해 최병헌은 기독교의 우월성을 주장한 것이다.
6. 첨언(添言)
유교와 기독교는 최병헌이 생각하는 종교성의 측면에서 동일한 선상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둘은 상호간에 배타적 선택을 강요받는 경쟁적인 사상들이 애초에 아니다. 더 나아가자면 이 둘의 믿음은 큰 틀에서 양립 가능하다. 두 사상이 모두 언급하고 있는 상제에 대해 기독교는 좀 더 심화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배치되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며, 그렇기에 기독교인 최병헌은 유학의 지식을 저술과 연구에 활용하였다. 하지만 당시는 조선인들이 전통사상을 대표하는 유교와 신종교인 개신교 사이의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다. 두 종교의 양립 가능성과 배타적 선택의 시대적 요청이 최병헌으로 하여금 ‘성산명경’과 ‘만종일련’이라는 종교서를 저술하게끔 했는지도 모른다.
참고문헌
최익제 박사학위 논문, 한말 일제강점기 탁사 최병헌의 생애와 사상, 한국교원대학교, 2008
최병헌, 성산명경, 東洋書院, 1911
최병헌 저, 박혜선 역, ‘만종일련’, 성광문화사, 1985
심광섭, 탁사 최병헌의 유교적 기독교 신학, 신학사상 통권 122호 82p-109p,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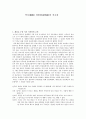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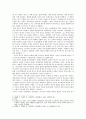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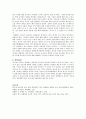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