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스마트 팜의 의미 및 비교
1. 스마트 팜의 정의
2. 스마트 농업과의 비교
Ⅱ. 스마트 팜 도입의 효과와 도입의 방해 요인
1. 스마트 팜 도입의 기대효과
2. 스마트 팜 도입의 방해 요인
Ⅲ. 스마트 팜 정착을 위한 대책 및 방안
Ⅳ. 참고문헌
1. 스마트 팜의 정의
2. 스마트 농업과의 비교
Ⅱ. 스마트 팜 도입의 효과와 도입의 방해 요인
1. 스마트 팜 도입의 기대효과
2. 스마트 팜 도입의 방해 요인
Ⅲ. 스마트 팜 정착을 위한 대책 및 방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격이 높게 설정되어 있고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ICT 등에 대한 이해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독립적이고 주도적으로 ICT 기술을 도입하고 장비를 구입하여 이를 통해 스마트 팜을 구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ICT 장비를 들여오고, 관련 지식을 쌓는 것 역시 투자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도입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생산 및 매출이 떨어지는 것은 필연적인 상황에서 스마트 팜의 도입을 단순히 개인이나 농가 수준에서 하도록 바라는 것은 너무 큰 욕심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보조금이 지급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매우 큰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ICT 설비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영세한 농가에 대한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사용되는 장비를 구매보다는 저리 임대를 통해 우선 생산성 향상을 기한 다음 그 후에 대여 자금을 회수하는 식의 방식으로 재정 부담은 극소화하면서도 지원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스마트 팜의 의미, 효과 등에 대한 홍보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 기본적으로 스마트 팜에 대한 필요성을 농가 스스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이해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이 이루어져야만 자발적인 스마트 팜 도입을 통해 스마트 팜이 가지는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농업 ICT 분야의 전문가와 SW 경쟁력의 제고이다. 스마트 팜은 단순히 ICT 기술이 적용된 장비를 도입하고 이를 설치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한국의 스마트 팜의 경우 많은 장비가 외국 제품의 의존하고 있으며 스마트 팜에 적용될 데이터베이스나 지식 역시 미흡한 실정이라 타국의 스마트 팜 도입 효과에 비해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요한 것은 농업 ICT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들을 통해 산출된 기술을 운영할 수 있는 SW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그저 양적으로 스마트 팜을 차용하는 농가 호수를 늘리는 양적 팽창의 방식은 비록 과거에 비해 보다 나은 생산량과 농가 현황을 만드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으나 이는 단기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며 보일 수 있는 효과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팜 기술 및 장비 개발을 위한 ICT 분야의 전문가 양성, 그리고 자체적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통해 스마트 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보다 극대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농업 ICT 분야의 전문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농업 발전에 관여할 수 있도록 농촌의 농가와 전문가들을 연계해주는 활동 역시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김관중, 허재두, 『스마트팜 기술동향 및 전망』, ETRI, 2015.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 팜 운영실태 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이투데이-농림축산식품부 공동기획, 「IT 만난 농업 스마트팜, 생산성 늘고 노동력 절감됐다.」, 2016.12.28
따라서 독립적이고 주도적으로 ICT 기술을 도입하고 장비를 구입하여 이를 통해 스마트 팜을 구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ICT 장비를 들여오고, 관련 지식을 쌓는 것 역시 투자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도입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생산 및 매출이 떨어지는 것은 필연적인 상황에서 스마트 팜의 도입을 단순히 개인이나 농가 수준에서 하도록 바라는 것은 너무 큰 욕심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보조금이 지급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매우 큰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ICT 설비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영세한 농가에 대한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사용되는 장비를 구매보다는 저리 임대를 통해 우선 생산성 향상을 기한 다음 그 후에 대여 자금을 회수하는 식의 방식으로 재정 부담은 극소화하면서도 지원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스마트 팜의 의미, 효과 등에 대한 홍보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 기본적으로 스마트 팜에 대한 필요성을 농가 스스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이해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이 이루어져야만 자발적인 스마트 팜 도입을 통해 스마트 팜이 가지는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농업 ICT 분야의 전문가와 SW 경쟁력의 제고이다. 스마트 팜은 단순히 ICT 기술이 적용된 장비를 도입하고 이를 설치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한국의 스마트 팜의 경우 많은 장비가 외국 제품의 의존하고 있으며 스마트 팜에 적용될 데이터베이스나 지식 역시 미흡한 실정이라 타국의 스마트 팜 도입 효과에 비해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요한 것은 농업 ICT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들을 통해 산출된 기술을 운영할 수 있는 SW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그저 양적으로 스마트 팜을 차용하는 농가 호수를 늘리는 양적 팽창의 방식은 비록 과거에 비해 보다 나은 생산량과 농가 현황을 만드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으나 이는 단기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며 보일 수 있는 효과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팜 기술 및 장비 개발을 위한 ICT 분야의 전문가 양성, 그리고 자체적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통해 스마트 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보다 극대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농업 ICT 분야의 전문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농업 발전에 관여할 수 있도록 농촌의 농가와 전문가들을 연계해주는 활동 역시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김관중, 허재두, 『스마트팜 기술동향 및 전망』, ETRI, 2015.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 팜 운영실태 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이투데이-농림축산식품부 공동기획, 「IT 만난 농업 스마트팜, 생산성 늘고 노동력 절감됐다.」, 2016.1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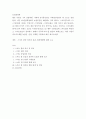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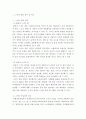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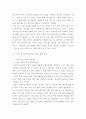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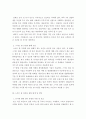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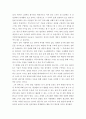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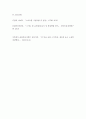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