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계사이다. 이절은 약 3백 년 전인 서기 1689년 숙종15년에 세워졌는데 이절의 원래의 이름은 精水庵으로 규모가 매우 작은 암자였다. 이 절을 세운 재미있는 사연이 전해지고 있다.
옛날 어느 스님이 길을 가다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현몽하기를 어느 우물에서 용 다섯 마리가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것이었다. 잠을 깨고 보니 참으로 이상한 꿈이었다. 스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가 꿈에서 본 장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났다. 튼 물위에 산이 있고 그 산중에는 우물이 있었다.
이때 스님은 생각하기를 ‘이는 필경 부처님께서 나로 하여금 중생을 계도할 도량을 만들라는 계시야’하고 그 장소를 찾아다녔다.
그는 이곳저곳을 찾아 헤메었는데 육지에선 그곳을 찾을 수가 없었고 얼마 후에 대부도 호아금산 기슭을 헤메다가 비로소 꿈의 자리를 발견하였다고 한다. 그는 이곳이 부처님\'께서 계시하신 곳이 틀림없다고 확신하고 이곳에 절을 세우기로 작정하고 건립기금조성에 나섰다. 그는 대부도 전역을 순회하며 공양미를 거두고 독지가의 찬조를 얻으려 노력하였으나 이 섬 주민들은 부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빈곤한 관계로 모금하는데 많은 고생을 하였다. 그 스님이 뜻을 세운지 수년, 드디어 그 정성에 감동해 기금이 모이기 시작하였고 오륙년 후 노력한 보람이 있어 작은 암자가 되었다.
이 절 옆에는 우물 하나가 있는데 이 우물이 바로 그 스님의 꿈에 나타난 우물로 용 다섯 마리가 승천한 곳이라고 하여 용정(龍井)이라 불렀으며 용들이 승천한 우물이 맑고 깨끗해서 정수암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후 이 절 부근에 내(川)가 둘이 있다 하여 쌍계사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렀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학생인 저도 이곳의 우물에서 한 바가지의 물을 마셔 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런 글을 쓸 줄을 몰랐다.
2) 인조임금과 대부도 처녀
대부도의 옆에는 조그만 풍도 섬이 있는데 인조 즉위 원년에 평안도의 \'이괄\'이 반란을 일으켜 남쪽으로 내려와 서울을 에워싸니 왕은 이 난을 피하여 한양을 떠나 대부도 근처의 남양에 이르러 배를 타고 풍도에 잠시 머물렀는데 그때 인조임금은 이섬에 머문 기념으로 은행나무를 두 그루 심고 이 섬을 떠나 대부도를 향하였다. 이후 360년이 지난 이 섬에 두 그루의 은행나무는 크게 잘 자라서 경기도의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데 학생인 제가 안산시청 녹지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보호수 관리를 위해서 풍도에 가 본적이 있다.
또한 1624년 인조반정 때 큰 공을 세운 무장 이괄은 논공생상 시에 자기 공에 비해 낮은 2등공신의 행상이 내려지자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때 대부도를 거쳐 풍도를 간 것이다. 인조임금이 대부도에 올라 우물에서 물을 먹으려 할 때 이 섬의 어느 처녀가 물을 긷고 있었다. 이 때 임금은 무심코 그 처녀를 보고 말하기를 \'네 손이 참으로 곱기도 하구나\' 하며 그 처녀의 한 손을 쓰다듬어 준 후 이 섬을 떠났다. 그 후 이 처녀는 임금님이 만지신 손이라 하여 한 손을 천으로 감고 남이 절대로 못 만지게 하였고 과년하도록 시집도 안가고 수절하였다. 훗날 난리가 평정된 뒤, 이 이야기를 들은 인조 임금은 이 처녀를 도성으로 불러 들여 일생을 편히 살게 해주었다고 전하고 있다.
3)왕주물
안산시 대부동 종현 마을에는 우물이 세 개가 있었다. 현재는 하나밖에 남아 있지 않지만 옛날에는 셋이 있어 이곳에서 아낙네들이 물을 긷고 빨래도 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큰 우물이 바로 왕주물이다.
조선왕조 시절, 어느 왕이 마침 이 근처를 지나다가 물을 마시고 싶어 했다. 수행하던 신하들이 좋은 물을 찾아 헤매자 김씨 할머니가 큰 우물물을 권했다. 신하가 그 물을 떠서 진상하자 왕은 \'참으로 맛이 있구나\' 하고 칭찬을 하였다. 왕은 덧붙여 \'아직까지 이렇게 시원한 물을 마셔 보기는 처음이구나\' 라고 하였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그때부터 그 큰 우물을 임금 \'왕(王)\'자에 주인 \'주(主)\'자를 곁들여 \'왕주물\'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후 왕주물에서 귀신을 보았다는 말이 이 마을에 널리 퍼졌는데 무서운 귀신이 나타난다는 것은 불길한 징조임이 틀림이 없다고 하여 마을사람들은 무당을 불러 굿을 하게 되었으며 결국 흉터가 되고 말았다고 한다. 그 후 왕주물 근처에는 사람들이 오지 않게 되었고 그 근처에는 상여독을 짓게 되었다. 상여독이란 죽은 사람을 실어다가 되가져 와 보관하는 곳으로 한자에 지나가도 소름이 끼쳤다고 하는데 마을 어른들은 어린이들이 왕주물에서 노는 것을 막았을 뿐더러 가까이 가지도 말라고 타이르고 하였는데 지금은 우물의 모습은 흔적이 없고 귀신에 대한 이야기만 무성하다고 한다.
4)탄도의 삼형제 바위
옛날 대부도 옆의 조그만 탄도 섬이 있었는데 금실 좋은 부부가 아들 삼형제를 두고 살았는데 어느 날 부부는 삼형제를 두고 갯벌로 일을 나가서 낙지 조개 등을 잡느라 시간가는 줄 모르고 갯일을 하는데 갑자기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해무(海霧)가 끼기 시작하여 부부는 갯벌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짐작되는 방향으로 아무리 걸어도 육지는 나오지 않고 갯벌에서 계속되는 헤매는 동안 바닷물이 들어와 부부는 결국 죽게 되어 두 개의 바위로 변하였다.
한편 집에서 부모를 기다리던 삼형제는 부모가 돌아오지 않자 산으로 올라가 바다를 그리며 부모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으나 부모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고 기다림에 지친 삼형제도 그곳에서 죽어 바위로 변하였다.
지금도 탄도에는 삼형제 바위가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며, 바다에는 부부가 삼형제 바위를 애절하게 바라보고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5)선감도 나룻배 사공
대부도의 주변에는 작은 여러 섬들이 흩어져 있는데 대부도 건너편 선감도를 가기위해서는 나룻배를를 애용해야 했다. 옛날에는 나룻배 사공이 많았지만 이 이야기는 박신태 뱃사공 이야기로부터 비롯된다.
박신태 사공은 그날그날 대부도와 선감도에서 잡은 어물이라든지 곡물 등을 실어다 주며 비교적 넉넉하게 살았다고 한다. 나룻배 삯으로 현물을 많이 받던 때라 집의 찬거리도 넉넉했고 특히 그는 술을 좋아했기 때문에 쉬는 때에는 거나하게 취하기 일쑤였는데 맛살조개를 잡은 아낙네는 맛을 주고, 굴을 따는 아주머니는 생굴을
옛날 어느 스님이 길을 가다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현몽하기를 어느 우물에서 용 다섯 마리가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것이었다. 잠을 깨고 보니 참으로 이상한 꿈이었다. 스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가 꿈에서 본 장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났다. 튼 물위에 산이 있고 그 산중에는 우물이 있었다.
이때 스님은 생각하기를 ‘이는 필경 부처님께서 나로 하여금 중생을 계도할 도량을 만들라는 계시야’하고 그 장소를 찾아다녔다.
그는 이곳저곳을 찾아 헤메었는데 육지에선 그곳을 찾을 수가 없었고 얼마 후에 대부도 호아금산 기슭을 헤메다가 비로소 꿈의 자리를 발견하였다고 한다. 그는 이곳이 부처님\'께서 계시하신 곳이 틀림없다고 확신하고 이곳에 절을 세우기로 작정하고 건립기금조성에 나섰다. 그는 대부도 전역을 순회하며 공양미를 거두고 독지가의 찬조를 얻으려 노력하였으나 이 섬 주민들은 부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빈곤한 관계로 모금하는데 많은 고생을 하였다. 그 스님이 뜻을 세운지 수년, 드디어 그 정성에 감동해 기금이 모이기 시작하였고 오륙년 후 노력한 보람이 있어 작은 암자가 되었다.
이 절 옆에는 우물 하나가 있는데 이 우물이 바로 그 스님의 꿈에 나타난 우물로 용 다섯 마리가 승천한 곳이라고 하여 용정(龍井)이라 불렀으며 용들이 승천한 우물이 맑고 깨끗해서 정수암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후 이 절 부근에 내(川)가 둘이 있다 하여 쌍계사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렀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학생인 저도 이곳의 우물에서 한 바가지의 물을 마셔 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런 글을 쓸 줄을 몰랐다.
2) 인조임금과 대부도 처녀
대부도의 옆에는 조그만 풍도 섬이 있는데 인조 즉위 원년에 평안도의 \'이괄\'이 반란을 일으켜 남쪽으로 내려와 서울을 에워싸니 왕은 이 난을 피하여 한양을 떠나 대부도 근처의 남양에 이르러 배를 타고 풍도에 잠시 머물렀는데 그때 인조임금은 이섬에 머문 기념으로 은행나무를 두 그루 심고 이 섬을 떠나 대부도를 향하였다. 이후 360년이 지난 이 섬에 두 그루의 은행나무는 크게 잘 자라서 경기도의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데 학생인 제가 안산시청 녹지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보호수 관리를 위해서 풍도에 가 본적이 있다.
또한 1624년 인조반정 때 큰 공을 세운 무장 이괄은 논공생상 시에 자기 공에 비해 낮은 2등공신의 행상이 내려지자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때 대부도를 거쳐 풍도를 간 것이다. 인조임금이 대부도에 올라 우물에서 물을 먹으려 할 때 이 섬의 어느 처녀가 물을 긷고 있었다. 이 때 임금은 무심코 그 처녀를 보고 말하기를 \'네 손이 참으로 곱기도 하구나\' 하며 그 처녀의 한 손을 쓰다듬어 준 후 이 섬을 떠났다. 그 후 이 처녀는 임금님이 만지신 손이라 하여 한 손을 천으로 감고 남이 절대로 못 만지게 하였고 과년하도록 시집도 안가고 수절하였다. 훗날 난리가 평정된 뒤, 이 이야기를 들은 인조 임금은 이 처녀를 도성으로 불러 들여 일생을 편히 살게 해주었다고 전하고 있다.
3)왕주물
안산시 대부동 종현 마을에는 우물이 세 개가 있었다. 현재는 하나밖에 남아 있지 않지만 옛날에는 셋이 있어 이곳에서 아낙네들이 물을 긷고 빨래도 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큰 우물이 바로 왕주물이다.
조선왕조 시절, 어느 왕이 마침 이 근처를 지나다가 물을 마시고 싶어 했다. 수행하던 신하들이 좋은 물을 찾아 헤매자 김씨 할머니가 큰 우물물을 권했다. 신하가 그 물을 떠서 진상하자 왕은 \'참으로 맛이 있구나\' 하고 칭찬을 하였다. 왕은 덧붙여 \'아직까지 이렇게 시원한 물을 마셔 보기는 처음이구나\' 라고 하였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그때부터 그 큰 우물을 임금 \'왕(王)\'자에 주인 \'주(主)\'자를 곁들여 \'왕주물\'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후 왕주물에서 귀신을 보았다는 말이 이 마을에 널리 퍼졌는데 무서운 귀신이 나타난다는 것은 불길한 징조임이 틀림이 없다고 하여 마을사람들은 무당을 불러 굿을 하게 되었으며 결국 흉터가 되고 말았다고 한다. 그 후 왕주물 근처에는 사람들이 오지 않게 되었고 그 근처에는 상여독을 짓게 되었다. 상여독이란 죽은 사람을 실어다가 되가져 와 보관하는 곳으로 한자에 지나가도 소름이 끼쳤다고 하는데 마을 어른들은 어린이들이 왕주물에서 노는 것을 막았을 뿐더러 가까이 가지도 말라고 타이르고 하였는데 지금은 우물의 모습은 흔적이 없고 귀신에 대한 이야기만 무성하다고 한다.
4)탄도의 삼형제 바위
옛날 대부도 옆의 조그만 탄도 섬이 있었는데 금실 좋은 부부가 아들 삼형제를 두고 살았는데 어느 날 부부는 삼형제를 두고 갯벌로 일을 나가서 낙지 조개 등을 잡느라 시간가는 줄 모르고 갯일을 하는데 갑자기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해무(海霧)가 끼기 시작하여 부부는 갯벌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짐작되는 방향으로 아무리 걸어도 육지는 나오지 않고 갯벌에서 계속되는 헤매는 동안 바닷물이 들어와 부부는 결국 죽게 되어 두 개의 바위로 변하였다.
한편 집에서 부모를 기다리던 삼형제는 부모가 돌아오지 않자 산으로 올라가 바다를 그리며 부모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으나 부모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고 기다림에 지친 삼형제도 그곳에서 죽어 바위로 변하였다.
지금도 탄도에는 삼형제 바위가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며, 바다에는 부부가 삼형제 바위를 애절하게 바라보고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5)선감도 나룻배 사공
대부도의 주변에는 작은 여러 섬들이 흩어져 있는데 대부도 건너편 선감도를 가기위해서는 나룻배를를 애용해야 했다. 옛날에는 나룻배 사공이 많았지만 이 이야기는 박신태 뱃사공 이야기로부터 비롯된다.
박신태 사공은 그날그날 대부도와 선감도에서 잡은 어물이라든지 곡물 등을 실어다 주며 비교적 넉넉하게 살았다고 한다. 나룻배 삯으로 현물을 많이 받던 때라 집의 찬거리도 넉넉했고 특히 그는 술을 좋아했기 때문에 쉬는 때에는 거나하게 취하기 일쑤였는데 맛살조개를 잡은 아낙네는 맛을 주고, 굴을 따는 아주머니는 생굴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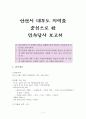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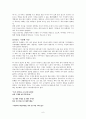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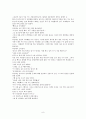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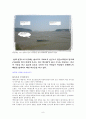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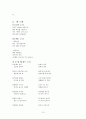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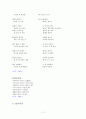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