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본문내용
려 있으며 《악장가사》《악학궤범》《시용향악보》에 국한문으로 전한다.
4) 窮獸奔
①형식- 한시체
②내용- 궁수분은 경신추(庚申秋)의 사건을 배경으로 한 것인데, “경신년 가을에 우리 태조는 왜적을 지리산에서 만나 싸워 크게 이기니 왜적을 이로부터 감히 육지에 올라 소란을 부리지 못하여 백성들이 편안하였다.” 《삼봉집》 권2 악장 궁수분조
라고 하여 나라를 구하고 민심을 크게 얻은 것을 기록하고 있다. 삼국유사 권2의 기록에 따르면 신라의 문무왕은 그의 유언대로 대왕암에 水葬했는데, 그는 죽어서도 護國大龍이 되어 불법을 수호하고 왜구를 무찌르겠다고 했으니, 백성들의 왜구에 대한 근심을 없애준 태조의 공은 지대한 것이었다.
③출전- 《악학궤범》과 《악장가사》에 전한다.
5) 靖東方曲
①형식- 형식은 6언시체(六言詩體)의 한시에 토를 단 형태로, 《대악후보》에 의하면 3·2·3·3·2·3의 16정간(井間) 6대강(大綱)에 6행강(行綱)으로 되어 있고, 장구와 박(拍)을 위한 악보와 함께 총보(總譜)로 되어 있으며, 악조는 평조이다. 전 5장으로 되어있다.
②내용- 유명한 위화도 회군을 합리화한 것으로 제작 동기를 “무진년(1388)봄에 우가 군사를 크게 일으켜 요동을 공격하자 우리 태조는 우군장으로 여러 장수들을 효유하여 의로써 회군하였다 《삼봉집》 권2 악장 정동방곡조
라고 기록하고 있다. 궁수분곡과 납씨가와 함께 무공곡에 속하며 우왕(禑王)이 랴오둥[遼東]을 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키자 이성계가 <4불가론>을 내세워 회군한 일에 대해 동북면의 백성들과 여진족들이 기뻐하며 밤낮으로 몰려와 칭송을 하였다는 내용의 노래이다. 태조의 사당인 문소전(文昭殿)에서 제사를 지낼 때와 회례연(會禮宴)에서 쓰였는데, 오늘날에는 당피리를 중심으로 한 관현악곡으로 연주되고 있다. 고려 속악과 조선 초기 악가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③출전-《태조실록》 《세종실록》 《악학궤범》 《악장가사》 등에 실려 전한다.
6) 文德曲
①형식-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7언 절구 한시체이다. 매 장의 끝 2구는 후렴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②내용- 조선 왕조의 통치이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③출전- 《태조실록》권4 태조2년 7월조와 《삼봉집》에 한시가 전하며, 《악학궤범》에는 현토된 가사가 전한다.
④압운- 제1장과 2장은 상평성(上平聲) 동운(東韻)을 취하고 있다. 제3장은 하평성(下平聲) 우운(尤韻)을, 제4장은 입성(入聲) 통운(通韻)을 취하고 있다. 즉, 절구운(絶句韻)이 아니라 각 장 매구운(每句韻)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문덕곡은 압운과 평측으로 볼 때는 칠언 절구가 아니라 칠언 고시 내지는 칠언 단시이다. 또한 매구운으로 쓴 것으로 보아 당초부터 의도적으로 지어진 노래의 가사임을 알 수 있다.
1장 開言路
태조가 민정을 파악하고자 언로를 크게 열고 널리 여론을 청취함으로써 그 덕이 순(舜)임금과 같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후렴구에 보면 순임금과 동등한 덕을 찬미하는 내용이 있으나, 이것은 신하로서 임금에 대한 형식적인 예우의 문제이거나 자긍의식의 발로일 뿐, 아유(阿諛)로만 비판할 것은 아니다. 윗사람에게 바쳐지는 것은 예를 갖추어 자신의 의도를 은근히 표현하는 것이니, 이것이 곧 신하의 간쟁(諫諍)이다.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순임금도 걸주(桀紂)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이면에 숨겨져 있다. 이렇듯 후렴구는 반복하여 음악의 절주에 맞춤으로써 경계지사(敬戒之詞)의 의미를 지닌다.
2장 保功臣
힘을 다하여 조선 창업에 공을 세운 신하들을 잘 보살피는 무궁한 덕을 읊었다. 임금과 신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정관정요(貞觀政要)에 “군신은 본래 치란을 같이 하며, 안위를 함께 하는 것이다. 만약 임금이 충간을 받아들이면 신하는 나아가 직언을 한다. 이런 까닭으로 군신의 계합이 예로부터 소중한 것이다. 만약 임금이 스스로 현명하다 해도, 신하가 바른 정치를 구하지 못한다면 위태롭고, 망하지 않으려고 해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임금이 나라를 잃으면 신하 또한 능히 홀로 그 집안을 온전히 할 수 없을 것이다.” 徐兢 정관정요 권제3,
라고 하여 명량상우(明良相遇) 의 바람직한 의미를 부연한 바 있다. 임금을 성군으로 이끄는 책임은 결국 신하에게 있고 그 다음이 지인처사(知人處事) 임을 말한다.
3장 正經界
전제 개혁을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부국강병의 정책을 통해 국가의 역량을 집중해서 태평성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앙집권적인 제도의 개혁과 과전법의 실시, 사병(私兵)의 혁파 등은 국가의 역량을 한데 모아 나라를 부국강병의 반석 위에 올려놓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4장 定禮樂
예악을 제정하는 것은 창업의 기본이자 만대의 기틀임을 강조하고 있다. 왕조 창업은 새로운 천명을 전제로 한다. 천명이란 선하지 못한 것을 선한 것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통치의 주체를 하늘의 명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역대의 제왕들은 음악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왔고, 이는 곧 민심을 파악하여 정치의 득실을 상고하는 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봉건시대의 기본질서인 예와 아울러 운용질서로서의 악의 실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7) 進時口號 退時口號
①형식- 한시체
②내용- 궁중무용 呈才時의 처음과 끝에 사용되는 치어는 임금에 대한 축수의 의미를 지닌다. 몽금척, 수보록과 통용한다는 진시구호와 퇴시구호에도 겉으로는 임금의 성덕에 대한 찬미를 드러내고 있으나, 이면에는 경계지심을 항상 지녀야 한다는 신하로서의 주문이 깔려 있다.
8) 夢金尺中腔詞
①형식- 한시체
②내용- 몽금척중의 강사를 보면 태평성대의 자취가 엿보이고 있다. 조선왕조를 설계하고 이념의 틀을 제시한 정도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태평성대를 여는데 있었던 것이다.
9) 新都歌
한시로는 전하지 않고 유일하게 국문악장으로만 전한다
녜 양쥬(楊州) 올히여
디위예 신도형승(新都形勝) 이샷다
국셩왕(開國聖王)이 이 셩(聖代)를 니르어샷다
잣다온뎌 당금경(當今景)잣다온뎌
셩슈만년(聖壽萬年)샤 만민(萬民)의 함락(咸樂)이샷다
아으 다롱다리
알 한강슈(漢江水)여 뒤흔 삼각산(三角山)이여
4) 窮獸奔
①형식- 한시체
②내용- 궁수분은 경신추(庚申秋)의 사건을 배경으로 한 것인데, “경신년 가을에 우리 태조는 왜적을 지리산에서 만나 싸워 크게 이기니 왜적을 이로부터 감히 육지에 올라 소란을 부리지 못하여 백성들이 편안하였다.” 《삼봉집》 권2 악장 궁수분조
라고 하여 나라를 구하고 민심을 크게 얻은 것을 기록하고 있다. 삼국유사 권2의 기록에 따르면 신라의 문무왕은 그의 유언대로 대왕암에 水葬했는데, 그는 죽어서도 護國大龍이 되어 불법을 수호하고 왜구를 무찌르겠다고 했으니, 백성들의 왜구에 대한 근심을 없애준 태조의 공은 지대한 것이었다.
③출전- 《악학궤범》과 《악장가사》에 전한다.
5) 靖東方曲
①형식- 형식은 6언시체(六言詩體)의 한시에 토를 단 형태로, 《대악후보》에 의하면 3·2·3·3·2·3의 16정간(井間) 6대강(大綱)에 6행강(行綱)으로 되어 있고, 장구와 박(拍)을 위한 악보와 함께 총보(總譜)로 되어 있으며, 악조는 평조이다. 전 5장으로 되어있다.
②내용- 유명한 위화도 회군을 합리화한 것으로 제작 동기를 “무진년(1388)봄에 우가 군사를 크게 일으켜 요동을 공격하자 우리 태조는 우군장으로 여러 장수들을 효유하여 의로써 회군하였다 《삼봉집》 권2 악장 정동방곡조
라고 기록하고 있다. 궁수분곡과 납씨가와 함께 무공곡에 속하며 우왕(禑王)이 랴오둥[遼東]을 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키자 이성계가 <4불가론>을 내세워 회군한 일에 대해 동북면의 백성들과 여진족들이 기뻐하며 밤낮으로 몰려와 칭송을 하였다는 내용의 노래이다. 태조의 사당인 문소전(文昭殿)에서 제사를 지낼 때와 회례연(會禮宴)에서 쓰였는데, 오늘날에는 당피리를 중심으로 한 관현악곡으로 연주되고 있다. 고려 속악과 조선 초기 악가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③출전-《태조실록》 《세종실록》 《악학궤범》 《악장가사》 등에 실려 전한다.
6) 文德曲
①형식-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7언 절구 한시체이다. 매 장의 끝 2구는 후렴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②내용- 조선 왕조의 통치이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③출전- 《태조실록》권4 태조2년 7월조와 《삼봉집》에 한시가 전하며, 《악학궤범》에는 현토된 가사가 전한다.
④압운- 제1장과 2장은 상평성(上平聲) 동운(東韻)을 취하고 있다. 제3장은 하평성(下平聲) 우운(尤韻)을, 제4장은 입성(入聲) 통운(通韻)을 취하고 있다. 즉, 절구운(絶句韻)이 아니라 각 장 매구운(每句韻)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문덕곡은 압운과 평측으로 볼 때는 칠언 절구가 아니라 칠언 고시 내지는 칠언 단시이다. 또한 매구운으로 쓴 것으로 보아 당초부터 의도적으로 지어진 노래의 가사임을 알 수 있다.
1장 開言路
태조가 민정을 파악하고자 언로를 크게 열고 널리 여론을 청취함으로써 그 덕이 순(舜)임금과 같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후렴구에 보면 순임금과 동등한 덕을 찬미하는 내용이 있으나, 이것은 신하로서 임금에 대한 형식적인 예우의 문제이거나 자긍의식의 발로일 뿐, 아유(阿諛)로만 비판할 것은 아니다. 윗사람에게 바쳐지는 것은 예를 갖추어 자신의 의도를 은근히 표현하는 것이니, 이것이 곧 신하의 간쟁(諫諍)이다.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순임금도 걸주(桀紂)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이면에 숨겨져 있다. 이렇듯 후렴구는 반복하여 음악의 절주에 맞춤으로써 경계지사(敬戒之詞)의 의미를 지닌다.
2장 保功臣
힘을 다하여 조선 창업에 공을 세운 신하들을 잘 보살피는 무궁한 덕을 읊었다. 임금과 신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정관정요(貞觀政要)에 “군신은 본래 치란을 같이 하며, 안위를 함께 하는 것이다. 만약 임금이 충간을 받아들이면 신하는 나아가 직언을 한다. 이런 까닭으로 군신의 계합이 예로부터 소중한 것이다. 만약 임금이 스스로 현명하다 해도, 신하가 바른 정치를 구하지 못한다면 위태롭고, 망하지 않으려고 해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임금이 나라를 잃으면 신하 또한 능히 홀로 그 집안을 온전히 할 수 없을 것이다.” 徐兢 정관정요 권제3,
라고 하여 명량상우(明良相遇) 의 바람직한 의미를 부연한 바 있다. 임금을 성군으로 이끄는 책임은 결국 신하에게 있고 그 다음이 지인처사(知人處事) 임을 말한다.
3장 正經界
전제 개혁을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부국강병의 정책을 통해 국가의 역량을 집중해서 태평성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앙집권적인 제도의 개혁과 과전법의 실시, 사병(私兵)의 혁파 등은 국가의 역량을 한데 모아 나라를 부국강병의 반석 위에 올려놓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4장 定禮樂
예악을 제정하는 것은 창업의 기본이자 만대의 기틀임을 강조하고 있다. 왕조 창업은 새로운 천명을 전제로 한다. 천명이란 선하지 못한 것을 선한 것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통치의 주체를 하늘의 명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역대의 제왕들은 음악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왔고, 이는 곧 민심을 파악하여 정치의 득실을 상고하는 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봉건시대의 기본질서인 예와 아울러 운용질서로서의 악의 실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7) 進時口號 退時口號
①형식- 한시체
②내용- 궁중무용 呈才時의 처음과 끝에 사용되는 치어는 임금에 대한 축수의 의미를 지닌다. 몽금척, 수보록과 통용한다는 진시구호와 퇴시구호에도 겉으로는 임금의 성덕에 대한 찬미를 드러내고 있으나, 이면에는 경계지심을 항상 지녀야 한다는 신하로서의 주문이 깔려 있다.
8) 夢金尺中腔詞
①형식- 한시체
②내용- 몽금척중의 강사를 보면 태평성대의 자취가 엿보이고 있다. 조선왕조를 설계하고 이념의 틀을 제시한 정도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태평성대를 여는데 있었던 것이다.
9) 新都歌
한시로는 전하지 않고 유일하게 국문악장으로만 전한다
녜 양쥬(楊州) 올히여
디위예 신도형승(新都形勝) 이샷다
국셩왕(開國聖王)이 이 셩(聖代)를 니르어샷다
잣다온뎌 당금경(當今景)잣다온뎌
셩슈만년(聖壽萬年)샤 만민(萬民)의 함락(咸樂)이샷다
아으 다롱다리
알 한강슈(漢江水)여 뒤흔 삼각산(三角山)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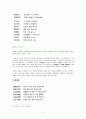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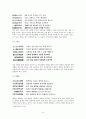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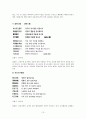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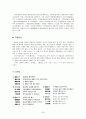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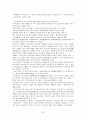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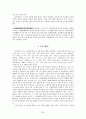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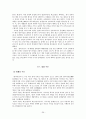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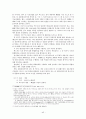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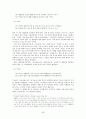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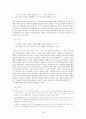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