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일본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강화 전략의 배경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신흥시장의 부상
가. 급속한 아시아 신흥시장의 경제성장
나. 아시아 신흥국의 인프라 수요
다. 아시아 신흥국의 중간 소득층 확대
라.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아시아 지역의 중요성 확대
2. 일본 내수시장의 한계
제2장 일본정부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
1. 신성장전략상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
2. 인프라 수출 전략
가. 일본정부의 인프라 수출 전략
나. 주요 분야별 추진 성과
3. BOP 비즈니스 지원 정책
가. BOP 비즈니스의 개념과 실제 사례
나. 일본정부의 BOP 비즈니스 지원 정책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신흥시장의 부상
가. 급속한 아시아 신흥시장의 경제성장
나. 아시아 신흥국의 인프라 수요
다. 아시아 신흥국의 중간 소득층 확대
라.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아시아 지역의 중요성 확대
2. 일본 내수시장의 한계
제2장 일본정부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
1. 신성장전략상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
2. 인프라 수출 전략
가. 일본정부의 인프라 수출 전략
나. 주요 분야별 추진 성과
3. BOP 비즈니스 지원 정책
가. BOP 비즈니스의 개념과 실제 사례
나. 일본정부의 BOP 비즈니스 지원 정책
본문내용
지출이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 신흥국의 중산층 증가, 이에 따른 내구소비재 시장 확대는 당연한 흐름일 것이다.
그림 5 아시아 신흥국의 서비스 소비지출 전망 [産業省(2010e) 에서 재인용]
<서비스 소비지출액(조 달러)> <서비스 소비지출/가계 지출비중(%)>
라.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아시아 지역의 중요성 확대
일본정부가 아시아 경제권과 기타 신흥국에 주목하는 또 다른 배경은 자국 기업이 이들 지역에 직접투자를 통해 진출하는 것이 일본경제의 성장에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1985년의 플라자 합의를 계기로 본격화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우선 1980년대 말까지 나타난 주요 특징은 1980년대 이전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던 개도국, 특히 동남아시아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미국와 유럽의 비중이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1951~80년간 직접투자 누적액은 동남아시아 26.9%, 중남미 17%로 이들 개도국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으나, 1980년대 후반에는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유럽의 비중이 합계 70%대로 급증하였다. 이처럼 당시 일본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북미와 유럽 같은 선진국에 집중되었던 것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1980년대 일본경제의 버블을 배경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나 M&A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1990년대에는 일본기업들이 플라자 합의 이후의 엔고, 일본 국내 임금상승, 물가상승 등의 원인으로 동아시아 지역을 대일(對日) 혹은 대미(對美) 공급기지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다는 특징을 지닌다. 중국이나 ASEAN 국가들의 외자도입 규제완화 역시 일본기업의 직접투자를 가속화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아시아 역내에서 일본기업의 국제분업 형성을 촉진하였고, 나아가 일본기업이 자국 내에 축적한 생산관리시스템을 동아시아에 이전하게 되는 흐름으로 연결되었다.
그림 6 일본의 주요 해외지역별 수출액 추이 [財務省、『貿易計』각년도]
일본의 아시아지역에 대한 투자 비중 증가는 우선 일본기업의 해외 지역별 현지법인수의 추이에서 알 수 있다. 지역별로 보았을 때, 일본기업의 현지법인은 이미 1990년대부터 미국과 캐나다의 북미지역보다 아시아지역에 더 많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02년 이후에는 아시아지역의 현지법인 증가각 매우 현저하였다. 앞서 지적한 일본기업의 아시아 지역에서의 국제분업이 이때부터 가속화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7 일본기업의 해외지역별 현지법인 수 추이 [産業省、『海外事業活動基本調査』각년도]
물론 일본기업의 현지법인 추이만으로는 일본기업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를 중시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외지역국가별 매출액 추이와 직접투자 수익률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기업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현지법인 수는 2000년대 들어 급증하였으나 아시아 지역에서의 매출액 규모가 북미지역을 추월한 시점은 2006년부터이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2008년 초반부터 2009년 중반에 걸쳐 세계전체의 해외 현지법인 매출액 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급감하는 가운데, 이 시기에는 아시아 지역의 매출액도 감소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2009년 2/4분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의 회복과 아시아 신흥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북미나 유럽지역을 훨씬 능가하는 속도로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기업들이 아시아 시장을 중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림 8 일본기업의 해외지역별 현지법인 매출액 추이 [産業省、『海外事業活動基本調査』각년도]
그림 9 일본기업의 해외지역별 현지법인 경상이익 추이 [産業省、『海外現地法人四半期調査』]
2. 일본 내수시장의 한계
일본경제의 침체에 따라 얼마나 내수시장에 한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1980년도 이후 명목 GDP와 가계소비 추이를 분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명목GDP 규모는 1997년 2/4분기의 약 518조 엔을 정점으로, 2003년부터 경제위기 직전인 2007년까지는 경제성장결과 약간 회복되었으나 2010년 말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477조 엔까지 하락하였다. 1990년 이후 실질경제성장률 역시 1980년 대의 평균 5%대보다 훨씬 낮은 1~2%의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그림 10 일본의 경제성장 추이 [閣府 『民計算』]
일본경제가 장기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수출확대와 내수활성화가 모두 중요하지만, 내수확대에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 근거는 기본적으로 일본은 인구감소와 저출산고령화라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의 전체인구는 이미 2004년에 감소 추이로 돌아섰고, 나아가 이러한 인구감소 추세 못지 않게 인구 고령화는 내수확대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제3장 일본정부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
1. 신성장전략상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
1980년대 한때 일본 경제는 1인당 GDP가 미국을 추월하는 등 경제대국으로서의 위상이 최고조에 달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버블붕괴로 그 위상은 추락하였고, 2000년대 들어서는 장기불황이 2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일본정부는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신흥국을 중시하는 정책과 전략을 통한 국가재건을 강조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은 2009년 5월 당시 자민당 아소(麻生太) 내각이 발표한 ‘아시아 경제배증계획’에 처음 등장하였다. ‘아시아 경제배증계획’이란, 1960년 당시 이케다(池田勇人) 내각이 수립한 장기경제계획인 ‘소득배증계획’을 본따, 2020년까지 아시아의 경제규모를 2배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일본정부는 최대 2조엔의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하여 아시아 국가들의 인프라 건설, 재해대응 능력 향상, 식품에너지 안전 측면의 인재육성, 지혁협력, 무역투자 촉진 등을 지원한다는 발상이다. 바꿔 말하면, 아시아 지역에서 볼륨 존이 급속히 성장하면 공산품이나 주택, 서비스 분야에서 거대한 시장이 형성
그림 5 아시아 신흥국의 서비스 소비지출 전망 [産業省(2010e) 에서 재인용]
<서비스 소비지출액(조 달러)> <서비스 소비지출/가계 지출비중(%)>
라.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아시아 지역의 중요성 확대
일본정부가 아시아 경제권과 기타 신흥국에 주목하는 또 다른 배경은 자국 기업이 이들 지역에 직접투자를 통해 진출하는 것이 일본경제의 성장에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1985년의 플라자 합의를 계기로 본격화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우선 1980년대 말까지 나타난 주요 특징은 1980년대 이전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던 개도국, 특히 동남아시아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미국와 유럽의 비중이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1951~80년간 직접투자 누적액은 동남아시아 26.9%, 중남미 17%로 이들 개도국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으나, 1980년대 후반에는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유럽의 비중이 합계 70%대로 급증하였다. 이처럼 당시 일본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북미와 유럽 같은 선진국에 집중되었던 것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1980년대 일본경제의 버블을 배경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나 M&A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1990년대에는 일본기업들이 플라자 합의 이후의 엔고, 일본 국내 임금상승, 물가상승 등의 원인으로 동아시아 지역을 대일(對日) 혹은 대미(對美) 공급기지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다는 특징을 지닌다. 중국이나 ASEAN 국가들의 외자도입 규제완화 역시 일본기업의 직접투자를 가속화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아시아 역내에서 일본기업의 국제분업 형성을 촉진하였고, 나아가 일본기업이 자국 내에 축적한 생산관리시스템을 동아시아에 이전하게 되는 흐름으로 연결되었다.
그림 6 일본의 주요 해외지역별 수출액 추이 [財務省、『貿易計』각년도]
일본의 아시아지역에 대한 투자 비중 증가는 우선 일본기업의 해외 지역별 현지법인수의 추이에서 알 수 있다. 지역별로 보았을 때, 일본기업의 현지법인은 이미 1990년대부터 미국과 캐나다의 북미지역보다 아시아지역에 더 많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02년 이후에는 아시아지역의 현지법인 증가각 매우 현저하였다. 앞서 지적한 일본기업의 아시아 지역에서의 국제분업이 이때부터 가속화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7 일본기업의 해외지역별 현지법인 수 추이 [産業省、『海外事業活動基本調査』각년도]
물론 일본기업의 현지법인 추이만으로는 일본기업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를 중시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외지역국가별 매출액 추이와 직접투자 수익률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기업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현지법인 수는 2000년대 들어 급증하였으나 아시아 지역에서의 매출액 규모가 북미지역을 추월한 시점은 2006년부터이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2008년 초반부터 2009년 중반에 걸쳐 세계전체의 해외 현지법인 매출액 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급감하는 가운데, 이 시기에는 아시아 지역의 매출액도 감소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2009년 2/4분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의 회복과 아시아 신흥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북미나 유럽지역을 훨씬 능가하는 속도로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기업들이 아시아 시장을 중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림 8 일본기업의 해외지역별 현지법인 매출액 추이 [産業省、『海外事業活動基本調査』각년도]
그림 9 일본기업의 해외지역별 현지법인 경상이익 추이 [産業省、『海外現地法人四半期調査』]
2. 일본 내수시장의 한계
일본경제의 침체에 따라 얼마나 내수시장에 한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1980년도 이후 명목 GDP와 가계소비 추이를 분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명목GDP 규모는 1997년 2/4분기의 약 518조 엔을 정점으로, 2003년부터 경제위기 직전인 2007년까지는 경제성장결과 약간 회복되었으나 2010년 말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477조 엔까지 하락하였다. 1990년 이후 실질경제성장률 역시 1980년 대의 평균 5%대보다 훨씬 낮은 1~2%의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그림 10 일본의 경제성장 추이 [閣府 『民計算』]
일본경제가 장기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수출확대와 내수활성화가 모두 중요하지만, 내수확대에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 근거는 기본적으로 일본은 인구감소와 저출산고령화라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의 전체인구는 이미 2004년에 감소 추이로 돌아섰고, 나아가 이러한 인구감소 추세 못지 않게 인구 고령화는 내수확대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제3장 일본정부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
1. 신성장전략상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
1980년대 한때 일본 경제는 1인당 GDP가 미국을 추월하는 등 경제대국으로서의 위상이 최고조에 달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버블붕괴로 그 위상은 추락하였고, 2000년대 들어서는 장기불황이 2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일본정부는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신흥국을 중시하는 정책과 전략을 통한 국가재건을 강조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은 2009년 5월 당시 자민당 아소(麻生太) 내각이 발표한 ‘아시아 경제배증계획’에 처음 등장하였다. ‘아시아 경제배증계획’이란, 1960년 당시 이케다(池田勇人) 내각이 수립한 장기경제계획인 ‘소득배증계획’을 본따, 2020년까지 아시아의 경제규모를 2배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일본정부는 최대 2조엔의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하여 아시아 국가들의 인프라 건설, 재해대응 능력 향상, 식품에너지 안전 측면의 인재육성, 지혁협력, 무역투자 촉진 등을 지원한다는 발상이다. 바꿔 말하면, 아시아 지역에서 볼륨 존이 급속히 성장하면 공산품이나 주택, 서비스 분야에서 거대한 시장이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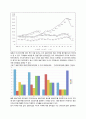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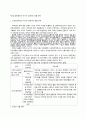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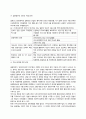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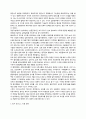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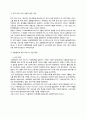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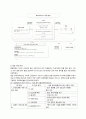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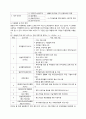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