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촬영하여 오래된 사진인 듯한 효과를 주면서 이미 본 듯한 느낌을 준다.
4) 사진 전체를 과도하게 밝게 하여 사진 속 대상들의 깊이를 사라지게 함으로써 특별한 효과를 얻는다.
아날로그 사진작가들은 이제 사진과 피사체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자 한다. 그 방법은 컴퓨터 그래픽 효과를 차용하는 것이다. 위의 방법들은 모두 아날로그 사진기가 디지털 사진의 미학적 효과를 얻기 위한 전략이다. 이들 작품은 익숙한 현실에 대하여 ‘낯설게 하기’ 효과를 드러낸다. 이 낯선 느낌은 디지털의 근원, 즉 피사체가 존재하지 않는 그 허구성에서 오는 것이다.
모든 뉴미디어는 처음에 올드 미디어를 흉내 냄으로서 수용되지만 결국 자신의 강력한 정체성을 갖게 되면 이 관계는 오히려 역전된다. 회화와 카메라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의 관계가 그러하다. 초기 사진은 세계의 실제에 대한 객관적 재현의 추구에서, 해독 가능한 작가의 관념의 텍스트로 진화했다. 80년대 들어오면서 사진은 더 이상 현실의 재현도 해석해야만 하는 텍스트도 아니다. 카메라와 피사체 사이에 존재하는 것은 단순히 반사광과 감광 물질 사이의 광학적, 화학적 인과관계 뿐이다. 사진은 모방의 의도가 전혀 없는 빛 자체의 물질효과로 그 본성상 지표기호가 된다. 이렇게 해서 사진은 실재의 거울, 실재의 변형을 거쳐 마침내 ‘실재의 자국’이 된다. 90년대 디지털 시대로 들어오면서 사진은 이제 이 지표성을 상실하고 다시 도상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컴퓨터 그래픽의 합성 사진 속의 실재는 사진이나 육안의 현실과는 달라진다. 초현실적이고 언캐니한 느낌 이것이 디지털 미학이다.
4) 사진 전체를 과도하게 밝게 하여 사진 속 대상들의 깊이를 사라지게 함으로써 특별한 효과를 얻는다.
아날로그 사진작가들은 이제 사진과 피사체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자 한다. 그 방법은 컴퓨터 그래픽 효과를 차용하는 것이다. 위의 방법들은 모두 아날로그 사진기가 디지털 사진의 미학적 효과를 얻기 위한 전략이다. 이들 작품은 익숙한 현실에 대하여 ‘낯설게 하기’ 효과를 드러낸다. 이 낯선 느낌은 디지털의 근원, 즉 피사체가 존재하지 않는 그 허구성에서 오는 것이다.
모든 뉴미디어는 처음에 올드 미디어를 흉내 냄으로서 수용되지만 결국 자신의 강력한 정체성을 갖게 되면 이 관계는 오히려 역전된다. 회화와 카메라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의 관계가 그러하다. 초기 사진은 세계의 실제에 대한 객관적 재현의 추구에서, 해독 가능한 작가의 관념의 텍스트로 진화했다. 80년대 들어오면서 사진은 더 이상 현실의 재현도 해석해야만 하는 텍스트도 아니다. 카메라와 피사체 사이에 존재하는 것은 단순히 반사광과 감광 물질 사이의 광학적, 화학적 인과관계 뿐이다. 사진은 모방의 의도가 전혀 없는 빛 자체의 물질효과로 그 본성상 지표기호가 된다. 이렇게 해서 사진은 실재의 거울, 실재의 변형을 거쳐 마침내 ‘실재의 자국’이 된다. 90년대 디지털 시대로 들어오면서 사진은 이제 이 지표성을 상실하고 다시 도상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컴퓨터 그래픽의 합성 사진 속의 실재는 사진이나 육안의 현실과는 달라진다. 초현실적이고 언캐니한 느낌 이것이 디지털 미학이다.
추천자료
 <<서울, 1964년 겨울>>이 현대에 주는 의미
<<서울, 1964년 겨울>>이 현대에 주는 의미 일본의 요괴문화(애니메이션, 관광산업에서)
일본의 요괴문화(애니메이션, 관광산업에서) 인문학 위기(인문과학 위기)의 인식과 실체, 인문학 위기(인문과학 위기)의 진단과 내외적 원...
인문학 위기(인문과학 위기)의 인식과 실체, 인문학 위기(인문과학 위기)의 진단과 내외적 원... [인문학][인문학위기]인문학(인문과학)의 정의, 인문학(인문과학)의 특성, 인문학(인문과학)...
[인문학][인문학위기]인문학(인문과학)의 정의, 인문학(인문과학)의 특성, 인문학(인문과학)... 20세기 초에서 한국 춤과 주체(몸)의 관계 - 예술과 대중문화의 소통을 위하여
20세기 초에서 한국 춤과 주체(몸)의 관계 - 예술과 대중문화의 소통을 위하여 20세기 초에서 한국 춤과 주체(몸)의 관계 - 예술과 대중문화의 소통을 위하여
20세기 초에서 한국 춤과 주체(몸)의 관계 - 예술과 대중문화의 소통을 위하여 인문정신과 문화콘텐츠연구 - 인문학의 문화상품화 위기를 넘어서 기회로
인문정신과 문화콘텐츠연구 - 인문학의 문화상품화 위기를 넘어서 기회로 인문학의 위기와 문화연구 - 분과학문 사이의 단절을 횡단하는 공존의 학문을 위하여
인문학의 위기와 문화연구 - 분과학문 사이의 단절을 횡단하는 공존의 학문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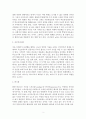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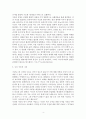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