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소설 역시 등장인물들이 소설말미에 \'문익환 목사와 황석영, 림수경\' 등의 북한 방문 인사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함으로써 통일이 가까워 왔다는 상징적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
끝으로 소재할 소설은 림종상의 「쇠찌르레기」란 작품으로 북한작품 중에는 그래도 남으로 편지를 보내려한다는 적극적인 행동성과 그리고 반대이념을 쫓아 남으로 떠난 이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였다는 점을 주목하여 볼 수 있는 소설이다. 이 소설의 주된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쇠찌르레기\'를 이용하여 남북으로 흩어진 부자간의 간절한 정을 나누는 줄거리로 이루어져있다.
구성도 이색적이다. 이 작품은 주로 북한의 조류학자 원흥길 박사의 손자 창운이 월남하여 남한의 조류학자로 활약 중인 삼촌 원병후 박사에게 보내는 편지를 담고 있다. 3대에 걸친 조류학자 일가의 이산과 상봉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액자소설 형식을 취하고 있는 소설이다. 하지만 이렇게 탄력적인 구성과 내용을 가진 이 소설도 여전히 도식적인 통일지향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소설의 한계를 다시금 확인 할 수 있다.
이렇듯 북한 소설은 새의 자유로움을 공통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통일을 염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앞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림진강에서도 주인공 어머니는 \'까치\'를 바라보며 새의 자유로움을 언급하고 있다.
3. 결론
a. 통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
우리는 앞서 살펴본 남북한의 작품들을 통해 냉전체제가 와해되던 1990년대 전후에 분단국가 속에 살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아픔과 곧 다가올지 모를 통일에 대한 염원들을 공통적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남북분단의 참혹한 현실을 문학을 통해 알 수 있음과 동시에 표면적으로 알고 있었던 남북통일, 분단현실에 관해 깊게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었다.
b. 분단문학이 나아가야할 방향
어느 것 1990년대를 뛰어넘어 2015년을 살고 있는 지금, \'분단\'이 아닌 \'통일\' 문제가 국가적인 차원을 넘어 세계적인 주제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도 북한에서도 통일 문제에 관한 창조적이고 구제적인 노력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그 문제가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는 삶의 여러 문제들, 세계사 변동의 여러 문제와 결부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일리기도 하다. 문학이 꼭 그처럼 사회 공통적인 문제만을 추구해야 한다고 불수는 없지만 다시금 남북 분단의 시대에 분단의 핵심적인 내용을 주제로 삼은 분단문학이 한국문학의 중심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가 노력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박덕규 이성희 글, 『탈북 디아스포라』, 푸른사상, 2012.
- 유임하 편, 『북한소설선』, 아카데미아 문학컬렉션, 2013.
- 김종회 글, 『북한소설의 이해2』, 청동거울, 2004.
- 전경주 저,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과 대비』, 살림출판, 2012.
- 림종상 글, 『쇠찌르레기』, 살림터, 1993.
- 이문열 글, 『아우와의 만남』, 둥지, 1994.
- 최일남 외, 『다시 읽고 싶은 소설2』, 삼문철판사, 1993
끝으로 소재할 소설은 림종상의 「쇠찌르레기」란 작품으로 북한작품 중에는 그래도 남으로 편지를 보내려한다는 적극적인 행동성과 그리고 반대이념을 쫓아 남으로 떠난 이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였다는 점을 주목하여 볼 수 있는 소설이다. 이 소설의 주된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쇠찌르레기\'를 이용하여 남북으로 흩어진 부자간의 간절한 정을 나누는 줄거리로 이루어져있다.
구성도 이색적이다. 이 작품은 주로 북한의 조류학자 원흥길 박사의 손자 창운이 월남하여 남한의 조류학자로 활약 중인 삼촌 원병후 박사에게 보내는 편지를 담고 있다. 3대에 걸친 조류학자 일가의 이산과 상봉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액자소설 형식을 취하고 있는 소설이다. 하지만 이렇게 탄력적인 구성과 내용을 가진 이 소설도 여전히 도식적인 통일지향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소설의 한계를 다시금 확인 할 수 있다.
이렇듯 북한 소설은 새의 자유로움을 공통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통일을 염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앞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림진강에서도 주인공 어머니는 \'까치\'를 바라보며 새의 자유로움을 언급하고 있다.
3. 결론
a. 통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
우리는 앞서 살펴본 남북한의 작품들을 통해 냉전체제가 와해되던 1990년대 전후에 분단국가 속에 살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아픔과 곧 다가올지 모를 통일에 대한 염원들을 공통적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남북분단의 참혹한 현실을 문학을 통해 알 수 있음과 동시에 표면적으로 알고 있었던 남북통일, 분단현실에 관해 깊게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었다.
b. 분단문학이 나아가야할 방향
어느 것 1990년대를 뛰어넘어 2015년을 살고 있는 지금, \'분단\'이 아닌 \'통일\' 문제가 국가적인 차원을 넘어 세계적인 주제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도 북한에서도 통일 문제에 관한 창조적이고 구제적인 노력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그 문제가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는 삶의 여러 문제들, 세계사 변동의 여러 문제와 결부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일리기도 하다. 문학이 꼭 그처럼 사회 공통적인 문제만을 추구해야 한다고 불수는 없지만 다시금 남북 분단의 시대에 분단의 핵심적인 내용을 주제로 삼은 분단문학이 한국문학의 중심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가 노력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박덕규 이성희 글, 『탈북 디아스포라』, 푸른사상, 2012.
- 유임하 편, 『북한소설선』, 아카데미아 문학컬렉션, 2013.
- 김종회 글, 『북한소설의 이해2』, 청동거울, 2004.
- 전경주 저,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과 대비』, 살림출판, 2012.
- 림종상 글, 『쇠찌르레기』, 살림터, 1993.
- 이문열 글, 『아우와의 만남』, 둥지, 1994.
- 최일남 외, 『다시 읽고 싶은 소설2』, 삼문철판사,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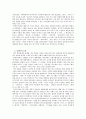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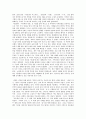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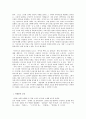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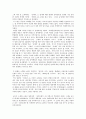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