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년 조불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직후이다. 이후 전교자유기를 맞이한 천주교가 수행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교회의 재건이었으며, 이 사업에는 흩어진 신자들을 모아 붕괴된 조직을 강화하고 그들의 생활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내포지방은 신앙공동체 조직의 강화작업은 외국인 신부들의 내포지방 순회로 시작되었다. 이들은 내포지방 공소와 교우촌을 방문하여 성사를 집전하는 한편 실상을 파악하여 궁벽한 산골로 분산되어 있는 교우촌을 평야지대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던 바, 이러한 조치는 19세기 말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해마다 평균 6개의 공소가 설치되어 1883년부터 1900년까지 신설된 공소는 약 100여개에 달하였다. 이렇게 전교자유기를 맞아 내포지방의 천주교는 외국인 신부들의 적극적 지원과 이 지방의 천주교인들의 노력으로 재건에 성공하여 그 세를 확장하여 갈 수 있었다.
6. 한말 일제하 내포지역의 감리교의 동향 -홍성군 중심으로-
1)홍성지방 사회의 특징
홍성군은 조선시기 ‘대홍주’로 불리면서 정치경제 및 사회적으로 공주와 더불어 충청우도의 핵심적인 지역이었다. 즉 충남 서북부의 행정교통의 중심지로 동쪽은 예산군, 서북쪽은 서산시, 남쪽은 청양군 및 보령시와 접하고 있다. 장항선 연변의 중심지로서 육로의 요지이고, 해로상으로 서해 도서의 관문으로 인천과 군산을 잇는 요충지였다. 따라서 충청 서부 지방의 행정문화의 중심거점으로서, 이른바 ‘내포문화권’의 행정 및 문화 중심지로서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홍주문화권’의 중심지였다.
홍성지방의 학풍은 李珥 - 宋詩烈 - 權尙夏 - 韓元震 으로 이어지는 기호학파 유림의 적통을 계승하는 호서유림의 중심지였다. 이는 일제하 湖西儒宗으로 받들어졌던 한말 의병장 金福漢, 李 등을 필두로 위정척사의 화이론과 절의론을 전개하면서, 호서지방 유림들의 항일전쟁과 반일여론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홍성에는 내포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서원이 건립되었으며(3곳), 모두 사액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홍성지역의 학문적 전통이 강하고, 재지사족의 위상제고 노력이 컸으며, 정치적으로 중앙과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었음을 의미한다. 다만 노론계 호서사림의 학풍이 많은 영향을 끼쳤던 충청도의 일반적인 경향과 달리, 노론 일색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주목된다. 동일한 지역에 당색이 다른 서원이 건립되었다는 것은 각 정파에서 세를 확장하려고 했던 특성이 강했고, 사족활동 및 당파갈등의 여지가 지역내에 상존하고 있었음을 반증한다. 즉 조선시기만 하더라도 홍성 지역은 어느 한 당파에 의해 좌우되거나, 특정 정파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지 않았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홍성은 일제시기 이후 쇠락하기 시작했다. 조선시기 이래의 성리학적 질서와 재지사족의 향촌사회 지배체제가 붕괴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후기 이래의 사회변동 과정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끼쳤던 재지사족이 약화되고, 지역의 지리적 및 사회문화적 개방성에 따라 새로운 사조와 신문물의 수용에 적극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일제시기 홍성의 경제적 배경과 근간은 여전히 농업이었다. 그러나 농촌사회의 실정은 일제의 수탈로 인해 농민층이 분해되는 등 전반적인 사회변동 현상이 노정되고 있었다. 이는 홍성의 경제 및 사회적 기반이 충남의 다른 시군에 비해 낙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2)홍성지역의 감리교 수용과 발전
홍성은 내포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천주교와 개신교 등 서양 종교의 전래와 확산이 일찍부터 활발했다. 개신교의 경우, 내포지방은 한말 미국 선교회간에 선교지 분할 협정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감리교 선교지역으로 정해졌다. 따라서 홍성군에 처음 선교사를 파송한 교파는 장로교였으나, 선교분할 협정에 의거 감리교 선교지역이 되면서 감리교 선교사가 파송되었고, 이후 활발한 전도활동이 전개되었다. 1931년 현재, 홍성군 내 설립되었던 6개의 교회 중에서 홍동면 금당성결교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감리교회(홍성제일광천갈산금마홍동)였던 사실에서, 홍성지역의 감리교 수용이 어느 정도 활발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신교의 수용과 함께 홍성군에 건립된 최초의 교회는 간동교회(홍성감리교회 전신)이다. 처음에는 장로교 선교사인 민노아가 부임하여 시무하다가, 선교지 분할 협정에 따라 이임하고 감리교 선교사인 서원보가 부임하였다. 이로부터 감리교의 본격적인 수용과 확산이 전개되기 시작한 것이다. 홍성교회에 출석하던 이인주 장로에 의해 설립된 갈산교회 역시 홍성군에 설립된 초기교회의 하나로서 지역의 선교와 개신교의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갈산교회는 갈산리에 형성된 신앙공동체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애경사를 교회에서 전적으로 주관할 정도의 생활 공동체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초기 개신교 수용과정에서 지역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전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으며, 지역은 물론 국가와 민족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 발양되기도 하였다. 즉 일제시기 사회운동과 민족운동에 갈산교회 신도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3) 한말일제하 홍성지방의 민족운동과 지역엘리트
식민지시기에 사회운동과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던 홍성지역 인사들은 상당히 많다. 이들 중에서 1920년대 호반 홍성고보유치운동을 벌였던 일부 인사들이 친일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조선후기 이후 지역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특정 가문의 인사들이나, 개신교를 수용하였던 선각적 지식인, 홍성에 기반을 둔 토착 세력들은 일제의 침략에 맞서 강력한 저항을 하거나, 민중의 계몽에 앞장서는 등 지역엘리트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 특히 개신교의 수용과정에서 민족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깊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던 기독교 신도들은 적극적인 민족운동을 전개하였음은 물론, 새로운 사회의 건설에 앞장서는 등 지역사회의 변혁을 주도하였다. 교육을 통한 민족의 계몽에 적극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31운동이 발생했을 때에도 각 군에서 많은 인사들이 일제에 저항하였다. 홍성고보유치운동을 전개하였던 유지들과 일정한 선을 그면서 활동하였던 홍성청년회, 기독교 청년 선교 단체인 엡
6. 한말 일제하 내포지역의 감리교의 동향 -홍성군 중심으로-
1)홍성지방 사회의 특징
홍성군은 조선시기 ‘대홍주’로 불리면서 정치경제 및 사회적으로 공주와 더불어 충청우도의 핵심적인 지역이었다. 즉 충남 서북부의 행정교통의 중심지로 동쪽은 예산군, 서북쪽은 서산시, 남쪽은 청양군 및 보령시와 접하고 있다. 장항선 연변의 중심지로서 육로의 요지이고, 해로상으로 서해 도서의 관문으로 인천과 군산을 잇는 요충지였다. 따라서 충청 서부 지방의 행정문화의 중심거점으로서, 이른바 ‘내포문화권’의 행정 및 문화 중심지로서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홍주문화권’의 중심지였다.
홍성지방의 학풍은 李珥 - 宋詩烈 - 權尙夏 - 韓元震 으로 이어지는 기호학파 유림의 적통을 계승하는 호서유림의 중심지였다. 이는 일제하 湖西儒宗으로 받들어졌던 한말 의병장 金福漢, 李 등을 필두로 위정척사의 화이론과 절의론을 전개하면서, 호서지방 유림들의 항일전쟁과 반일여론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홍성에는 내포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서원이 건립되었으며(3곳), 모두 사액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홍성지역의 학문적 전통이 강하고, 재지사족의 위상제고 노력이 컸으며, 정치적으로 중앙과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었음을 의미한다. 다만 노론계 호서사림의 학풍이 많은 영향을 끼쳤던 충청도의 일반적인 경향과 달리, 노론 일색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주목된다. 동일한 지역에 당색이 다른 서원이 건립되었다는 것은 각 정파에서 세를 확장하려고 했던 특성이 강했고, 사족활동 및 당파갈등의 여지가 지역내에 상존하고 있었음을 반증한다. 즉 조선시기만 하더라도 홍성 지역은 어느 한 당파에 의해 좌우되거나, 특정 정파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지 않았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홍성은 일제시기 이후 쇠락하기 시작했다. 조선시기 이래의 성리학적 질서와 재지사족의 향촌사회 지배체제가 붕괴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후기 이래의 사회변동 과정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끼쳤던 재지사족이 약화되고, 지역의 지리적 및 사회문화적 개방성에 따라 새로운 사조와 신문물의 수용에 적극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일제시기 홍성의 경제적 배경과 근간은 여전히 농업이었다. 그러나 농촌사회의 실정은 일제의 수탈로 인해 농민층이 분해되는 등 전반적인 사회변동 현상이 노정되고 있었다. 이는 홍성의 경제 및 사회적 기반이 충남의 다른 시군에 비해 낙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2)홍성지역의 감리교 수용과 발전
홍성은 내포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천주교와 개신교 등 서양 종교의 전래와 확산이 일찍부터 활발했다. 개신교의 경우, 내포지방은 한말 미국 선교회간에 선교지 분할 협정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감리교 선교지역으로 정해졌다. 따라서 홍성군에 처음 선교사를 파송한 교파는 장로교였으나, 선교분할 협정에 의거 감리교 선교지역이 되면서 감리교 선교사가 파송되었고, 이후 활발한 전도활동이 전개되었다. 1931년 현재, 홍성군 내 설립되었던 6개의 교회 중에서 홍동면 금당성결교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감리교회(홍성제일광천갈산금마홍동)였던 사실에서, 홍성지역의 감리교 수용이 어느 정도 활발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신교의 수용과 함께 홍성군에 건립된 최초의 교회는 간동교회(홍성감리교회 전신)이다. 처음에는 장로교 선교사인 민노아가 부임하여 시무하다가, 선교지 분할 협정에 따라 이임하고 감리교 선교사인 서원보가 부임하였다. 이로부터 감리교의 본격적인 수용과 확산이 전개되기 시작한 것이다. 홍성교회에 출석하던 이인주 장로에 의해 설립된 갈산교회 역시 홍성군에 설립된 초기교회의 하나로서 지역의 선교와 개신교의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갈산교회는 갈산리에 형성된 신앙공동체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애경사를 교회에서 전적으로 주관할 정도의 생활 공동체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초기 개신교 수용과정에서 지역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전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으며, 지역은 물론 국가와 민족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 발양되기도 하였다. 즉 일제시기 사회운동과 민족운동에 갈산교회 신도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3) 한말일제하 홍성지방의 민족운동과 지역엘리트
식민지시기에 사회운동과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던 홍성지역 인사들은 상당히 많다. 이들 중에서 1920년대 호반 홍성고보유치운동을 벌였던 일부 인사들이 친일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조선후기 이후 지역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특정 가문의 인사들이나, 개신교를 수용하였던 선각적 지식인, 홍성에 기반을 둔 토착 세력들은 일제의 침략에 맞서 강력한 저항을 하거나, 민중의 계몽에 앞장서는 등 지역엘리트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 특히 개신교의 수용과정에서 민족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깊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던 기독교 신도들은 적극적인 민족운동을 전개하였음은 물론, 새로운 사회의 건설에 앞장서는 등 지역사회의 변혁을 주도하였다. 교육을 통한 민족의 계몽에 적극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31운동이 발생했을 때에도 각 군에서 많은 인사들이 일제에 저항하였다. 홍성고보유치운동을 전개하였던 유지들과 일정한 선을 그면서 활동하였던 홍성청년회, 기독교 청년 선교 단체인 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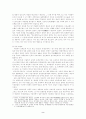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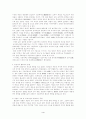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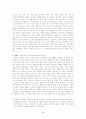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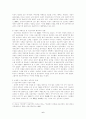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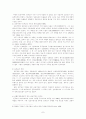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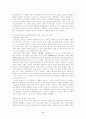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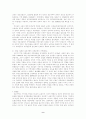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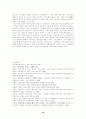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