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고단한 삶에 대한 어찌할 수 없는 선택이면서, 또한 화자와 같은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현실에 대한 나름의 긍정적 자각일 것이다. 비록 어려운 삶이지만 따뜻한 인간에 대한 애정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궁핍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지라도, 실의와 체념이 어우러진 현상 속에서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시는 물의 이미지와 화자의 세계인식이 병행되며 전개되고 있다. 강물의 이미지는 곧바로 화자의 세계관을 대변한다. ‘강’은 도회를 흐르고 있으며, 시간적 배경은 저물녘이다. 맑게 흐르는 강이 아니라 무겁게 흐르는 강물이다. 이 샛강은 썩어서 흐른다. 그 강물은 스스로 썩어간 것이 아니라 썩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은연중 산업화도시화라는 문명적 속성의 부정을 암시한다. 문명 이전의 청정과 정체성은 산업화에 의해 침해를 받고 오염되며 그 부정성은 누적되어 간다.
‘저문 강에 삽을 씻고’는 가난한 슬픔이 70년대 민중적인 시의 공통적인 주제임을 재확인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현실의 부조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조리로 인해 더욱 탄탄해지는 인간 혹은 민중에 대한 마음이 시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삽’의 의미도 더 심화된다. 즉, 일용 노동자를 상기하는 시적 소도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노동의 신성함과 삶 자체를 상징하는 의미로 기능하는 것이다.
Ⅲ. 결론
이승훈은 자아와 세계의 행복한 합일을 원하지만 그것이 쉽게 성취될 수 있으리라는 낭만적 환상은 잘 갖지 않는다. 그래서 그 틈을 가장 예민하게 느끼는 곳 바로 `낭만적 아이러니\'의 상태를 천착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죽을 때까지 / 아마 당신의 방엔 /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나는 바람을 타고 / 날아가는 새는 /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라는 구절은 닿을 수 없는 곳을 노래하는 시인 정신 그 자체를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시의 전반부가 `당신의 방\'의 모습을 그리고 있으면서 그곳에 이르고 싶다는 염원을 암시하고 있다면, 후반부는 `날개\' 대신에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론적인 한계가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순환적인 인식은 인간존재의 비극성을 떠올리게 한다. 어차피 죽게 될 운명의 인간은 그럼에도 언제나 삶에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 왔고 또 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유안진의 시는 1997년에 출간된 《누이》를 기점으로 좀더 깊어진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천명(天命)을 안다는 나이를 지나 쓰기 시작한 시였기 때문일까. 시인의 시에서는 연륜의 깊이와 함께 어린아이의 맑음이 공존하고 있다. 오래 한 길을 걸어 높은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에게서는 공통적인 분위기가 느껴진다. 날카로운 통찰의 시선과 함께 맑고 담담한 평온함이 느껴지게 마련인데, 구도의 자세로 한 길을 걸어온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아이처럼 맑아지곤 한다. 도를 닦는다고 하면 속세를 떠나 깊은 산 속 암자에라도 들어가야 할 것 같은 선입견을 대개는 가지고 있지만, 사실 속세의 초월만이 구도의 길은 아니다. 오히려 평범한 일상인이 도달할 수 있는 구도의 길은 삶의 진창을 떠나지 않으면서 그 안에서 자기의 길에 몰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래 외곬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맑음은 초월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지독하게 삶에 발을 담그고 있어서라고 생각된다.
지천명의 나이를 지나 어느덧 이순의 나이마저 넘긴 시인의 시가 아직도 무언가를 모색하고 있고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시인이 초월이 아닌 구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나이가 들면 시도 삶도 고요해지리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편견일지도 모른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아니 오래 겪었다고 해서 절실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유안진의 시에서 삶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통찰의 시선이 번득이다가도 “경주 남쪽 금오산 절벽마다 기대어 서 계신 마애불상 품에 얼굴 파묻고 한없이 울고 (〈오늘은 언제인가〉, 《봄비 한 주머니》)”싶다는 솔직한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은 그녀가 여전히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젊은 열정의 시인이기 때문이다.
강은교의 시세계는 허무의 바다에서 돛을 올린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에게 허무란 오랫동안 면벽좌선하여 터득한 선의 경지도 아니며, 이 세상을 다 살아본 노인들이 체득한 삶의 무상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현실의 삶의 다양한 무늬가 현상되기 이전의 자의식의 영도이자 ‘백지상태’이다. 촬영 이전의 순도 높은 필름인 것이다.
‘저문 강에 삽을 씻고’는 산업화 시대를 고되게 살아가는 민중의 삶의 현장을 시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시의 화자는 어느 노동자로 볼 수 있는데, 시인 스스로가 시적 화자로 설정되어 있어 시인 자신이 노동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설정은 일부의 다른 민중시가 가지고 있는 시적 화자의 목소리와 시적 상황의 불균형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고통스럽고 비참한 현실에 대해 절규하거나 직접 토로하는 대신 절제되고 조용한 목소리를 통해 우리가 처한 노동 현실을 그리며 삶의 궁극적 가치를 묻고 있다는 점에서, 참여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작품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참고 문헌>
김용찬. 『시로 읽는 세상』. 투데이. 2003
김혜니. 『한국 현대시문학사 연구』. 국학자료원. 2002
이문열. 『인생을 말한다』. 자유문학사. 1993
http://www.seelotus.com/gojeon/hyeon-dae/si/si-new/jeo-mun-kang-e-sab-eul.htm
http://ipcp.edunet4u.net/%7Ekoreannote/2/2-%C0%FA%B9%AE%B0%AD%BF%A1%BB%F0%C0%BB.htm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11&dir_id=110103&docid=212264&ts=1056462692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11&dir_id=110103&docid=1419950&ts=1109261300
이 시는 물의 이미지와 화자의 세계인식이 병행되며 전개되고 있다. 강물의 이미지는 곧바로 화자의 세계관을 대변한다. ‘강’은 도회를 흐르고 있으며, 시간적 배경은 저물녘이다. 맑게 흐르는 강이 아니라 무겁게 흐르는 강물이다. 이 샛강은 썩어서 흐른다. 그 강물은 스스로 썩어간 것이 아니라 썩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은연중 산업화도시화라는 문명적 속성의 부정을 암시한다. 문명 이전의 청정과 정체성은 산업화에 의해 침해를 받고 오염되며 그 부정성은 누적되어 간다.
‘저문 강에 삽을 씻고’는 가난한 슬픔이 70년대 민중적인 시의 공통적인 주제임을 재확인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현실의 부조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조리로 인해 더욱 탄탄해지는 인간 혹은 민중에 대한 마음이 시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삽’의 의미도 더 심화된다. 즉, 일용 노동자를 상기하는 시적 소도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노동의 신성함과 삶 자체를 상징하는 의미로 기능하는 것이다.
Ⅲ. 결론
이승훈은 자아와 세계의 행복한 합일을 원하지만 그것이 쉽게 성취될 수 있으리라는 낭만적 환상은 잘 갖지 않는다. 그래서 그 틈을 가장 예민하게 느끼는 곳 바로 `낭만적 아이러니\'의 상태를 천착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죽을 때까지 / 아마 당신의 방엔 /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나는 바람을 타고 / 날아가는 새는 /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라는 구절은 닿을 수 없는 곳을 노래하는 시인 정신 그 자체를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시의 전반부가 `당신의 방\'의 모습을 그리고 있으면서 그곳에 이르고 싶다는 염원을 암시하고 있다면, 후반부는 `날개\' 대신에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론적인 한계가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순환적인 인식은 인간존재의 비극성을 떠올리게 한다. 어차피 죽게 될 운명의 인간은 그럼에도 언제나 삶에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 왔고 또 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유안진의 시는 1997년에 출간된 《누이》를 기점으로 좀더 깊어진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천명(天命)을 안다는 나이를 지나 쓰기 시작한 시였기 때문일까. 시인의 시에서는 연륜의 깊이와 함께 어린아이의 맑음이 공존하고 있다. 오래 한 길을 걸어 높은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에게서는 공통적인 분위기가 느껴진다. 날카로운 통찰의 시선과 함께 맑고 담담한 평온함이 느껴지게 마련인데, 구도의 자세로 한 길을 걸어온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아이처럼 맑아지곤 한다. 도를 닦는다고 하면 속세를 떠나 깊은 산 속 암자에라도 들어가야 할 것 같은 선입견을 대개는 가지고 있지만, 사실 속세의 초월만이 구도의 길은 아니다. 오히려 평범한 일상인이 도달할 수 있는 구도의 길은 삶의 진창을 떠나지 않으면서 그 안에서 자기의 길에 몰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래 외곬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맑음은 초월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지독하게 삶에 발을 담그고 있어서라고 생각된다.
지천명의 나이를 지나 어느덧 이순의 나이마저 넘긴 시인의 시가 아직도 무언가를 모색하고 있고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시인이 초월이 아닌 구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나이가 들면 시도 삶도 고요해지리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편견일지도 모른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아니 오래 겪었다고 해서 절실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유안진의 시에서 삶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통찰의 시선이 번득이다가도 “경주 남쪽 금오산 절벽마다 기대어 서 계신 마애불상 품에 얼굴 파묻고 한없이 울고 (〈오늘은 언제인가〉, 《봄비 한 주머니》)”싶다는 솔직한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은 그녀가 여전히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젊은 열정의 시인이기 때문이다.
강은교의 시세계는 허무의 바다에서 돛을 올린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에게 허무란 오랫동안 면벽좌선하여 터득한 선의 경지도 아니며, 이 세상을 다 살아본 노인들이 체득한 삶의 무상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현실의 삶의 다양한 무늬가 현상되기 이전의 자의식의 영도이자 ‘백지상태’이다. 촬영 이전의 순도 높은 필름인 것이다.
‘저문 강에 삽을 씻고’는 산업화 시대를 고되게 살아가는 민중의 삶의 현장을 시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시의 화자는 어느 노동자로 볼 수 있는데, 시인 스스로가 시적 화자로 설정되어 있어 시인 자신이 노동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설정은 일부의 다른 민중시가 가지고 있는 시적 화자의 목소리와 시적 상황의 불균형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고통스럽고 비참한 현실에 대해 절규하거나 직접 토로하는 대신 절제되고 조용한 목소리를 통해 우리가 처한 노동 현실을 그리며 삶의 궁극적 가치를 묻고 있다는 점에서, 참여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작품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참고 문헌>
김용찬. 『시로 읽는 세상』. 투데이. 2003
김혜니. 『한국 현대시문학사 연구』. 국학자료원. 2002
이문열. 『인생을 말한다』. 자유문학사. 1993
http://www.seelotus.com/gojeon/hyeon-dae/si/si-new/jeo-mun-kang-e-sab-eul.htm
http://ipcp.edunet4u.net/%7Ekoreannote/2/2-%C0%FA%B9%AE%B0%AD%BF%A1%BB%F0%C0%BB.htm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11&dir_id=110103&docid=212264&ts=1056462692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11&dir_id=110103&docid=1419950&ts=1109261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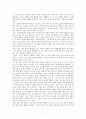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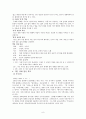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