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시작하는 말
2. 자주 틀리는 표준어 규정
3. 실생활에서 많이 틀리는 표준어 사례
4. 맺음말
2. 자주 틀리는 표준어 규정
3. 실생활에서 많이 틀리는 표준어 사례
4. 맺음말
본문내용
표준어 규정과 오용 사례
1. 시작하는 말
* 표준어의 중요성
표준어는 한 나라의 공통어로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언어이다. 표준어는 한 나라의 국민을 언어적으로 통일시켜 주는 언어요, 방언보다 품위가 있고 공적인 상황에 적합한 언어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들이 표준어를 널리 익혀서 정확하게 구사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만약 국민들이 표준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휘의 이질화가 심해져서 공동의 민족문화를 창조, 발전해나갈 기초자산이 붕괴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어휘는 단순하게 그 말 속에 담긴 뜻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사상과 가치관 등을 함께 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 자주 틀리는 표준어 규정
우리의 일상 대화들을 들어보면 표준어 규정에 어긋나는 것들이 많다. 많은 규정 중에서도 <우리말 오류사전, 박유희> <틀리기 쉬운 우리말 바로쓰기, 임규홍> 등의 책을 참고하고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개의 항목을 뽑게 되었다.
1 ) 굳어진 형태를 인정한 경우
제 5 항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고
강낭-콩
고삿
사글-세
울력-성당
강남-콩
고샅
삭월-세
위력-성당
겉~, 속~
‘월세’는 표준어임
떼를 지어서 으르고 협박하는 일
-> 어원(語源)이 뚜렷한데도 언중(言衆)들의 어원 의식이 약하여져 어원으로부터 멀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고, 아무리 어원에 충실한 형태이더라도 현실적으로 쓰이지 않는 것은 표준어 영역 밖으로 밀어 낼 것을 다룬 항이다.
① \'강남콩(江南∼)\'은 \'남비\'(제 9 항)와 함께 이미 어원을 인식하지 않고 \'강낭콩, 냄비\'로 쓰이고 있는 언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② \'지붕을 이을 때에 쓰는 새끼\'와 \'좁은 골목이나 길\'을 다 함께 \'고샅\'으로 써 오던 것을 분화시켜 앞의 것을 \'고삿\'으로 바꾼 것이다.
③ \'월세(月貰)\'의 딴 말인 \'삭월세\'를 \'朔月貰\'의 뜻으로 잡아 \'사글세\'란 말과 함께 써 오던 것을, \'朔月貰\'는 단순한 한자취음(漢字取音)일 뿐으로 취할 바가 못된다하여 \'사글세\'만을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다만, 어원적으로 원형에 더 가까운 형태가 아직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고
갈비
갓모
굴-젓
말-곁
물-수란
밀-뜨리다
적-이
휴-지
가리
갈모
구-젓
말-겻
물-수랄
미-뜨리다
저으기
수지
~구이, ~찜, 갈빗-대
1. 사기 만드는 물레 밑고리
2. ‘갈모’는 갓 위에 쓰는, 유지로 만든 우비
적이-나, 적이나-하면
-> 어원 의식이 남아 있어 그 쪽 형태가 쓰이는 것들은 그 짝이 되는 비어원적인 형태보다 우선권을 줄 것을 다룬 항이다.
① \'휴지\'가 그 대표적인 예로서, 한자어 \'休紙\'에 대한 의식으로 종래 표준어로 인정되었던 \'수지\'보다 널리 쓰이게 되어 이번에 \'휴지\'만을 단일 표준어로 인정한 것이다.
② 같은 이유로 \'갈비\'가 채택되고, 그 동안 표준어로 인정되었던 \'가리\'를 버리게 되었다.
③ 이 중 \'적이\'는 특이하다. \'적이\'는 의미적으로 \'적다\'와는 멀어졌다(오히려 반대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 때문에 그 동안 한편으로는 \'저으기\'가 널리 보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적다\'와의 관계를 부정할 수 없어 이것을 인정하는 쪽으로 결정하였다.
2 ) 두 뜻을 한 형태로 통일한 경우
제 6 항 다음 단어들은 의미를 구별함이 없이, 한 가지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고
돌
둘-째
셋-째
넷-째
빌리다
돐
두-째
세-째
네-째
빌다
생일, 주기
‘제 2, 두 개째’의 뜻
‘제 3, 세 개째’의 뜻
‘제 4, 네 개째’의 뜻
1. 빌려 주다, 발려 오다
2. ‘용서를 빌다’는 ‘빌다’임.
-> 그 동안 용법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해 온 것 중 그 구별이 어려워 혼란을 일으켜 오던 것을 정리한 것이다.
① \'돌\'은 생일, \'돐\'은 \'한글 반포 500돐\'처럼 주기의 의미로 세분해 썼던 것을, 그러한 구분이 얼마간 인위적인데다가 불필요한 세분이라 판단되어 \'돌\'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② \'두째, 셋째\'는 \'첫째\'와 함께 차례를, \'둘째, 셋째\'는 \'하나째\'와 함께 \"사과를 벌써 셋째 먹는다.\"에서와 같이 수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구분하여 왔다. 그러나 언어 현실에서 이와 같은 구분 역시 인위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에 \'둘째, 셋째\'로 통합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두째, 세째, 네째\'와 같은 표기는 어느 경우에도 볼 수 없게 되었다.
③ \'빌다\'에는 \'乞, 祝\'의 뜻이 있기에, \'借\'의 뜻으로는 \'빌려 오다\'로, \'貸\'의 뜻으로는 \'빌려 주다\'로 하여, \'빌리다\'에는 \'借, 貸\'의 뜻이 다 들어 있는 것으로 처리한 것이다.
다만, \'둘째\'는 십 단위 이상의 서수사에 쓰일 때에 \'두째\'로 한다.
ㄱ
ㄴ
비고
열두-째
스물두-째
열두 개째의 뜻은 ‘열둘째’로
스물두 개째의 뜻은 ‘스물둘째’로
-> 차례를 나타내는 말로 \'열두째, 스물두째, 서른두째\' 등 \'두째\' 앞에 다른 수가 올 때에는 받침 \'ㄹ\'이 분명히 탈락하는 언어 현실을 살려 부득이 종래의 구분을 살렸다.
3 ) 수컷을 이루는 접두사를 수로 통일해야 경우
제 7 항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고
수-꿩
수-나사
수-놈
수-사돈
수-소
수-은행나무
수-퀑, 숫-꿩
숫-나사
숫-놈
숫-사돈
숫-소
숫-은행나무
‘장끼’도 표준어임.
‘황소’도 표준어임.
-> \'암-수\'의 \'수\'는 역사적으로 명사 \'
1. 시작하는 말
* 표준어의 중요성
표준어는 한 나라의 공통어로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언어이다. 표준어는 한 나라의 국민을 언어적으로 통일시켜 주는 언어요, 방언보다 품위가 있고 공적인 상황에 적합한 언어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들이 표준어를 널리 익혀서 정확하게 구사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만약 국민들이 표준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휘의 이질화가 심해져서 공동의 민족문화를 창조, 발전해나갈 기초자산이 붕괴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어휘는 단순하게 그 말 속에 담긴 뜻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사상과 가치관 등을 함께 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 자주 틀리는 표준어 규정
우리의 일상 대화들을 들어보면 표준어 규정에 어긋나는 것들이 많다. 많은 규정 중에서도 <우리말 오류사전, 박유희> <틀리기 쉬운 우리말 바로쓰기, 임규홍> 등의 책을 참고하고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개의 항목을 뽑게 되었다.
1 ) 굳어진 형태를 인정한 경우
제 5 항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고
강낭-콩
고삿
사글-세
울력-성당
강남-콩
고샅
삭월-세
위력-성당
겉~, 속~
‘월세’는 표준어임
떼를 지어서 으르고 협박하는 일
-> 어원(語源)이 뚜렷한데도 언중(言衆)들의 어원 의식이 약하여져 어원으로부터 멀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고, 아무리 어원에 충실한 형태이더라도 현실적으로 쓰이지 않는 것은 표준어 영역 밖으로 밀어 낼 것을 다룬 항이다.
① \'강남콩(江南∼)\'은 \'남비\'(제 9 항)와 함께 이미 어원을 인식하지 않고 \'강낭콩, 냄비\'로 쓰이고 있는 언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② \'지붕을 이을 때에 쓰는 새끼\'와 \'좁은 골목이나 길\'을 다 함께 \'고샅\'으로 써 오던 것을 분화시켜 앞의 것을 \'고삿\'으로 바꾼 것이다.
③ \'월세(月貰)\'의 딴 말인 \'삭월세\'를 \'朔月貰\'의 뜻으로 잡아 \'사글세\'란 말과 함께 써 오던 것을, \'朔月貰\'는 단순한 한자취음(漢字取音)일 뿐으로 취할 바가 못된다하여 \'사글세\'만을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다만, 어원적으로 원형에 더 가까운 형태가 아직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고
갈비
갓모
굴-젓
말-곁
물-수란
밀-뜨리다
적-이
휴-지
가리
갈모
구-젓
말-겻
물-수랄
미-뜨리다
저으기
수지
~구이, ~찜, 갈빗-대
1. 사기 만드는 물레 밑고리
2. ‘갈모’는 갓 위에 쓰는, 유지로 만든 우비
적이-나, 적이나-하면
-> 어원 의식이 남아 있어 그 쪽 형태가 쓰이는 것들은 그 짝이 되는 비어원적인 형태보다 우선권을 줄 것을 다룬 항이다.
① \'휴지\'가 그 대표적인 예로서, 한자어 \'休紙\'에 대한 의식으로 종래 표준어로 인정되었던 \'수지\'보다 널리 쓰이게 되어 이번에 \'휴지\'만을 단일 표준어로 인정한 것이다.
② 같은 이유로 \'갈비\'가 채택되고, 그 동안 표준어로 인정되었던 \'가리\'를 버리게 되었다.
③ 이 중 \'적이\'는 특이하다. \'적이\'는 의미적으로 \'적다\'와는 멀어졌다(오히려 반대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 때문에 그 동안 한편으로는 \'저으기\'가 널리 보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적다\'와의 관계를 부정할 수 없어 이것을 인정하는 쪽으로 결정하였다.
2 ) 두 뜻을 한 형태로 통일한 경우
제 6 항 다음 단어들은 의미를 구별함이 없이, 한 가지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고
돌
둘-째
셋-째
넷-째
빌리다
돐
두-째
세-째
네-째
빌다
생일, 주기
‘제 2, 두 개째’의 뜻
‘제 3, 세 개째’의 뜻
‘제 4, 네 개째’의 뜻
1. 빌려 주다, 발려 오다
2. ‘용서를 빌다’는 ‘빌다’임.
-> 그 동안 용법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해 온 것 중 그 구별이 어려워 혼란을 일으켜 오던 것을 정리한 것이다.
① \'돌\'은 생일, \'돐\'은 \'한글 반포 500돐\'처럼 주기의 의미로 세분해 썼던 것을, 그러한 구분이 얼마간 인위적인데다가 불필요한 세분이라 판단되어 \'돌\'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② \'두째, 셋째\'는 \'첫째\'와 함께 차례를, \'둘째, 셋째\'는 \'하나째\'와 함께 \"사과를 벌써 셋째 먹는다.\"에서와 같이 수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구분하여 왔다. 그러나 언어 현실에서 이와 같은 구분 역시 인위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에 \'둘째, 셋째\'로 통합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두째, 세째, 네째\'와 같은 표기는 어느 경우에도 볼 수 없게 되었다.
③ \'빌다\'에는 \'乞, 祝\'의 뜻이 있기에, \'借\'의 뜻으로는 \'빌려 오다\'로, \'貸\'의 뜻으로는 \'빌려 주다\'로 하여, \'빌리다\'에는 \'借, 貸\'의 뜻이 다 들어 있는 것으로 처리한 것이다.
다만, \'둘째\'는 십 단위 이상의 서수사에 쓰일 때에 \'두째\'로 한다.
ㄱ
ㄴ
비고
열두-째
스물두-째
열두 개째의 뜻은 ‘열둘째’로
스물두 개째의 뜻은 ‘스물둘째’로
-> 차례를 나타내는 말로 \'열두째, 스물두째, 서른두째\' 등 \'두째\' 앞에 다른 수가 올 때에는 받침 \'ㄹ\'이 분명히 탈락하는 언어 현실을 살려 부득이 종래의 구분을 살렸다.
3 ) 수컷을 이루는 접두사를 수로 통일해야 경우
제 7 항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고
수-꿩
수-나사
수-놈
수-사돈
수-소
수-은행나무
수-퀑, 숫-꿩
숫-나사
숫-놈
숫-사돈
숫-소
숫-은행나무
‘장끼’도 표준어임.
‘황소’도 표준어임.
-> \'암-수\'의 \'수\'는 역사적으로 명사 \'
추천자료
 의사소통장애(communication disorder)
의사소통장애(communication disorder) [분석/조사] 의사소통 가족치료이론
[분석/조사] 의사소통 가족치료이론 의사소통 가족치료이론
의사소통 가족치료이론 의사소통 장애의 이해
의사소통 장애의 이해 사티어의 가족의사소통 이론
사티어의 가족의사소통 이론 의사소통기술 중 듣는 기술에 대하여 논하라
의사소통기술 중 듣는 기술에 대하여 논하라 의사소통원칙과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서술
의사소통원칙과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서술 의사소통장애
의사소통장애 의사소통장애 정의, 분류, 특성, 원인, 진단, 치료, 교육
의사소통장애 정의, 분류, 특성, 원인, 진단, 치료, 교육 의사소통에 방해를 가져오는 언어적, 비언어적 요소는 어떤 것이 있는지 토론.
의사소통에 방해를 가져오는 언어적, 비언어적 요소는 어떤 것이 있는지 토론. 의사소통기술에서 아이 메시지(I-message)기법과 유 메시지(YOU-message)기법의 차이점을 쓰...
의사소통기술에서 아이 메시지(I-message)기법과 유 메시지(YOU-message)기법의 차이점을 쓰... 의사소통 유형 개념과 그 유형(회피형, 초이성형, 산만형, 일치형)에 대해 각각 설명하시오.
의사소통 유형 개념과 그 유형(회피형, 초이성형, 산만형, 일치형)에 대해 각각 설명하시오. 가족상담및치료___의사소통의 5가지 유형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가족상담및치료___의사소통의 5가지 유형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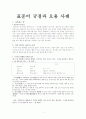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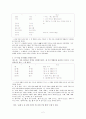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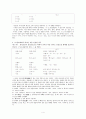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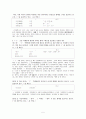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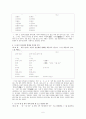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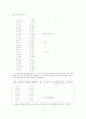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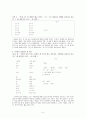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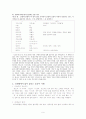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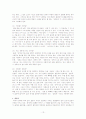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