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위해 기여하는 것으로 포장해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배아줄기세포연구는 기술의 발전을 우선과제로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결과는 감추어왔다. 이는 위험성의 부각이 연구의 활성화, 기술의 발전에 제약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배아줄기세포연구의 거대담론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황우석 사태가 일어나고 배아줄기세포연구의 이면에 있던 문제들이 부각되었다. 제도적 측면에서 난자추출의 위험성에 대한 고지의 의무, 제공의 동의와 권리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여성의 몸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아닌 배아줄기세포연구가 윤리적 비난을 모면하는 수단적 역할로 사용되었다. 생물학적, 사회적 몸을 기술에 가두는 배아줄기세포연구의 담론을 변화시켜 기술과학과 섹슈얼리티의 상호구성성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의 접근은 현재 배아줄기세포연구의 연결구조에 대한 변화이다.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통한 질병의 치료, 기술의 선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영향력 아래 간과되었던 여성의 몸을 인식하고, 이를 배아줄기세포연구의 바탕으로 삼아야한다. 성인의 세포를 분화시킨 성체줄기세포의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루어진 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난자추출은 여성의 몸에 대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성체줄기세포의 연구는 여성의 몸에 대한 위협의 가능성이 전제가 되어야하는 배아줄기세포의 연결고리의 변화를 주는 것이다. 배아줄기세포연구 속 여성의 몸은 기술과학의 가치와 사회적 가치 사이에서 대상화, 수단화되어왔다. 성체줄기세포의 연구는 기존 담론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의 접근은 현재 배아줄기세포연구의 연결구조에 대한 변화이다.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통한 질병의 치료, 기술의 선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영향력 아래 간과되었던 여성의 몸을 인식하고, 이를 배아줄기세포연구의 바탕으로 삼아야한다. 성인의 세포를 분화시킨 성체줄기세포의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루어진 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난자추출은 여성의 몸에 대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성체줄기세포의 연구는 여성의 몸에 대한 위협의 가능성이 전제가 되어야하는 배아줄기세포의 연결고리의 변화를 주는 것이다. 배아줄기세포연구 속 여성의 몸은 기술과학의 가치와 사회적 가치 사이에서 대상화, 수단화되어왔다. 성체줄기세포의 연구는 기존 담론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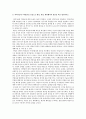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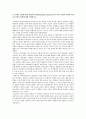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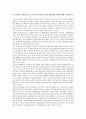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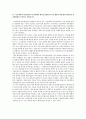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