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김종삼의 생애
2. 김종삼 시인과 그의 시에 대한 연구현황
3. 김종삼의 시세계 및 대표시
4. 그 외 김종삼 시작품 감상
2. 김종삼 시인과 그의 시에 대한 연구현황
3. 김종삼의 시세계 및 대표시
4. 그 외 김종삼 시작품 감상
본문내용
비극과 전쟁난민의 참상, 더 나아가 인간의 비극적 운명을 형상화했다.
그는 평생 소외된 약자였고 삶의 변방에 서서 그늘을 노래한 사람이었다. 가난과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인간을 찾아다니며 물 몇 통 건네주길 원했고, 죽음의 세계를 넘어선 생명의 나무를 꿈꿨고, 밤을 새워 세상에 남길 시를 쓰길 원했다. 그러한 자기 욕망의 한 쪽에는 세상에 버림받은 실패자로서의 낭패감이 상승의 의욕을 낚아채기도 했다. 그의 내면은 자멸과 신생이 교차하는 아이러니의 공간이었다. 그 고통의 아이러니 속에서 우리의 가슴을 때리는 시가 창조된 것은 그의 말대로 기적이고 축복이다. 이 기적과 축복의 시가 1950년대 막장 같은 폐허의 시대에서 1980년대 신기루 같은 허영의 시대까지 펼쳐졌다. 그것은 한 개인의 삶의 굴절을 반영함과 동시에 폐허와 허영 사이에 펼쳐진 시대의 굴곡까지 반영한다. 김종삼의 시는 그런 시대적 상징을 내포한다. “인간의 생명은 잠깐이라지만” 그의 시의 빛은 찬연하고 뜻은 풍성하다.
4. 그 외 김종삼 시작품 감상
- 「술래잡기」 전문, 1969
『김종삼 전집』, 청하, 1988, 77쪽에서 인용
눈을 감고 시의 내용을 연상해보면 고운 색동옷을 입었지만 마냥 앳되어 보이지는 않는 심청이가 오랜만에 제 또래와 웃으며 술래잡기하는 모습이 떠오른다. 그러나 이내 심청이가 술래가 되고, 헝겊을 매 시야를 잃는 순간 심청이는 자신이 두고 온 아버지를 떠올리며 잠시나마 잊었던 현실의 슬픔을 환기하게 된다. 심청이는 ‘술래잡기’로는 현실의 고통에서 도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망부석이 되고 만다.
술래잡기는 ‘심청일 웃겨보자’는 착하고 순진한 아이들의 동심에서 비롯된 놀이이다. 하지만 심청이가 술래가 되자 이상한 상황이 되고 만다. ‘위로해주는’ 아이들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심청이는 더 이상 어울릴 수 없는 소외자가 되버린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심청이’는 따뜻한 사랑에도 실존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자들을 표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시는 소외된 이들을 보듬고자 하는 김종삼의 따뜻한 마음과 그럼에도 비극적이고 비화해적인 세계관에 의해 본질적으로는 소외될 수밖에 없는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느껴져 읽는 이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전문,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민음사, 1982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는 김종삼의 마지막 개인 시집의 표제작이다. 어떠한 수사나 기교 없이 시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투박하지만 올곧은 대답을 남겨준 시다.
그는 ‘시가 무엇이냐’며 묻는 질문에 ‘자신은 시인이 못됨으로 대답할 수 없다’고 회피한다. 이윽고 전형적인 소시민들이 복작거리는 곳을 돌아다니고 나서야 ‘순하고 명랑하고 맘 좋고 인정이 있어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시인이라며 대답한다. 앞선 물桶에서 드러나는 시의 주제의식과 연결하면 순하고 명량하고 맘 좋고 인정이 있는 사람이 이타적 삶을 실천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삶은 김종삼이 추구하는 진정한 시의 목적과 일치하는 것이다.
김종삼은 누가 그를 시인이라고 소개하면 “나 같이 인간도 덜 된 놈이 무슨 시인이냐. 건달이다. 후라이나 까고”라며 시인으로서의 자신을 냉소했다고 한다. 강석경, 앞의 책, 291쪽 참고.
또한 그의 산문 중 「먼 ‘시인의 영역’」에서 그는 스스로를 시인의 영역에 도달할 수 없는 엉터리 시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종삼, 「먼 ‘시인의 영역’」, 『문학사상』, 1973.
이는 글짓기, 앙포르멜, 물통 등 자신을 반성하는 시가 적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속 ‘나는 시인이 못 된다’라는 반성적 대답이 대략 30년의 창작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나온 말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이러한 부정은 그가 엄격하게 시의 목적의식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가치 추구를 위한 그의 끊임없는 반성에서 나온 물음, 즉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속 ‘시가 무엇이냐’, 물桶 속 ‘그동안 무엇을 하였느냐’의 물음은 보편적 가치로서의 삶을 요구함으로써 인정이 메말라가는 현대사회의 우리의 심장에 성찰이라는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 참고 문헌
기본 자료
김종삼, 『십이음계』, 삼애사, 1969.
,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민음사, 1982.
, 『김종삼 전집』(장석주 편), 청하, 1988.
2. 국내 논저
권명옥, 「추상성 시학」, 『한국언어문화』 제17집, 한국언어문화학회, 1999.
, 「은폐성의 정서와 시학」, 『한국시학연구』 제11집, 한국시학회, 2004.
, 「적막의 미학」, 『한국문예비평연구』 제15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4.
김 현, 「김종삼을 찾아서」, 장석주 편, 『김종삼 전집』, 청하. 1988.
김성조, 김종삼 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0.
김시태, 「언어의 고독한 축제」, 『한국의 현대시 연구』, 민음사, 1989.
김주연, 「김종삼을 찾아서」, 장석주 편, 『김종삼 전집』, 청하, 1988.
김춘수, 「김종삼과 시의 비애」, 『의미와 무의미』, 문학과지성사, 1976.
남진우, 미적 근대성과 순간의 시학 연구, 중앙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1.
반경환, 「폐허 속의 시학」, 『시와 의식』, 문학과지성사, 1992.
송현지, 시인으로서의 자기 인식과 시쓰기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7.
오규원, 「타프니스 시인론」, 『현실과 극기』, 문학과지성사. 1986.
오형엽, 「풍경의 배움과 존재의 감춤」, 『1950년대 시인들』, 나남, 1994.
이경수, 「부정의 미학」, 장석주 편, 『김종삼 전집』, 청하, 1988.
이민호, 『김종삼의 시적 상상력과 텍스트성』, 보고사, 2004.
이숭원, 「김종삼 시의 환상과 현실」, 『20세기 한국시인론』, 국학자료원, 1997.
, 『김종삼 시를 찾아서』, 태학사, 2015.
이승훈, 「평화의 시학」, 장석주 편, 『김종삼 전집』, 청하, 1988.
장석주, 「한 미학주의자의 상상세계」, 『김종삼 전집』, 청하, 1988.
하현식, 「두 가지 줄기의 시학」, 『현대시학』, 1983.
황동규, 「잔상의 미학」, 장석주 편, 『김종삼 전집』, 청하, 1988.
그는 평생 소외된 약자였고 삶의 변방에 서서 그늘을 노래한 사람이었다. 가난과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인간을 찾아다니며 물 몇 통 건네주길 원했고, 죽음의 세계를 넘어선 생명의 나무를 꿈꿨고, 밤을 새워 세상에 남길 시를 쓰길 원했다. 그러한 자기 욕망의 한 쪽에는 세상에 버림받은 실패자로서의 낭패감이 상승의 의욕을 낚아채기도 했다. 그의 내면은 자멸과 신생이 교차하는 아이러니의 공간이었다. 그 고통의 아이러니 속에서 우리의 가슴을 때리는 시가 창조된 것은 그의 말대로 기적이고 축복이다. 이 기적과 축복의 시가 1950년대 막장 같은 폐허의 시대에서 1980년대 신기루 같은 허영의 시대까지 펼쳐졌다. 그것은 한 개인의 삶의 굴절을 반영함과 동시에 폐허와 허영 사이에 펼쳐진 시대의 굴곡까지 반영한다. 김종삼의 시는 그런 시대적 상징을 내포한다. “인간의 생명은 잠깐이라지만” 그의 시의 빛은 찬연하고 뜻은 풍성하다.
4. 그 외 김종삼 시작품 감상
- 「술래잡기」 전문, 1969
『김종삼 전집』, 청하, 1988, 77쪽에서 인용
눈을 감고 시의 내용을 연상해보면 고운 색동옷을 입었지만 마냥 앳되어 보이지는 않는 심청이가 오랜만에 제 또래와 웃으며 술래잡기하는 모습이 떠오른다. 그러나 이내 심청이가 술래가 되고, 헝겊을 매 시야를 잃는 순간 심청이는 자신이 두고 온 아버지를 떠올리며 잠시나마 잊었던 현실의 슬픔을 환기하게 된다. 심청이는 ‘술래잡기’로는 현실의 고통에서 도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망부석이 되고 만다.
술래잡기는 ‘심청일 웃겨보자’는 착하고 순진한 아이들의 동심에서 비롯된 놀이이다. 하지만 심청이가 술래가 되자 이상한 상황이 되고 만다. ‘위로해주는’ 아이들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심청이는 더 이상 어울릴 수 없는 소외자가 되버린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심청이’는 따뜻한 사랑에도 실존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자들을 표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시는 소외된 이들을 보듬고자 하는 김종삼의 따뜻한 마음과 그럼에도 비극적이고 비화해적인 세계관에 의해 본질적으로는 소외될 수밖에 없는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느껴져 읽는 이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전문,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민음사, 1982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는 김종삼의 마지막 개인 시집의 표제작이다. 어떠한 수사나 기교 없이 시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투박하지만 올곧은 대답을 남겨준 시다.
그는 ‘시가 무엇이냐’며 묻는 질문에 ‘자신은 시인이 못됨으로 대답할 수 없다’고 회피한다. 이윽고 전형적인 소시민들이 복작거리는 곳을 돌아다니고 나서야 ‘순하고 명랑하고 맘 좋고 인정이 있어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시인이라며 대답한다. 앞선 물桶에서 드러나는 시의 주제의식과 연결하면 순하고 명량하고 맘 좋고 인정이 있는 사람이 이타적 삶을 실천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삶은 김종삼이 추구하는 진정한 시의 목적과 일치하는 것이다.
김종삼은 누가 그를 시인이라고 소개하면 “나 같이 인간도 덜 된 놈이 무슨 시인이냐. 건달이다. 후라이나 까고”라며 시인으로서의 자신을 냉소했다고 한다. 강석경, 앞의 책, 291쪽 참고.
또한 그의 산문 중 「먼 ‘시인의 영역’」에서 그는 스스로를 시인의 영역에 도달할 수 없는 엉터리 시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종삼, 「먼 ‘시인의 영역’」, 『문학사상』, 1973.
이는 글짓기, 앙포르멜, 물통 등 자신을 반성하는 시가 적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속 ‘나는 시인이 못 된다’라는 반성적 대답이 대략 30년의 창작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나온 말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이러한 부정은 그가 엄격하게 시의 목적의식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가치 추구를 위한 그의 끊임없는 반성에서 나온 물음, 즉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속 ‘시가 무엇이냐’, 물桶 속 ‘그동안 무엇을 하였느냐’의 물음은 보편적 가치로서의 삶을 요구함으로써 인정이 메말라가는 현대사회의 우리의 심장에 성찰이라는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 참고 문헌
기본 자료
김종삼, 『십이음계』, 삼애사, 1969.
,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민음사, 1982.
, 『김종삼 전집』(장석주 편), 청하, 1988.
2. 국내 논저
권명옥, 「추상성 시학」, 『한국언어문화』 제17집, 한국언어문화학회, 1999.
, 「은폐성의 정서와 시학」, 『한국시학연구』 제11집, 한국시학회, 2004.
, 「적막의 미학」, 『한국문예비평연구』 제15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4.
김 현, 「김종삼을 찾아서」, 장석주 편, 『김종삼 전집』, 청하. 1988.
김성조, 김종삼 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0.
김시태, 「언어의 고독한 축제」, 『한국의 현대시 연구』, 민음사, 1989.
김주연, 「김종삼을 찾아서」, 장석주 편, 『김종삼 전집』, 청하, 1988.
김춘수, 「김종삼과 시의 비애」, 『의미와 무의미』, 문학과지성사, 1976.
남진우, 미적 근대성과 순간의 시학 연구, 중앙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1.
반경환, 「폐허 속의 시학」, 『시와 의식』, 문학과지성사, 1992.
송현지, 시인으로서의 자기 인식과 시쓰기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7.
오규원, 「타프니스 시인론」, 『현실과 극기』, 문학과지성사. 1986.
오형엽, 「풍경의 배움과 존재의 감춤」, 『1950년대 시인들』, 나남, 1994.
이경수, 「부정의 미학」, 장석주 편, 『김종삼 전집』, 청하, 1988.
이민호, 『김종삼의 시적 상상력과 텍스트성』, 보고사, 2004.
이숭원, 「김종삼 시의 환상과 현실」, 『20세기 한국시인론』, 국학자료원, 1997.
, 『김종삼 시를 찾아서』, 태학사, 2015.
이승훈, 「평화의 시학」, 장석주 편, 『김종삼 전집』, 청하, 1988.
장석주, 「한 미학주의자의 상상세계」, 『김종삼 전집』, 청하, 1988.
하현식, 「두 가지 줄기의 시학」, 『현대시학』, 1983.
황동규, 「잔상의 미학」, 장석주 편, 『김종삼 전집』, 청하,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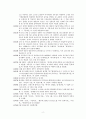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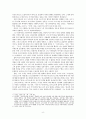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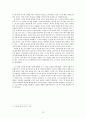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