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한국어와 독일어의 공통점
1. 분명한 존댓말 표현
2. 동사가 문장 끝에 온다.
3. 긴 합성어
4. 애매한 대답
5. 다 마찬가지다
Ⅱ. 한국어와 독일어의 형용사
1. 한국어와 독일어의 기능과 형태
2. 발렌츠와 문형
1. 분명한 존댓말 표현
2. 동사가 문장 끝에 온다.
3. 긴 합성어
4. 애매한 대답
5. 다 마찬가지다
Ⅱ. 한국어와 독일어의 형용사
1. 한국어와 독일어의 기능과 형태
2. 발렌츠와 문형
본문내용
한국어에서 형용사가 술어가 되는 문장들이 귀속되는 문형들의 체계의 구성 요서로 ‘N이’,‘N에’,‘N보다’,‘N로’등의 다석 개의 구, 즉 조사‘이’,‘에’,‘와’,‘보다’,‘로’ 등을 지닌 구를 설정한 다음, ‘N이’와 형용사 술어로 이루어지는 문형 1개, ‘N이’와 어느 다른 구 하나나 또 하나의 ‘N이’와 형용사 술어로 이루어지는 문형 5개. ‘N이’와 어느 다른 구 하나와 또 하나의 ‘N이’와 형용사 술어로 이루어지는 문형 2개 등 모두 8개의 문형을 설정하고 있다.
각 문형에 귀속되는 문장의 실례는 다음과 같다.
제 1형 〈N이 +A〉
꽃이 아름답다.
제 2형 〈N이 + N에 + A〉
이 약은 몸에 해롭다.
제 3형 〈N이 + N와 + A〉
동생은 형과 다르다.
제 4형 〈N이 + N보다 + A〉
우리 반이 1반보다 못하다.
제 5형 〈N이 + N이 + A〉
나는 밤이 무섭다.
제 6형 〈N이 + N로 + A〉
그는 아동 작가로 유명하다.
제 7형 〈N이 + N로 + N이 + A〉
연변은 사과배산지로 소문이 짜하다.
제 8형 〈N이 + N와 + N이 + A〉
그는 영수와 사이과 좋다.
이중 제7형게 속하는 문장에 있는 형용사들이 언제나 ‘소문’, ‘이름’등과 같은 특정 단어와 결합되어 나타나고 이 결합체가 해당 문장의 술어를 이루므로, 이런 문장들은 모두 제6형에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고 따라서 제7형이란 문형은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에 대해 강은국(1993)에서는 제7형의 〈N이 +A〉의 구조가 아직까지는 매개의 구성요소가 각자의 자립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바 제6형의 기본문형을 이루는 〈이름높다〉, 〈성망높다〉와 같은 공고한 단어결합으로까지는 발달되지 못했고, 이 〈N이 +A〉의 구조가 비록 어느 정도 설구론적인 결합관계에 놓여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아주 밀착된 결합으로까지는 되지 않았기에 그 사이에 다른 수식어들을 자유롭게 끼워넣을 수 있다. 또 〈N이〉의 위치를 어순바꿈의 수법에 의해 다른 구성요소들의 앞에 끌어 내갈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문장들에 있어서 술어는 형용사만으로 이루어지고 그 앞에 위치한 조사 ‘가’가 붙은 구는 독립적인 문장 성분으로 간주할 수 있고, 따라서 제7형과 같은 문형을 설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한다.
그런데 강은국(1993)에서는 제6형에 귀속되는 문장의 한 실례로 문장 최교수는 언어학자로 이름높다를 들고 있는데 이 문장은 다음의 문장과 등가물이다.
최교수는 언어학자로 이름이 높다.
그런데 이 문장과 제7형에 귀속되는 문장의 실례로 든 문장 ‘연변은 사과배산지로 소문이 짜하다.’는 차이가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고, 이에 따라 이 문장도 제7형에 귀속시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등가물인 두 문장 ‘최교수는 언어학자로 이름높다.’와 ‘최교수는 언어학자로 이름이 높다.’가 각각 상이한 문형에 귀속되는 결과가 생기게 된다. 다음의 두 문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미문가(美文家)로 이름있다.
그는 미문가(美文家)로 이름이 있다.
실제로 문형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처럼 문장 내에 특정 명사가 외관상 보어의 형태로 특정 형용사와 항상 함께 나타나는 경우 문장에서 무엇을 술어로 파악할 것인가가 적잖이 문제가 된다.
그는 고고학에 조예가 깊다.
이 문장에서 ‘조예가 깊다’를 술어로 간주하면 이 문장은 위의 제2형에 귀속되지만, 만약 이 문장의 술어가 ‘깊다’라고 해석하면 이 문장은 위의 어느 문형에도 귀속되지 못하고, 따라서 이를 위해 하나의 새로운 문형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후자의 입장을 취하는 주복매(1986)에서는 이런 문장을 〈임자말 +〔임자씨+에〕+〔임자씨+이/가〕+풀이말〉이란 문형에 귀속시킨다.
각 문형에 귀속되는 문장의 실례는 다음과 같다.
제 1형 〈N이 +A〉
꽃이 아름답다.
제 2형 〈N이 + N에 + A〉
이 약은 몸에 해롭다.
제 3형 〈N이 + N와 + A〉
동생은 형과 다르다.
제 4형 〈N이 + N보다 + A〉
우리 반이 1반보다 못하다.
제 5형 〈N이 + N이 + A〉
나는 밤이 무섭다.
제 6형 〈N이 + N로 + A〉
그는 아동 작가로 유명하다.
제 7형 〈N이 + N로 + N이 + A〉
연변은 사과배산지로 소문이 짜하다.
제 8형 〈N이 + N와 + N이 + A〉
그는 영수와 사이과 좋다.
이중 제7형게 속하는 문장에 있는 형용사들이 언제나 ‘소문’, ‘이름’등과 같은 특정 단어와 결합되어 나타나고 이 결합체가 해당 문장의 술어를 이루므로, 이런 문장들은 모두 제6형에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고 따라서 제7형이란 문형은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에 대해 강은국(1993)에서는 제7형의 〈N이 +A〉의 구조가 아직까지는 매개의 구성요소가 각자의 자립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바 제6형의 기본문형을 이루는 〈이름높다〉, 〈성망높다〉와 같은 공고한 단어결합으로까지는 발달되지 못했고, 이 〈N이 +A〉의 구조가 비록 어느 정도 설구론적인 결합관계에 놓여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아주 밀착된 결합으로까지는 되지 않았기에 그 사이에 다른 수식어들을 자유롭게 끼워넣을 수 있다. 또 〈N이〉의 위치를 어순바꿈의 수법에 의해 다른 구성요소들의 앞에 끌어 내갈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문장들에 있어서 술어는 형용사만으로 이루어지고 그 앞에 위치한 조사 ‘가’가 붙은 구는 독립적인 문장 성분으로 간주할 수 있고, 따라서 제7형과 같은 문형을 설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한다.
그런데 강은국(1993)에서는 제6형에 귀속되는 문장의 한 실례로 문장 최교수는 언어학자로 이름높다를 들고 있는데 이 문장은 다음의 문장과 등가물이다.
최교수는 언어학자로 이름이 높다.
그런데 이 문장과 제7형에 귀속되는 문장의 실례로 든 문장 ‘연변은 사과배산지로 소문이 짜하다.’는 차이가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고, 이에 따라 이 문장도 제7형에 귀속시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등가물인 두 문장 ‘최교수는 언어학자로 이름높다.’와 ‘최교수는 언어학자로 이름이 높다.’가 각각 상이한 문형에 귀속되는 결과가 생기게 된다. 다음의 두 문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미문가(美文家)로 이름있다.
그는 미문가(美文家)로 이름이 있다.
실제로 문형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처럼 문장 내에 특정 명사가 외관상 보어의 형태로 특정 형용사와 항상 함께 나타나는 경우 문장에서 무엇을 술어로 파악할 것인가가 적잖이 문제가 된다.
그는 고고학에 조예가 깊다.
이 문장에서 ‘조예가 깊다’를 술어로 간주하면 이 문장은 위의 제2형에 귀속되지만, 만약 이 문장의 술어가 ‘깊다’라고 해석하면 이 문장은 위의 어느 문형에도 귀속되지 못하고, 따라서 이를 위해 하나의 새로운 문형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후자의 입장을 취하는 주복매(1986)에서는 이런 문장을 〈임자말 +〔임자씨+에〕+〔임자씨+이/가〕+풀이말〉이란 문형에 귀속시킨다.
추천자료
 국어학 - 과거시제체계'-었-' 에 관하여
국어학 - 과거시제체계'-었-' 에 관하여 [영어]영어교육(영어학습)의 의의, 영어교육(영어학습)의 실패요인, English Cafe(영어카페, ...
[영어]영어교육(영어학습)의 의의, 영어교육(영어학습)의 실패요인, English Cafe(영어카페, ... [문법][전통문법][규범문법][구조문법][역사비교문법]문법의 개념, 문법의 특징, 문법의 범주...
[문법][전통문법][규범문법][구조문법][역사비교문법]문법의 개념, 문법의 특징, 문법의 범주... 킹제임스성경(KJV, 흠정역성경)의 특징, 킹제임스성경(KJV, 흠정역성경)의 탄생, 킹제임스성...
킹제임스성경(KJV, 흠정역성경)의 특징, 킹제임스성경(KJV, 흠정역성경)의 탄생, 킹제임스성... [번역][번역과 번역사][번역과 번역학][번역과 한자어][번역과 오역][번역과 번역문제점][번...
[번역][번역과 번역사][번역과 번역학][번역과 한자어][번역과 오역][번역과 번역문제점][번... EBS다큐프라임 언어발달의 수수께끼 감상문
EBS다큐프라임 언어발달의 수수께끼 감상문 2016년 2학기 언어의이해 중간시험과제물 E형(번역의 관점에서 영어와 한국어의 특성)
2016년 2학기 언어의이해 중간시험과제물 E형(번역의 관점에서 영어와 한국어의 특성) [한국어 교육론] 국내 국외 교재 분석
[한국어 교육론] 국내 국외 교재 분석 말하기 수업시 활용 가능한 활동과 청화식 교수법에 대한 고찰
말하기 수업시 활용 가능한 활동과 청화식 교수법에 대한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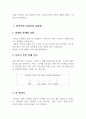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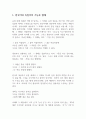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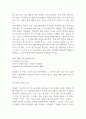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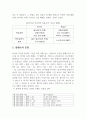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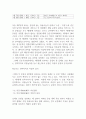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