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소개
2. 사계절의 주요 세시풍속
3. 끝맺음
4. 참고자료
2. 사계절의 주요 세시풍속
3. 끝맺음
4. 참고자료
본문내용
더 간소하고, 얼른 추위가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것이 많았습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세시풍속이 바로 동지이죠.
동지는 밤이 가장 길고 해가 가장 짧은 날을 일컫는 말로, 대개 양력 12월 22일이나 23일쯤이 동지가 되었습니다. 밤이 가장 길고 해가 가장 짧은 날이라는 뜻은, 겨울의 가장 가운데에 있는 날이자 그만큼 추운 날이기도 하다는 의미지요. 그래서 이 날에는 따뜻한 팥죽을 만들어 먹는 것이 중요한 세시풍속이었습니다. 다른 죽을 먹어도 되는데 왜 굳이 팥죽이었을까요? 이는 붉은 팥이 귀신을 쫓아내는 힘이 있어 긴 밤 혹시 침범할 지도 모르는 귀신을 팥죽이 막아내 줄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팥죽을 단순히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집의 외진 곳, 예를 들면 헛간이나 장독대 같은 곳에 올려 두었다가 먹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런 곳에 혹시 들어와 있을지도 모르는 귀신을 쫓아내는 의미였죠.
앞서 추수를 감사하는 추석과 같은 명절은 농경 사회에는 그 어디에나 있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겨울의 한가운데에서 해가 가장 긴 날, 다시 말하면 이제 해가 짧아져 봄이 오는 과정이 시작되는 날을 기리는 것 역시 농경 사회에서는 흔히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겨울이 농경 사회에서는 버티기 힘들었다는 의미이지요. 혹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을 기리는 기독교의 명절 크리스마스도 이 동지와 같은 명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남선. \"세시풍속 상식사전.\"-- (2012), 90%(교보 ebook 기준)
12월 22일과 25일. 우연치고는 너무 가깝지 않나요? 학생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 궁금하네요.
3. 끝맺음
자, 이렇게 우리나라 사계절의 많은 세시풍속 중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설날, 단오, 추석, 동지에 관한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이미 알고 있었던 명절과 세시풍속도 있었고, 알지 못했던 세시풍속도 있었을 겁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명절이라도 새로 알게 된 세시풍속도 있었을 거고요. 어떤 부분에선 지루했고, 어떤 면에선 흥미로웠을 겁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부분보다 어? 이런 부분도 있었어? 하는 부분이 많았기를, 지루했던 부분보다 흥미로웠던 부분이 많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진부함과 새로움, 지루함과 흥미로움보다 제가 이 글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바는 과거 우리 조상님들이 왜 이런 전통을 가지게 되었는지, 어째서 이런 전통이 필요했는지 그 이유입니다. 조상님들은 우리와 달리 농사가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농경 사회에서 사셨고, 그래서 농사를 중심에 두고 모든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른바 세시풍속이라 불리는 것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일견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을 감안하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조금이나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시대가 변하면서 이 모든 세시풍속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대가 변했고, 우리는 이제 농사가 아니라 스마트폰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세상을 살고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특히 유네스코 세계 문화재로 지정된 단오 문화처럼, 충분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 안타까움을 넘어 슬프기도 합니다. 학생 여러분은 오늘 이 글에서 알게 된 것을 조금이라도 더 기억해서 이 사라져가는 세시풍속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참고자료
1. 최남선. \"세시풍속 상식사전.\"-- (2012)
동지는 밤이 가장 길고 해가 가장 짧은 날을 일컫는 말로, 대개 양력 12월 22일이나 23일쯤이 동지가 되었습니다. 밤이 가장 길고 해가 가장 짧은 날이라는 뜻은, 겨울의 가장 가운데에 있는 날이자 그만큼 추운 날이기도 하다는 의미지요. 그래서 이 날에는 따뜻한 팥죽을 만들어 먹는 것이 중요한 세시풍속이었습니다. 다른 죽을 먹어도 되는데 왜 굳이 팥죽이었을까요? 이는 붉은 팥이 귀신을 쫓아내는 힘이 있어 긴 밤 혹시 침범할 지도 모르는 귀신을 팥죽이 막아내 줄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팥죽을 단순히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집의 외진 곳, 예를 들면 헛간이나 장독대 같은 곳에 올려 두었다가 먹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런 곳에 혹시 들어와 있을지도 모르는 귀신을 쫓아내는 의미였죠.
앞서 추수를 감사하는 추석과 같은 명절은 농경 사회에는 그 어디에나 있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겨울의 한가운데에서 해가 가장 긴 날, 다시 말하면 이제 해가 짧아져 봄이 오는 과정이 시작되는 날을 기리는 것 역시 농경 사회에서는 흔히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겨울이 농경 사회에서는 버티기 힘들었다는 의미이지요. 혹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을 기리는 기독교의 명절 크리스마스도 이 동지와 같은 명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남선. \"세시풍속 상식사전.\"-- (2012), 90%(교보 ebook 기준)
12월 22일과 25일. 우연치고는 너무 가깝지 않나요? 학생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 궁금하네요.
3. 끝맺음
자, 이렇게 우리나라 사계절의 많은 세시풍속 중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설날, 단오, 추석, 동지에 관한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이미 알고 있었던 명절과 세시풍속도 있었고, 알지 못했던 세시풍속도 있었을 겁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명절이라도 새로 알게 된 세시풍속도 있었을 거고요. 어떤 부분에선 지루했고, 어떤 면에선 흥미로웠을 겁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부분보다 어? 이런 부분도 있었어? 하는 부분이 많았기를, 지루했던 부분보다 흥미로웠던 부분이 많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진부함과 새로움, 지루함과 흥미로움보다 제가 이 글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바는 과거 우리 조상님들이 왜 이런 전통을 가지게 되었는지, 어째서 이런 전통이 필요했는지 그 이유입니다. 조상님들은 우리와 달리 농사가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농경 사회에서 사셨고, 그래서 농사를 중심에 두고 모든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른바 세시풍속이라 불리는 것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일견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을 감안하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조금이나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시대가 변하면서 이 모든 세시풍속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대가 변했고, 우리는 이제 농사가 아니라 스마트폰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세상을 살고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특히 유네스코 세계 문화재로 지정된 단오 문화처럼, 충분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 안타까움을 넘어 슬프기도 합니다. 학생 여러분은 오늘 이 글에서 알게 된 것을 조금이라도 더 기억해서 이 사라져가는 세시풍속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참고자료
1. 최남선. \"세시풍속 상식사전.\"-- (2012)
추천자료
 [한국문화자원의 이해2 2학년 공통] 강의 1강에서 학습한 세시풍속 중 봄 여름 가을 겨울을 ...
[한국문화자원의 이해2 2학년 공통] 강의 1강에서 학습한 세시풍속 중 봄 여름 가을 겨울을 ... 방송통신대학교/한국문화자원의 이해2/강의 1강에서 학습한 세시풍속 중 봄, 여름, 가을, 겨...
방송통신대학교/한국문화자원의 이해2/강의 1강에서 학습한 세시풍속 중 봄, 여름, 가을, 겨... 2021년 2학기 한국문화자원의이해2 중간시험과제물 공통(강의 1강에서 학습한 세시풍속)
2021년 2학기 한국문화자원의이해2 중간시험과제물 공통(강의 1강에서 학습한 세시풍속) [한국문화자원의이해2 2학년 공통] 강의 1강에서 학습한 세시풍속 중 봄․여름․가을․겨울을 대...
[한국문화자원의이해2 2학년 공통] 강의 1강에서 학습한 세시풍속 중 봄․여름․가을․겨울을 대... 한국문화자원의이해2 ) 강의 1강에서 학습한 세시풍속 중 봄․여름․가을․겨울을 대표하는 세시...
한국문화자원의이해2 ) 강의 1강에서 학습한 세시풍속 중 봄․여름․가을․겨울을 대표하는 세시... 한국문화자원의이해2 ) 세시풍속 중 봄,여름,가을,겨울을 대표하는 세시풍속을 각각 1개씩 선...
한국문화자원의이해2 ) 세시풍속 중 봄,여름,가을,겨울을 대표하는 세시풍속을 각각 1개씩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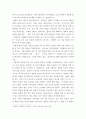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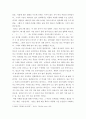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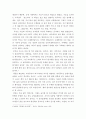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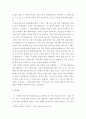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