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식회사법
※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사이트 glaw.scourt.go.kr을 이용할 것)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대전고등법원 2007. 8. 24. 선고 2007나77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대전지방법원 2006. 12. 28. 선고 2006가합25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1. 서론2. 본론
2.1 사실관계
2.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2.2.1 법적 쟁점
2.2.1.1 존속 회사의 자본 증가 한도
2.2.1.2 합병 비율의 불공정성
2.2.1.3 합병 비율 산정의 효력
2.2.2 법원의 판단
2.3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
※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사이트 glaw.scourt.go.kr을 이용할 것)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대전고등법원 2007. 8. 24. 선고 2007나77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대전지방법원 2006. 12. 28. 선고 2006가합25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1. 서론2. 본론
2.1 사실관계
2.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2.2.1 법적 쟁점
2.2.1.1 존속 회사의 자본 증가 한도
2.2.1.2 합병 비율의 불공정성
2.2.1.3 합병 비율 산정의 효력
2.2.2 법원의 판단
2.3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아 채무초과 회사를 당사자로 하여 합병을 할 경우 규제를 해야 한다고 여기게 되었다. 하지만, 합병은 이러한 부실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에 채무초과 회사의 합병을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사회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서 비효율적으로 결과를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채무초과 회사가 합병당사회사가 되는 것에 대한 관련 조항이 존재하지 않고, 이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경우 본 상황에 대하여 원고가 얼마나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판결을 내리게 된다. 따라서 본인은 이에 대하여 정확한 판결 사례 및 조항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다.
세 번째 쟁점을 보면 비상장 법인과 상장법인 사이의 합병을 진행할 때 정확한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비상장 법인으로 인하여 주식가격을 산정하는 것에 대한 불명확성으로 발생한 주장으로 판단된다. 비상장 법인의 주식가격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해야 할지는 지금까지 많은 사안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 방식이 아직까지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문을 가지게 되면서도, 이에 대하여 합병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협상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문제가 덜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되는 것 같다. 특정 계산식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합병비율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주식 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너무 강제적인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3. 결론
본 사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계열사 사이의 합병이나,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합병은 한국의 합병 거래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거래 형식이다. 이러한 부실기업과의 합병을 바라볼 때 소멸회사의 순 자산이나, 채무 초과 여부 등을 바탕으로 하여 합병을 조정하는 방식은 줄어들어야 한다. 이보다는 계열사와의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합병을 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부실기업이 합병 당사자가 될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주나 채권자가 손실을 당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금지하거나 증가될 자본금을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악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
즉, 무조건적으로 한쪽의 주장에 따라 합병을 진행하거나, 법에 의존하여 합병을 진행하기 보다는 양측의 주장을 파악 후 서로 절충하여 합의에 의해 진행되는 합병이 적합할 것이다. 이렇게 합병을 진행하게 될 경우 많은 기업들은 서로 간의 불만 없이 합병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대법원 2008다64136판례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1743
노혁준, (2009). 부실계열사 합병과 합병비율, 한국상사법학회
http://www.riss.kr.openlink.ssu.ac.kr:8080/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04d82043ad3acb974884a65323211ff0
세 번째 쟁점을 보면 비상장 법인과 상장법인 사이의 합병을 진행할 때 정확한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비상장 법인으로 인하여 주식가격을 산정하는 것에 대한 불명확성으로 발생한 주장으로 판단된다. 비상장 법인의 주식가격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해야 할지는 지금까지 많은 사안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 방식이 아직까지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문을 가지게 되면서도, 이에 대하여 합병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협상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문제가 덜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되는 것 같다. 특정 계산식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합병비율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주식 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너무 강제적인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3. 결론
본 사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계열사 사이의 합병이나,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합병은 한국의 합병 거래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거래 형식이다. 이러한 부실기업과의 합병을 바라볼 때 소멸회사의 순 자산이나, 채무 초과 여부 등을 바탕으로 하여 합병을 조정하는 방식은 줄어들어야 한다. 이보다는 계열사와의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합병을 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부실기업이 합병 당사자가 될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주나 채권자가 손실을 당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금지하거나 증가될 자본금을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악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
즉, 무조건적으로 한쪽의 주장에 따라 합병을 진행하거나, 법에 의존하여 합병을 진행하기 보다는 양측의 주장을 파악 후 서로 절충하여 합의에 의해 진행되는 합병이 적합할 것이다. 이렇게 합병을 진행하게 될 경우 많은 기업들은 서로 간의 불만 없이 합병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대법원 2008다64136판례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1743
노혁준, (2009). 부실계열사 합병과 합병비율, 한국상사법학회
http://www.riss.kr.openlink.ssu.ac.kr:8080/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04d82043ad3acb974884a65323211ff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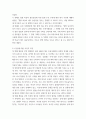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