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1) 영화 <파이트 클럽>의 스토리텔링
2) 영화 속의 서사적 정체성 – 정신분석학에 기반한 등장인물 간 갈등구조
3. 결론
2. 본론
1) 영화 <파이트 클럽>의 스토리텔링
2) 영화 속의 서사적 정체성 – 정신분석학에 기반한 등장인물 간 갈등구조
3. 결론
본문내용
금에 집착하는 것인지, 모임 활동은 왜 병적으로 꾸준히 나갔었는지 등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다. 그동안 결핍되었던 일차적인 욕구가 타일러와의 주먹다짐을 통해 극적으로 해소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잭은 전보다 훨씬 더 대담해지고 점점 더 타일러와 비슷한 사람이 되어간다. 이후 매주 서로를 때리며 쾌감을 느끼는 파이트 클럽이 탄생하게 된다.
잭과 타일러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폭력 행위에 전염시킨다. 이러한 과정에서 역설적이게도 잭은 삶의 활력을 되찾는다. 점점 더 타일러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며 잭은 환자들의 모임에도 나가지 않게 된다. 과거에 그였다면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가구를 닦고 쓸고 청소했을 것이다. 하지만 잭은 이러한 과거의 자신과 결별한다. 파이트 클럽이 잭의 과거를 뒤엎는 역할까지 하게 된 것이다.
영화에서 파이트 클럽이 전국 각지로 순식간에 퍼지는 모습은 억압된 욕망을 무의식에 가둬두고 지내는 사람이 그만큼 많이 있음을 암시한다. 심지어 파이트 클럽의 규칙 1조가 다른 사람들에게 파이트 클럽에 대해 누설하지 말 것인데도 말이다. 파이트 클럽 안에서는 누구든지 마음대로 싸울 수 있고 승자와 패자가 없다. 항복하는 순간 싸움은 끝난다. 싸움으로 그 어떤 내기도 하지 않는다. 오로지 순수한 싸움만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파이트 클럽이다. 이러한 파이트 클럽에서 사람들은 모두 어느 때보다 살아있는 것 같은 강한 생명력을 느낀다. 잭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도 억압되고 내재하여있던 욕구가 해소되면서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게 된다. 이와 반대로 파이트 클럽 밖에서의 일상은 전보다 더 지루하고 단조로울 뿐이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파이트 클럽에 더더욱 모여들게 된다.
- 자살로 표현된 자존감 상실
영화에서 타일러가 자신의 머리에 총을 겨눈 이후의 장면은 은유적으로 표현되어 굉장히 난해하다. 아마도 총을 겨누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단순히 자살 그 이상의 무언가로 남기고 싶어 한 감독의 의도가 아닐까 추측해본다. 타일러가 자신의 머리에 총을 겨누는 행위는 무의식 속 억압된 충동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싶은 욕망이 죽음도 불사할 만큼 간절한 욕망임을 암시한다. 자유를 추구하며 폭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타일러의 본능은 총소리와 함께 사라졌지만 타일러는 죽지 않았다. 영화에서 타일러가 자신에게 총을 겨누며 나는 눈을 뜨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 장면은 주인공 역시 자신의 내면이 진짜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다.
이러한 타일러를 바라보며 걱정하는 말라는 그의 상처를 보듬어준다. 타일러와 말라가 손을 잡는 순간 현대문명의 부산물들이 폭파한다. 여기서 진정한 자존감을 발견하게 된다. 말라와 손을 잡으면서 타인과 진솔한 소통을 하게 되고 잃어버린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다. 폭파된 부산물들은 그동안 자신을 가둬두었던 것들을 의미하며 모든 것이 폭파되며 사라지는 장면에서 우리는 이유 모를 통쾌함을 느끼게 되는데 무의식의 단단한 벽을 깨고 내재한 욕구를 극 중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마주했기 때문이다.
결론
인간의 무의식은 자기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깊게 내재하여있는 이질적인 영역이다. 영화 <파이트 클럽>은 잭의 내면을 완벽하게 장악해버린 타자의 담론이다. 뒤늦게 깨달은 환상을 직면하는 잭을 보면서 우리는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 영화에서 감독은 자본주의가 낳은 대량생산 상품의 소비문화를 꼬집는다. 쏟아지는 상품의 물결에서 우리는 과연 안녕한 것인지, 우리도 잭과 다를 바 없는 인간이라는 메시지를 던진다. 무기력한 삶 속에서 상품을 소비하는 단순하고 반복된 행동으로 억압된 무의식을 해소하는 현대 사회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영화라고 생각한다. 우리도 잭과 마찬가지로 죽음에 이를 정도로 완전한 직면까지는 아니라도 풀리지 못한 또 다른 욕망이 언제든 타일러가 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과연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사회가 발전할수록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는가를 묻게 된다. 영화 속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질문들에 모두 부정할 수밖에 없다. 특히 말라의 삶은 현대사회의 어두운 면을 여실히 드러낸다. 주인공은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게 된 현대사회 속에서 즉 풍요로울 대로 풍요로워진 일상에서 빈곤과 소멸을 이야기한다. 말라는 주인공에게 드레스를 보여주며 말한다. 드레스의 쓰임은 한 번의 행사로 끝난 것이라고. 우리 역시 말라의 드레스처럼 일회성으로 소비되는 존재로서 말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
잭과 타일러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폭력 행위에 전염시킨다. 이러한 과정에서 역설적이게도 잭은 삶의 활력을 되찾는다. 점점 더 타일러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며 잭은 환자들의 모임에도 나가지 않게 된다. 과거에 그였다면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가구를 닦고 쓸고 청소했을 것이다. 하지만 잭은 이러한 과거의 자신과 결별한다. 파이트 클럽이 잭의 과거를 뒤엎는 역할까지 하게 된 것이다.
영화에서 파이트 클럽이 전국 각지로 순식간에 퍼지는 모습은 억압된 욕망을 무의식에 가둬두고 지내는 사람이 그만큼 많이 있음을 암시한다. 심지어 파이트 클럽의 규칙 1조가 다른 사람들에게 파이트 클럽에 대해 누설하지 말 것인데도 말이다. 파이트 클럽 안에서는 누구든지 마음대로 싸울 수 있고 승자와 패자가 없다. 항복하는 순간 싸움은 끝난다. 싸움으로 그 어떤 내기도 하지 않는다. 오로지 순수한 싸움만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파이트 클럽이다. 이러한 파이트 클럽에서 사람들은 모두 어느 때보다 살아있는 것 같은 강한 생명력을 느낀다. 잭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도 억압되고 내재하여있던 욕구가 해소되면서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게 된다. 이와 반대로 파이트 클럽 밖에서의 일상은 전보다 더 지루하고 단조로울 뿐이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파이트 클럽에 더더욱 모여들게 된다.
- 자살로 표현된 자존감 상실
영화에서 타일러가 자신의 머리에 총을 겨눈 이후의 장면은 은유적으로 표현되어 굉장히 난해하다. 아마도 총을 겨누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단순히 자살 그 이상의 무언가로 남기고 싶어 한 감독의 의도가 아닐까 추측해본다. 타일러가 자신의 머리에 총을 겨누는 행위는 무의식 속 억압된 충동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싶은 욕망이 죽음도 불사할 만큼 간절한 욕망임을 암시한다. 자유를 추구하며 폭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타일러의 본능은 총소리와 함께 사라졌지만 타일러는 죽지 않았다. 영화에서 타일러가 자신에게 총을 겨누며 나는 눈을 뜨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 장면은 주인공 역시 자신의 내면이 진짜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다.
이러한 타일러를 바라보며 걱정하는 말라는 그의 상처를 보듬어준다. 타일러와 말라가 손을 잡는 순간 현대문명의 부산물들이 폭파한다. 여기서 진정한 자존감을 발견하게 된다. 말라와 손을 잡으면서 타인과 진솔한 소통을 하게 되고 잃어버린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다. 폭파된 부산물들은 그동안 자신을 가둬두었던 것들을 의미하며 모든 것이 폭파되며 사라지는 장면에서 우리는 이유 모를 통쾌함을 느끼게 되는데 무의식의 단단한 벽을 깨고 내재한 욕구를 극 중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마주했기 때문이다.
결론
인간의 무의식은 자기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깊게 내재하여있는 이질적인 영역이다. 영화 <파이트 클럽>은 잭의 내면을 완벽하게 장악해버린 타자의 담론이다. 뒤늦게 깨달은 환상을 직면하는 잭을 보면서 우리는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 영화에서 감독은 자본주의가 낳은 대량생산 상품의 소비문화를 꼬집는다. 쏟아지는 상품의 물결에서 우리는 과연 안녕한 것인지, 우리도 잭과 다를 바 없는 인간이라는 메시지를 던진다. 무기력한 삶 속에서 상품을 소비하는 단순하고 반복된 행동으로 억압된 무의식을 해소하는 현대 사회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영화라고 생각한다. 우리도 잭과 마찬가지로 죽음에 이를 정도로 완전한 직면까지는 아니라도 풀리지 못한 또 다른 욕망이 언제든 타일러가 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과연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사회가 발전할수록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는가를 묻게 된다. 영화 속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질문들에 모두 부정할 수밖에 없다. 특히 말라의 삶은 현대사회의 어두운 면을 여실히 드러낸다. 주인공은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게 된 현대사회 속에서 즉 풍요로울 대로 풍요로워진 일상에서 빈곤과 소멸을 이야기한다. 말라는 주인공에게 드레스를 보여주며 말한다. 드레스의 쓰임은 한 번의 행사로 끝난 것이라고. 우리 역시 말라의 드레스처럼 일회성으로 소비되는 존재로서 말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
추천자료
 문학교육과 문체론
문학교육과 문체론 정신분석이 매체 비평에서의 사용에 관한 분석, 고찰, 결론 [발표자료]
정신분석이 매체 비평에서의 사용에 관한 분석, 고찰, 결론 [발표자료] 금오신화의 성격 및 소설사적 의의
금오신화의 성격 및 소설사적 의의 [텍스트][고전텍스트][언어학][수용론][교육패러다임][고전텍스트의 지도]텍스트의 언어학, ...
[텍스트][고전텍스트][언어학][수용론][교육패러다임][고전텍스트의 지도]텍스트의 언어학, ... [기본텍스트][설명텍스트][픽션텍스트][TV광고][일렉트로닉][친일문학][사진][영상]기본텍스...
[기본텍스트][설명텍스트][픽션텍스트][TV광고][일렉트로닉][친일문학][사진][영상]기본텍스... 연극 이와 영화 왕의 남자 비교분석
연극 이와 영화 왕의 남자 비교분석 서사문학교육
서사문학교육 [구비문학][구비][문학][인터넷]구비문학과 인터넷, 구비문학과 방송, 구비문학과 영상화, 구...
[구비문학][구비][문학][인터넷]구비문학과 인터넷, 구비문학과 방송, 구비문학과 영상화, 구... [소설][소설 이론][소설 구성][소설 플롯][소설 인물][소설 시간][소설 시점][소설 서술][플...
[소설][소설 이론][소설 구성][소설 플롯][소설 인물][소설 시간][소설 시점][소설 서술][플... (현대소설론 공통) 다음 단편소설 중 두 편을 선택하여 읽은 후 작품에 드러난 이주노동자의 ...
(현대소설론 공통) 다음 단편소설 중 두 편을 선택하여 읽은 후 작품에 드러난 이주노동자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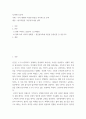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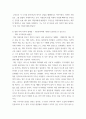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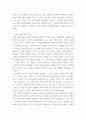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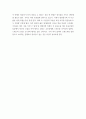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