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1) 단형피동
2) 장형피동
3) 단형피동과 장형피동의 차이
4) 그 외의 피동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2. 본론
1) 단형피동
2) 장형피동
3) 단형피동과 장형피동의 차이
4) 그 외의 피동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이다.
4) 그 외의 피동
‘되다, 당하다, 받다’에 의한 피동으로서, 어휘적 피동이라고 불린다. 이것은 서술성을 가진 일부 명사 뒤에 붙어 피동의 뜻을 더하고 또한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로 사용된다.
또한, 분명한 동작 주체를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탈 행동적 피동이라도 한다. 예를 들면, ‘날씨가 풀렸다’는 ‘하늘이 날씨를 풀었다’라는 것 자체도 매우 부자연스럽고, 일상생활에서는 이 문장을 사용할 때 보통 동작 주체를 의식하지 않고 쓴다.
3. 결론
위와 같이 능동문과 피동문의 개념, 다양한 피동의 형성체계, 그리고 단형피동과 장형피동을 비교분석해 의미적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차이를 정리함으로 인해 단형피동과 장형피동을 정확히 구분하고 각기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피동의 개념과 그것에 대한 범주를 정의하는 부분에서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현 학교문법에서는 피동의 범위를 단형 피동, 장형 피동의 일부만 인정하고 있지만, ‘단형 피동, 장형 피동, 그리고 어휘 피동’을 피동 범주에 포함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렇게 함으로서, 피동의 구분을 확장하여 한국어의 다양한 피동 현상에 대한 충분하고 효과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피동문의 특징과 의미를 통해 피동이 하나의 문법 범주로 능동문과 다른 특질을 지니고 있음을 더욱 확연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표준국어문법론, 남기심·고영근, 탑출판사, 2013
또한 최근 세계적으로 한국의 다양한 문화 컨텐츠가 주목을 받으며 한류문화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 한국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다양한 한국 영화, 그리고 특히 한국 음악을 좋아하고 따라 부르는 외국인들이 많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그것과 더불어 외국인들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와 학습의지가 높아졌다. 오랫동안 한국에서 살아온 자국민들에게는 이러한 한국어의 피동문의 개념과 쓰임새가 자연스럽게 혹은 부자연스럽게 다가와 그 문장 자체가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느껴지지만, 외국인 학습자들은 처음부터 하나씩 한국어의 문법을 배워야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한국인으로서 한국어의 문법체계를 알고 각 내용을 인지하고 구분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언제든 한국어에 대해 궁금해 하고 알고 싶어 하는 세계인들이 있다면 가르쳐줄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즉,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개론을 학습함에 있어 많은 유익함을 느끼고 있으며 나 자신만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가르쳐줄 수 있는 능력까지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 천재교육, http://www.chunjae.co.kr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개론, 김진호, 박이정, 2008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09.10.09.
피동,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encykorea.aks.ac.kr/
표준국어문법론, 남기심·고영근, 탑출판사, 2013
4) 그 외의 피동
‘되다, 당하다, 받다’에 의한 피동으로서, 어휘적 피동이라고 불린다. 이것은 서술성을 가진 일부 명사 뒤에 붙어 피동의 뜻을 더하고 또한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로 사용된다.
또한, 분명한 동작 주체를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탈 행동적 피동이라도 한다. 예를 들면, ‘날씨가 풀렸다’는 ‘하늘이 날씨를 풀었다’라는 것 자체도 매우 부자연스럽고, 일상생활에서는 이 문장을 사용할 때 보통 동작 주체를 의식하지 않고 쓴다.
3. 결론
위와 같이 능동문과 피동문의 개념, 다양한 피동의 형성체계, 그리고 단형피동과 장형피동을 비교분석해 의미적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차이를 정리함으로 인해 단형피동과 장형피동을 정확히 구분하고 각기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피동의 개념과 그것에 대한 범주를 정의하는 부분에서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현 학교문법에서는 피동의 범위를 단형 피동, 장형 피동의 일부만 인정하고 있지만, ‘단형 피동, 장형 피동, 그리고 어휘 피동’을 피동 범주에 포함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렇게 함으로서, 피동의 구분을 확장하여 한국어의 다양한 피동 현상에 대한 충분하고 효과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피동문의 특징과 의미를 통해 피동이 하나의 문법 범주로 능동문과 다른 특질을 지니고 있음을 더욱 확연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표준국어문법론, 남기심·고영근, 탑출판사, 2013
또한 최근 세계적으로 한국의 다양한 문화 컨텐츠가 주목을 받으며 한류문화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 한국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다양한 한국 영화, 그리고 특히 한국 음악을 좋아하고 따라 부르는 외국인들이 많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그것과 더불어 외국인들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와 학습의지가 높아졌다. 오랫동안 한국에서 살아온 자국민들에게는 이러한 한국어의 피동문의 개념과 쓰임새가 자연스럽게 혹은 부자연스럽게 다가와 그 문장 자체가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느껴지지만, 외국인 학습자들은 처음부터 하나씩 한국어의 문법을 배워야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한국인으로서 한국어의 문법체계를 알고 각 내용을 인지하고 구분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언제든 한국어에 대해 궁금해 하고 알고 싶어 하는 세계인들이 있다면 가르쳐줄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즉,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개론을 학습함에 있어 많은 유익함을 느끼고 있으며 나 자신만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가르쳐줄 수 있는 능력까지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 천재교육, http://www.chunjae.co.kr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개론, 김진호, 박이정, 2008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09.10.09.
피동,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encykorea.aks.ac.kr/
표준국어문법론, 남기심·고영근, 탑출판사,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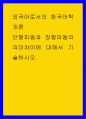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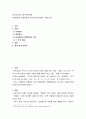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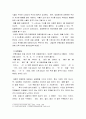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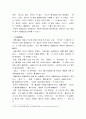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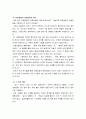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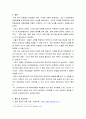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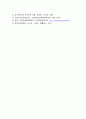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