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1) 문화예술
2) 문화도시
3) 공공성과 미술성
3.
결론
4.
참고문헌
서론
2.
본론
1) 문화예술
2) 문화도시
3) 공공성과 미술성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 있고, 재건축을 하는 건물에 다시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문제는 건질만한 공공미술 작품이 있는가이다. 그래서 정부는 재료에 대하여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공공미술 사후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공공미술이라고 볼 수 없는 추상 조각에 대한 불쾌감,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공공미술이 방치가 되어 있는 비참한 상태를 조각공해라고 한다.
장소의 특징과 주위 환경을 고려하여서 작품을 전시를 해야 하는 그러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작품의 독립성보다 작품의 환경 조화를 중요시하고, 주변 건축, 풍경과 의미가 있는 대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공공미술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한국의 경우 서울로 7017에 개장 기념 조형물로 서울역 광장에 설치가 되었던 슈즈트리 작품이 논란이 되었다. 슈즈트리는 버려진 신발로 세운 대형조형물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철거 위기에 놓여져 있던 서울역 고가를 보행길로 재생을 한 것을 나타내기 위한 상징적 작품으로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도시재생과 환경보전을 상징하면서 만든 공공미술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응은 좋지 않았다. 기괴하고 흉물스럽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으며, 쓰레기 더미 같다는 평가 또한 있었다. 서울시 예산이 들어갔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상징성, 황견, 미관 등 모든 요소가 애매하여서 세금 낭비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이를 철거하는 것에 있어 많은 쓰레기가 생겨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 공공미술이 피해를 준다는 것이 확증이 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참여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논란이 된 작품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공공기간에 의하여 기획이 되고, 설치가 된 작품이다.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고려를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에 공공미술사업과정에 있어 시민들 참여가 보장이 되어야 한다. 애초 시민 의견을 반영하였다면, 논란은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다. 예술과 흉물 사이를 넘나들고 있는 공공미술을 공공, 대중을 위한 미술이다. 공공은 누구이며, 공공미술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을 해봐야 본다고 생각한다.
3. 결론
예술(장소)과 지역, 도시와 만났을 때, 어떠한 연계성과 방향을 가지고 활동을 할 것인지, 현실에 직면한 상황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낼 것인지에 대해서 지역을 바라볼 때, 어떠한 관점과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 등의 각자의 영역안에서 다양안 “도시와 장소”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이는 각자의 목표와 의미에서 세분화가 되어서 자신에게 필요한 장소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다.
즉, “도시의 장소”는 개개인이 만들어내는 과정으로서의 출발이라고 본다. 문화도시를 지정하는 것에 있어도 이와 같은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 지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의 문화로 작용하여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확장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
마지막으로 장소에 대한 인식유형에 따라서 선호를 하는 장소의 유형은 다르다. 따라서 우리는 장소의 유형이 다양하고, 구체적이고, 폭넓게 분포를 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한다. 가족 이외의 타인과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만의 장소를 확보하는가에 대한 부분과, 행동의 주체자가 얼마나 자신의 의지대로 주체적 활동, 자신의 표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하여, “도시의 장소”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도시는 얼마나 다양한 요구를 지원하고 있고, 도시의 공공 공간의 디자인에 있어서도 장소의 질적 향상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것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
4. 참고문헌
1)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2010
2) 도시중산층 중년여성의 여가생활과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김문덕, 숙명여대,2004
장소의 특징과 주위 환경을 고려하여서 작품을 전시를 해야 하는 그러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작품의 독립성보다 작품의 환경 조화를 중요시하고, 주변 건축, 풍경과 의미가 있는 대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공공미술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한국의 경우 서울로 7017에 개장 기념 조형물로 서울역 광장에 설치가 되었던 슈즈트리 작품이 논란이 되었다. 슈즈트리는 버려진 신발로 세운 대형조형물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철거 위기에 놓여져 있던 서울역 고가를 보행길로 재생을 한 것을 나타내기 위한 상징적 작품으로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도시재생과 환경보전을 상징하면서 만든 공공미술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응은 좋지 않았다. 기괴하고 흉물스럽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으며, 쓰레기 더미 같다는 평가 또한 있었다. 서울시 예산이 들어갔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상징성, 황견, 미관 등 모든 요소가 애매하여서 세금 낭비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이를 철거하는 것에 있어 많은 쓰레기가 생겨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 공공미술이 피해를 준다는 것이 확증이 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참여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논란이 된 작품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공공기간에 의하여 기획이 되고, 설치가 된 작품이다.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고려를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에 공공미술사업과정에 있어 시민들 참여가 보장이 되어야 한다. 애초 시민 의견을 반영하였다면, 논란은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다. 예술과 흉물 사이를 넘나들고 있는 공공미술을 공공, 대중을 위한 미술이다. 공공은 누구이며, 공공미술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을 해봐야 본다고 생각한다.
3. 결론
예술(장소)과 지역, 도시와 만났을 때, 어떠한 연계성과 방향을 가지고 활동을 할 것인지, 현실에 직면한 상황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낼 것인지에 대해서 지역을 바라볼 때, 어떠한 관점과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 등의 각자의 영역안에서 다양안 “도시와 장소”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이는 각자의 목표와 의미에서 세분화가 되어서 자신에게 필요한 장소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다.
즉, “도시의 장소”는 개개인이 만들어내는 과정으로서의 출발이라고 본다. 문화도시를 지정하는 것에 있어도 이와 같은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 지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의 문화로 작용하여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확장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
마지막으로 장소에 대한 인식유형에 따라서 선호를 하는 장소의 유형은 다르다. 따라서 우리는 장소의 유형이 다양하고, 구체적이고, 폭넓게 분포를 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한다. 가족 이외의 타인과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만의 장소를 확보하는가에 대한 부분과, 행동의 주체자가 얼마나 자신의 의지대로 주체적 활동, 자신의 표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하여, “도시의 장소”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도시는 얼마나 다양한 요구를 지원하고 있고, 도시의 공공 공간의 디자인에 있어서도 장소의 질적 향상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것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
4. 참고문헌
1)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2010
2) 도시중산층 중년여성의 여가생활과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김문덕, 숙명여대,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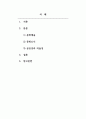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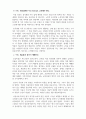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