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춘천과 댐들
Ⅱ. 춘천 칠층석탑과 근화동 당간지주
Ⅲ. 김유정과 그의 생가터
Ⅳ. 문수원 정원과 청평사
Ⅱ. 춘천 칠층석탑과 근화동 당간지주
Ⅲ. 김유정과 그의 생가터
Ⅳ. 문수원 정원과 청평사
본문내용
른 시대의 것인데, 현재 흔적이 남아 있지 않아 이곳 문수원 정원이 당시의 형태를 알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정원으로 꼽힌다. 현재 이자현의 승탑 오른쪽에 있는 영지(影池, 南池)를 1981년 조사단이 지표발굴과 측량조사 했는데, 이 연못은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는 전형적인 고려시대 연못인 영지”라고 밝혔다. 영지 밑바닥에서 고려 말 청자편과 조선시대 백자편이 발견됐으며, 못의 규모는 남북 19.5m, 북쪽 호수 안이 16m, 남쪽 호수 안이 11.7m로 뒤쪽이 약간 넓은 사다리꼴이다. 이는 감상자의 시각을 배려한 것으로 추측되며, 연못 속에 큰 돌 셋을 놓아둔 것은 삼산의 봉우리를 상징한다. 또 연못을 영지라 함은 물이 맑고 깨끗하여 아름다운 오봉산 부용봉(芙蓉峰)이 비치기 때문이다. 여기서 400m쯤 떨어진 청평사 계곡 하류에서는 정원 조성용 암석과
<문수원 정원의 영지 : 청평사 계곡 전체는 고려 초에 이자현이 조성한 계획된 정원이었는데 영지가 그 대표적인 자취이다.>
석축이 발견되었다.
이자현은 청평사를 중건하고 정원을 만들면서 이 영지를 중심으로 대규모의 정원을 꾸몄던 것이다. 누석식(壘石式) 정원을 중심으로 영지와 정자, 청각적 효과를 위한 수구식(水溝式) 정원까지 동원, 평지의 정원(平庭)과 계곡에 자리한 정원(溪庭), 산속의 정원(山庭) 등 지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정원을 마련해 수도하는 선원의 특색에 걸맞도록 꾸몄다. 문수원 정원에 관한 이같은 기록들은 「청평사문수원기비」(淸平寺文殊院記碑)에서 밝혀진 것들이다. 문수원 정원으로 이름났던 이곳엔 당시 시인묵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으니 조선시대 학자 우담 정시한(愚潭 丁時翰)은 이곳 선동식암에서 여러 날을 묵으며 청평사의 모습을 감상하고 진락공 이자현의 유적을 두루 찾아 그 고풍을 추모했다고 그의 저서 『산중일기』(山中日記)에서 토로하고 있다. 이자현은 베옷 입고 나물밥 먹으며 선(禪)을 하였고, 『문수원기』(文殊院記)에서 “능엄경은 마음의 본 바탕을 밝히는 지름길”이라 기록할 정도로 『능엄경』을 독파해 불도를 깨달았다. 예종은 종종 그를 서울로 청하였으나 한번도 응하지 않았으며, 평생 수도생활로 일관하다가 청평사에서 생을 마감한다.
5. 청평사
5-1. 연혁
국보로 지정되었던 극락전이 한국전쟁 때 불타버린 후 지금은 그 기단 위에 대웅전이 들어섰다. 무지개처럼 공굴린 계단의 소맷돌 끝부분이 정교한 조각솜씨를 자랑한다.
청평사는 한국전쟁 때 거의 소실된 것을, 1970년대에 전각들을 짓고 회전문을 보수하고 범종각과 요사채를 앉혔다. 지금은 회전문 앞과 뒤, 대웅전 사이에 반듯한 건물터들만 쓸쓸히 남아 휑하니 뚫린 느낌이지만, 이곳 읍지에 따르면 고려시대 청평사의 규모는 221칸이나 됐다고 전한다.
<청평사 전경>
청평사는 고려 광종 24년(973) 승현선사(承玄, 또는 永玄禪師)가 창건하고 백암선원(白巖禪院)이라 불렀다. 구산선문이 한창 활발하던 그 시절 참선도량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절은 얼마 안돼 폐사가 되었다가 문종 22년(1068) 춘천도감창사(春川道監倉使)로 있던 이개(李)가 경운산의 빼어난 경치에 감탄하여 옛 절터에 절을 다시 짓고 보현원(普賢院)이라 했다. 그뒤 이개의 장남 이자현이 벼슬을 버리고 대를 이어 이곳에 와 머물면서 도적이 그치고 호랑이와 이리가 자취를 감췄다고 전한다. 이자현은 그때 산 이름을 ‘맑게 평정되었다’는 뜻의 청평(淸平)이라 하고, 자신이 두 번이나 친견한 문수보살의 이름을 따 절 이름을 문수원(文殊院)이라 했다. 또 전각 여러 채를 짓고 견성(見性)·양신(養神) 등 여덟 암자를 새로 세웠으며, 청평산 골짜기 전체를 사찰 경내로 삼아 정원으로 가꾸었다. 이 정원이 오늘날 고려정원의 기초이자 모범이며 가장 오래된 정원으로 전해져 중요한 자료가 되는 ‘문수원 정원’(文殊院庭園)이다. 원나라 태정황후는 성징(性澄)·윤견(允堅) 스님 등이 바친 경전을 보내면서 이 절에서 간직토록 했고, 공민왕 16년(1367)부터 2년여 동안엔 당대의 고승 나옹화상이 머물렀으며, 조선 세조 2년(1466)에는 매월당 김시습이 서향원(瑞香院)을 짓고 은둔한다. 명종 12년(1557)엔 보우선사가 당우를 새롭게 중건하고 능인전(能仁殿)을 수선해 절 이름을 만수청평선사(萬壽淸平禪寺)라 했으며, 숙종 37년(1711) 환성화상(喚惺和尙)이 전각과 요사를 중창했었다. 절 뒤편에 고려시대 이 절에 머물며 수도했던 환적당(幻寂堂)과 설화당 부도가 있다. 청평사터는 강원도 기념물 제55호이다.
<회전문 : 소박하고 간소하게 꾸며진 건물이나 한국전쟁 때 주변의 건물과 좌우 행랑이 불타면서 제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다.>
5-2. 회전문 : 보물 제164호
청평사에서만 볼 수 있는 회전문은 현재 일주문도 없는 청평사의 넓은 절터 앞쪽에 덩그러니 서 있지만 본래는 천왕문의 기능을 담당했던 조선시대 제2 산문, 즉 중문에 해당한다. 조선 명종(1545~1567 재위) 때 보우대사가 중건했다가 한국전쟁 때 불타 제 모습을 잃었으나 회전문의 축대만은 그대로이다. 아래층은 넓게 꾸민 3층이고, 위층의 축대는 높고 가파른 7단으로 쌓았으며 그 넓은 공간 위에 주춧돌을 놓았다.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1칸이므로 8개의 기둥이면 충분했을 것이나 문짝을 달기 위해 안쪽 가운데 두개의 기둥을 더 세워 10개의 기둥이 되었다. 가운데 넓은 한 칸을 통로로 사용하고 양쪽의 좁은 공간으론 벽을 둘러 그 안에 사천왕상의 입상을 안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하나 실제로는 사천왕상이 들어설 공간이 못된다. 좌우에 행각(行閣)이 있었다면 오히려 안정감이 있었을 것 같다. 안쪽 측면에 마루를 놓았으며 본래의 모습은 잃었지만 건물은 매우 소박하게 꾸몄다. 건물 구조는 16세기 중엽 들어 쇠퇴하기 시작한 주심포 양식에서 익공계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천장의 가구는 대들보와 마루대공이 전부인 단촐한 집이고 맞배지붕이다. 회전문이라 해서 얼핏 빙글빙글 돌아가는 문을 연상하겠지만, 중생들에게 윤회전생을 깨우치기 위한 ‘마음의 문’이다. 특히 절에서는 거의 보기 드문 홍살을 천장에 가로로 배열한 문이어서 주목된다. 보물 제164호이다.
<문수원 정원의 영지 : 청평사 계곡 전체는 고려 초에 이자현이 조성한 계획된 정원이었는데 영지가 그 대표적인 자취이다.>
석축이 발견되었다.
이자현은 청평사를 중건하고 정원을 만들면서 이 영지를 중심으로 대규모의 정원을 꾸몄던 것이다. 누석식(壘石式) 정원을 중심으로 영지와 정자, 청각적 효과를 위한 수구식(水溝式) 정원까지 동원, 평지의 정원(平庭)과 계곡에 자리한 정원(溪庭), 산속의 정원(山庭) 등 지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정원을 마련해 수도하는 선원의 특색에 걸맞도록 꾸몄다. 문수원 정원에 관한 이같은 기록들은 「청평사문수원기비」(淸平寺文殊院記碑)에서 밝혀진 것들이다. 문수원 정원으로 이름났던 이곳엔 당시 시인묵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으니 조선시대 학자 우담 정시한(愚潭 丁時翰)은 이곳 선동식암에서 여러 날을 묵으며 청평사의 모습을 감상하고 진락공 이자현의 유적을 두루 찾아 그 고풍을 추모했다고 그의 저서 『산중일기』(山中日記)에서 토로하고 있다. 이자현은 베옷 입고 나물밥 먹으며 선(禪)을 하였고, 『문수원기』(文殊院記)에서 “능엄경은 마음의 본 바탕을 밝히는 지름길”이라 기록할 정도로 『능엄경』을 독파해 불도를 깨달았다. 예종은 종종 그를 서울로 청하였으나 한번도 응하지 않았으며, 평생 수도생활로 일관하다가 청평사에서 생을 마감한다.
5. 청평사
5-1. 연혁
국보로 지정되었던 극락전이 한국전쟁 때 불타버린 후 지금은 그 기단 위에 대웅전이 들어섰다. 무지개처럼 공굴린 계단의 소맷돌 끝부분이 정교한 조각솜씨를 자랑한다.
청평사는 한국전쟁 때 거의 소실된 것을, 1970년대에 전각들을 짓고 회전문을 보수하고 범종각과 요사채를 앉혔다. 지금은 회전문 앞과 뒤, 대웅전 사이에 반듯한 건물터들만 쓸쓸히 남아 휑하니 뚫린 느낌이지만, 이곳 읍지에 따르면 고려시대 청평사의 규모는 221칸이나 됐다고 전한다.
<청평사 전경>
청평사는 고려 광종 24년(973) 승현선사(承玄, 또는 永玄禪師)가 창건하고 백암선원(白巖禪院)이라 불렀다. 구산선문이 한창 활발하던 그 시절 참선도량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절은 얼마 안돼 폐사가 되었다가 문종 22년(1068) 춘천도감창사(春川道監倉使)로 있던 이개(李)가 경운산의 빼어난 경치에 감탄하여 옛 절터에 절을 다시 짓고 보현원(普賢院)이라 했다. 그뒤 이개의 장남 이자현이 벼슬을 버리고 대를 이어 이곳에 와 머물면서 도적이 그치고 호랑이와 이리가 자취를 감췄다고 전한다. 이자현은 그때 산 이름을 ‘맑게 평정되었다’는 뜻의 청평(淸平)이라 하고, 자신이 두 번이나 친견한 문수보살의 이름을 따 절 이름을 문수원(文殊院)이라 했다. 또 전각 여러 채를 짓고 견성(見性)·양신(養神) 등 여덟 암자를 새로 세웠으며, 청평산 골짜기 전체를 사찰 경내로 삼아 정원으로 가꾸었다. 이 정원이 오늘날 고려정원의 기초이자 모범이며 가장 오래된 정원으로 전해져 중요한 자료가 되는 ‘문수원 정원’(文殊院庭園)이다. 원나라 태정황후는 성징(性澄)·윤견(允堅) 스님 등이 바친 경전을 보내면서 이 절에서 간직토록 했고, 공민왕 16년(1367)부터 2년여 동안엔 당대의 고승 나옹화상이 머물렀으며, 조선 세조 2년(1466)에는 매월당 김시습이 서향원(瑞香院)을 짓고 은둔한다. 명종 12년(1557)엔 보우선사가 당우를 새롭게 중건하고 능인전(能仁殿)을 수선해 절 이름을 만수청평선사(萬壽淸平禪寺)라 했으며, 숙종 37년(1711) 환성화상(喚惺和尙)이 전각과 요사를 중창했었다. 절 뒤편에 고려시대 이 절에 머물며 수도했던 환적당(幻寂堂)과 설화당 부도가 있다. 청평사터는 강원도 기념물 제55호이다.
<회전문 : 소박하고 간소하게 꾸며진 건물이나 한국전쟁 때 주변의 건물과 좌우 행랑이 불타면서 제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다.>
5-2. 회전문 : 보물 제164호
청평사에서만 볼 수 있는 회전문은 현재 일주문도 없는 청평사의 넓은 절터 앞쪽에 덩그러니 서 있지만 본래는 천왕문의 기능을 담당했던 조선시대 제2 산문, 즉 중문에 해당한다. 조선 명종(1545~1567 재위) 때 보우대사가 중건했다가 한국전쟁 때 불타 제 모습을 잃었으나 회전문의 축대만은 그대로이다. 아래층은 넓게 꾸민 3층이고, 위층의 축대는 높고 가파른 7단으로 쌓았으며 그 넓은 공간 위에 주춧돌을 놓았다.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1칸이므로 8개의 기둥이면 충분했을 것이나 문짝을 달기 위해 안쪽 가운데 두개의 기둥을 더 세워 10개의 기둥이 되었다. 가운데 넓은 한 칸을 통로로 사용하고 양쪽의 좁은 공간으론 벽을 둘러 그 안에 사천왕상의 입상을 안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하나 실제로는 사천왕상이 들어설 공간이 못된다. 좌우에 행각(行閣)이 있었다면 오히려 안정감이 있었을 것 같다. 안쪽 측면에 마루를 놓았으며 본래의 모습은 잃었지만 건물은 매우 소박하게 꾸몄다. 건물 구조는 16세기 중엽 들어 쇠퇴하기 시작한 주심포 양식에서 익공계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천장의 가구는 대들보와 마루대공이 전부인 단촐한 집이고 맞배지붕이다. 회전문이라 해서 얼핏 빙글빙글 돌아가는 문을 연상하겠지만, 중생들에게 윤회전생을 깨우치기 위한 ‘마음의 문’이다. 특히 절에서는 거의 보기 드문 홍살을 천장에 가로로 배열한 문이어서 주목된다. 보물 제164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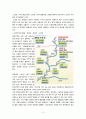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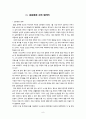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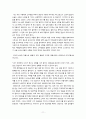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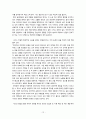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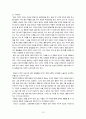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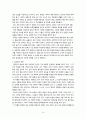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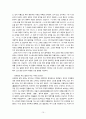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