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목차
Ⅰ. 예천 개황
Ⅱ. 개심사터 오층석탑
Ⅲ. 동본동 석불입상과 삼층석탑
Ⅳ. 용문사(龍門寺)
Ⅴ. 예천회룡포
Ⅵ. 초간정(草澗亭)
Ⅶ. 한천사
Ⅷ. 무섬마을(영주)
Ⅱ. 개심사터 오층석탑
Ⅲ. 동본동 석불입상과 삼층석탑
Ⅳ. 용문사(龍門寺)
Ⅴ. 예천회룡포
Ⅵ. 초간정(草澗亭)
Ⅶ. 한천사
Ⅷ. 무섬마을(영주)
본문내용
웠다고 하다.
2. 삼층석탑
규모는 전고 3.56m, 탑신고 3.2m, 기단폭 1.74m이다.이 탑은 통일신라시대 후기에 건립된 전형적인 삼층석탑으로 한천사 내에 있다. 이중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세웠다. 탑신에는 우주가 양각되었고, 옥개석의 추녀 끝은 치켜들었으며, 상륜부에는 노반과 복발이 남아 있다. 탑의 전체 높이는 3.6m로 소형의 우아한 석탑이다.
3. 철조비로자나불좌상 : 보물 제667호
광배(光背)와 대좌(臺座)가 없어진 이 철조불상(鐵造佛像)은 철불들이 많이 조성되던 신라말 불상계통을 보여주고 있는 우수한 작품이다. 두부(頭部)는 소발(素髮)이며 나지막한 육계(肉)가 있고, 원만하고 큼직한 얼굴에는 반달형의 긴 눈과 눈썹, 작게 표현된 코와 꽉 다문 입 등에서 자비롭고 근엄한 표정을 읽을 수 있다. 이마에는 큼직한 백호(白毫)가 표현되어 있고 두 귀는 길게 늘어졌다. 짧은 목에는 삼도(三道)가 보이고 얼굴은 전체적으로 팽창되었으나 군살이 붙지 않은 형상이다. 가슴이 많이 노출되었고 당당한 어깨를 지녔다. 법의(法衣)는 우견편단(右肩偏袒)이며 옷주름은 굵은 선으로 왼손을 거쳐서 밑으로 내려와 결가부좌한 다리에 이르러 반타원형을 이루어 생동감을 주고 있다. 풍만한 가슴에 배를 약간 내밀고 있으며 다소 형식적인 표현이 보인다. 왼손은 어깨 부근에서 들고 첫째와 셋째 손가락을 맞대고 있으며 오른손은 가슴 부근에서 약합(藥盒)을 들고 있다. 얼굴은 우아하면서도 침잠(沈潛)한 인상을 풍기는데 건장한 상체(上體), 당당한 어깨, 양감(量感) 있는 가슴, 결가부좌(結跏趺坐)의 의젓한 모습, 탄력 있는 다리와 함께 신라 말 불상으로는 좀처럼 보기 드문 뛰어난 기량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긴 상체라든가 편편한 콧잔등, 두드러진 인중 등에서 신라말의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어서 당시 유행하던 신라말 철불상들 가운데 우수한 걸작의 하나로 생각된다.
Ⅷ. 무섬마을(영주)
1. 개관
처음에는 \'물섬마을\'이라 불렸다고 전해진다. 발음상의 이유 때문인지 \'ㄹ\'이 빠지고 무섬마을이 되었다. 낙동강 지류인 내성천에 폭 안긴 자태가 영락없는 물속의 섬이다. 무섬마을을 감싸 안은 물줄기는 낙동강 지류인 내성천이다. 아예 물 위에 떠 있는 섬은 아니지만 보기에는 \'물속의 섬\' 같다. 삼면은 내성천 줄기에 안겨있고 뒤로는 태백산 끝자락과 이어진다.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를 떠올리면 모양은 비슷하다. 단종의 한(恨)이 건너지 못할 만큼 깊은 물과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을 절벽으로 막혔다는 점만 뺀다면. 한문으로도 똑같다. 물수(水)에 섬도(島)를 써서 수도리다. 무섬마을은 경북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에 자리한다. 뭍과 이어진 마을 뒷산은 태백산 줄기, 강 건너에는 소백산 줄기가 스며든다. 태백산에서 이어지는 내성천과 소백산에서 흐르는 서천이 이곳에서 몸을 섞어 \'물도리동\'이라고도 불렸다.
앞산(남산)에 올라 무섬마을을 살펴보면 물줄기에 물줄기가 더해지고 산과 물이 태극모양으로 돌아나간다. 음양의 조화가 좋아 자식이 잘되고 의식이 풍족하다고 해석된다. 또 무섬마을을 두고 물위에 활짝 핀 연꽃 모양의 땅, \'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이라고도 한다. 이런 지형에서는 학자들이 많이 배출된다고.
무섬마을을 보면 세 번 놀란다. 우선 마을을 품은 산과 물줄기에 놀라고 그 안에 들어선 고택들에 놀란다. 마지막으로 이 마을이 품은 개방·개혁 정신에 놀란다. 자연환경, 즉 비주얼(Visual)은 물론 멋진 몸매와 정신까지 갖춘 무섬마을에서 안빈낙도의 삶을 꾸려가던 선조들을 만나보자.
2. 마을의 연혁
\"1666년에 반남 박씨가 강 건너 마을에서 이곳으로 분가하러 들어왔다. 그때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 그의 증손녀 사위 선성 김씨가 이곳에 정착하면서 두 성(姓)씨 가 모여 사는 집성촌이 되었다. 해방 전만해도 100여 가구가 넘는 큰 마을이었는데 80여년 전쯤 갑술년 큰 홍수가 나서 절반은 손실됐었다. 지금 남은 고택은 43채이다. 사람이 사는 집은 26채 뿐이다. 독거노인이 많다는 뜻이다. 평균연령은 78세, 이 마을에서 60대는 2명 뿐이어서 90은 넘어야 노인대접을 받는다!
3. 무섬마을 고택
4. 아도서숙
아도서숙은 일제 강점기에 무섬마을 주민들이 계몽 활동과 항일 운동을 벌인 근거지였다. ‘아도’는 아세아 조선의 섬인 수도리를 뜻하며 ‘서숙’은 서당을 의미한다. 1928년 10월, 이 지역 항일운동 지도자인 김화진 선생의 주도로 무섬마을 청년들이 대중의 모임 장소인 공회당을 세우고 모임·배움·단결을 기치로 아도서숙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아도서숙은 당시 사회 분위기가 봉건적·억압적이었지만 파격적으로 열린 교육을 실시하였다. 신분 계급과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배울 수 있었고, 학급 편성은 오전·오후·야간반을 두어 학생들이 가능한 시간에 와서 배우고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하였다. 주로 민족 교육과 문맹 퇴치 및 신문명 교육, 농사 기술 교육 등을 실시했으며, 새끼를 꼬거나 멍석을 만들면서도 수업에 참여해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학생들의 단결심 고양과 체력 향상을 위해 강변 백사장에서 축구 같은 운동도 자주 즐기도록 했다. 농사일이 바쁘지 않은 겨울철에는 제한 없이 학생을 수용하였다.
아도서숙은 9명의 운영위원회를 두고 이 같은 교육 체제를 유지했다. 운영위원이었던 김화진, 김종진, 김성규, 김종규, 김계진, 김명진, 김광진, 김희규, 박찬하 등은 모두 영주 지역 사회운동의 핵심 인물들이기도 했다. 이들은 줄기차게 항일운동을 전개했으며, 수시로 체포되어 구류·투옥과 고문을 당하였다. 또한 광주학생운동에 호응하는 격문 의거가 있을 때에는 무섬마을의 부녀자들이 아도서숙의 호롱불 밑에서 밤을 새워 태극기를 만들기도 했다. 1931년 9월에는 일경 1개 소대가 몰려와 무섬마을 청년 18명을 체포하여 굴비처럼 한 오랏줄에 엮어 외나무다리를 건너 압송하기도 했다. 온갖 탄압에도 무섬마을 주민들이 굴복하지 않자 일제는 1933년 7월, 아도서숙에 불을 질러 5년 만에 강제로 폐쇄하였다.
아도서숙은 이 지역 항일운동의 특징적 역사를 잘 말해 주는 뜻깊은 장소이다. 현재 건물은 원래 자리에 고증을 거쳐 복원한 것이다.
2. 삼층석탑
규모는 전고 3.56m, 탑신고 3.2m, 기단폭 1.74m이다.이 탑은 통일신라시대 후기에 건립된 전형적인 삼층석탑으로 한천사 내에 있다. 이중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세웠다. 탑신에는 우주가 양각되었고, 옥개석의 추녀 끝은 치켜들었으며, 상륜부에는 노반과 복발이 남아 있다. 탑의 전체 높이는 3.6m로 소형의 우아한 석탑이다.
3. 철조비로자나불좌상 : 보물 제667호
광배(光背)와 대좌(臺座)가 없어진 이 철조불상(鐵造佛像)은 철불들이 많이 조성되던 신라말 불상계통을 보여주고 있는 우수한 작품이다. 두부(頭部)는 소발(素髮)이며 나지막한 육계(肉)가 있고, 원만하고 큼직한 얼굴에는 반달형의 긴 눈과 눈썹, 작게 표현된 코와 꽉 다문 입 등에서 자비롭고 근엄한 표정을 읽을 수 있다. 이마에는 큼직한 백호(白毫)가 표현되어 있고 두 귀는 길게 늘어졌다. 짧은 목에는 삼도(三道)가 보이고 얼굴은 전체적으로 팽창되었으나 군살이 붙지 않은 형상이다. 가슴이 많이 노출되었고 당당한 어깨를 지녔다. 법의(法衣)는 우견편단(右肩偏袒)이며 옷주름은 굵은 선으로 왼손을 거쳐서 밑으로 내려와 결가부좌한 다리에 이르러 반타원형을 이루어 생동감을 주고 있다. 풍만한 가슴에 배를 약간 내밀고 있으며 다소 형식적인 표현이 보인다. 왼손은 어깨 부근에서 들고 첫째와 셋째 손가락을 맞대고 있으며 오른손은 가슴 부근에서 약합(藥盒)을 들고 있다. 얼굴은 우아하면서도 침잠(沈潛)한 인상을 풍기는데 건장한 상체(上體), 당당한 어깨, 양감(量感) 있는 가슴, 결가부좌(結跏趺坐)의 의젓한 모습, 탄력 있는 다리와 함께 신라 말 불상으로는 좀처럼 보기 드문 뛰어난 기량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긴 상체라든가 편편한 콧잔등, 두드러진 인중 등에서 신라말의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어서 당시 유행하던 신라말 철불상들 가운데 우수한 걸작의 하나로 생각된다.
Ⅷ. 무섬마을(영주)
1. 개관
처음에는 \'물섬마을\'이라 불렸다고 전해진다. 발음상의 이유 때문인지 \'ㄹ\'이 빠지고 무섬마을이 되었다. 낙동강 지류인 내성천에 폭 안긴 자태가 영락없는 물속의 섬이다. 무섬마을을 감싸 안은 물줄기는 낙동강 지류인 내성천이다. 아예 물 위에 떠 있는 섬은 아니지만 보기에는 \'물속의 섬\' 같다. 삼면은 내성천 줄기에 안겨있고 뒤로는 태백산 끝자락과 이어진다.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를 떠올리면 모양은 비슷하다. 단종의 한(恨)이 건너지 못할 만큼 깊은 물과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을 절벽으로 막혔다는 점만 뺀다면. 한문으로도 똑같다. 물수(水)에 섬도(島)를 써서 수도리다. 무섬마을은 경북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에 자리한다. 뭍과 이어진 마을 뒷산은 태백산 줄기, 강 건너에는 소백산 줄기가 스며든다. 태백산에서 이어지는 내성천과 소백산에서 흐르는 서천이 이곳에서 몸을 섞어 \'물도리동\'이라고도 불렸다.
앞산(남산)에 올라 무섬마을을 살펴보면 물줄기에 물줄기가 더해지고 산과 물이 태극모양으로 돌아나간다. 음양의 조화가 좋아 자식이 잘되고 의식이 풍족하다고 해석된다. 또 무섬마을을 두고 물위에 활짝 핀 연꽃 모양의 땅, \'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이라고도 한다. 이런 지형에서는 학자들이 많이 배출된다고.
무섬마을을 보면 세 번 놀란다. 우선 마을을 품은 산과 물줄기에 놀라고 그 안에 들어선 고택들에 놀란다. 마지막으로 이 마을이 품은 개방·개혁 정신에 놀란다. 자연환경, 즉 비주얼(Visual)은 물론 멋진 몸매와 정신까지 갖춘 무섬마을에서 안빈낙도의 삶을 꾸려가던 선조들을 만나보자.
2. 마을의 연혁
\"1666년에 반남 박씨가 강 건너 마을에서 이곳으로 분가하러 들어왔다. 그때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 그의 증손녀 사위 선성 김씨가 이곳에 정착하면서 두 성(姓)씨 가 모여 사는 집성촌이 되었다. 해방 전만해도 100여 가구가 넘는 큰 마을이었는데 80여년 전쯤 갑술년 큰 홍수가 나서 절반은 손실됐었다. 지금 남은 고택은 43채이다. 사람이 사는 집은 26채 뿐이다. 독거노인이 많다는 뜻이다. 평균연령은 78세, 이 마을에서 60대는 2명 뿐이어서 90은 넘어야 노인대접을 받는다!
3. 무섬마을 고택
4. 아도서숙
아도서숙은 일제 강점기에 무섬마을 주민들이 계몽 활동과 항일 운동을 벌인 근거지였다. ‘아도’는 아세아 조선의 섬인 수도리를 뜻하며 ‘서숙’은 서당을 의미한다. 1928년 10월, 이 지역 항일운동 지도자인 김화진 선생의 주도로 무섬마을 청년들이 대중의 모임 장소인 공회당을 세우고 모임·배움·단결을 기치로 아도서숙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아도서숙은 당시 사회 분위기가 봉건적·억압적이었지만 파격적으로 열린 교육을 실시하였다. 신분 계급과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배울 수 있었고, 학급 편성은 오전·오후·야간반을 두어 학생들이 가능한 시간에 와서 배우고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하였다. 주로 민족 교육과 문맹 퇴치 및 신문명 교육, 농사 기술 교육 등을 실시했으며, 새끼를 꼬거나 멍석을 만들면서도 수업에 참여해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학생들의 단결심 고양과 체력 향상을 위해 강변 백사장에서 축구 같은 운동도 자주 즐기도록 했다. 농사일이 바쁘지 않은 겨울철에는 제한 없이 학생을 수용하였다.
아도서숙은 9명의 운영위원회를 두고 이 같은 교육 체제를 유지했다. 운영위원이었던 김화진, 김종진, 김성규, 김종규, 김계진, 김명진, 김광진, 김희규, 박찬하 등은 모두 영주 지역 사회운동의 핵심 인물들이기도 했다. 이들은 줄기차게 항일운동을 전개했으며, 수시로 체포되어 구류·투옥과 고문을 당하였다. 또한 광주학생운동에 호응하는 격문 의거가 있을 때에는 무섬마을의 부녀자들이 아도서숙의 호롱불 밑에서 밤을 새워 태극기를 만들기도 했다. 1931년 9월에는 일경 1개 소대가 몰려와 무섬마을 청년 18명을 체포하여 굴비처럼 한 오랏줄에 엮어 외나무다리를 건너 압송하기도 했다. 온갖 탄압에도 무섬마을 주민들이 굴복하지 않자 일제는 1933년 7월, 아도서숙에 불을 질러 5년 만에 강제로 폐쇄하였다.
아도서숙은 이 지역 항일운동의 특징적 역사를 잘 말해 주는 뜻깊은 장소이다. 현재 건물은 원래 자리에 고증을 거쳐 복원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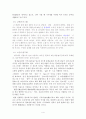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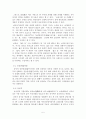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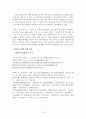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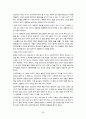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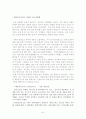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