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목차
Ⅰ. 영암개관
Ⅱ. 도갑사
Ⅲ. 왕인박사(王仁博士) 유적지
Ⅳ. 장천리 선사유적
Ⅴ. 쌍계사터 돌장승
Ⅵ. 월남사터 · 무위사
Ⅱ. 도갑사
Ⅲ. 왕인박사(王仁博士) 유적지
Ⅳ. 장천리 선사유적
Ⅴ. 쌍계사터 돌장승
Ⅵ. 월남사터 · 무위사
본문내용
觀自在母)라고도 불리운다.
일반 관음보살의 경우 대부분 머리에 보관을 쓰고 있는데 비하여, 백의관음은 흰 두건을 쓰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통 흰옷을 걸치고 있다. 백의관음의 형상은 백옥색(白玉色)으로 왼손을 펴서 젖가슴에 대고, 오른손에는 연꽃을 쥐고 결가부좌(結跏趺坐)를 하였으며, 무량수불을 안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백의관음은 인도에서 탄생하였기 때문에 중국풍의 수월관음(水月觀音)이전부터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당나라 말기 수월관음도에 백의(白衣)가 응용되기 시작하면서 수월관음상에 백의관음상이 융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벽화가 일어난 배경에는 수묵화(水墨畵)의 발달과 선종의 융성으로 수묵관음도(水墨觀音圖)가 나타나면서 표현상 관세음보살이 자연스럽게 백의(白衣)를 걸치게 된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수월관음(水月觀音)이란 하늘에 뜬 달이 물속에 비친 달이라는 뜻으로, 인생의 허무함에서 발생한 고난을 구제하여 달관(達觀)하게 하는 사색적인 보살로 33관음 중의 하나이다. 이 수월관음(水月觀音)을 주제로 한 그림은 주로 남인도의 바다에 면하고 있는 보타락가산(補陀洛迦山)의 바위 위에 반가좌(半跏坐)의 모습을 담고 있다.이 반가사유(半跏思惟)의 모습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환상이, 꿈 또는 물에 비친 달이 덧없음과 같다는 것을 깨우침으로써 고난을 초월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2-4. 삼층석탑
무위사 극락전 오른쪽에 자리하고 있는 탑으로, 전체의 무게를 지탱하는 기단(基壇)을 2층으로 두고, 그 위로 3층의 탑신(塔身)을 올려놓은 모습이다. 기단은 각 층의 4면마다 기둥 모양을 본떠 새겼는데, 아래층은 면의 모서리와 가운데에, 위층은 모서리에만 두었다. 특히 아래층에는 기둥조각으로 나뉜 8곳에 안상(眼象)을 세밀하게
새겨 장식하였다. 탑신은 각 층의 몸돌과 지붕돌이 각각 하나의 돌로 이루어져 있고, 몸돌의 모서리마다 기둥 모양을 새겨 놓았다. 얇고 평평해 보이는 지붕돌은 밑면에 4단씩의 받침을 두었으며, 처마는 수평을 이루다 양쪽가에서 가볍게 위로 들려 있다. 꼭대기에는 네모난 받침돌 위로 세 개의 머리장식이 가지런히 올려져 있다.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그 크기가 적당히 줄어들어 있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 탑으로, 비록 1층과 3층의 지붕돌이 약간 깨져 있긴 하나 대체로 원래의 모습이 잘 간직되어 있다. 만든 시기는 뒤에 서있는 선각대사편광탑비(945년에 만들어짐)와 같은 때이거나 그보다 조금 떨어지는 고려시대 전기일 것으로 추측된다.
2-5. 선각대사 편광탑비(先覺大師 遍光塔碑) : 보물 제507호
이 탑비는 선각대사 형미(逈微)를 기리기 위하여 세운 것으로, 고려 정종 원년(946년)에 세운 것이다. 선각대사는 신라 말의 명승으로, 당나라에 건너가서 14년 만에 돌아와 무위사에 8년간 머물렀다. 고려 태조 원년(918년)에 54세의 나이로 입적하자 태조 왕건(王建)이 선각(先覺)이라는 시호(諡號)를 내리고, 탑 이름을 편광탑(遍光塔)이라 하였다. 이 비는 선각대사가 입적한지 28년 만에 세워진 것이다.
보물 제507호로 지정되어 있다. 높이 약 2.35m, 너비 1.12m의 규모이다. 무위사 극락보전 서쪽 약 30m에 위치하는데, 돌로 쌓은 담장 안에 남향으로 서 있다. 귀부(龜趺), 비좌(碑座), 비신(碑身), 이수 등을 다 갖추고 있는 전통적인 양식의 비(碑)다.
귀부의 두부(頭部)는 양 뿔을 뚜렷이 조각한 용머리이며, 여의주를 물고 있는 입은 투조(透彫)로 되어 있다. 거북의 등에는 6각갑(六角甲) 무늬를 양각하고, 비좌의 앞뒤 2면에는 보운(寶雲) 무늬, 양 측면에는 안상을 각각 양각(陽刻), 음각으로 새겼다. 이수에는 3단의 층급형(層級形) 받침을 새겨 겹송이 연꽃무늬를 장식하였다.
비제(碑題)는 \'고려국고무위갑사선각대사편광영탑비명 정서(高麗國故無爲岬寺先覺大師遍光靈塔碑銘 井序)\'라고 시작하여 지은이 최언휘와 쓴 이 유훈율의 성명을 기록하였다. 각부의 조각 기법은 당대의 다른 비석에 비하여 사실(寫實)의 경향을 띠어 조각예술로서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새겨진 글자의 크기는 2cm이고 해서체(楷書體)이다.
비문(碑文)에 따르면, 선각대사는 무주(武州 지금의 광주) 출신으로 법휘(法諱)는 형미(逈微)이고, 속성은 최씨이다. 882년(신라 헌강왕 8)인 18세에 구례 화엄사에서 구족계(具足戒)를 받았으며, 그 후 가지산 보림사, 구산선문의 태두인 보조선사(普照禪師)를 찾아가 선법(禪法)을 배웠다. 그리고 27세에 당나라에 들어가 운거도응(雲居道應)의 심인(心印)을 받고 905년에 귀국하여 강진 무위갑사에 머무르니 이때가 선각대사의 나이 41세 때의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2-6. 미륵전의 석불
이곳 미륵전(彌勒殿) 안에는 무위사와 잘 어울리는 석불(石佛)이 봉안되어 있다.지방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토속적인 불상이 있기 마련인데, 이 석불이 이 지역을 대표하는 석불이 아닌가 싶다. 인근 수암마을에서 옮겨온 것이라고 하는데, 이 석불을 보고 있으면 이 지방의 아주머니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다.
눈두덩과 입술이 두툼하고 전체적인 얼굴이 어지간한 시련쯤은 얼마든지 견디어 낼 수 있는 강인한 여성상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본인은 배우지 못하면서도 갖은 고초를 다 겪어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굳센 남도(南道)의 어머니를 보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은 배우지 못하였어도 사리가 분명하고, 자기 주관 또한 뚜렷하여 외모만 보고 박대하였다가는 크게 무안을 당할만한 대찬 여인이다.
이 석불은 자연석에 부조(浮彫)로 새겨 모셨다. 이마 위에 육계와 머리 형태가 마치 여인의 몰림머리와 같은 형태를 하고 있어 일반적인 불상의 형식에서 많이 벗어난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불신(佛身) 주변에 화염문(火焰紋) 광배(光背)를 선각(線刻)한 점이나, 목의 삼도(三道)와 수인(手印) 등에서 석가모니불임을 알 수 있다. 부숭부숭한 눈두덩에 입술이 두텁고, 인중이 짧으며, 왼쪽 어깨는 움츠린 듯 좁게 표현하였다. 현재의하단부가 마루바닥 밑으로 들어가 있어, 정확한 크기는 알 수 없으나, 마루까지의 높이는 218cm이다.
일반 관음보살의 경우 대부분 머리에 보관을 쓰고 있는데 비하여, 백의관음은 흰 두건을 쓰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통 흰옷을 걸치고 있다. 백의관음의 형상은 백옥색(白玉色)으로 왼손을 펴서 젖가슴에 대고, 오른손에는 연꽃을 쥐고 결가부좌(結跏趺坐)를 하였으며, 무량수불을 안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백의관음은 인도에서 탄생하였기 때문에 중국풍의 수월관음(水月觀音)이전부터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당나라 말기 수월관음도에 백의(白衣)가 응용되기 시작하면서 수월관음상에 백의관음상이 융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벽화가 일어난 배경에는 수묵화(水墨畵)의 발달과 선종의 융성으로 수묵관음도(水墨觀音圖)가 나타나면서 표현상 관세음보살이 자연스럽게 백의(白衣)를 걸치게 된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수월관음(水月觀音)이란 하늘에 뜬 달이 물속에 비친 달이라는 뜻으로, 인생의 허무함에서 발생한 고난을 구제하여 달관(達觀)하게 하는 사색적인 보살로 33관음 중의 하나이다. 이 수월관음(水月觀音)을 주제로 한 그림은 주로 남인도의 바다에 면하고 있는 보타락가산(補陀洛迦山)의 바위 위에 반가좌(半跏坐)의 모습을 담고 있다.이 반가사유(半跏思惟)의 모습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환상이, 꿈 또는 물에 비친 달이 덧없음과 같다는 것을 깨우침으로써 고난을 초월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2-4. 삼층석탑
무위사 극락전 오른쪽에 자리하고 있는 탑으로, 전체의 무게를 지탱하는 기단(基壇)을 2층으로 두고, 그 위로 3층의 탑신(塔身)을 올려놓은 모습이다. 기단은 각 층의 4면마다 기둥 모양을 본떠 새겼는데, 아래층은 면의 모서리와 가운데에, 위층은 모서리에만 두었다. 특히 아래층에는 기둥조각으로 나뉜 8곳에 안상(眼象)을 세밀하게
새겨 장식하였다. 탑신은 각 층의 몸돌과 지붕돌이 각각 하나의 돌로 이루어져 있고, 몸돌의 모서리마다 기둥 모양을 새겨 놓았다. 얇고 평평해 보이는 지붕돌은 밑면에 4단씩의 받침을 두었으며, 처마는 수평을 이루다 양쪽가에서 가볍게 위로 들려 있다. 꼭대기에는 네모난 받침돌 위로 세 개의 머리장식이 가지런히 올려져 있다.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그 크기가 적당히 줄어들어 있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 탑으로, 비록 1층과 3층의 지붕돌이 약간 깨져 있긴 하나 대체로 원래의 모습이 잘 간직되어 있다. 만든 시기는 뒤에 서있는 선각대사편광탑비(945년에 만들어짐)와 같은 때이거나 그보다 조금 떨어지는 고려시대 전기일 것으로 추측된다.
2-5. 선각대사 편광탑비(先覺大師 遍光塔碑) : 보물 제507호
이 탑비는 선각대사 형미(逈微)를 기리기 위하여 세운 것으로, 고려 정종 원년(946년)에 세운 것이다. 선각대사는 신라 말의 명승으로, 당나라에 건너가서 14년 만에 돌아와 무위사에 8년간 머물렀다. 고려 태조 원년(918년)에 54세의 나이로 입적하자 태조 왕건(王建)이 선각(先覺)이라는 시호(諡號)를 내리고, 탑 이름을 편광탑(遍光塔)이라 하였다. 이 비는 선각대사가 입적한지 28년 만에 세워진 것이다.
보물 제507호로 지정되어 있다. 높이 약 2.35m, 너비 1.12m의 규모이다. 무위사 극락보전 서쪽 약 30m에 위치하는데, 돌로 쌓은 담장 안에 남향으로 서 있다. 귀부(龜趺), 비좌(碑座), 비신(碑身), 이수 등을 다 갖추고 있는 전통적인 양식의 비(碑)다.
귀부의 두부(頭部)는 양 뿔을 뚜렷이 조각한 용머리이며, 여의주를 물고 있는 입은 투조(透彫)로 되어 있다. 거북의 등에는 6각갑(六角甲) 무늬를 양각하고, 비좌의 앞뒤 2면에는 보운(寶雲) 무늬, 양 측면에는 안상을 각각 양각(陽刻), 음각으로 새겼다. 이수에는 3단의 층급형(層級形) 받침을 새겨 겹송이 연꽃무늬를 장식하였다.
비제(碑題)는 \'고려국고무위갑사선각대사편광영탑비명 정서(高麗國故無爲岬寺先覺大師遍光靈塔碑銘 井序)\'라고 시작하여 지은이 최언휘와 쓴 이 유훈율의 성명을 기록하였다. 각부의 조각 기법은 당대의 다른 비석에 비하여 사실(寫實)의 경향을 띠어 조각예술로서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새겨진 글자의 크기는 2cm이고 해서체(楷書體)이다.
비문(碑文)에 따르면, 선각대사는 무주(武州 지금의 광주) 출신으로 법휘(法諱)는 형미(逈微)이고, 속성은 최씨이다. 882년(신라 헌강왕 8)인 18세에 구례 화엄사에서 구족계(具足戒)를 받았으며, 그 후 가지산 보림사, 구산선문의 태두인 보조선사(普照禪師)를 찾아가 선법(禪法)을 배웠다. 그리고 27세에 당나라에 들어가 운거도응(雲居道應)의 심인(心印)을 받고 905년에 귀국하여 강진 무위갑사에 머무르니 이때가 선각대사의 나이 41세 때의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2-6. 미륵전의 석불
이곳 미륵전(彌勒殿) 안에는 무위사와 잘 어울리는 석불(石佛)이 봉안되어 있다.지방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토속적인 불상이 있기 마련인데, 이 석불이 이 지역을 대표하는 석불이 아닌가 싶다. 인근 수암마을에서 옮겨온 것이라고 하는데, 이 석불을 보고 있으면 이 지방의 아주머니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다.
눈두덩과 입술이 두툼하고 전체적인 얼굴이 어지간한 시련쯤은 얼마든지 견디어 낼 수 있는 강인한 여성상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본인은 배우지 못하면서도 갖은 고초를 다 겪어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굳센 남도(南道)의 어머니를 보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은 배우지 못하였어도 사리가 분명하고, 자기 주관 또한 뚜렷하여 외모만 보고 박대하였다가는 크게 무안을 당할만한 대찬 여인이다.
이 석불은 자연석에 부조(浮彫)로 새겨 모셨다. 이마 위에 육계와 머리 형태가 마치 여인의 몰림머리와 같은 형태를 하고 있어 일반적인 불상의 형식에서 많이 벗어난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불신(佛身) 주변에 화염문(火焰紋) 광배(光背)를 선각(線刻)한 점이나, 목의 삼도(三道)와 수인(手印) 등에서 석가모니불임을 알 수 있다. 부숭부숭한 눈두덩에 입술이 두텁고, 인중이 짧으며, 왼쪽 어깨는 움츠린 듯 좁게 표현하였다. 현재의하단부가 마루바닥 밑으로 들어가 있어, 정확한 크기는 알 수 없으나, 마루까지의 높이는 218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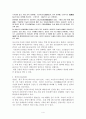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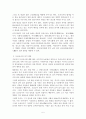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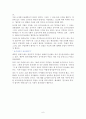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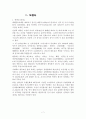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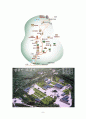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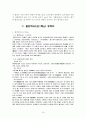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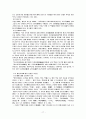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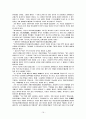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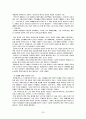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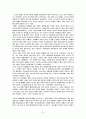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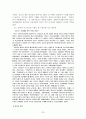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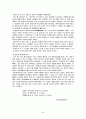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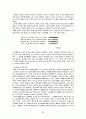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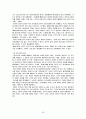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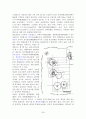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