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라데팡스는 미래형신도시로 50여 개의 빌딩이 모여있는 곳이다. 신 개선문은 프랑스 혁명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었고 이것은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35층짜리 사무실 빌딩이다. 높이는 110미터에 달하며, 유리, 화강암, 그리고 백색의 카라라 대리석으로 장식됐으며, 이는 지름 100미터 넓이의 광장에 세워졌다. 방문객은 내부 공간에 있는 유리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된 지붕과 외부 전망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전망대는 도시의 독특한 전망과 이 중심지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출처 : 마크 어빙 외 공저,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세계 건축 1001, 2009. 1. 20., 마로니에북스
이 신 개선문은 구 개선문(에투알 개선문)과 같은 선상에 위치하게 지어졌다. 그래서 신 개선문의 전망대로 올라가면 구 개선문을 볼 수 있게 해놓았다. 그래서 더욱 신과 구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볼 수 있는 것 같다. 매우 크게 지어진 건물이어서 흉물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 하늘을 그대로 비추는 유리를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주변 환경을 담아낸다. 디자인은 심플한 직선을 사용하여서 매우 현대적이다. 또한 아랫부분에 추상적인 형태의 막으로 구조를 둘렀다.
프랑스 사람들은 변화나 튀는 것을 싫어하는 것인지 예전에 에펠탑도 흉물이라고 평가했었던 반면 지금 에펠탑이 파리를 대표하는 건축물이 된 것을 보면 나중에 신 개선문도 ‘현대의 파리’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편 20c의 이탈리아에서는 고전건축을 재해석한 건축가로써 세기를 빛내었다고 평가되어지는 사람이 있다. 근대는 건축이 가벼운 절충주의와 무의미한 역사적 건축요소인 아치, 박공지붕, 장식 등의 인용 및 적용 상업적 포장술의 건축이 범람하여 결국에는 부정적인 비평에 이르게 되었다. 출처 : 니콜라우스 페브스너, 근대건축과 디자인의 원천, 1986, 태림문화사
그런 무분별한 양식의 파도 속에서 기존 도시건축을 재구성하여 현대의 건축 양식에 적용한 건축가가 바로 이탈리아의 ‘알도로시(Aldo Rossi)’이다.
그는 고전건축이 지닌 형태와 공간을 연구하고 이를 현대적 건축물로 재탄생시킨 인물이다. 그는 “건축물은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주장을 했고, 극간소화된 도형(삼각형, 사각형, 원, 원기둥 등)을 기본으로 건축물을 디자인했다. 그가 대표한 건축 사조를 \'신합리주의\' 라고도 한다.
그의 대표적인 건축물은 바로 ‘세계의 극장(The Theater of the World)’이다. 이는 1979년 11월 베니스비엔날레의 출품작이다. 이 비엔날레에서는‘18c 베니스의 수상극장’이 테마였다. ‘세계의 극장’은 원형극장의 형태이며 물 위를 떠다닐 수 있게 디자인되었다. 작은 배 위에 높이 25m, 폭이 9.5m인 소극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극장은 역시 알도로시가 기본 디자인 형상으로 삼았던 삼각형과 사각형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이다. 알도로시가 무엇보다 이론적, 근원적, 과거에 대한 고찰과 회기를 모태로 삼았기 때문에 그의 건축물은 단순한 형태이지만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러한 고전 건축양식을 재해석하거나 투영하여 건축물에 반영한 건축가로 이탈리아에 알도로시가 있다면 미국에는 ‘루이스 칸’이 있다. 그의 건축은 당시의 건축사조와는 사뭇 달랐다. 현대건축의 특징이 유동적이고 명랑한 것이라면 칸의 건축물들은 대체로 우아하고 진중하다. 한 예로 국립현대미술관-과천관을 지은 김태수 건축가는 대학 3년 재학중에 우연히‘PA’잡지를 보다가 루이스 칸의 예일아트갤러리(1953년 완공)를 발견하고 한눈에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그 당시에 루이스 칸은 별로 유명하지 않았는데, 미스 반 데로에, 발터 그로피우스, 르 꼬르뷔제와는 달리 현대적이면서 동시에 과거의 유산, 이집트 시대에서부터 연결되어 지는 휴머니티의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무엇이 그의 건축에 그러한 아우라를 느끼게 했을까? 그는 당시 유행하던 건축사조를 따르지 않고 건축의 본질을 끝없이 알아내려 애썼다. 즉, 그의 건축은 고전 건축양식을 따른다기보다는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처음 보았을 때 느껴지는 그 장엄하고 신비로운 느낌과 같은 고전적인 품격을 이어 갔다고 볼 수 있다. 아까 언급한 ‘예일아트갤러리’는 예일대학 내에 있어서 최초의 현대건축이며, 점과 거리에 면한 연속성을 배려한 동측의 파사드가 정층 돌쌓기에 수평보더를 배치하였을 뿐만아니라 북측은 중정을 놓아 개방되게 하였다. 내부의 천장은 삼각추를 연속시킨 듯한 독특한 구조 시스템이 드러나게 디자인되었다.
느낀점
신고전주의 이후로 고전 건축양식의 건축사조가 다시 돌아온다면 아마도 장식적인 요소들이 더욱 간소화되어서 창틀이나 더더욱 자그마한 요소에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너무 뜬금없는 요소로써 나타난 고전주의 건축양식은 달갑지만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건축물들과 어우러지는 주변 환경을 고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 예로 미국은 그 뿌리가 사실상 유럽에 있기 때문에 워싱턴의 ‘토머스 제퍼슨 기념관’ 이나 ‘링컨 기념관’은 어색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탈아입구(탈아시아론;서구를 따라함)를 외치던 근대시대의 일본에서 영향을 받아 지은 덕수궁 미술관은 기와가 올라간 돌담길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어색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통상적으로는 장식이 간소화되어있는 것을 ‘현대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모던 스타일로 현대를 대표하는 디자인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최근의 건축물은 모듈화된 건축양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해체주의 건축’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빌라나 호텔같은 곳에서나 종종 고전 건축양식의 박공 지붕양식, 창틀의 아치 양식이 적용된 것을 주로 볼 수 있고 커다란 건축물로써는 드문드문하게 잘 보이지 않는 편이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해체주의 건축양식도 소위 ‘유행하는 건축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루이스 칸은 이러한 유행의 파도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만의 철학을 갖고 건축의 본질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나도 앞으로 건축을 해나가면서 나만의 건축양식을 가질 수 있는 건축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신 개선문은 구 개선문(에투알 개선문)과 같은 선상에 위치하게 지어졌다. 그래서 신 개선문의 전망대로 올라가면 구 개선문을 볼 수 있게 해놓았다. 그래서 더욱 신과 구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볼 수 있는 것 같다. 매우 크게 지어진 건물이어서 흉물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 하늘을 그대로 비추는 유리를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주변 환경을 담아낸다. 디자인은 심플한 직선을 사용하여서 매우 현대적이다. 또한 아랫부분에 추상적인 형태의 막으로 구조를 둘렀다.
프랑스 사람들은 변화나 튀는 것을 싫어하는 것인지 예전에 에펠탑도 흉물이라고 평가했었던 반면 지금 에펠탑이 파리를 대표하는 건축물이 된 것을 보면 나중에 신 개선문도 ‘현대의 파리’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편 20c의 이탈리아에서는 고전건축을 재해석한 건축가로써 세기를 빛내었다고 평가되어지는 사람이 있다. 근대는 건축이 가벼운 절충주의와 무의미한 역사적 건축요소인 아치, 박공지붕, 장식 등의 인용 및 적용 상업적 포장술의 건축이 범람하여 결국에는 부정적인 비평에 이르게 되었다. 출처 : 니콜라우스 페브스너, 근대건축과 디자인의 원천, 1986, 태림문화사
그런 무분별한 양식의 파도 속에서 기존 도시건축을 재구성하여 현대의 건축 양식에 적용한 건축가가 바로 이탈리아의 ‘알도로시(Aldo Rossi)’이다.
그는 고전건축이 지닌 형태와 공간을 연구하고 이를 현대적 건축물로 재탄생시킨 인물이다. 그는 “건축물은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주장을 했고, 극간소화된 도형(삼각형, 사각형, 원, 원기둥 등)을 기본으로 건축물을 디자인했다. 그가 대표한 건축 사조를 \'신합리주의\' 라고도 한다.
그의 대표적인 건축물은 바로 ‘세계의 극장(The Theater of the World)’이다. 이는 1979년 11월 베니스비엔날레의 출품작이다. 이 비엔날레에서는‘18c 베니스의 수상극장’이 테마였다. ‘세계의 극장’은 원형극장의 형태이며 물 위를 떠다닐 수 있게 디자인되었다. 작은 배 위에 높이 25m, 폭이 9.5m인 소극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극장은 역시 알도로시가 기본 디자인 형상으로 삼았던 삼각형과 사각형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이다. 알도로시가 무엇보다 이론적, 근원적, 과거에 대한 고찰과 회기를 모태로 삼았기 때문에 그의 건축물은 단순한 형태이지만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러한 고전 건축양식을 재해석하거나 투영하여 건축물에 반영한 건축가로 이탈리아에 알도로시가 있다면 미국에는 ‘루이스 칸’이 있다. 그의 건축은 당시의 건축사조와는 사뭇 달랐다. 현대건축의 특징이 유동적이고 명랑한 것이라면 칸의 건축물들은 대체로 우아하고 진중하다. 한 예로 국립현대미술관-과천관을 지은 김태수 건축가는 대학 3년 재학중에 우연히‘PA’잡지를 보다가 루이스 칸의 예일아트갤러리(1953년 완공)를 발견하고 한눈에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그 당시에 루이스 칸은 별로 유명하지 않았는데, 미스 반 데로에, 발터 그로피우스, 르 꼬르뷔제와는 달리 현대적이면서 동시에 과거의 유산, 이집트 시대에서부터 연결되어 지는 휴머니티의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무엇이 그의 건축에 그러한 아우라를 느끼게 했을까? 그는 당시 유행하던 건축사조를 따르지 않고 건축의 본질을 끝없이 알아내려 애썼다. 즉, 그의 건축은 고전 건축양식을 따른다기보다는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처음 보았을 때 느껴지는 그 장엄하고 신비로운 느낌과 같은 고전적인 품격을 이어 갔다고 볼 수 있다. 아까 언급한 ‘예일아트갤러리’는 예일대학 내에 있어서 최초의 현대건축이며, 점과 거리에 면한 연속성을 배려한 동측의 파사드가 정층 돌쌓기에 수평보더를 배치하였을 뿐만아니라 북측은 중정을 놓아 개방되게 하였다. 내부의 천장은 삼각추를 연속시킨 듯한 독특한 구조 시스템이 드러나게 디자인되었다.
느낀점
신고전주의 이후로 고전 건축양식의 건축사조가 다시 돌아온다면 아마도 장식적인 요소들이 더욱 간소화되어서 창틀이나 더더욱 자그마한 요소에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너무 뜬금없는 요소로써 나타난 고전주의 건축양식은 달갑지만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건축물들과 어우러지는 주변 환경을 고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 예로 미국은 그 뿌리가 사실상 유럽에 있기 때문에 워싱턴의 ‘토머스 제퍼슨 기념관’ 이나 ‘링컨 기념관’은 어색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탈아입구(탈아시아론;서구를 따라함)를 외치던 근대시대의 일본에서 영향을 받아 지은 덕수궁 미술관은 기와가 올라간 돌담길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어색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통상적으로는 장식이 간소화되어있는 것을 ‘현대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모던 스타일로 현대를 대표하는 디자인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최근의 건축물은 모듈화된 건축양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해체주의 건축’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빌라나 호텔같은 곳에서나 종종 고전 건축양식의 박공 지붕양식, 창틀의 아치 양식이 적용된 것을 주로 볼 수 있고 커다란 건축물로써는 드문드문하게 잘 보이지 않는 편이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해체주의 건축양식도 소위 ‘유행하는 건축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루이스 칸은 이러한 유행의 파도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만의 철학을 갖고 건축의 본질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나도 앞으로 건축을 해나가면서 나만의 건축양식을 가질 수 있는 건축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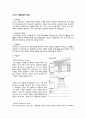


















소개글